목차
<목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본문내용
서 그런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게야.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태엽만 틀면 그 시시한 율동을 안할 수 없고...... 한없이 권태로운 반복, 우리하고 같잖아. 경아는 딸라 냄새만 맡으면 그 슬픈 ‘브로큰 잉글리시’를 지껄이고 나는 딸라 냄새에 그 똑같은 잡종의 쌍판을 그리고 또 그리고.”(181)
(...)
“사람이고 싶어. 내가 사람이라는 확인을 하고 싶어.”(181)
12.
옥희도 씨는 “내가 아직도 화가인가 알고 싶어”라는 말을 남기고 며칠 결근을 한다. 침팬지가 있는 곳으로도 며칠 째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이경은 연지동의 옥희도 씨의 집으로 다시 한 번 향한다. 그곳에서 제일 궁금했던 것, 그림에 대해 조심스레 묻는다.
나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부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돌토돌한 질감을 주는 게 이채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부연 혼돈 속에 고독이 괴물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한발에 고사한 나무- 그렇다면 잔인한 태양의 광신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태양이 없는 한발-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짙은 안개 속의 한발...... 무채색의 오돌토돌한 화면이 마치 짙은 안개 같았다.(206)
그림을 보고 심란해진 이경은 그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옥희도 씨의 부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 “그 분의 그림에서 그 절망적인 궁상을 못 읽다니......”(208) 옥희도 씨의 아내와의 말다툼은 소설 전체의 흐름에서 다소 뜬금없이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경의 예민한 반응은 삶의 실상을 날카롭게 포착하려는 주인공의 감수성과 사랑에의 갈구를 표현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13.
12장에서 주인공은 미군 죠오의 구애를 받는다. 13장에서는, 이경이 죠오가 초대한 경서호텔로 찾아갔다가 그와 관계를 나누기 직전에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나오게 된다. 이 13장은 이 책 가운데서 가장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우며 그렇기 때문에 또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장과 함께, <<나목>>의 핵심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경이 순순히 경서호텔로 찾아가 미군에게 몸을 맡기는 것은, 일종의 자기 파괴 욕구라 할 수 있다.
기실 호텔에서 주인공이 순간적으로 난동을 부리며 도망쳐 나오는 것은, 그녀의 두 오빠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육신이 죠오에 의해 처참하게 망가질 것 같았다. 혁이 오빠와 욱이 오빠의 육신처럼 호청을 붉게 물들이며 참담하고 추악하게 조각날 것 같았다. 도망쳐야지. 도망쳐야지.”(223-224) 순간적으로 침대 시트는 핏빛으로 보이고 그 환각은 마침내 그녀의 기억을 소급한다. “오 노오, 프리이스 프리이스 돈 브레이크 미”(224) 하고 애원하는 장면과 앞전의 무참히 찢겨진 젊은 육체의 환각은 심층적으로 볼 때 의미심장하다.
미국인 죠오와의 성관계가 곧 파멸을 의미한다는 직관은, 단순히 성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오빠들의 죽음을 초래한 어두운 힘이 그대로 자기마저 휩쓸고 부숴버리려 한다는 것을 예감한 일종의 육체적 직관이다. 그것은 전쟁을 몰고 온 어둠의 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다.
14.
14장에서는 앞 서 암시되었던 두 오빠의 죽음의 자세한 내막이 서술된다. 전쟁이 한창일 무렵, 주인공의 두 오빠는 피란에 실패하고 징집을 피해 고택의 한 구석에 숨어 지내던 중이었다. 그러다 큰 아버지와 민이 오빠의 내방으로 은신처를 바꿔야 할 일이 생겼다. 주인공의 아이디어로 두 오빠는 한 모퉁이 행랑방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날 밤, 두 오빠는 포격, 혹은 폭격으로 무참하게 죽는다. 그 충격으로 오랜 병을 앓게 된 어머니는 정신이 들자 말한다.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시고 계집애만 남겨놓으셨노.”(243)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며 오빠들의 몫까지 꼭 효도를 하겠다고 결심한 주인공은 어머니의 이말(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태도) 심한 상처를 받는다. 주인공은 잉여로 살아남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은 아들들에 대한 탄식으로 살아남은 딸의 삶을 잉여의 것으로 치부하는 어머니에 대해 강렬한 미움과 증오를 느낀다.
15.
미군 죠오와의 사건으로 주인공은 여전히 자신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
“사람이고 싶어. 내가 사람이라는 확인을 하고 싶어.”(181)
12.
옥희도 씨는 “내가 아직도 화가인가 알고 싶어”라는 말을 남기고 며칠 결근을 한다. 침팬지가 있는 곳으로도 며칠 째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이경은 연지동의 옥희도 씨의 집으로 다시 한 번 향한다. 그곳에서 제일 궁금했던 것, 그림에 대해 조심스레 묻는다.
나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부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돌토돌한 질감을 주는 게 이채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부연 혼돈 속에 고독이 괴물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한발에 고사한 나무- 그렇다면 잔인한 태양의 광신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태양이 없는 한발-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짙은 안개 속의 한발...... 무채색의 오돌토돌한 화면이 마치 짙은 안개 같았다.(206)
그림을 보고 심란해진 이경은 그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가,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옥희도 씨의 부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 “그 분의 그림에서 그 절망적인 궁상을 못 읽다니......”(208) 옥희도 씨의 아내와의 말다툼은 소설 전체의 흐름에서 다소 뜬금없이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경의 예민한 반응은 삶의 실상을 날카롭게 포착하려는 주인공의 감수성과 사랑에의 갈구를 표현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13.
12장에서 주인공은 미군 죠오의 구애를 받는다. 13장에서는, 이경이 죠오가 초대한 경서호텔로 찾아갔다가 그와 관계를 나누기 직전에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나오게 된다. 이 13장은 이 책 가운데서 가장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우며 그렇기 때문에 또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장과 함께, <<나목>>의 핵심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경이 순순히 경서호텔로 찾아가 미군에게 몸을 맡기는 것은, 일종의 자기 파괴 욕구라 할 수 있다.
기실 호텔에서 주인공이 순간적으로 난동을 부리며 도망쳐 나오는 것은, 그녀의 두 오빠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육신이 죠오에 의해 처참하게 망가질 것 같았다. 혁이 오빠와 욱이 오빠의 육신처럼 호청을 붉게 물들이며 참담하고 추악하게 조각날 것 같았다. 도망쳐야지. 도망쳐야지.”(223-224) 순간적으로 침대 시트는 핏빛으로 보이고 그 환각은 마침내 그녀의 기억을 소급한다. “오 노오, 프리이스 프리이스 돈 브레이크 미”(224) 하고 애원하는 장면과 앞전의 무참히 찢겨진 젊은 육체의 환각은 심층적으로 볼 때 의미심장하다.
미국인 죠오와의 성관계가 곧 파멸을 의미한다는 직관은, 단순히 성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오빠들의 죽음을 초래한 어두운 힘이 그대로 자기마저 휩쓸고 부숴버리려 한다는 것을 예감한 일종의 육체적 직관이다. 그것은 전쟁을 몰고 온 어둠의 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다.
14.
14장에서는 앞 서 암시되었던 두 오빠의 죽음의 자세한 내막이 서술된다. 전쟁이 한창일 무렵, 주인공의 두 오빠는 피란에 실패하고 징집을 피해 고택의 한 구석에 숨어 지내던 중이었다. 그러다 큰 아버지와 민이 오빠의 내방으로 은신처를 바꿔야 할 일이 생겼다. 주인공의 아이디어로 두 오빠는 한 모퉁이 행랑방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날 밤, 두 오빠는 포격, 혹은 폭격으로 무참하게 죽는다. 그 충격으로 오랜 병을 앓게 된 어머니는 정신이 들자 말한다.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시고 계집애만 남겨놓으셨노.”(243)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며 오빠들의 몫까지 꼭 효도를 하겠다고 결심한 주인공은 어머니의 이말(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태도) 심한 상처를 받는다. 주인공은 잉여로 살아남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은 아들들에 대한 탄식으로 살아남은 딸의 삶을 잉여의 것으로 치부하는 어머니에 대해 강렬한 미움과 증오를 느낀다.
15.
미군 죠오와의 사건으로 주인공은 여전히 자신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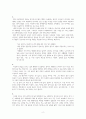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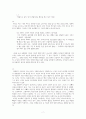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