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머리말
Ⅱ.명조 통치체제의 성립
ⅰ)태조의 전제권 강화
ⅱ)영락제의 전제권 확립
Ⅲ.황제권의 양륜:내각과 환관
ⅰ)내각제도의 발전
ⅱ)환관의 정치개입
ⅲ)수보장거정의 전권정치
Ⅳ.전제적 중앙집권화에 대한 신사의 대응
Ⅴ.맺음말
Ⅱ.명조 통치체제의 성립
ⅰ)태조의 전제권 강화
ⅱ)영락제의 전제권 확립
Ⅲ.황제권의 양륜:내각과 환관
ⅰ)내각제도의 발전
ⅱ)환관의 정치개입
ⅲ)수보장거정의 전권정치
Ⅳ.전제적 중앙집권화에 대한 신사의 대응
Ⅴ.맺음말
본문내용
들의 집합장소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림강학은 동림서원에서 행해지는 강학활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동림서원을 중심으로 분당이 건립되어 강학을 행하고 있었다. 분원의 강학은 동림서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지고 자주 주맹인 고헌성을 초빙하여 강의를 들었으며 고헌성이 주맹이 되어서도 역시 분원을 순회하면서 강학활동을 주도하여 타지방에까지 동림서원의 세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갔다.
동림서원의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계사경찰에서 산적당한 반내각파 인물들이 운집하게 되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일부 조신들과 지식층 인사들이 규합되어 점차 私黨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림서원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천하의 군자들이 동림의 정의에 귀의하게 되어 與論을 좌우하는 잠재력을 發揮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동림서원은 강력한 재야세력을 형성하고 講學活動을 배경으로 시정을 논의하여 주권파에 대항하므로서 명실상부한 政治集團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명말의 朋黨 結成은 결국 6부의 실권을 내각이 權力偏重이라는 제도적 모순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6부의 실권을 다시 찾기 위하여 鬪爭하는 과정에서 내각파와 반내각파가 형성되고 계사경찰에서 추출된 반내각파 인물들이 大同一致하여 東林書院을 중심으로 會同함으로써 東林黨이 결성되었던 것이다.
----------------------
25)谷應泰,《明史紀事本末》,卷 66,臺北,삼민서국,1969,p.713.
Ⅴ.맺음말.
명조의 통치체제는 홍무~영락시기에 걸쳐 확립되었다. 태조는 황권의 안정과 남부중심체제의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 의옥을 일으켜 동향의 건국 공신집단과 남부출신관료들을 제거하였다. 토착세력과 유착하기 쉬운 남인 관료에 대한 견제는 영락제의 북경천도에 의해 해소되고 중국 전역의 통일적 지배체제가 성립하였다. 태조는 관료기구의 정점에 있는 중서성과 승상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개혁을 비롯하여 행정·사법·군사의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로 집중시켜 里甲농민을 기저로 한 황제일원적 지배를 확립하였다. 萬機를 직접 통할하게 된 황제에게는 자연 그 업무의 보조자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황제의 가장 측근집단인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황제의 비서관을 출발한 내각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영락제시기부터 시작되었다. 明代의 皇帝獨裁體制는 이 宦官과 內閣이라는 두 사적 기구를 버팀돌로 하여 가능하였다.
환관세력의 대표인 사례태감은 지위상으로는 4품에 불과하나 표의와 인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권을 행사하지만 일단 황제의 총애가 끝나면 바로 비극적 종말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으로는 제한된 성격의 기구였다. 명대 환관의 정치행태는 황제의 사적 이익추구를 돕고 회뢰 등의 개인적 부패를 노정하였다. 내각은 초기에는 하품의 청요관인 한림원 修撰·編修등이 입각하여 비서적인 기능을 행하였으나, 장주의 표의권이 있으므로 점차 정책결정기구로서 기능하고, 각신도 상서겸관으로 입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료계의 정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내각은 원래 황제의 사적 기구라는 성격이지만 그 기능·지위상으로 이같이 관료계의 정점에 위치하게 되자 가정초 대례의 논쟁의 경우와 같이 황제와 대립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례의 논쟁에서 내각을 중심으로 한 관료계가 황제 의지를 꺾지 못하고, 그 결과 황제의지에 영합하는 대례파가 내각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후 내각의 수보권은 더욱 강화되어 갔지만, 그것은 황제 일원적인 지배와의 밀착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환관과 내각의 두 사적 기구를 기반으로 한 명대황제권은 관료가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행정지원으로부터 고립되어 명 후기로 갈수록 사적인 정치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명대 내각이 가장 막강했던 시기는 융경말~만력초의 10년간 장거정수보시기였다. 그는 당시의 내외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中央集權的인 皇帝一元的 支配體制의 强化를 통해 효율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하였다.
그 밑에서 내각은 考成法의 실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료기구의 정점에서 위치하게 되었으나, 그 시책은 장거정의 개인적 정치역량에 의존했던 것이다. 장거정 자신도 관료기구, 행정구조내에서 육부와 하등의 통속관계를 갖지 않는 내각에 대해 그 관료행정구조 자체를 변혁하지는 않았다. 또한 내각은 한림출신에 독점되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료에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廷臣과 대립할 여지가 컸다. 더욱이 장거정내각은 그러한 배타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관료와 독서인을 강하게 통제·탄압하였다. 장량실시, 세역징수도 관료의 효율성만을 극대화시키면서 중앙권력 주도로 행하였다. 또한 장거정은 재정절감책으로 상당한 국고잉여를 결과하였지만 그 이상 공공재정을 조절하기 위해 그것을 이용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장거정의 전권정치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명조의 당쟁은 기원하고, 그 점에서 明朝의 專制支配體制는 만력기부터 붕괴한다고 할 수 있다.
黨爭의 弊害는 어느 時代에나 莫甚한 것이며 명말의 동림당과 비동림당의 당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門戶가 紛烈 角立하여 交相하니 명은 神宗代에 이르러 실재로 滅亡한 것과 다를 바없게 되어 만력 중기 이후 계속된 동림당과 비동림당의 혼열한 黨爭은 明王朝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亡國의 根本이 되고 있는 것이다.
限定된 官職과 급증하는 관료희망자들의 수용이라는 矛盾으로 야기되는 黨爭은 革新的인 제도의 改革이 隨伴되지 않는 한 必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강좌중국사》Ⅳ, 지식산업사, 1989.
오금성, 《중국근세사회 경제사연구》, 일조각, 1986.
오금성외, 《명말·청초사회의 조명》, 도서출판 한울, 1990.
윤혜영 편역, 《중국사》,흥성사, 1986.
조영록,《중국근세정치사연구》,지식산업사, 1988.
민두기, 《중국근세사연구-신사층의 사상과 행동》,일조각, 1973.
권중달, <명대의 교육제도-특히 명왕조의 군주독재적 성격과 관련하여>, 《대동문화연구》, 17, 1983.
김종박, <명대 동림 당쟁과 그 사회 배경>, 《동양사학연구》, 16, 1981.
고창석, <명대의 동창·서창에 대한 고찰>, 《경북사학》,2, 1982.
조영록,<명태조의 군주권 강화와 언로개방책>, 《역사와 인간의 대응》,1984.
동림강학은 동림서원에서 행해지는 강학활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동림서원을 중심으로 분당이 건립되어 강학을 행하고 있었다. 분원의 강학은 동림서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지고 자주 주맹인 고헌성을 초빙하여 강의를 들었으며 고헌성이 주맹이 되어서도 역시 분원을 순회하면서 강학활동을 주도하여 타지방에까지 동림서원의 세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갔다.
동림서원의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계사경찰에서 산적당한 반내각파 인물들이 운집하게 되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일부 조신들과 지식층 인사들이 규합되어 점차 私黨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림서원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천하의 군자들이 동림의 정의에 귀의하게 되어 與論을 좌우하는 잠재력을 發揮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동림서원은 강력한 재야세력을 형성하고 講學活動을 배경으로 시정을 논의하여 주권파에 대항하므로서 명실상부한 政治集團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명말의 朋黨 結成은 결국 6부의 실권을 내각이 權力偏重이라는 제도적 모순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6부의 실권을 다시 찾기 위하여 鬪爭하는 과정에서 내각파와 반내각파가 형성되고 계사경찰에서 추출된 반내각파 인물들이 大同一致하여 東林書院을 중심으로 會同함으로써 東林黨이 결성되었던 것이다.
----------------------
25)谷應泰,《明史紀事本末》,卷 66,臺北,삼민서국,1969,p.713.
Ⅴ.맺음말.
명조의 통치체제는 홍무~영락시기에 걸쳐 확립되었다. 태조는 황권의 안정과 남부중심체제의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 의옥을 일으켜 동향의 건국 공신집단과 남부출신관료들을 제거하였다. 토착세력과 유착하기 쉬운 남인 관료에 대한 견제는 영락제의 북경천도에 의해 해소되고 중국 전역의 통일적 지배체제가 성립하였다. 태조는 관료기구의 정점에 있는 중서성과 승상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개혁을 비롯하여 행정·사법·군사의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로 집중시켜 里甲농민을 기저로 한 황제일원적 지배를 확립하였다. 萬機를 직접 통할하게 된 황제에게는 자연 그 업무의 보조자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황제의 가장 측근집단인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황제의 비서관을 출발한 내각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영락제시기부터 시작되었다. 明代의 皇帝獨裁體制는 이 宦官과 內閣이라는 두 사적 기구를 버팀돌로 하여 가능하였다.
환관세력의 대표인 사례태감은 지위상으로는 4품에 불과하나 표의와 인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권을 행사하지만 일단 황제의 총애가 끝나면 바로 비극적 종말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으로는 제한된 성격의 기구였다. 명대 환관의 정치행태는 황제의 사적 이익추구를 돕고 회뢰 등의 개인적 부패를 노정하였다. 내각은 초기에는 하품의 청요관인 한림원 修撰·編修등이 입각하여 비서적인 기능을 행하였으나, 장주의 표의권이 있으므로 점차 정책결정기구로서 기능하고, 각신도 상서겸관으로 입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관료계의 정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내각은 원래 황제의 사적 기구라는 성격이지만 그 기능·지위상으로 이같이 관료계의 정점에 위치하게 되자 가정초 대례의 논쟁의 경우와 같이 황제와 대립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대례의 논쟁에서 내각을 중심으로 한 관료계가 황제 의지를 꺾지 못하고, 그 결과 황제의지에 영합하는 대례파가 내각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후 내각의 수보권은 더욱 강화되어 갔지만, 그것은 황제 일원적인 지배와의 밀착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환관과 내각의 두 사적 기구를 기반으로 한 명대황제권은 관료가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행정지원으로부터 고립되어 명 후기로 갈수록 사적인 정치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명대 내각이 가장 막강했던 시기는 융경말~만력초의 10년간 장거정수보시기였다. 그는 당시의 내외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中央集權的인 皇帝一元的 支配體制의 强化를 통해 효율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하였다.
그 밑에서 내각은 考成法의 실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료기구의 정점에서 위치하게 되었으나, 그 시책은 장거정의 개인적 정치역량에 의존했던 것이다. 장거정 자신도 관료기구, 행정구조내에서 육부와 하등의 통속관계를 갖지 않는 내각에 대해 그 관료행정구조 자체를 변혁하지는 않았다. 또한 내각은 한림출신에 독점되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료에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廷臣과 대립할 여지가 컸다. 더욱이 장거정내각은 그러한 배타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관료와 독서인을 강하게 통제·탄압하였다. 장량실시, 세역징수도 관료의 효율성만을 극대화시키면서 중앙권력 주도로 행하였다. 또한 장거정은 재정절감책으로 상당한 국고잉여를 결과하였지만 그 이상 공공재정을 조절하기 위해 그것을 이용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장거정의 전권정치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명조의 당쟁은 기원하고, 그 점에서 明朝의 專制支配體制는 만력기부터 붕괴한다고 할 수 있다.
黨爭의 弊害는 어느 時代에나 莫甚한 것이며 명말의 동림당과 비동림당의 당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門戶가 紛烈 角立하여 交相하니 명은 神宗代에 이르러 실재로 滅亡한 것과 다를 바없게 되어 만력 중기 이후 계속된 동림당과 비동림당의 혼열한 黨爭은 明王朝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亡國의 根本이 되고 있는 것이다.
限定된 官職과 급증하는 관료희망자들의 수용이라는 矛盾으로 야기되는 黨爭은 革新的인 제도의 改革이 隨伴되지 않는 한 必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강좌중국사》Ⅳ, 지식산업사, 1989.
오금성, 《중국근세사회 경제사연구》, 일조각, 1986.
오금성외, 《명말·청초사회의 조명》, 도서출판 한울, 1990.
윤혜영 편역, 《중국사》,흥성사, 1986.
조영록,《중국근세정치사연구》,지식산업사, 1988.
민두기, 《중국근세사연구-신사층의 사상과 행동》,일조각, 1973.
권중달, <명대의 교육제도-특히 명왕조의 군주독재적 성격과 관련하여>, 《대동문화연구》, 17, 1983.
김종박, <명대 동림 당쟁과 그 사회 배경>, 《동양사학연구》, 16, 1981.
고창석, <명대의 동창·서창에 대한 고찰>, 《경북사학》,2, 1982.
조영록,<명태조의 군주권 강화와 언로개방책>, 《역사와 인간의 대응》,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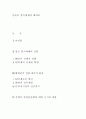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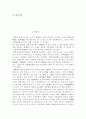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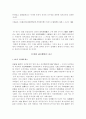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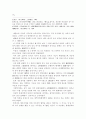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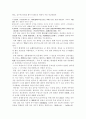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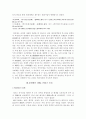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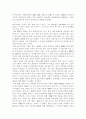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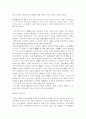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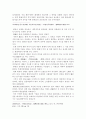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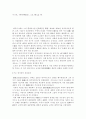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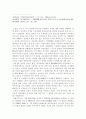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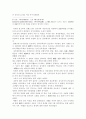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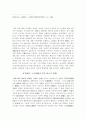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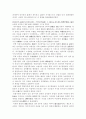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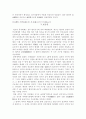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