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선어록과 일상언어
3. 서로 다른 체계들
4. 결론
2. 선어록과 일상언어
3. 서로 다른 체계들
4. 결론
본문내용
술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화두해설행위에 대한 비판만 하더라도 이 책에서 김용옥의 <<벽암록>> 해설만 문제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일본서적에서는 화두를 공공연히 해설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규탁, 한형조, 이은윤, 정성본, 김태완 등의 저서에서 화두가 해설되고 있고 목정배교수도 학술발표회 토론석에서 그런 예를 \'자연스럽게\' 제기한 적이 있는 만큼 화두에 대한 해설은 이미 공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변상섭의 관점에서 보기로 한다면, 김용옥 보다도 이은윤의 해설이 字句 하나 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 박영록, <선어록 해석의 몇가지 문제점>, <<백련불교논집·9>>에서 비슷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변상섭이 화두해설행위에 대해 비판한다면 이러한 흐름 전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광범위한 사례 수집과 차분한 논리 전개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상섭은 김용옥만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변상섭의 문제제기는 한편으로 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학계 전체의 토론대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화두를 해설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비겁한 양비론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화두를 해설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화두를 해설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본다. 사실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상섭은 선어록을 \'번역은 해야 하지만 해설 해선 안된다\'고 하였는데 \'번역\'과 \'해설\'이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 분별적인 사고 작용이 없이 번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변상섭 자신도 화두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지고 해설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그는 \"내가 지금 이렇게 김용옥선생을 뒤따라 화두에 대해 왈가왈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만 도올 선생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변상섭 저, <<김용옥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시공사, 2000, 서울. 46p
이 부분을 보면 변상섭이 자신의 서술은 \'메타 언어\'이고 남의 서술은 \'대상 언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화두에 대한 번역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논리적으로 따지는 과정\'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적으로 따지는 과정\'에서 화두에 대한 해설이 동반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연구성과가 <<선학대사전>>으로 집대성되는 것이다. 만약 화두를 해설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극단적으로 추종한다면 <<선학대사전>>에서 어휘의 절반 정도는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옳든 그르든 화두에 대한 해설 행위는 점차 많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화두를 해설하지 않는다는 미명아래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이나, 선어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으로 책을 편집하는 행위, 화두를 구체적인 사회환경과 분리시켜 절대화 시키는 것 등도 결코 칭찬 받을 행위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아예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전제에 아래 화두에 대한 학술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결론
\'선\'에 있어 \'부차적\'으로 취급되기 쉬운 문제들에 대해 \'선학\'에서는 답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 아래 \'일상언어\'와 \'선학\'의 관계에 대해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또 이러한 고찰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상적 측면\'에서만 고찰해온 여러 대상들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도 고찰할 여지가 있음을 보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현상\'과 \'언어\'는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서로 존재체계가 다른 것이며, 그런 만큼 \'선\'과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인 \'선학\' 역시 서로 별개의 체계임을 보였다. \'선 언어\'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언급\'이라면 \'선학\'은 \'그 언급\'에 대한 연구일 따름인 것이다. 학문은 그 연구의 대상과 한계를 겸허히 인정할 때 오히려 그 학문의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선학에 대한 일상언어적 접근\'에 있어 \'모순어법\' 외에 몇 가지 사례들, 예를 들어 왜 질문에는 꼭 대답을 하는지, 주인공 외에 조연들의 역할은 무시해도 좋은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분량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 참고문헌
현각스님 편, <<선학강의-선종사부록->>, 불일출판사, 1998. 순천.
이청담, 이혜성 저, <<선입문>>, 아카데미, 1975, 서울.
홍정식 저, <<법화경요해>>,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1986.
周裕 저, <<禪宗語言>>, 浙江人民出版社, 1999. 절강성 항주.
김태완 저,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장경각, 2001, 서울.
야나기다 세이잔 저, 추만호 · 안영길 역, <<선의 사상과 역사>>, 민족사, 1991, 서울.
변상섭 저, <<김용옥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시공사, 2000, 서울.
랄프 파솔드 저, 황적륜 외 공역,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1994, 서울.
*학술회의 발표논문*
김태완 저, <선, 언어, 선학 -좋은 선학을 위한 하나의 모색>, 한국선학회 제10차 정기학술회의 발표문, 2001년 3월 17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정성본 <간화선 수행과 공안공부의 문제>, 간화선 대토론회 발표논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도법스님 <왜 간화선인가>, 간화선 대토론회 약정토론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종호스님 <간화선 수행과 공안공부의 문제를 읽고>, 간화선 대토론회 약정토론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이덕진 <간화선 수행과 공안공부의 문제에 대한 논평>, 간화선 대토론회 약정토론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한형조 <한국불교의 새화두 : 간화와 돈오를 넘어>, 간화선 대토론회 발표논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종림, <한형조교수 발표문의 논평>, 간화선 대토론회 약정토론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김태완 <한형조 교수에 대한 논평>, 간화선 대토론회 약정토론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 박영록, <선어록 해석의 몇가지 문제점>, <<백련불교논집·9>>에서 비슷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변상섭이 화두해설행위에 대해 비판한다면 이러한 흐름 전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광범위한 사례 수집과 차분한 논리 전개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상섭은 김용옥만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변상섭의 문제제기는 한편으로 적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학계 전체의 토론대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화두를 해설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비겁한 양비론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화두를 해설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화두를 해설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본다. 사실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상섭은 선어록을 \'번역은 해야 하지만 해설 해선 안된다\'고 하였는데 \'번역\'과 \'해설\'이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 분별적인 사고 작용이 없이 번역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변상섭 자신도 화두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지고 해설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그는 \"내가 지금 이렇게 김용옥선생을 뒤따라 화두에 대해 왈가왈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만 도올 선생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변상섭 저, <<김용옥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시공사, 2000, 서울. 46p
이 부분을 보면 변상섭이 자신의 서술은 \'메타 언어\'이고 남의 서술은 \'대상 언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화두에 대한 번역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논리적으로 따지는 과정\'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적으로 따지는 과정\'에서 화두에 대한 해설이 동반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연구성과가 <<선학대사전>>으로 집대성되는 것이다. 만약 화두를 해설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극단적으로 추종한다면 <<선학대사전>>에서 어휘의 절반 정도는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옳든 그르든 화두에 대한 해설 행위는 점차 많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화두를 해설하지 않는다는 미명아래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이나, 선어록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으로 책을 편집하는 행위, 화두를 구체적인 사회환경과 분리시켜 절대화 시키는 것 등도 결코 칭찬 받을 행위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아예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전제에 아래 화두에 대한 학술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결론
\'선\'에 있어 \'부차적\'으로 취급되기 쉬운 문제들에 대해 \'선학\'에서는 답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 아래 \'일상언어\'와 \'선학\'의 관계에 대해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또 이러한 고찰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상적 측면\'에서만 고찰해온 여러 대상들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도 고찰할 여지가 있음을 보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현상\'과 \'언어\'는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서로 존재체계가 다른 것이며, 그런 만큼 \'선\'과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인 \'선학\' 역시 서로 별개의 체계임을 보였다. \'선 언어\'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언급\'이라면 \'선학\'은 \'그 언급\'에 대한 연구일 따름인 것이다. 학문은 그 연구의 대상과 한계를 겸허히 인정할 때 오히려 그 학문의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선학에 대한 일상언어적 접근\'에 있어 \'모순어법\' 외에 몇 가지 사례들, 예를 들어 왜 질문에는 꼭 대답을 하는지, 주인공 외에 조연들의 역할은 무시해도 좋은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분량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 참고문헌
현각스님 편, <<선학강의-선종사부록->>, 불일출판사, 1998. 순천.
이청담, 이혜성 저, <<선입문>>, 아카데미, 1975, 서울.
홍정식 저, <<법화경요해>>,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1986.
周裕 저, <<禪宗語言>>, 浙江人民出版社, 1999. 절강성 항주.
김태완 저,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장경각, 2001, 서울.
야나기다 세이잔 저, 추만호 · 안영길 역, <<선의 사상과 역사>>, 민족사, 1991, 서울.
변상섭 저, <<김용옥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시공사, 2000, 서울.
랄프 파솔드 저, 황적륜 외 공역, <<사회언어학>>, 한신문화사, 1994, 서울.
*학술회의 발표논문*
김태완 저, <선, 언어, 선학 -좋은 선학을 위한 하나의 모색>, 한국선학회 제10차 정기학술회의 발표문, 2001년 3월 17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
정성본 <간화선 수행과 공안공부의 문제>, 간화선 대토론회 발표논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도법스님 <왜 간화선인가>, 간화선 대토론회 약정토론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종호스님 <간화선 수행과 공안공부의 문제를 읽고>, 간화선 대토론회 약정토론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이덕진 <간화선 수행과 공안공부의 문제에 대한 논평>, 간화선 대토론회 약정토론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한형조 <한국불교의 새화두 : 간화와 돈오를 넘어>, 간화선 대토론회 발표논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종림, <한형조교수 발표문의 논평>, 간화선 대토론회 약정토론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김태완 <한형조 교수에 대한 논평>, 간화선 대토론회 약정토론문, 2000년 10월 24일, 조계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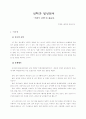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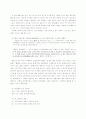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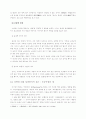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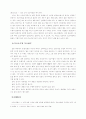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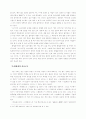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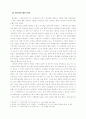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