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삼국시대의 모습
1) 기본 고유 저고리 치마
2) 벽화에 나타난 치마 저고리
3. 통일 신라 시대의 모습
1) 흥덕왕 복식금제를 통해 본 치마 저고리 모습
2) 용강동 출토 토용을 통해 본 치마 저고리 모습
4. 고려 시대의 모습
1) 둔마리 고분의 공양 인물
2) 나한도(羅漢圖) 옆의 여인상
3) 유물 저고리
4) 목우상(木偶像) 치마 저고리 모습
5) 하연부인상(河演夫人像)
6) 관경서분변상도(觀經序分變相圖)
5. 조선시대의 모습
1) 15세기의 신말주 계회도(申末舟 契會圖)
2) 16세기
3) 17세기
4) 18세기
5) 19세기
6) 20세기
7) 치마
6. 결론
2. 삼국시대의 모습
1) 기본 고유 저고리 치마
2) 벽화에 나타난 치마 저고리
3. 통일 신라 시대의 모습
1) 흥덕왕 복식금제를 통해 본 치마 저고리 모습
2) 용강동 출토 토용을 통해 본 치마 저고리 모습
4. 고려 시대의 모습
1) 둔마리 고분의 공양 인물
2) 나한도(羅漢圖) 옆의 여인상
3) 유물 저고리
4) 목우상(木偶像) 치마 저고리 모습
5) 하연부인상(河演夫人像)
6) 관경서분변상도(觀經序分變相圖)
5. 조선시대의 모습
1) 15세기의 신말주 계회도(申末舟 契會圖)
2) 16세기
3) 17세기
4) 18세기
5) 19세기
6) 20세기
7) 치마
6. 결론
본문내용
목판 깃이라고 추정하고 여밈도 매우 길다. 느슨하게 여유 있는 매무새로 보인다. 조반 부인상(趙伴夫人像)이 있다. 고려말에 태어나서 조선조 초까지 산 사람으로 하연부인(河演夫人)과 거의 동시대이나 옷의 종류는 완전히 다르다. 조반 부인은 확실히 조선조 초기의 복식을 하고 있다. 긴 치마를 입고 치마 허리 끈을 길게 늘이고 있다. 저고리는 계회도 여인상보다는 다소 짧고, 깃은 같은 듯하고 고름은 있을 것이나 팔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2) 16세기
유물로 1965년 경기도 광주에서 출토된 1560년대 것인 치마 저고리가 있다. 수의이기는 하지만 저고리가 매우 크다. 대단히 풍신한 모습이다. 그런데 깃·섶·겨마기·끝동이 저고리와는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 겉깃 끝은 지금 저고리의 안깃 모양이다. 저고리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옆이 퍼져 있다. 치마 길이는 그리 길지 않으나 폭은 넓은 듯하다. 안동김씨 수의에는 고름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으나 다른 유물에서 보면 고름은 실용적인 좁고(1~2cm) 짧은(20~25cm)것이다.
3) 17세기
저고리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여자 저고리가 2점이 있다. 한 점은 광해군 부인인 중궁유씨의 것으로 일반 저고리보다는 훨씬 길이가 길어 마치 당의의 시초라고 보고 있다. 깃은 16세기와 달리 깃이 섶 위에 앉혀졌는데 당코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궁의 것은 여전히 저고리 깃이 16세기의 형 그대로이다. 일반적으로 유물을 보면 저고리 길이가 시대가 흐르면서 약간씩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7세기의 특징의 하나로서 월정사 소장의 1660년대 저고리를 보면 겨드랑이 밑에 무가 달려 있다.
4) 18세기
이대 박물관 소장의 완산최씨 저고리가 있다. 그 특징은 저고리 길이가 다소 짧아지면 배래선이 수구를 약간 좁히면서 곡선이 되어 있다. 겉섶 넓이가 위 아래로 넓어서 여밈이 깊은 편이다. 그리고 곁마기의 위가 소매 쪽으로 다소 뻗어 나가고 있음이 특징이다.
5) 19세기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할 때이다, 19세기초의 유물에서 보면 초기에는 저고리 길이가 30cm 정도이었으나 작고 짧아져서 말엽에는 18cm 정도까지도 되었다. 그러면서 당코 목판 깃에서 모서리를 둥글리게 되고 진동도 좁고 다 작아져 갔다.
6) 20세기
초기에는 19세기의 모습이 계속되다가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활동에 편안할 정도로 저고리가 길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화장·진동·배래·수구 등이 넉넉해 지고 있다. 1940년대부터는 저고리 길이가 긴 것이 유행이 되어 30~38cm까지 내려갔다가 1960년대 부터 다시 짧아졌고 미적 감각이 발달하면서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큰 변동은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깃 모양의 변천은 초기에는 넓이가 10.5cm나 되다가 중기가 되면서 깃 길이가 짧아지고 넓이도 좁아졌다. 그리고 목판 깃에서 당코 깃으로 그리고 현재와 같은 깃이 되었다
.
고름도 초기에는 불과 1~2cm나비에 길이 20~25cm정도로 좁고 짧았으나 중기가 되면서 약간 길고 넓어졌다. 후기에는 한 때 극단적으로 넓어지고 길어지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안착이 된 셈이다.
7) 치마
유물을 통하여 보면 의례용으로 대란치마·스란치마가 있는데 말기에는 겹치마로 변하였다. 일반적으로 발등 길이가 보통이고, 일하는 사람은 홑으로 걷어 올려 입은 모습이 풍속화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의 안동김씨 유물을 보면 19세기의 것으로 상류층 사람의 치마단의 변천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양쪽 선단을 같은 감이나 따로단을 대어 2.5cm나비로 바느질하고 아래 단은 가로지로 3cm나비로 딴 단을 대고 있다. 다음 단계는 안쪽 선단은 제단을 2cm 나비로 접었고 거죽 선단은 딴 단을 3~3.5cm 나비로 대고 밑에 단은 가로지로 4cm나비의 딴 단을 대고 있다. 그러다가 양쪽 선단을 모두 제단으로 하고 밑에 단만 가로지로 4cm정도 딴 단을 대고 있다. 지금과 같이 선단 아랫단 모두 제단을 접어서 만든 것은 19세기 말엽부터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의 무명치마는 0.4~0.5cm로 가늘게 제단으로 감쳐져 있다.
아무튼 조선조에서는 긴치마에 여유 있게 긴 저고리를 입어 오다가 조선조 중후기부터 저고리가 짧아지고 따라서 작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화기부터 다시 활동하기 편하게 하면서 통치마가 생겼고 여자들이 활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긴치마를 걷어 올려 매어 입었고 치마 길이를 짧게도 하였다
5. 결론
이상으로 우리 나라의 역사의 흐름과 함께 흐른 전통의례복식 중 치마저고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통의례복식에는 관혼상제를 위한 사례복식과 함께 평생을 두고 행하여졌을 의례와 관련된 복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이전의 의례복식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비하여 단편적인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유교가 정신적 문화적 바탕을 이루었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예학의 융성과 보급과 함께 의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 실생활 속에서 실행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의례와 관련된 복식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조 말기 이후에 들어온 서구문물의 영향으로 전통생활 방식에 변화가 초래되었고, 따라서 의례나 그에 따른 복식은 점차 사라지면서 그 모습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근래에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됨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느낀 것은 역사를 공부하고 있기에 전통의복이라 하면, 막연히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한복이나 역사드라마에 나오는 의상들을 떠올리곤 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각하며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의 의상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많은 변화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조사를 하면서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어떤 전통 양식이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입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란 사실이다.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패션과 유행은 존재했던 것이다. 시대적인 통념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2) 16세기
유물로 1965년 경기도 광주에서 출토된 1560년대 것인 치마 저고리가 있다. 수의이기는 하지만 저고리가 매우 크다. 대단히 풍신한 모습이다. 그런데 깃·섶·겨마기·끝동이 저고리와는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 겉깃 끝은 지금 저고리의 안깃 모양이다. 저고리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옆이 퍼져 있다. 치마 길이는 그리 길지 않으나 폭은 넓은 듯하다. 안동김씨 수의에는 고름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으나 다른 유물에서 보면 고름은 실용적인 좁고(1~2cm) 짧은(20~25cm)것이다.
3) 17세기
저고리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여자 저고리가 2점이 있다. 한 점은 광해군 부인인 중궁유씨의 것으로 일반 저고리보다는 훨씬 길이가 길어 마치 당의의 시초라고 보고 있다. 깃은 16세기와 달리 깃이 섶 위에 앉혀졌는데 당코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궁의 것은 여전히 저고리 깃이 16세기의 형 그대로이다. 일반적으로 유물을 보면 저고리 길이가 시대가 흐르면서 약간씩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7세기의 특징의 하나로서 월정사 소장의 1660년대 저고리를 보면 겨드랑이 밑에 무가 달려 있다.
4) 18세기
이대 박물관 소장의 완산최씨 저고리가 있다. 그 특징은 저고리 길이가 다소 짧아지면 배래선이 수구를 약간 좁히면서 곡선이 되어 있다. 겉섶 넓이가 위 아래로 넓어서 여밈이 깊은 편이다. 그리고 곁마기의 위가 소매 쪽으로 다소 뻗어 나가고 있음이 특징이다.
5) 19세기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할 때이다, 19세기초의 유물에서 보면 초기에는 저고리 길이가 30cm 정도이었으나 작고 짧아져서 말엽에는 18cm 정도까지도 되었다. 그러면서 당코 목판 깃에서 모서리를 둥글리게 되고 진동도 좁고 다 작아져 갔다.
6) 20세기
초기에는 19세기의 모습이 계속되다가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활동에 편안할 정도로 저고리가 길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화장·진동·배래·수구 등이 넉넉해 지고 있다. 1940년대부터는 저고리 길이가 긴 것이 유행이 되어 30~38cm까지 내려갔다가 1960년대 부터 다시 짧아졌고 미적 감각이 발달하면서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큰 변동은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깃 모양의 변천은 초기에는 넓이가 10.5cm나 되다가 중기가 되면서 깃 길이가 짧아지고 넓이도 좁아졌다. 그리고 목판 깃에서 당코 깃으로 그리고 현재와 같은 깃이 되었다
.
고름도 초기에는 불과 1~2cm나비에 길이 20~25cm정도로 좁고 짧았으나 중기가 되면서 약간 길고 넓어졌다. 후기에는 한 때 극단적으로 넓어지고 길어지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안착이 된 셈이다.
7) 치마
유물을 통하여 보면 의례용으로 대란치마·스란치마가 있는데 말기에는 겹치마로 변하였다. 일반적으로 발등 길이가 보통이고, 일하는 사람은 홑으로 걷어 올려 입은 모습이 풍속화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의 안동김씨 유물을 보면 19세기의 것으로 상류층 사람의 치마단의 변천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양쪽 선단을 같은 감이나 따로단을 대어 2.5cm나비로 바느질하고 아래 단은 가로지로 3cm나비로 딴 단을 대고 있다. 다음 단계는 안쪽 선단은 제단을 2cm 나비로 접었고 거죽 선단은 딴 단을 3~3.5cm 나비로 대고 밑에 단은 가로지로 4cm나비의 딴 단을 대고 있다. 그러다가 양쪽 선단을 모두 제단으로 하고 밑에 단만 가로지로 4cm정도 딴 단을 대고 있다. 지금과 같이 선단 아랫단 모두 제단을 접어서 만든 것은 19세기 말엽부터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의 무명치마는 0.4~0.5cm로 가늘게 제단으로 감쳐져 있다.
아무튼 조선조에서는 긴치마에 여유 있게 긴 저고리를 입어 오다가 조선조 중후기부터 저고리가 짧아지고 따라서 작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화기부터 다시 활동하기 편하게 하면서 통치마가 생겼고 여자들이 활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긴치마를 걷어 올려 매어 입었고 치마 길이를 짧게도 하였다
5. 결론
이상으로 우리 나라의 역사의 흐름과 함께 흐른 전통의례복식 중 치마저고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통의례복식에는 관혼상제를 위한 사례복식과 함께 평생을 두고 행하여졌을 의례와 관련된 복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이전의 의례복식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비하여 단편적인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유교가 정신적 문화적 바탕을 이루었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예학의 융성과 보급과 함께 의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 실생활 속에서 실행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의례와 관련된 복식도 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조 말기 이후에 들어온 서구문물의 영향으로 전통생활 방식에 변화가 초래되었고, 따라서 의례나 그에 따른 복식은 점차 사라지면서 그 모습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근래에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됨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느낀 것은 역사를 공부하고 있기에 전통의복이라 하면, 막연히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한복이나 역사드라마에 나오는 의상들을 떠올리곤 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각하며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의 의상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많은 변화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조사를 하면서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어떤 전통 양식이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입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란 사실이다.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패션과 유행은 존재했던 것이다. 시대적인 통념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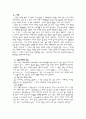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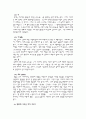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