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시작하면서
2. 주관성, 보편성, 필연성
3. 칸트와 당대의 공통적 음악관
4.<감정>의 시스템
5.예술과 음악
6.끝내면서
2. 주관성, 보편성, 필연성
3. 칸트와 당대의 공통적 음악관
4.<감정>의 시스템
5.예술과 음악
6.끝내면서
본문내용
히 (또는 필연적으로) 있어야할 것을 아는 것\'(윤리철학)이다.
31) 판단력은 <반성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bestimmende Urteilskraft)으로 나뉜다. 후자는 이미 주어진 표상을 통해 근본이 되는 개념을 \'규정짓는\' 능력인데, 이 때에 보편적인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없어서 이를 찾아내야 한다.(KU Einleitung V). 미에 대한 판단은 보편적인 것이 없고 특수한 것만 있기에 후자와 같은 것이 요구된다.
32) <합목적성>(合目的性. ZweckmaBigkeit)으로 많이 번역된다. <적절성>으로 의역해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목적부합성>은 판단력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개별적(또는 특수한) 현상들을 하나의 보편적 법칙 아래 포섭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무규정적인 것들에 질서와 규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 때의 <목적>은 칸트에 의해 도덕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33) 칸트의 <공통감>(Sensus communis 또는 Gemeinsinn)은 개념이 없는 미적 판단에서 준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 그것을 합산한 결과를 의미하지 않고, \'바람직한 보편성\'을 뜻한다.
34) <판단력>은 『순수이성비판』에서 <카테고리>와 <재료>가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는 것에 불과했는데, 『판단력비판』에서는 주로 예술판단을 뜻하게 된다.
35) <게슈막>은 서양어에서 매우 명백한 번역어를 갖고 있다: Taste (영), Go?t(불), Gusto(이). 이 말은 한국어로 취향, 취미 또는 구미(口味)로 번역된다. 내용적으로는 \'입맛\'이라는 원뜻에 맞을지 모르나 이 말이 주는 연상작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한국어에는 \'멋의 감각\'이라는 말이 이에 가장 가깝다고 보여진다.
36) 이 특징들을 달하우스(Carl Dahlhaus)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한국어 번역본 조영주, 주동률: 음악미학. 이론과 실천사 1987. 17쪽. ① <게슈막>은 항상 개성적이며 특수한 상황에서 판단한다. ② 그러나 판단할 때에는 어떤 일정한 작품이나 구체적 미학적 상황에서 나온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술이 전달하는 교양성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③ <게슈막>은 긍정적 판단보다는 부정적 판단을 더 내린다. 긍정적 판단을 받는 것은 곧 \'게슈막\'이 없다는 비난을 별로 받지 않는 것이다.④ <게슈막>은 개성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항상 보편적 가치를 목표로 한다.
37) 아우구스티누스(최민순 역): 고백록(IV. 13장). 성바오로 서원 1965. 74쪽.
38)이외에도 칸트는\"불쾌(不快)를 통해서만 가능한 쾌(快)와 함께 받아들여지는 대상물(Gegenstand)은 숭고하다\"(KU §27)고 말한다. 이는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나중에 거기에 기쁨으로 승복하는 것이다. 또한 숭고함의 이데에에는 \"매우 커다란 교양력(Kultur)\"(KU §29)이 요구되며, 인간의 성품(Natur)속에 주어진 실천적 이데에의 감정, 즉 윤리적 감정(게퓔)을 토대로 하고 있다.
39) 사물로부터 받아들인 그림들과 특성들을 마음대로 연결시키는 인간의 능력으로 대상이 없어도 가능하다. 칸트는 시작(詩作) 능력을 구상력이라고도 한다. 이 구상력을 분별력에 순응시키는 것이 곧 판단력이다(KU §10). 칸트는 \"관의 다양한 점과 순수 감지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통일의 조건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생산적인 구상력>(Produktive Einbildungskraft)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예술 창조에서도 표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경험을 전재로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꾸며낸다. 즉 받아들인 감각적 소재를 변형하여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그러기에 경험 이전의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재생산적인 구상력>(Reproduktive Einbildungskraft)은 단순히 경험의 연상작용과 연결된 법칙과만 상관되기 때문에 초경험적이지 못하다. 즉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40) 음악미학텍스트. 138쪽.
41) 달하우스는 이러한 면을 보고 칸트가 감정이론에 의지한 것은 그의 시스템에서 필연성을 보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Dahlhaus: Klassische und romantische Musikasthetik. Laaber 1988. p.54.
42) <관심>이란 말은 당시에 \"이익, 당파성, 유용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칸트에게서는 \"인식에 대한 관심\"까지 확장된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게슈막 판단>과 관계하여서 관심이 \"우리가 어떤 대상의 존재적 표상과 관련되어 마음에 들어 하는 것\"(Das Wohlgefallen, das wir mit der Vorstellung der Existenz eines Gegenstandes verbinden, KU §2)이라고 정의된다. 나아가 관심은 \"유쾌한 것을 마음에 들어함\"과 \"선을 마음에 들어함\"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의 성격이 <무관심적 감성(미)적 판단>에서는 앞의 \"편파적\"(parteilich) 성격이 부인되고, 단지 \"관조적인\"(kontemplativ) 것으로 제시된다.
43) 그런 회의를 가장 명확하게 발설한 사람이 쿨렌캄프이다: Jens Kulenkampff. Kants Logik des asthetishcen Urteils. Frankfurt am Main 1978. 그는 칸트의 <감성(미)적 판단력 비판>이 그의 철학에서 중요하지만 아직 해명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발견하는 분석\"(entdeckende Analyse)이라고 보며(p. 30) 사실은 칸트의 철학 시스템과 무관하다고 말한다.
44)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요술피리』 또는 베토벤의 『피델리오』의 도덕적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음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부터 온 것이며, 18세기에 음악의 중심 장르가 되는 심포니는 도덕과 관련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위쪽으로
31) 판단력은 <반성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bestimmende Urteilskraft)으로 나뉜다. 후자는 이미 주어진 표상을 통해 근본이 되는 개념을 \'규정짓는\' 능력인데, 이 때에 보편적인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없어서 이를 찾아내야 한다.(KU Einleitung V). 미에 대한 판단은 보편적인 것이 없고 특수한 것만 있기에 후자와 같은 것이 요구된다.
32) <합목적성>(合目的性. ZweckmaBigkeit)으로 많이 번역된다. <적절성>으로 의역해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목적부합성>은 판단력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으로서, 여러 가지 개별적(또는 특수한) 현상들을 하나의 보편적 법칙 아래 포섭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무규정적인 것들에 질서와 규칙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 때의 <목적>은 칸트에 의해 도덕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33) 칸트의 <공통감>(Sensus communis 또는 Gemeinsinn)은 개념이 없는 미적 판단에서 준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 그것을 합산한 결과를 의미하지 않고, \'바람직한 보편성\'을 뜻한다.
34) <판단력>은 『순수이성비판』에서 <카테고리>와 <재료>가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는 것에 불과했는데, 『판단력비판』에서는 주로 예술판단을 뜻하게 된다.
35) <게슈막>은 서양어에서 매우 명백한 번역어를 갖고 있다: Taste (영), Go?t(불), Gusto(이). 이 말은 한국어로 취향, 취미 또는 구미(口味)로 번역된다. 내용적으로는 \'입맛\'이라는 원뜻에 맞을지 모르나 이 말이 주는 연상작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한국어에는 \'멋의 감각\'이라는 말이 이에 가장 가깝다고 보여진다.
36) 이 특징들을 달하우스(Carl Dahlhaus)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37) 아우구스티누스(최민순 역): 고백록(IV. 13장). 성바오로 서원 1965. 74쪽.
38)이외에도 칸트는\"불쾌(不快)를 통해서만 가능한 쾌(快)와 함께 받아들여지는 대상물(Gegenstand)은 숭고하다\"(KU §27)고 말한다. 이는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나중에 거기에 기쁨으로 승복하는 것이다. 또한 숭고함의 이데에에는 \"매우 커다란 교양력(Kultur)\"(KU §29)이 요구되며, 인간의 성품(Natur)속에 주어진 실천적 이데에의 감정, 즉 윤리적 감정(게퓔)을 토대로 하고 있다.
39) 사물로부터 받아들인 그림들과 특성들을 마음대로 연결시키는 인간의 능력으로 대상이 없어도 가능하다. 칸트는 시작(詩作) 능력을 구상력이라고도 한다. 이 구상력을 분별력에 순응시키는 것이 곧 판단력이다(KU §10). 칸트는 \"관의 다양한 점과 순수 감지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통일의 조건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생산적인 구상력>(Produktive Einbildungskraft)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예술 창조에서도 표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경험을 전재로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꾸며낸다. 즉 받아들인 감각적 소재를 변형하여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그러기에 경험 이전의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재생산적인 구상력>(Reproduktive Einbildungskraft)은 단순히 경험의 연상작용과 연결된 법칙과만 상관되기 때문에 초경험적이지 못하다. 즉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40) 음악미학텍스트. 138쪽.
41) 달하우스는 이러한 면을 보고 칸트가 감정이론에 의지한 것은 그의 시스템에서 필연성을 보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Dahlhaus: Klassische und romantische Musikasthetik. Laaber 1988. p.54.
42) <관심>이란 말은 당시에 \"이익, 당파성, 유용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칸트에게서는 \"인식에 대한 관심\"까지 확장된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게슈막 판단>과 관계하여서 관심이 \"우리가 어떤 대상의 존재적 표상과 관련되어 마음에 들어 하는 것\"(Das Wohlgefallen, das wir mit der Vorstellung der Existenz eines Gegenstandes verbinden, KU §2)이라고 정의된다. 나아가 관심은 \"유쾌한 것을 마음에 들어함\"과 \"선을 마음에 들어함\"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의 성격이 <무관심적 감성(미)적 판단>에서는 앞의 \"편파적\"(parteilich) 성격이 부인되고, 단지 \"관조적인\"(kontemplativ) 것으로 제시된다.
43) 그런 회의를 가장 명확하게 발설한 사람이 쿨렌캄프이다: Jens Kulenkampff. Kants Logik des asthetishcen Urteils. Frankfurt am Main 1978. 그는 칸트의 <감성(미)적 판단력 비판>이 그의 철학에서 중요하지만 아직 해명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발견하는 분석\"(entdeckende Analyse)이라고 보며(p. 30) 사실은 칸트의 철학 시스템과 무관하다고 말한다.
44)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요술피리』 또는 베토벤의 『피델리오』의 도덕적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음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문학으로부터 온 것이며, 18세기에 음악의 중심 장르가 되는 심포니는 도덕과 관련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위쪽으로
추천자료
 [공학/컴퓨터/통신] 문학과 음악
[공학/컴퓨터/통신] 문학과 음악 르네상스 음악
르네상스 음악 문화예술이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 콜버그, 칸트, 메를로-퐁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 콜버그, 칸트, 메를로-퐁티를 중심으로 고대(선사시대-3세기경)와 중세(9세기-14세기 말)의 음악
고대(선사시대-3세기경)와 중세(9세기-14세기 말)의 음악 락[Rock]음악의 역사와 현주소 - 파워포인트 -
락[Rock]음악의 역사와 현주소 - 파워포인트 - 락[Rock] 음악의 역사와 현주소
락[Rock] 음악의 역사와 현주소 영화와 영화 음악의 관계
영화와 영화 음악의 관계 전통미술, 건축, 음악,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전통미술, 건축, 음악,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 일상생활의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음악, 언어, 광고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음악, 언어, 광고를 중심으로- 아도르노의 미메시스적 합리성, 아도르노예술의 주술적 기원, 아도르노예술의 현실과의 관계,...
아도르노의 미메시스적 합리성, 아도르노예술의 주술적 기원, 아도르노예술의 현실과의 관계,... [흄][경험론][경험주의][흄의 미학][흄의 도덕감이론][흄의 인성론][공리주의]흄의 경험론(경...
[흄][경험론][경험주의][흄의 미학][흄의 도덕감이론][흄의 인성론][공리주의]흄의 경험론(경... 조선대학교 인강 음악으로의 초대 핵심요약 및 퀴즈족보
조선대학교 인강 음악으로의 초대 핵심요약 및 퀴즈족보 예술이란 무엇인가 칸트에 대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칸트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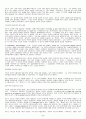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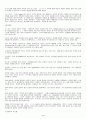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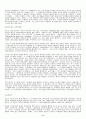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