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동한 서법예술 흥기의 배경
1) 문인사대부 개체자각의식의 성장
2) 한대 서체의 발달과 연구
3. 한대의 서법이론
1) 최원의 [초서세]
2) 신식에 대한 고식의 고수: 조일의 비초서
3) 채옹의 서법이론
4. 개체정감의 철학적 근거
5. 맺음 말
2. 동한 서법예술 흥기의 배경
1) 문인사대부 개체자각의식의 성장
2) 한대 서체의 발달과 연구
3. 한대의 서법이론
1) 최원의 [초서세]
2) 신식에 대한 고식의 고수: 조일의 비초서
3) 채옹의 서법이론
4. 개체정감의 철학적 근거
5. 맺음 말
본문내용
그런 시대의식에 비해 논문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기존 미학사에서 주장되는 일반적 내용과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논자가 이 시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나름대로의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논증의 확대, 혹은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미학사 바라보기 등의 경우 등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폈더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기존과 똑같은 사실내용으로써 자기 목소리만을 크게 외치고 있는 격이라고나 할까.
게다가 논문의 후반부와 결론 부분에 가면 가면 애초의 자기 주장이 견지되지 못하고 위진시대를 미학의 본격적 개화로 보고 있는 듯한 말을 많이 하고 있어 논자가 강조했던 동한에 대한 시대의식이 흐려지고 있어 논자 자신도 아직 혼란 속에 있는 듯 보여진다. 물론 논자는 동한 시대의 성과 위에서 위진 미학이 그렇게 꽃피울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인 것 같은데, 좀더 자기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예는 다음에서도 잘 드러난다.
논자는 동한시대의 미학은 表情이고 위진시대는 表意이라고 하면서, 표정에서 표의로 미학사상의 경향이 전환되어갔으며, \'意\'란 처음에는 \'창작자의 창작정감\'으로 정의했다가 뒤에서는 \'본래의 참된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논자가 이렇게 동한시대를 중국미학의 시발점으로 삼는 중요한 준거는 유가사상에 대한 이탈, 도가사상에 대한 관심의 증폭과 함께 나타나는 \'개체자각의식\'의 성장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의 성장하에서 서법예술 자체에서 이미 전서 예서 초서 행서 등의 서체가 모두 행해지고 있었고 아울러 서법이론 자체도 철학적 사유속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그 전거로 들고있다.
논자는 개체자각의식의 자각을 야기시킨 직접적 원인을 \'당고의 난\' 등 동한시기 환관의 전횡하에서의 사대부 탄압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적 박해는 담론의 주제를 집단의식 강조에서 개체자아의 문제로 전환시키는가\"하는 점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그 역설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개체자각의식의 발전은 곧바로 개인의 \'심미의식\'의 발전과 연결되는 것인가.
3.
동한 사대부의 개체의식의 발전은 초서로써 나타난다고 논자는 보고 있다. \"동한 시대 서법론은 최원의 초서세, 조일의 비초서, 채옹의 저술 등이 있는데, 모두 동한 사대부 개체자각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독립되고 성숙된 심미의식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 시기 초서의 흥기와 유행은 중국서법이 실용적 가치를 넘어서서 개체 정감을 표현하는 예술로 발전하는 계기를 형성하였다\"고 해서 개체의식의 발전이 초서와 상관됨을 논하고, 더나아가 초서의 시작이 바로 예술로서의 서법을 가능케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최원에서 조일 채옹으로 논리전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서와 개체자각의식을 이끈 도가사상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가. 논자의 전개대로라면 한대 예서체는 유가사상적인 서체이고 초서는 도가사상적인 서체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4.
논자는 동한시기 가장 성숙된 서법이론을 전개한 자로써 채옹을 들고 있다. 그런데 최원의 초서세, 조일의 비초서에 뒤이어지는 채옹의 서법론은 이전의 초서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있어 글의 논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본논문의 전개상 초서에 대한 분석은 나름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채옹 부분에서 갑자기 논의주제가 초서에서 채옹 개인의 서법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대 서론의 집대성자 채옹을 빼놓고 동한의 서법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채옹은 서법사에서 전서와 예서를 잘한 자로써, 그리고 비백서를 창안한 사람으로 유명한 자이다. 채옹이 초서를 잘했다거나 그가 초서에 대해 언급한 글은 현재의 문헌상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단 초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치더라도 채옹의 서법론과 도가사상과의 관련하에서 예술적 심미의식의 자각 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논자는 \"채옹의 서법론은 주역사상과 노장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왕충의 원기자연론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채옹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는 환관집단에 반대하는 청류사대부 계층으로서 \'개체자각의식\'보다 집단의 책임의식이 높은 사람이었으며, 유가경전을 연구하고 경전의 뜻을 널리 펴는 것을 입신의 주요임무라고 보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書畵辭賦는 하잖은 재주일뿐 국가를 다스리고 바로잡는 일은 하지 못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가 書者散也 등에서 보여주듯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성향은 유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논자는 채옹의 중요성에 비해 개인적 배경조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채옹의 \'勢\' 개념에 대해 논자는 \"形勢, 글자의 형으로부터 나오는 勢\"라고 풀고 있다. 우리가 보통 세라고 하면 위진 초기에 위항의 『四 書勢』 경우처럼 形勢의 勢 개념이 있고 후대 많이 쓰이게 되는 筆勢의 개념이 있다. 보통 채옹의 세 개념은 형세와 필세 개념이 포괄되어 있다고 보는데, 논자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 개념은 서법예술에서 중요범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정밀한 연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최원 「초서세」에서 觀其法象 : \"기본적 상\" 본받을 만한 상.
·최원 或주(墨=主)点染 : \"주나 점 등을 찍은 형세\" 주와 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조일 「비초서」 讚堅仰高 : \"깊이 파고들어 그 스승삼는 서법을 연구하면서\" 이 글의 출처는 『논어』 「子罕」편 顔淵 然歎曰 仰之 高 讚之 堅 이다. 즉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 견고해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초서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조일 夕 不息 : \"저녁에도 삼가 쉬지 않으며\" 이글의 출처는 주역 건괘 구삼 君子終日乾乾 夕 若 無咎와 건괘 상전 君子以自强不息인 만큼 그 본의가 더 살아나도록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조일 以草 壁 : \"도토리 나무 열매로 벽에다 그림을 그린다\" ?
·조일 見시(角+思)出血 : \"관자뼈에서 피가 나오다\" 허신 설문해자에 角中骨也, 단옥재 주 骨 作肉인만큼, 또 앞뒤 문맥상 여기서는 손톱 안쪽의 살집을 가리키는 뜻이 아닐까?
게다가 논문의 후반부와 결론 부분에 가면 가면 애초의 자기 주장이 견지되지 못하고 위진시대를 미학의 본격적 개화로 보고 있는 듯한 말을 많이 하고 있어 논자가 강조했던 동한에 대한 시대의식이 흐려지고 있어 논자 자신도 아직 혼란 속에 있는 듯 보여진다. 물론 논자는 동한 시대의 성과 위에서 위진 미학이 그렇게 꽃피울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인 것 같은데, 좀더 자기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예는 다음에서도 잘 드러난다.
논자는 동한시대의 미학은 表情이고 위진시대는 表意이라고 하면서, 표정에서 표의로 미학사상의 경향이 전환되어갔으며, \'意\'란 처음에는 \'창작자의 창작정감\'으로 정의했다가 뒤에서는 \'본래의 참된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논자가 이렇게 동한시대를 중국미학의 시발점으로 삼는 중요한 준거는 유가사상에 대한 이탈, 도가사상에 대한 관심의 증폭과 함께 나타나는 \'개체자각의식\'의 성장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의 성장하에서 서법예술 자체에서 이미 전서 예서 초서 행서 등의 서체가 모두 행해지고 있었고 아울러 서법이론 자체도 철학적 사유속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그 전거로 들고있다.
논자는 개체자각의식의 자각을 야기시킨 직접적 원인을 \'당고의 난\' 등 동한시기 환관의 전횡하에서의 사대부 탄압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적 박해는 담론의 주제를 집단의식 강조에서 개체자아의 문제로 전환시키는가\"하는 점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그 역설명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개체자각의식의 발전은 곧바로 개인의 \'심미의식\'의 발전과 연결되는 것인가.
3.
동한 사대부의 개체의식의 발전은 초서로써 나타난다고 논자는 보고 있다. \"동한 시대 서법론은 최원의 초서세, 조일의 비초서, 채옹의 저술 등이 있는데, 모두 동한 사대부 개체자각의식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독립되고 성숙된 심미의식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 시기 초서의 흥기와 유행은 중국서법이 실용적 가치를 넘어서서 개체 정감을 표현하는 예술로 발전하는 계기를 형성하였다\"고 해서 개체의식의 발전이 초서와 상관됨을 논하고, 더나아가 초서의 시작이 바로 예술로서의 서법을 가능케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최원에서 조일 채옹으로 논리전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서와 개체자각의식을 이끈 도가사상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가. 논자의 전개대로라면 한대 예서체는 유가사상적인 서체이고 초서는 도가사상적인 서체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4.
논자는 동한시기 가장 성숙된 서법이론을 전개한 자로써 채옹을 들고 있다. 그런데 최원의 초서세, 조일의 비초서에 뒤이어지는 채옹의 서법론은 이전의 초서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있어 글의 논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본논문의 전개상 초서에 대한 분석은 나름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채옹 부분에서 갑자기 논의주제가 초서에서 채옹 개인의 서법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대 서론의 집대성자 채옹을 빼놓고 동한의 서법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채옹은 서법사에서 전서와 예서를 잘한 자로써, 그리고 비백서를 창안한 사람으로 유명한 자이다. 채옹이 초서를 잘했다거나 그가 초서에 대해 언급한 글은 현재의 문헌상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단 초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치더라도 채옹의 서법론과 도가사상과의 관련하에서 예술적 심미의식의 자각 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논자는 \"채옹의 서법론은 주역사상과 노장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왕충의 원기자연론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채옹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는 환관집단에 반대하는 청류사대부 계층으로서 \'개체자각의식\'보다 집단의 책임의식이 높은 사람이었으며, 유가경전을 연구하고 경전의 뜻을 널리 펴는 것을 입신의 주요임무라고 보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書畵辭賦는 하잖은 재주일뿐 국가를 다스리고 바로잡는 일은 하지 못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가 書者散也 등에서 보여주듯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성향은 유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논자는 채옹의 중요성에 비해 개인적 배경조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채옹의 \'勢\' 개념에 대해 논자는 \"形勢, 글자의 형으로부터 나오는 勢\"라고 풀고 있다. 우리가 보통 세라고 하면 위진 초기에 위항의 『四 書勢』 경우처럼 形勢의 勢 개념이 있고 후대 많이 쓰이게 되는 筆勢의 개념이 있다. 보통 채옹의 세 개념은 형세와 필세 개념이 포괄되어 있다고 보는데, 논자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 개념은 서법예술에서 중요범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정밀한 연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최원 「초서세」에서 觀其法象 : \"기본적 상\" 본받을 만한 상.
·최원 或주(墨=主)点染 : \"주나 점 등을 찍은 형세\" 주와 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조일 「비초서」 讚堅仰高 : \"깊이 파고들어 그 스승삼는 서법을 연구하면서\" 이 글의 출처는 『논어』 「子罕」편 顔淵 然歎曰 仰之 高 讚之 堅 이다. 즉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 견고해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초서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조일 夕 不息 : \"저녁에도 삼가 쉬지 않으며\" 이글의 출처는 주역 건괘 구삼 君子終日乾乾 夕 若 無咎와 건괘 상전 君子以自强不息인 만큼 그 본의가 더 살아나도록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조일 以草 壁 : \"도토리 나무 열매로 벽에다 그림을 그린다\" ?
·조일 見시(角+思)出血 : \"관자뼈에서 피가 나오다\" 허신 설문해자에 角中骨也, 단옥재 주 骨 作肉인만큼, 또 앞뒤 문맥상 여기서는 손톱 안쪽의 살집을 가리키는 뜻이 아닐까?
추천자료
 공산주의 정치체제
공산주의 정치체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를 읽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를 읽고> 북한의 영토변화와 주변정세
북한의 영토변화와 주변정세 동북공정의 원인과 정치적 대응방안
동북공정의 원인과 정치적 대응방안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근현대사 `전쟁 종결과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수업지도안 및 학습지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근현대사 `전쟁 종결과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수업지도안 및 학습지 [현대사회와 심리학] 동조, 순종, 복종
[현대사회와 심리학] 동조, 순종, 복종 북한 군사제도의 형성과 군사조직의 변천에 관해
북한 군사제도의 형성과 군사조직의 변천에 관해 중국의 경제체제 및 제도개혁
중국의 경제체제 및 제도개혁 남북한의 차이 비교분석
남북한의 차이 비교분석 레저스포츠 중 탁구에 대한 것
레저스포츠 중 탁구에 대한 것 북의 주체사상
북의 주체사상  [고전소설]고전소설의 성격, 고전소설의 소재, 고전소설의 구성,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
[고전소설]고전소설의 성격, 고전소설의 소재, 고전소설의 구성, 조선후기 고전소설 현씨양웅... [라오스]나라소개,종교,사회문화,역사,관광,경제,라오스레포트
[라오스]나라소개,종교,사회문화,역사,관광,경제,라오스레포트 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
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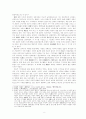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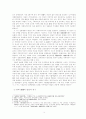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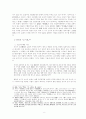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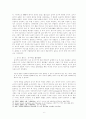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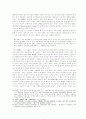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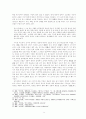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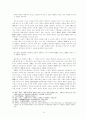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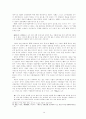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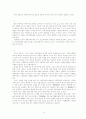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