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렴한 독특한 성격을 지닌 시조로 인정된다. 이 점이 바로 사림파 문학에서 퇴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느끼게 하는 한 예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무이도가 第九曲詩 一絶을 두고 평한 그의 「독자가 읊조려 감상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초원하고 함축된 무궁한 뜻을 얻는다」
) 이황, 『퇴계전서』, 卷13, 「答金成甫」 別紙讀者於諷詠玩味之餘 而得其意思超遠涵畜無窮之義 則亦可移作造道之人 深淺高下抑揚進退之意.
라는 독자의 수용시각에 따라 시인의 본 뜻과 관계없이 「造道」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퇴계는 이 작품을 통하여 독자가 「조도」적 쾌락을 얻기를 기대했음이 분명하고, 이것은 도산십이곡 跋文의 「蕩滌鄙吝感發融通」이 뒷받침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퇴계는 시인의 「本意」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독자의 수용 영역을 상당히 넓게 잡았다. 그가 무이도가를 차운한 詩인 「閒讀武夷志次九曲棹歌韻十首」
) 이황, 『퇴계전서』, 卷1, 「詩」.
는 주자의 「본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창작했고, 반면 무이도가를 평한 「往復書」와 「答金成甫別紙」 등에 나타난 비평 내용은 「造道的」인 면도 가미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산십이곡은 자연 독자의 수용시각을 중시하고 이를 시적 모티브로 삼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103-
「陶山雜詠」 18絶과 「陶山記」 등은 주자의 「무이정사잡영」 12수와 「무이정사기」는 물론이고 「운곡기」와 雲谷26詠도 아울러 수용하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퇴계는 도산의 자연과 생활에 대한 吟詠은 국문으로 된 「도산십이곡」과 한문으로 지어진 도산잡영 18수, 도산잡영 26수 등 두 방면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국문시가와 한문시가의 차이점은 본고에서 깊이 천착할 성질이 아닌 만큼 다음으로 미루겠다. 이처럼 「도산십이곡」이라는 한 작품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멀고도 깊으며 넓은 배경을 지녔던 것이다. 위에 열거한 주자의 작품 말고도 주자의 武夷 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의 것들보다는 덜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퇴계는 「도산잡영」과 「무이잡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에 그 處를 쫓아 가각 七言一首로 그 事를 기록하여 무릇 18絶을 얻었고, 또한 蒙泉, 冽井, 庭草, 澗柳, 藥圃, 花 , 西麓, 南 , 翠微, 廖朗, 釣磯, 月艇, 鶴汀, 鷗渚, 魚梁, 漁村, 煙林, 雪徑, 遷, 漆園, 江寺, 官亭, 長郊, 遠岫, 土城, 校洞
) 이황, 『퇴계전서』, 卷3, 「詩 陶山雜詠幷記」, 1冊, 100∼107쪽.
등 五音雜詠 26수가 있어 앞의 시가 다하지 못한 사실들을 말했다.
도산서당 岩西軒 玩樂齊 등 18수의 명칭은 도산 주변의 경물에 퇴계 스스로가 이름 붙인 것으로 이를 七言絶句로 노래했고, 뒤의 26절은 다분히 주자의 운곡이십육영에 부회한 흔적이 보인다. 위 도산잡영에 나타난 지명은 운곡이십육영의 지명과 대비시켜볼 때 漆園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지명을 26개로 분류한 것은 동일하다. 이는 도산이 주자의 운곡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퇴계는 무엇 때문에 「도산잡영」과 「도산이십곡」으로 구분하여 창작했는지 그 까닭이 자못 궁금한 바 있다. 도산십이곡의 12수는 분명히 무이잡영과 운곡잡시의 20수를 원용했다고 본다. 이별육가의 「6수」가 「12수」로 양적인 팽창을 한 것은 단순히 그 분량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산십이곡은 이별육가가 조선조의 「六歌系」의 특성을 지닌 작품이라면 도산십이곡은 朱子詩의 수용과 이조 사림파의 문예의식을 아울러 곁들인 복합적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별육가의 노장적 은둔과 현실 풍자와 분방한 서정 등을 배제하고, 주자시와 文以載道論의 사림파 특유의 수용과 접맥된 문학론과 品格論에 바탕을 둔 連作 短歌였다.
-104-
한편 율곡의 高山九曲歌와 대비할 경우 이 두 작품의 詩想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산구곡가는 「人物起興」의 시각이 보다 강하게 작용한 단가로 생각된다. 불행히도 필자가 아는 한에서 栗谷全書에는 고산구곡가에 대한 율곡 자신의 언급은 전혀 없다. 이는 고산구곡가를 후학들이 감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고산구곡가에는 율곡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시조임이 확실한데도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주제와 수사는 너무나 평범하여 일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산십이곡은 跋文이 남아 있어서 소위 시인의 「本意」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퇴계의 「讀者於諷詠玩味之餘」
) 이황, 『퇴계전서』, 卷13, 「答金成甫別紙」.
라는 말이 연상되고, 따라서 우리는 도산십이곡을 「諷詠玩味」하여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퇴계의 「蕩滌鄙吝 感發融通」이란 말에서 그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도산십이곡은 문학사가 아닌 문학작품으로서는 이미 생명이 다한 것인지, 또 다했다고 여겨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고인의 깊은 뜻을 현대인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피상적 결론을 내린 채 깊이 음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산구곡가에서 「遊人은 오지 않고 볼 힝 없다 하더라」라고 읊은 율곡의 吟詠은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 도산십이곡의 배경에는 「이별육가」와 「武夷雜詠」과 「雲谷雜詩」가 있다. 운곡잡시는 近體가 아니고 古體다. 이 시는 주자의 구체적 강호생활의 면모를 노래한 것이다. 퇴계는 이를 본받아 도산잡영과 함께 「遊山書事」라는 표제로 자신의 강호생활의 양태를 읊었다. 「유산서사」 라는 제목은 운곡잡시의 시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표현이다.
-105-
도산십이곡은 도산에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노래한 것으로 퇴계 자신에게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였음은 강조되어야 한다. 도산십이곡이란 문학작품의 현장인 「陶山」은 주자의 은거지였던 「武夷九曲과 雲谷」이 합쳐진 擬構된 강호일 수도 있다. 주자는 「무이구곡」에서의 생활의 일면을 「무이도가와 무이잡영」으로, 「운곡」에서의 생활은 「운곡잡시와 운곡이십육영」으로 읊었고, 퇴계는 도산에서의 생활을 「도산십이곡과 도산잡영」으로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퇴계가 주자를 亞流的인 차원에서 그의 생활과 작품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이황, 『퇴계전서』, 卷13, 「答金成甫」 別紙讀者於諷詠玩味之餘 而得其意思超遠涵畜無窮之義 則亦可移作造道之人 深淺高下抑揚進退之意.
라는 독자의 수용시각에 따라 시인의 본 뜻과 관계없이 「造道」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퇴계는 이 작품을 통하여 독자가 「조도」적 쾌락을 얻기를 기대했음이 분명하고, 이것은 도산십이곡 跋文의 「蕩滌鄙吝感發融通」이 뒷받침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퇴계는 시인의 「本意」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독자의 수용 영역을 상당히 넓게 잡았다. 그가 무이도가를 차운한 詩인 「閒讀武夷志次九曲棹歌韻十首」
) 이황, 『퇴계전서』, 卷1, 「詩」.
는 주자의 「본의」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창작했고, 반면 무이도가를 평한 「往復書」와 「答金成甫別紙」 등에 나타난 비평 내용은 「造道的」인 면도 가미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산십이곡은 자연 독자의 수용시각을 중시하고 이를 시적 모티브로 삼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103-
「陶山雜詠」 18絶과 「陶山記」 등은 주자의 「무이정사잡영」 12수와 「무이정사기」는 물론이고 「운곡기」와 雲谷26詠도 아울러 수용하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퇴계는 도산의 자연과 생활에 대한 吟詠은 국문으로 된 「도산십이곡」과 한문으로 지어진 도산잡영 18수, 도산잡영 26수 등 두 방면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국문시가와 한문시가의 차이점은 본고에서 깊이 천착할 성질이 아닌 만큼 다음으로 미루겠다. 이처럼 「도산십이곡」이라는 한 작품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멀고도 깊으며 넓은 배경을 지녔던 것이다. 위에 열거한 주자의 작품 말고도 주자의 武夷 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위의 것들보다는 덜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퇴계는 「도산잡영」과 「무이잡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에 그 處를 쫓아 가각 七言一首로 그 事를 기록하여 무릇 18絶을 얻었고, 또한 蒙泉, 冽井, 庭草, 澗柳, 藥圃, 花 , 西麓, 南 , 翠微, 廖朗, 釣磯, 月艇, 鶴汀, 鷗渚, 魚梁, 漁村, 煙林, 雪徑, 遷, 漆園, 江寺, 官亭, 長郊, 遠岫, 土城, 校洞
) 이황, 『퇴계전서』, 卷3, 「詩 陶山雜詠幷記」, 1冊, 100∼107쪽.
등 五音雜詠 26수가 있어 앞의 시가 다하지 못한 사실들을 말했다.
도산서당 岩西軒 玩樂齊 등 18수의 명칭은 도산 주변의 경물에 퇴계 스스로가 이름 붙인 것으로 이를 七言絶句로 노래했고, 뒤의 26절은 다분히 주자의 운곡이십육영에 부회한 흔적이 보인다. 위 도산잡영에 나타난 지명은 운곡이십육영의 지명과 대비시켜볼 때 漆園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지명을 26개로 분류한 것은 동일하다. 이는 도산이 주자의 운곡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퇴계는 무엇 때문에 「도산잡영」과 「도산이십곡」으로 구분하여 창작했는지 그 까닭이 자못 궁금한 바 있다. 도산십이곡의 12수는 분명히 무이잡영과 운곡잡시의 20수를 원용했다고 본다. 이별육가의 「6수」가 「12수」로 양적인 팽창을 한 것은 단순히 그 분량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산십이곡은 이별육가가 조선조의 「六歌系」의 특성을 지닌 작품이라면 도산십이곡은 朱子詩의 수용과 이조 사림파의 문예의식을 아울러 곁들인 복합적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별육가의 노장적 은둔과 현실 풍자와 분방한 서정 등을 배제하고, 주자시와 文以載道論의 사림파 특유의 수용과 접맥된 문학론과 品格論에 바탕을 둔 連作 短歌였다.
-104-
한편 율곡의 高山九曲歌와 대비할 경우 이 두 작품의 詩想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산구곡가는 「人物起興」의 시각이 보다 강하게 작용한 단가로 생각된다. 불행히도 필자가 아는 한에서 栗谷全書에는 고산구곡가에 대한 율곡 자신의 언급은 전혀 없다. 이는 고산구곡가를 후학들이 감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고산구곡가에는 율곡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시조임이 확실한데도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주제와 수사는 너무나 평범하여 일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산십이곡은 跋文이 남아 있어서 소위 시인의 「本意」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퇴계의 「讀者於諷詠玩味之餘」
) 이황, 『퇴계전서』, 卷13, 「答金成甫別紙」.
라는 말이 연상되고, 따라서 우리는 도산십이곡을 「諷詠玩味」하여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퇴계의 「蕩滌鄙吝 感發融通」이란 말에서 그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도산십이곡은 문학사가 아닌 문학작품으로서는 이미 생명이 다한 것인지, 또 다했다고 여겨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고인의 깊은 뜻을 현대인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피상적 결론을 내린 채 깊이 음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산구곡가에서 「遊人은 오지 않고 볼 힝 없다 하더라」라고 읊은 율곡의 吟詠은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 도산십이곡의 배경에는 「이별육가」와 「武夷雜詠」과 「雲谷雜詩」가 있다. 운곡잡시는 近體가 아니고 古體다. 이 시는 주자의 구체적 강호생활의 면모를 노래한 것이다. 퇴계는 이를 본받아 도산잡영과 함께 「遊山書事」라는 표제로 자신의 강호생활의 양태를 읊었다. 「유산서사」 라는 제목은 운곡잡시의 시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표현이다.
-105-
도산십이곡은 도산에서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노래한 것으로 퇴계 자신에게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였음은 강조되어야 한다. 도산십이곡이란 문학작품의 현장인 「陶山」은 주자의 은거지였던 「武夷九曲과 雲谷」이 합쳐진 擬構된 강호일 수도 있다. 주자는 「무이구곡」에서의 생활의 일면을 「무이도가와 무이잡영」으로, 「운곡」에서의 생활은 「운곡잡시와 운곡이십육영」으로 읊었고, 퇴계는 도산에서의 생활을 「도산십이곡과 도산잡영」으로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퇴계가 주자를 亞流的인 차원에서 그의 생활과 작품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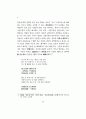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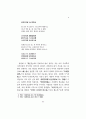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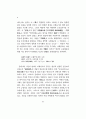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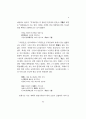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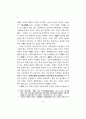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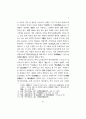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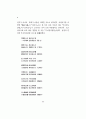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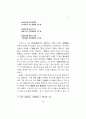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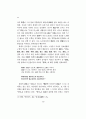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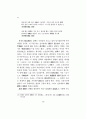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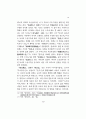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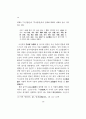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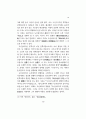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