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목차
1. 답기명언서(사칠논변 제일서)
1)제일서 부기
2. 답기명언서(사칠논변 제이서)
3)제이서 후론
3. 답기명언서(사칠논변 제삼서)
4. 답기명언서(사칠논변 제사서)
5. 답기명언서(사칠논변 제오서)
1)제일서 부기
2. 답기명언서(사칠논변 제이서)
3)제이서 후론
3. 답기명언서(사칠논변 제삼서)
4. 답기명언서(사칠논변 제사서)
5. 답기명언서(사칠논변 제오서)
본문내용
의 성을 논할 때는 오로지 이만을 가리켜 말하고 기질의 성을 논할 때는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다.\"
) \"천지의 성......섞어서 말한다.\": 이 대문은 性理大全 권 30 氣質之性에 보인다.
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理發과 氣發의 논리입니다. 제가 일찍이 이 말을 인용하여 \"이가 발했다는 것은 오로지 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가 발했다는 것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고 말한 것은 크게 무리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선생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용어의 사용이 적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신 변론에, 이른바 \"情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마치 性에 본성과 氣稟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 하신 것은 저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무엇을 지적하여 \"근본은 같으나 귀추가 다르다.\"는 것을 살피지 않았느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기질의 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다.\" 한 것은 대개 본연의 성이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섞어서 말한다\'고 한 것인데, 그러나 기질의 성 가운데 선한 것은 바로 본연의 성이고 따로 별개의 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른바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과 사단은 그 내용은 같고 이름만이 다르다.\"고 한 것은 아마도 理에 그릇되지 않는 것인 듯 합니다.
다만 사단·칠정을 이와 기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잘라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론이 자주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말씨의 사용에도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546-
이제 감히 요점만을 추려 논하여 비평해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외의 문구상의 적절치 못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일일이 분석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할 겨를이 없습니다. 역시 큰 근본이 이미 같다면 사소한 것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끝내는 반드시 의견이 같아질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오니, 회답을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第五書 附記(2)
주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천지의 中正한 기운을 받아 태어나므로 아무 느낌도 없을 때에는 순수하고 지극히 善하여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으니, 이른바 性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 性이 있으면 곧 形이 있고 형이 있으면 곧 心이 있게 되어, 사물에 대한 느낌이 없을 수 없으며, 사물에 느껴서 움직이게 되면 性의 욕구가 나오게 되어 여기에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데, 성의 욕구가 바로 이른바 情이라는 것이다.\"하였으니, 이 몇 마디 말은 실은 樂記에 나오는 動靜의 뜻을 해석
) 樂記에 나오는......뜻을 해석: \"사람이 나면서 고요한 것은 하늘의 성이고 물에 느껴서 움직이는 성의 욕이다〔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라고 한 말을 지칭한다. 앞의 주자의 말은 이에 대한 註이다. 禮記集說 권 18 樂記..
한 것으로, 말은 비록 간략하지만 이치는 모두 간추어져 있으니 性情에 관한 모든 뜻을 남김없이 다 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바 정이란 것은 喜·怒·哀·懼·愛·惡·欲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中庸에서 이른바 희·노·哀·樂과 동일한 정입니다. 대체로 이미 이 心이 있어 사물에 대한 느낌이 없을 수 없다면 情이 이와 기를 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물에 느껴서 움직이면서 선과 악이 여기에서 갈라진다면 정은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547-
그리고 희·노·애·락이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으면 곧 이른바 理이고 善이며, 발하여 절도에 맞지 않으면 바로 기품의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不善이 있게 되는 것인데, 맹자가 이른바 사단은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정을 대상으로, 그 理에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만을 가려 내어 말한 것입니다. 대개 맹자는 性善의 이치를 밝혀내어 그것을 사단으로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理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자는 또 말하기를, \"사단은 바로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하였는데, 대체로 사단은 이가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가 발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진실로 의심할 바가 없겠으나, 칠정은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이므로 그 발한 것이 비록 모두가 기만은 아니지만 기질과의 섞임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한 것이니, 이는 바로 기질의 성의 논리와 같습니다. 대개 성이란 본래 선한 것이지만, 기질에 떨어져 있으면 편벽되고 경쟁적인 것이 없지 않기 때문에 기질의 성이라 하고, 칠정은 비록 이와 기를 겸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여 그것을 함께 관리할 수 없어서 쉽게 악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칠정이> 발하여 중도에 맞으면 바로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므로 사단과 더불어 원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단지 이의 발한 것이라 한 것은, 맹자의 뜻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확충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학자들이 그것을 體認하여 확충하지 않아서야 되겠으며, 또는 칠정이 이와 기의 발함을 겸해 있지만, 그 이의 발함이 혹시 기를 주재하지 못하거나 기의 흐름이 도리어 理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학자들이 칠정의 발함에 있어 성찰에 의하여 잘 다스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사단과 칠정의 명칭이 각기 있게 되는 까닭이니, 학자들이 진실로 이를 토대로 하여 추구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반을 넘어설 것입니다.
또 或問에서는 喜·怒·愛·惡·欲을 도리어 仁·義에 가까운 듯이 보고 있습니다. 주자가 \"진실로 서로 근사한 점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저 \"서로 근사한 점이 있다.\"고만 말하고 그 근사한 점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은 본래 어떤 뜻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희·노·애·락을 인·의·예·지에 배속시키니 주자의 뜻에 비추어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개 칠정과 사단의 이론은 각기 하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아마도 섞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 점 역시 몰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48-
) \"천지의 성......섞어서 말한다.\": 이 대문은 性理大全 권 30 氣質之性에 보인다.
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理發과 氣發의 논리입니다. 제가 일찍이 이 말을 인용하여 \"이가 발했다는 것은 오로지 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가 발했다는 것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고 말한 것은 크게 무리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선생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용어의 사용이 적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신 변론에, 이른바 \"情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마치 性에 본성과 氣稟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 하신 것은 저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무엇을 지적하여 \"근본은 같으나 귀추가 다르다.\"는 것을 살피지 않았느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기질의 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다.\" 한 것은 대개 본연의 성이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섞어서 말한다\'고 한 것인데, 그러나 기질의 성 가운데 선한 것은 바로 본연의 성이고 따로 별개의 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른바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과 사단은 그 내용은 같고 이름만이 다르다.\"고 한 것은 아마도 理에 그릇되지 않는 것인 듯 합니다.
다만 사단·칠정을 이와 기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잘라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론이 자주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말씨의 사용에도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546-
이제 감히 요점만을 추려 논하여 비평해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외의 문구상의 적절치 못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일일이 분석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할 겨를이 없습니다. 역시 큰 근본이 이미 같다면 사소한 것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끝내는 반드시 의견이 같아질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오니, 회답을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第五書 附記(2)
주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천지의 中正한 기운을 받아 태어나므로 아무 느낌도 없을 때에는 순수하고 지극히 善하여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으니, 이른바 性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 性이 있으면 곧 形이 있고 형이 있으면 곧 心이 있게 되어, 사물에 대한 느낌이 없을 수 없으며, 사물에 느껴서 움직이게 되면 性의 욕구가 나오게 되어 여기에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데, 성의 욕구가 바로 이른바 情이라는 것이다.\"하였으니, 이 몇 마디 말은 실은 樂記에 나오는 動靜의 뜻을 해석
) 樂記에 나오는......뜻을 해석: \"사람이 나면서 고요한 것은 하늘의 성이고 물에 느껴서 움직이는 성의 욕이다〔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라고 한 말을 지칭한다. 앞의 주자의 말은 이에 대한 註이다. 禮記集說 권 18 樂記..
한 것으로, 말은 비록 간략하지만 이치는 모두 간추어져 있으니 性情에 관한 모든 뜻을 남김없이 다 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바 정이란 것은 喜·怒·哀·懼·愛·惡·欲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中庸에서 이른바 희·노·哀·樂과 동일한 정입니다. 대체로 이미 이 心이 있어 사물에 대한 느낌이 없을 수 없다면 情이 이와 기를 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물에 느껴서 움직이면서 선과 악이 여기에서 갈라진다면 정은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547-
그리고 희·노·애·락이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으면 곧 이른바 理이고 善이며, 발하여 절도에 맞지 않으면 바로 기품의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不善이 있게 되는 것인데, 맹자가 이른바 사단은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정을 대상으로, 그 理에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만을 가려 내어 말한 것입니다. 대개 맹자는 性善의 이치를 밝혀내어 그것을 사단으로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理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자는 또 말하기를, \"사단은 바로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하였는데, 대체로 사단은 이가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가 발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진실로 의심할 바가 없겠으나, 칠정은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이므로 그 발한 것이 비록 모두가 기만은 아니지만 기질과의 섞임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한 것이니, 이는 바로 기질의 성의 논리와 같습니다. 대개 성이란 본래 선한 것이지만, 기질에 떨어져 있으면 편벽되고 경쟁적인 것이 없지 않기 때문에 기질의 성이라 하고, 칠정은 비록 이와 기를 겸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여 그것을 함께 관리할 수 없어서 쉽게 악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칠정이> 발하여 중도에 맞으면 바로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므로 사단과 더불어 원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단지 이의 발한 것이라 한 것은, 맹자의 뜻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확충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학자들이 그것을 體認하여 확충하지 않아서야 되겠으며, 또는 칠정이 이와 기의 발함을 겸해 있지만, 그 이의 발함이 혹시 기를 주재하지 못하거나 기의 흐름이 도리어 理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학자들이 칠정의 발함에 있어 성찰에 의하여 잘 다스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사단과 칠정의 명칭이 각기 있게 되는 까닭이니, 학자들이 진실로 이를 토대로 하여 추구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반을 넘어설 것입니다.
또 或問에서는 喜·怒·愛·惡·欲을 도리어 仁·義에 가까운 듯이 보고 있습니다. 주자가 \"진실로 서로 근사한 점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저 \"서로 근사한 점이 있다.\"고만 말하고 그 근사한 점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은 본래 어떤 뜻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희·노·애·락을 인·의·예·지에 배속시키니 주자의 뜻에 비추어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개 칠정과 사단의 이론은 각기 하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아마도 섞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 점 역시 몰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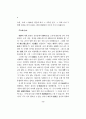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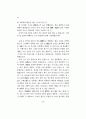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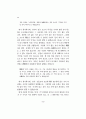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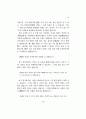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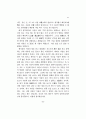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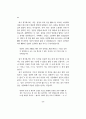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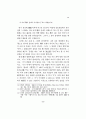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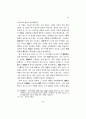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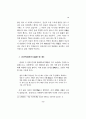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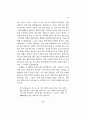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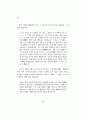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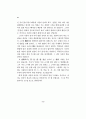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