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인간의 본래성과 두 제약
Ⅱ. 퇴계의 인간존재론
1. 퇴계 이기론의 특색
2. 사단대칠정의 이원론적 인간이해
3. 퇴계의 선악관
Ⅲ. 율곡의 인간존재론
1. 율곡 이기론의 특색
2. 칠정포사단의 일원론적 인간이해
3. 율곡의 선악관
Ⅳ. 성 경론과 인간의 제약성의 극복
1. 경과 물욕지폐의 극복-퇴계
2. 성과 기품지구의 극복-율곡
Ⅴ. 결 논
Ⅱ. 퇴계의 인간존재론
1. 퇴계 이기론의 특색
2. 사단대칠정의 이원론적 인간이해
3. 퇴계의 선악관
Ⅲ. 율곡의 인간존재론
1. 율곡 이기론의 특색
2. 칠정포사단의 일원론적 인간이해
3. 율곡의 선악관
Ⅳ. 성 경론과 인간의 제약성의 극복
1. 경과 물욕지폐의 극복-퇴계
2. 성과 기품지구의 극복-율곡
Ⅴ. 결 논
본문내용
질을 변화시키는 수양의 방법으로 克己와 勉强을 말한다. 인간의 꾸준한 자기극복, 자기개혁의 노력만이 變化氣質의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율곡에 있어서 誠으로 요약된다. 그리하여 율곡은 \"誠이 아니면 뜻을 세울 수 없고, 誠이 아니면 이치를 깨달을 수 없으며, 誠이 아니면 氣質을 變化시킬 수 없다.\"
) 『栗谷全書』, vol.1, p.465 : 志無誠則不立 理無誠則不格 氣質無誠則不能變化
고 말한다. 율곡은 誠을 實理之誠과 實心之誠으로 나누고, 天道는 實理요 人道는 實心이라 하였다.
) 『栗谷全書』, vol.2, p.581-582 : 誠者 眞實無妄之謂 而有實理之誠 有實其心之誠 …… 天道卽實理 而人道卽實心也
하늘에는 實理가 있기 때문에 氣化가 流行不息하는 것이며 사람에게는 實心이 있기 때문에 工夫에 間斷이 없는 것이다.
) 『栗谷全書』, vol.1, p.464 : 天有實理 故氣化流行而不息 人有實心 故工夫緝熙而無間
이러한 공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질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 『栗谷全書』, vol.1, p.418 : 帝王之學 莫切於變化氣質
이렇게 볼 때 율곡에게 있어서의 誠이란 위로는 天 人을 일관하는 원리요 모든 사물의 존재근거인 것이며, 아래로는 인간에게 있어서 氣稟의 제약을 극복하고 선을 구현하고자 하는 요법이라 할 수 있다.
-269-
Ⅴ. 結 論
퇴계 율곡의 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敬과 誠은 그 핵심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퇴계와 율곡이 왜 각각 敬과 誠을 강조하였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유가사상을 明善去惡의 \'도덕적 형이상학\'
) 牟宗三, 『心體與性體』, vol.1, pp.139-189 참조.
이라 한다면 여기서 도덕적 수양론으로서의 誠敬論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수양이란 무엇인가 제약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제기되는 것이며, 그 제약은 본래성과의 관련하에 말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인간의 본래성과 두 제약이라는 것으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인간의 본래성을 明德(또는 本然之性)이라 한다면 인간에게는 또한 氣稟之拘와 人欲之蔽라는 제약이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수양이란 이 두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氣稟이란 氣의 淸 濁의 문제로서 여기에 입각한 율곡의 경우는 일원론적 인간이해를 보여주었다. 物欲이란 天理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여기에 입각한 퇴계의 경우는 이원론적 인간이해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氣稟之拘와 人欲之蔽는 각각 선천적(근원적) 후천적(현상적) 제약으로서 그 본질상 다른 것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氣稟之拘는 人欲之蔽의 존재근거요 人欲之蔽는 氣稟之拘의 인식근거\"라는 식의 표현을 해 보았다. 그러면 본질상 이 양자가 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각각 일원적 이원적 인간이해로 발전하는 것일까? 인간의 행위양상(현상)은 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 善 惡으로 二分할 수 있으며, 퇴계는 이러한 天理와 人欲이 대립하는 현상을 그의 철학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볼 때 행위의 주체인 인간 자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원적 대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율곡의 경우는 이것을 氣의 淸 濁 문제로 해명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氣의 양측면으로 이해한다.
-270-
퇴계에 있어서의 理란 정당성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氣란 理에 대립하는 것이었다. 퇴계에 있어서의 理의 능동성과 理氣二元論은 그대로 그의 사단칠정론에 반영되어서 理氣互發論을 초래하였다. 四端과 七情, 道心과 人心을 대립적으로 이해한 퇴계는 天理와 人欲의 이원론으로 선 악의 문제를 해명하였다. 이러한 퇴계에 있어서의 敬이란 一身의 주재자인 心을 檢束하여 항상 天理가 人欲을 이기도록 하고자 하는 요법이었으며, 특히 天에 대한 畏敬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또한 天 人을 매개시켜주는 고리였다.
율곡의 경우는 항상 所以然과 所然으로 理 氣를 이해하고 理 氣는 一而二 二而一이라는 不離不雜의 理氣之妙를 말한다. 그러므로 율곡은 理의 능동성을 부정하고 氣發理乘一途論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氣質之性兼本然之性, 七情包四端, 人心道心相爲終始 등의 일원론적 인간이해를 보여주는 율곡은 선 악의 문제를 氣의 淸 濁으로 설명한다. 그리하여 항상 淸氣가 本然之性을 온전히 구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변화기질론이 제기된다. 이러한 율곡의 경우에 있어서 誠이란 기질을 변화시키는 요법이었으며, 특히 天 人을 일관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퇴계의 선 악 이원론적 인간이해는 인간의 타락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인간이해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퇴계에 있어서 天에 대한 畏敬은 윤리적 행위의 불가결한 보루인 것이다. 퇴계에 있어서의 天이란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고 길흉화복으로 보상하는 의지적 주재자로 인식된다. 다시 말하면 天은 타락하기 쉬운 인간에게 있어서의 윤리적 행위의 후견자로 이해된 것이다. 반면에 율곡의 氣發理乘一途論은 인간의 타락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신뢰가 보다 강하다. 인간은 자신의 성실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의지적 주재자에 대한 외경보다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며, 따라서 율곡은 天을 의지적 주재자로 규정하기 보다는 實理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퇴계에 있어서는 天과 人間의 이원성(이질성)이 강조된 것이라면, 율곡에 있어서의 天이란 實理로서 實心의 인간과의 일원성(동질성)이 강조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퇴계는 敬으로써 天人合一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말하고 율곡은 誠으로써 天人合一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말한 것이다.
-271-
이상에서 논한 것을 두고 볼 때, 퇴계의 敬思想과 율곡의 誠思想의 궁극적 차이는 善 惡의 所從來에 대한 견해의 차이, 즉 인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理氣互發論과 氣發理乘一途論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明善去惡 致中和 天人合一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유가사상으로서의 공통점이라고 하겠다.
) 『栗谷全書』, vol.1, p.465 : 志無誠則不立 理無誠則不格 氣質無誠則不能變化
고 말한다. 율곡은 誠을 實理之誠과 實心之誠으로 나누고, 天道는 實理요 人道는 實心이라 하였다.
) 『栗谷全書』, vol.2, p.581-582 : 誠者 眞實無妄之謂 而有實理之誠 有實其心之誠 …… 天道卽實理 而人道卽實心也
하늘에는 實理가 있기 때문에 氣化가 流行不息하는 것이며 사람에게는 實心이 있기 때문에 工夫에 間斷이 없는 것이다.
) 『栗谷全書』, vol.1, p.464 : 天有實理 故氣化流行而不息 人有實心 故工夫緝熙而無間
이러한 공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질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 『栗谷全書』, vol.1, p.418 : 帝王之學 莫切於變化氣質
이렇게 볼 때 율곡에게 있어서의 誠이란 위로는 天 人을 일관하는 원리요 모든 사물의 존재근거인 것이며, 아래로는 인간에게 있어서 氣稟의 제약을 극복하고 선을 구현하고자 하는 요법이라 할 수 있다.
-269-
Ⅴ. 結 論
퇴계 율곡의 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敬과 誠은 그 핵심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퇴계와 율곡이 왜 각각 敬과 誠을 강조하였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유가사상을 明善去惡의 \'도덕적 형이상학\'
) 牟宗三, 『心體與性體』, vol.1, pp.139-189 참조.
이라 한다면 여기서 도덕적 수양론으로서의 誠敬論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수양이란 무엇인가 제약이 있다는 판단 하에 제기되는 것이며, 그 제약은 본래성과의 관련하에 말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인간의 본래성과 두 제약이라는 것으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인간의 본래성을 明德(또는 本然之性)이라 한다면 인간에게는 또한 氣稟之拘와 人欲之蔽라는 제약이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수양이란 이 두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氣稟이란 氣의 淸 濁의 문제로서 여기에 입각한 율곡의 경우는 일원론적 인간이해를 보여주었다. 物欲이란 天理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여기에 입각한 퇴계의 경우는 이원론적 인간이해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氣稟之拘와 人欲之蔽는 각각 선천적(근원적) 후천적(현상적) 제약으로서 그 본질상 다른 것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氣稟之拘는 人欲之蔽의 존재근거요 人欲之蔽는 氣稟之拘의 인식근거\"라는 식의 표현을 해 보았다. 그러면 본질상 이 양자가 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각각 일원적 이원적 인간이해로 발전하는 것일까? 인간의 행위양상(현상)은 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 善 惡으로 二分할 수 있으며, 퇴계는 이러한 天理와 人欲이 대립하는 현상을 그의 철학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볼 때 행위의 주체인 인간 자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원적 대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율곡의 경우는 이것을 氣의 淸 濁 문제로 해명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氣의 양측면으로 이해한다.
-270-
퇴계에 있어서의 理란 정당성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氣란 理에 대립하는 것이었다. 퇴계에 있어서의 理의 능동성과 理氣二元論은 그대로 그의 사단칠정론에 반영되어서 理氣互發論을 초래하였다. 四端과 七情, 道心과 人心을 대립적으로 이해한 퇴계는 天理와 人欲의 이원론으로 선 악의 문제를 해명하였다. 이러한 퇴계에 있어서의 敬이란 一身의 주재자인 心을 檢束하여 항상 天理가 人欲을 이기도록 하고자 하는 요법이었으며, 특히 天에 대한 畏敬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또한 天 人을 매개시켜주는 고리였다.
율곡의 경우는 항상 所以然과 所然으로 理 氣를 이해하고 理 氣는 一而二 二而一이라는 不離不雜의 理氣之妙를 말한다. 그러므로 율곡은 理의 능동성을 부정하고 氣發理乘一途論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氣質之性兼本然之性, 七情包四端, 人心道心相爲終始 등의 일원론적 인간이해를 보여주는 율곡은 선 악의 문제를 氣의 淸 濁으로 설명한다. 그리하여 항상 淸氣가 本然之性을 온전히 구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변화기질론이 제기된다. 이러한 율곡의 경우에 있어서 誠이란 기질을 변화시키는 요법이었으며, 특히 天 人을 일관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퇴계의 선 악 이원론적 인간이해는 인간의 타락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인간이해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퇴계에 있어서 天에 대한 畏敬은 윤리적 행위의 불가결한 보루인 것이다. 퇴계에 있어서의 天이란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고 길흉화복으로 보상하는 의지적 주재자로 인식된다. 다시 말하면 天은 타락하기 쉬운 인간에게 있어서의 윤리적 행위의 후견자로 이해된 것이다. 반면에 율곡의 氣發理乘一途論은 인간의 타락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신뢰가 보다 강하다. 인간은 자신의 성실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의지적 주재자에 대한 외경보다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며, 따라서 율곡은 天을 의지적 주재자로 규정하기 보다는 實理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퇴계에 있어서는 天과 人間의 이원성(이질성)이 강조된 것이라면, 율곡에 있어서의 天이란 實理로서 實心의 인간과의 일원성(동질성)이 강조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퇴계는 敬으로써 天人合一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말하고 율곡은 誠으로써 天人合一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말한 것이다.
-271-
이상에서 논한 것을 두고 볼 때, 퇴계의 敬思想과 율곡의 誠思想의 궁극적 차이는 善 惡의 所從來에 대한 견해의 차이, 즉 인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理氣互發論과 氣發理乘一途論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明善去惡 致中和 天人合一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유가사상으로서의 공통점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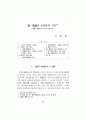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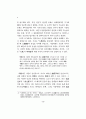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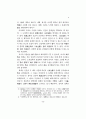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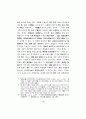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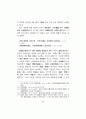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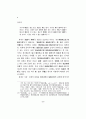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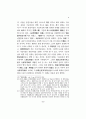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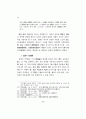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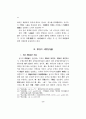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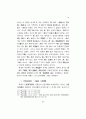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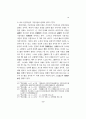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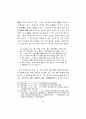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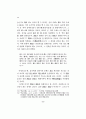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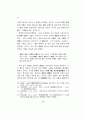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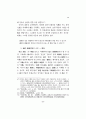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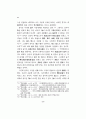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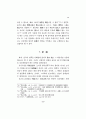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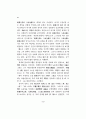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