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外 集
本 集
參考書籍과 註釋
1. 陳北溪(淳, 1153~1217)
2. 黃直翁(寅)
3. 王季海(漢)
4. 丁仲澄
5. 吳和中(雉)
難點과 功績
附加 所見
本 集
參考書籍과 註釋
1. 陳北溪(淳, 1153~1217)
2. 黃直翁(寅)
3. 王季海(漢)
4. 丁仲澄
5. 吳和中(雉)
難點과 功績
附加 所見
본문내용
래하였을 것이다. 선생 자신의 詩「精舍」(문집, 9/4a)에 「40년 동안 나는 악기와 책을 가지고 이곳을 왕래하였다. 나는 이 언덕에 거의 同鄕 사람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구절은 나의 견해를 증명한다.』
그는 또 宋史의 본문에서 後(뒤)자가 公(즉, 阮)자와 見(만나다)자 사이에 삽입된 것은 그 만남이 훨씬 뒤에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6/46a).
퇴계가 이곳에서 지적한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建陽 考亭의 精舍는 1192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으며, 王阮이 주희를 방문한 것은 그가 張 에게서 받은 충고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주희의 武夷山 주위지역에 대한 애정은 그의 문집의 많은 시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된다. 1152년에 그가 武夷의 觀妙堂에서 하룻밤 지낼 때 거기서 그는 宿武夷觀妙堂 二首(1/8b)를 지었다. 1153년에 그는 다시 武夷를 지나게 되었고, 다른 시 「遇武夷作」(1/15a)을 썼다. 그리고 1169년에 그는 배를 타고 이 산의 하천을 지났고(9/2a 겹줄의 註에 『行視武夷精舍作』의 시가 나옴), 1178년에서 1192년 사이에 武夷七詠(6/24b-25b)이라는 일곱 수의 시를 썼는데 거기에 1183년에 정식으로 세워진 武夷精舍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그의 다른 시들을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9/2a-b, 2b-4b).
연구자로서 퇴계 학술의 타당성은 다음 경우에서 더욱 드러난다. 周 의 항목(8/48a)아래에 퇴계는 14세기초의 저작인 周易會通
) 四庫全書總目 4(序 1328).
을 인용하였는데, 인용한 저자 董眞卿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周 의 字는 伯莊이며, 그는 永嘉(溫州)人이다. 그는 또 文公(朱熹의 諡號)에게서 莊仲의 이름을 받았다.』
-145-
陳榮捿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작 朱子門人에 考亭淵源錄23
) 原書는 宋端義(1447∼1501)가 편집함. 오늘날 입수할 수 있는 판본은 薛應 가 어느 정도 개정한 것임. 序 1568.
과 朱熹實紀28을 인용하였는데, 둘 다 周 은 주희의 제자라고 되어 있으나, 그들끼리도 일치하지 않아서(퇴계의 이야기와도 뒤얽혀 있고) 周 의 개인적 기록이, 역시 字가 莊仲이며 永嘉人인 沈 (통록, 5/41a)과 혼동되었을 것 같다.
) 朱子門人, 臺北, 1982, p.139 ; cf. p.133, 138.
사실상 어류에는 제자 周莊仲의 이름이 몇 번 나타나서(95/3913, 131/5102, 136/5272), 그의 존재도 확실한 것이다. 주희의 동료들 중에서 동일한 이름이나 字를 가진 이가 많은 경우로 판단해 보면, 단지 같은 고향이고 같은 字를 가졌으나 姓이 다른 두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附加 所見
퇴계의 통록은 약 400년 전에 지금의 田中謙二교수
) 田中, 朱門弟子師事年考, 東方學報, 44(1973), 48(1975).
나 陳교수의 저작과 비슷한 체재로 편집되었다. 그것의 간단한 체제와 체계적이고 선명한 배열때문에, 또 비록 약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자료의 신빙성때문에 중국학과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아직도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결점이 없지는 않다. 그것은 주요자료를 포함한 이전의 저작에서 문장이 취하여졌는데, 어류와 大全(문집)은 卷의 숫자없이 페이지만으로 인용되었다. 또 때때로 인용문의 서로 다른 곳에서 취하여져 한 곳에 합쳐졌다.예를 들어, 6/58a-b의 張顯之에게 보내는 주희의 편지는 두 개의 다른 부분에서 세 개의 문장이 인용되었다. 실제로 두번째 문장의 첫 부분은 문집 58/41a의 편지에서 인용되었고 두번째 부분(『又論聖賢傷劣』부터)은 문집 58/42a의 다른 편지에서 인용되었다. 그러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점은 모두 책의 재인쇄와 주석을 단 박식한 동시대의 학자들의 손에 의하여 고쳐졌고, 그래서 퇴계의 논저의 진정한 가치는 늘어나고 확대되어졌다.
주석에 있어서, 나는 여기에 16세기 위대한 신유학가의 기억력에 대하여 약간의 보충을 하겠다. 陳復齋(陳宓, 7/29b)의 항목아래에 퇴계는 眞德秀의 『跋陳復齋詩卷』을 인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46-
나는 스스로 경계하기 위한 도덕적 금언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학문에 있어 나는 臨 의 깊이에 이르지 못하였고, 나의 도량은 南海만큼 넓지 못하고, 나의 행동은 美德이 田보다 떨어지며, 가난한 생활에 만족함에 있어서 義烏를 대하기 부끄럽다.』
여기서 田은 나의 친구 陳師復(즉, 陳復齋, 陳宓)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西山先生眞文忠公文集, 四部叢刊版, 36/25b-26a.
이 금언에 언급된 臨 (西川), 南海(廣東), 田(福建), 義烏(浙江)은 모두 어떤 유명한 인물과 관계있는 지역이름이다. 겹줄의 주석에서(7/30a), 퇴계는 정확히 지적하였는데 臨 은 寧宗과 理宗때의 유학가며 정치가인 魏華父 즉 魏了翁(1178∼1237)을 나타내며, 義烏는 徐崇甫 즉 徐僑(1160∼1237)인데, 그는 秘書正字校書郞이며 經筵侍講이었으면서, 황제의 알현때에 초라한 옷을 입어서 공공연하게 동정을 받았었다. (宋史 422) 그러나 퇴계는 남해와 관계있는 사람을 결정지을 수 없었다. 나는 감히 남해는 崔與之(1158∼1239)를 나타낸다고 덧붙이겠는데, 그는 1193년에 進士科에 합격하기 전에 杭州의 국가교육기관에서 공부하던 廣東 최초의 학자이다. 여지는 1193년에서 1239년까지 많은 지방의 관리와 군사관리로 임명되면서 세 황제를 섬겼는데, 결국에는 南海郡公으로 세습지를 받았다. (宋史 406) 나는 戊辰年(1568) 3월에 자신의 의무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궁정에 제출한 퇴계의 두 번째 청원서에서, 최여지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자리를 받을 수 없는 모범적인 재상으로 인용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퇴계선생문집, 6/30b; cf. 退溪先生文集考證, 3/29b) 그는 통록을 편집할 때에 이최씨의 시호를 무심결에 빠뜨렸을 것이다.
) 崔與之의 文集이나 崔淸獻公集은 嶺南遺書 3集과 현대판 叢書集成에 들어 있음. 그의 菊坡集도 1卷과 3卷이 筆寫本으로만 남아 있음. cf. 黃蔭普, 廣東文獻書日知見錄, 改正版, Hong Kong, 1978, p,157.
-147-
(이 병 구 譯)
그는 또 宋史의 본문에서 後(뒤)자가 公(즉, 阮)자와 見(만나다)자 사이에 삽입된 것은 그 만남이 훨씬 뒤에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6/46a).
퇴계가 이곳에서 지적한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建陽 考亭의 精舍는 1192년이 되어서야 완성되었으며, 王阮이 주희를 방문한 것은 그가 張 에게서 받은 충고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주희의 武夷山 주위지역에 대한 애정은 그의 문집의 많은 시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된다. 1152년에 그가 武夷의 觀妙堂에서 하룻밤 지낼 때 거기서 그는 宿武夷觀妙堂 二首(1/8b)를 지었다. 1153년에 그는 다시 武夷를 지나게 되었고, 다른 시 「遇武夷作」(1/15a)을 썼다. 그리고 1169년에 그는 배를 타고 이 산의 하천을 지났고(9/2a 겹줄의 註에 『行視武夷精舍作』의 시가 나옴), 1178년에서 1192년 사이에 武夷七詠(6/24b-25b)이라는 일곱 수의 시를 썼는데 거기에 1183년에 정식으로 세워진 武夷精舍의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그의 다른 시들을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9/2a-b, 2b-4b).
연구자로서 퇴계 학술의 타당성은 다음 경우에서 더욱 드러난다. 周 의 항목(8/48a)아래에 퇴계는 14세기초의 저작인 周易會通
) 四庫全書總目 4(序 1328).
을 인용하였는데, 인용한 저자 董眞卿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周 의 字는 伯莊이며, 그는 永嘉(溫州)人이다. 그는 또 文公(朱熹의 諡號)에게서 莊仲의 이름을 받았다.』
-145-
陳榮捿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작 朱子門人에 考亭淵源錄23
) 原書는 宋端義(1447∼1501)가 편집함. 오늘날 입수할 수 있는 판본은 薛應 가 어느 정도 개정한 것임. 序 1568.
과 朱熹實紀28을 인용하였는데, 둘 다 周 은 주희의 제자라고 되어 있으나, 그들끼리도 일치하지 않아서(퇴계의 이야기와도 뒤얽혀 있고) 周 의 개인적 기록이, 역시 字가 莊仲이며 永嘉人인 沈 (통록, 5/41a)과 혼동되었을 것 같다.
) 朱子門人, 臺北, 1982, p.139 ; cf. p.133, 138.
사실상 어류에는 제자 周莊仲의 이름이 몇 번 나타나서(95/3913, 131/5102, 136/5272), 그의 존재도 확실한 것이다. 주희의 동료들 중에서 동일한 이름이나 字를 가진 이가 많은 경우로 판단해 보면, 단지 같은 고향이고 같은 字를 가졌으나 姓이 다른 두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附加 所見
퇴계의 통록은 약 400년 전에 지금의 田中謙二교수
) 田中, 朱門弟子師事年考, 東方學報, 44(1973), 48(1975).
나 陳교수의 저작과 비슷한 체재로 편집되었다. 그것의 간단한 체제와 체계적이고 선명한 배열때문에, 또 비록 약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자료의 신빙성때문에 중국학과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아직도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결점이 없지는 않다. 그것은 주요자료를 포함한 이전의 저작에서 문장이 취하여졌는데, 어류와 大全(문집)은 卷의 숫자없이 페이지만으로 인용되었다. 또 때때로 인용문의 서로 다른 곳에서 취하여져 한 곳에 합쳐졌다.예를 들어, 6/58a-b의 張顯之에게 보내는 주희의 편지는 두 개의 다른 부분에서 세 개의 문장이 인용되었다. 실제로 두번째 문장의 첫 부분은 문집 58/41a의 편지에서 인용되었고 두번째 부분(『又論聖賢傷劣』부터)은 문집 58/42a의 다른 편지에서 인용되었다. 그러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점은 모두 책의 재인쇄와 주석을 단 박식한 동시대의 학자들의 손에 의하여 고쳐졌고, 그래서 퇴계의 논저의 진정한 가치는 늘어나고 확대되어졌다.
주석에 있어서, 나는 여기에 16세기 위대한 신유학가의 기억력에 대하여 약간의 보충을 하겠다. 陳復齋(陳宓, 7/29b)의 항목아래에 퇴계는 眞德秀의 『跋陳復齋詩卷』을 인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146-
나는 스스로 경계하기 위한 도덕적 금언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학문에 있어 나는 臨 의 깊이에 이르지 못하였고, 나의 도량은 南海만큼 넓지 못하고, 나의 행동은 美德이 田보다 떨어지며, 가난한 생활에 만족함에 있어서 義烏를 대하기 부끄럽다.』
여기서 田은 나의 친구 陳師復(즉, 陳復齋, 陳宓)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西山先生眞文忠公文集, 四部叢刊版, 36/25b-26a.
이 금언에 언급된 臨 (西川), 南海(廣東), 田(福建), 義烏(浙江)은 모두 어떤 유명한 인물과 관계있는 지역이름이다. 겹줄의 주석에서(7/30a), 퇴계는 정확히 지적하였는데 臨 은 寧宗과 理宗때의 유학가며 정치가인 魏華父 즉 魏了翁(1178∼1237)을 나타내며, 義烏는 徐崇甫 즉 徐僑(1160∼1237)인데, 그는 秘書正字校書郞이며 經筵侍講이었으면서, 황제의 알현때에 초라한 옷을 입어서 공공연하게 동정을 받았었다. (宋史 422) 그러나 퇴계는 남해와 관계있는 사람을 결정지을 수 없었다. 나는 감히 남해는 崔與之(1158∼1239)를 나타낸다고 덧붙이겠는데, 그는 1193년에 進士科에 합격하기 전에 杭州의 국가교육기관에서 공부하던 廣東 최초의 학자이다. 여지는 1193년에서 1239년까지 많은 지방의 관리와 군사관리로 임명되면서 세 황제를 섬겼는데, 결국에는 南海郡公으로 세습지를 받았다. (宋史 406) 나는 戊辰年(1568) 3월에 자신의 의무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궁정에 제출한 퇴계의 두 번째 청원서에서, 최여지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자리를 받을 수 없는 모범적인 재상으로 인용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퇴계선생문집, 6/30b; cf. 退溪先生文集考證, 3/29b) 그는 통록을 편집할 때에 이최씨의 시호를 무심결에 빠뜨렸을 것이다.
) 崔與之의 文集이나 崔淸獻公集은 嶺南遺書 3集과 현대판 叢書集成에 들어 있음. 그의 菊坡集도 1卷과 3卷이 筆寫本으로만 남아 있음. cf. 黃蔭普, 廣東文獻書日知見錄, 改正版, Hong Kong, 1978, p,157.
-147-
(이 병 구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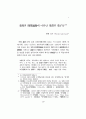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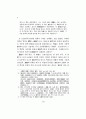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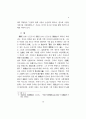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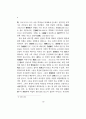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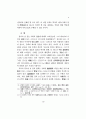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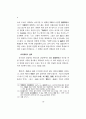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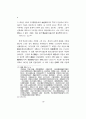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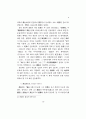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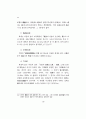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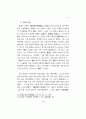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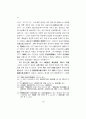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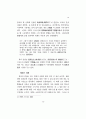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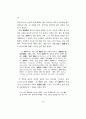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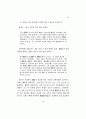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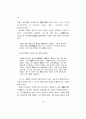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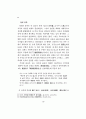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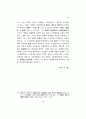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