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 목 : 장자사상
□ 총 페이지수 : 20
□ 목 차:
<제목차례>
장 자 사 상 1
1. 장자, 그 인물과 그 책 1
2. 장자의 사상 2
3.가치관 및 문화관 12
<표차례>
<그림차례>
□ 총 페이지수 : 20
□ 목 차:
<제목차례>
장 자 사 상 1
1. 장자, 그 인물과 그 책 1
2. 장자의 사상 2
3.가치관 및 문화관 12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고 大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은 天下에서 아직까지 없었다. 이로부터 보건데, 善人은 聖人의 道를 얻지 못하면 자립할 수 없고, 도척이 聖人의 道를 얻지 못하면 행세할 수 없다. 天下에 善人은 적고 不善人이 많다면, 聖人이 天下를 이롭게 함이 적고 천하를 해치는 것이 많다.(故盜척之徒問於척曰,盜亦有道乎? 척曰,適而無有道耶?夫妄意室中之藏,聖也;入先,勇也;出後,義也;知可否,知也;分均,仁也. 五者不備,而能成大盜者,天下未之有也. 由是觀之,善人不得聖之道不立,척不得聖人之道不行,天下,善人少而不善人多,則聖人之利天下也少而害天下也多.)
일체의 도덕조목은 善人에게 이용될 수 있으나 역시 惡人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이것으로 도덕 역시 죄악을 방지하기에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장자 후학은 이 점을 취하여, 일체의 도덕규범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중립적인 技術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장자 본인이 德性我\'를 부정하였으므로 그 후학들은 도덕의 자각에 대하여 더욱 아는 바가 없게된 것이다. (善과 惡은 각자의 我執과 主觀에 의해, 또 時代의 變遷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어서 영원한 善과 惡은 없다.)
이 설은 근원적으로 말해, 역시 인식 활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지식의 무한한 추구로 부터 文化上의 무한한 추구를 推出할 수 있다. 지식은 영원히 착오가 생기므로, 지식의 추구는 마치 형체가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 인류생활에는 영원히 죄악이 있다. 문화의 추구 역시 형체가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이나 같다. 文化 否定論은 마침내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죄악이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발전한다는 것이 문화부정론자들의 요지이다. 이 설은 老子에서 유래하였으므로 그 정면주장은 여전히 無爲\'의 관념위에 놓여져 있다.(是非否定) <在宥篇>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君子는 부득이 하여 天下에 臨하지만 無爲만은 못하다. 無爲한 뒤에야 그 生命의 情을 편안히 한다. (故君子不得已而臨리天下,莫若無爲.無爲也,而後安基性命之情.)
이 글의 아래에 老子의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천하를 위한다\'(貴以身爲天下)는 말이 인용되어 있다. 이것으로 본래는 老子사상을 발휘한 說임을 알 수 있다.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죄악은 더욱 복잡해 진다. 그러므로 文化의 眞相은 매우 슬퍼할 만하다. 대개 무궁한 추적을 하나 영원히 완성될 수가 없다. 老子는 옛날에 文化를 부정하는 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논지가 자세하지 못하였다. 莊子 자신은 이미 立說을 하여 지식의 무한한 추구는 無益함을 증명하였고, 그 後學은 이에 근거하여 문화의 무한한 추구는 無益함을 증명하였다. 그 정확한 근거는 즉 죄악과 文化가 나란히 발전하므로 문화는 영원히 죄악의 뒷전에 있게 된다.
형체는 귀하게 여기기에 부족하고, 認知 역시 중시하기에 부족하며, 德性 또한 아무 가치가 없다. 문화활동 자체가 다시 영원한 죄악의 추구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일체를 부정하고 남는 것은 오직 스스로 觀賞하는 心靈만이 있다. 이것이 곧 莊學의 결론이다.
☞ 理想的인 自我의 境界
無待하면서 逍遙하는 것으로, 莊子는 聖人,神人,至人,眞人을 이러한 경지에 오른 대표적 인물로 표현하였다.
① 無待 : 知效 => 宋榮子 => 列子 => 至人
| +---- 萬物을 超越하지 못함
+--- 중심적인 主體를 가지고 있음. 忘我하지 못함
忘我,喪我,坐喪 ==> 虛靜 ==> 至人의 경지
② 喪我 : 形軀,認知,德性 등 모든 것을 否定하면,
物은 事象이 아니며, 天地萬物은 一體이다. 또 喪我하였다면 나도 萬物과 一體가 된다. 그런 후에 至人이 된다.
物과 我는 대립되는 것이나 心齋후에 「物已非物」하여 「無物我之對立」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物我의 分別이 없어져서 天地萬物은 一體가 된다.
喪我 - 無所執,無所限 = 無待 - 絶對自由
忘形 => 心齋 -> 道心 --- 心卽虛
↘無知之知 ↘道之本身卽虛,虛卽無.
性理學 人心 = 道心 -> 理 - 性(不動寂然)
↘惡을 없애고 善을 키우는 마음
人心--> 性(理) - 善 -> 存養
↘ 情(氣) - 善惡共存
③ 齊物我 ==> 至人 (하지만 喪我의 경지에 이르러야 齊物할 수 있다)
〈齊物論〉 吾喪我(吾는 主體의 我이며 我는 形軀의 我이다)
喪我는 喪形이다. 莊子의 心은 심리상황이며 정서욕구이다. 이것을 모두 없앤 心이 道心이다.(道心:가장 고요한 마음)
心 - ① 심리상황.정서욕구 - 除去①後 - 最靜之心=道心
(知物的心;보통心)
④ 養生과 全生 : 먼저 不傷해야 한다. 그런 후에 觀賞을 길러라. 그러면 至人이 된다.
⑤ 才全而德不形 ; 心靈이 외적인 요인에 간섭받지 않는다. 德도 외형적인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된다. 그후에 至人이 된다.
才全 = 性全 (천부적인 良能, 性眞)
內德具足與大化同流(自然之化와 동류)
德不形 ; 진정한 德은 정신의 경계가 외계에 발현되는 것이다. (협의가 아니라 광의의 형태로 발현됨)
道德(道는 이치,德은 결과)의 德은 仁義禮의 德이며 莊子의 德이 아니다. 〈德充符〉 卽德充於內,而符現於外.
德 -> 老子 「德畜」의 德은 무엇인가?
⑥ 破生死 : 죽는 것은 휴식이다. 육체의 변화을 常,道,反으로 본다. 집착하지 마라. 古之眞人,不知說生,不知惡死.
⑦ 天人不相勝은 儒家의 天人合一과 다르다.
「天與人不相勝,是之謂眞人.」 (相勝 = 相容)
眞人에 있어서, 生死는 自然之化이다. (常,道,返)
眞人의 경계는 投入大化之中한다. 그렇기 때문에 眞我는 外物과 접하였을 때 相容한다.
* 儒家 ; 天 --> 化生, 地 --> 化育
道家 ; 天地는 단지 自然으로 봄. 入世 --> 眞我
佛家 ; 出世 --> 眞性(實像)
* 〈齊物論〉
自有我視之,則有人 地 天 之別,
自無我視之,則有人 地 天 也.
* 參 考 文 獻 *
勞思光 著. 《中國哲學史》, 三民書局, 民國79年.
鄭仁在 譯. 《中國哲學史》, 探求堂, 1990.
李康洙.鄭仁在.柳仁熙.李東三 共著.《中國哲學槪論》,방송통신대학,1992
陳鼓應 譯. 《莊子今註今譯》, 商務印書館, 民國73年.
張基槿.李錫浩 譯. 《老子.莊子》, 삼성출판사, 1990.
山 著, 吳進鐸 譯. 《감산의 莊子풀이》, 서광사, 1991.
尹在根 著.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둥지, 1991.
일체의 도덕조목은 善人에게 이용될 수 있으나 역시 惡人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이것으로 도덕 역시 죄악을 방지하기에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장자 후학은 이 점을 취하여, 일체의 도덕규범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중립적인 技術에 속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장자 본인이 德性我\'를 부정하였으므로 그 후학들은 도덕의 자각에 대하여 더욱 아는 바가 없게된 것이다. (善과 惡은 각자의 我執과 主觀에 의해, 또 時代의 變遷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어서 영원한 善과 惡은 없다.)
이 설은 근원적으로 말해, 역시 인식 활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지식의 무한한 추구로 부터 文化上의 무한한 추구를 推出할 수 있다. 지식은 영원히 착오가 생기므로, 지식의 추구는 마치 형체가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 인류생활에는 영원히 죄악이 있다. 문화의 추구 역시 형체가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이나 같다. 文化 否定論은 마침내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죄악이 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발전한다는 것이 문화부정론자들의 요지이다. 이 설은 老子에서 유래하였으므로 그 정면주장은 여전히 無爲\'의 관념위에 놓여져 있다.(是非否定) <在宥篇>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君子는 부득이 하여 天下에 臨하지만 無爲만은 못하다. 無爲한 뒤에야 그 生命의 情을 편안히 한다. (故君子不得已而臨리天下,莫若無爲.無爲也,而後安基性命之情.)
이 글의 아래에 老子의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천하를 위한다\'(貴以身爲天下)는 말이 인용되어 있다. 이것으로 본래는 老子사상을 발휘한 說임을 알 수 있다.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죄악은 더욱 복잡해 진다. 그러므로 文化의 眞相은 매우 슬퍼할 만하다. 대개 무궁한 추적을 하나 영원히 완성될 수가 없다. 老子는 옛날에 文化를 부정하는 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논지가 자세하지 못하였다. 莊子 자신은 이미 立說을 하여 지식의 무한한 추구는 無益함을 증명하였고, 그 後學은 이에 근거하여 문화의 무한한 추구는 無益함을 증명하였다. 그 정확한 근거는 즉 죄악과 文化가 나란히 발전하므로 문화는 영원히 죄악의 뒷전에 있게 된다.
형체는 귀하게 여기기에 부족하고, 認知 역시 중시하기에 부족하며, 德性 또한 아무 가치가 없다. 문화활동 자체가 다시 영원한 죄악의 추구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일체를 부정하고 남는 것은 오직 스스로 觀賞하는 心靈만이 있다. 이것이 곧 莊學의 결론이다.
☞ 理想的인 自我의 境界
無待하면서 逍遙하는 것으로, 莊子는 聖人,神人,至人,眞人을 이러한 경지에 오른 대표적 인물로 표현하였다.
① 無待 : 知效 => 宋榮子 => 列子 => 至人
| +---- 萬物을 超越하지 못함
+--- 중심적인 主體를 가지고 있음. 忘我하지 못함
忘我,喪我,坐喪 ==> 虛靜 ==> 至人의 경지
② 喪我 : 形軀,認知,德性 등 모든 것을 否定하면,
物은 事象이 아니며, 天地萬物은 一體이다. 또 喪我하였다면 나도 萬物과 一體가 된다. 그런 후에 至人이 된다.
物과 我는 대립되는 것이나 心齋후에 「物已非物」하여 「無物我之對立」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物我의 分別이 없어져서 天地萬物은 一體가 된다.
喪我 - 無所執,無所限 = 無待 - 絶對自由
忘形 => 心齋 -> 道心 --- 心卽虛
↘無知之知 ↘道之本身卽虛,虛卽無.
性理學 人心 = 道心 -> 理 - 性(不動寂然)
↘惡을 없애고 善을 키우는 마음
人心--> 性(理) - 善 -> 存養
↘ 情(氣) - 善惡共存
③ 齊物我 ==> 至人 (하지만 喪我의 경지에 이르러야 齊物할 수 있다)
〈齊物論〉 吾喪我(吾는 主體의 我이며 我는 形軀의 我이다)
喪我는 喪形이다. 莊子의 心은 심리상황이며 정서욕구이다. 이것을 모두 없앤 心이 道心이다.(道心:가장 고요한 마음)
心 - ① 심리상황.정서욕구 - 除去①後 - 最靜之心=道心
(知物的心;보통心)
④ 養生과 全生 : 먼저 不傷해야 한다. 그런 후에 觀賞을 길러라. 그러면 至人이 된다.
⑤ 才全而德不形 ; 心靈이 외적인 요인에 간섭받지 않는다. 德도 외형적인 것으로 드러나서는 안된다. 그후에 至人이 된다.
才全 = 性全 (천부적인 良能, 性眞)
內德具足與大化同流(自然之化와 동류)
德不形 ; 진정한 德은 정신의 경계가 외계에 발현되는 것이다. (협의가 아니라 광의의 형태로 발현됨)
道德(道는 이치,德은 결과)의 德은 仁義禮의 德이며 莊子의 德이 아니다. 〈德充符〉 卽德充於內,而符現於外.
德 -> 老子 「德畜」의 德은 무엇인가?
⑥ 破生死 : 죽는 것은 휴식이다. 육체의 변화을 常,道,反으로 본다. 집착하지 마라. 古之眞人,不知說生,不知惡死.
⑦ 天人不相勝은 儒家의 天人合一과 다르다.
「天與人不相勝,是之謂眞人.」 (相勝 = 相容)
眞人에 있어서, 生死는 自然之化이다. (常,道,返)
眞人의 경계는 投入大化之中한다. 그렇기 때문에 眞我는 外物과 접하였을 때 相容한다.
* 儒家 ; 天 --> 化生, 地 --> 化育
道家 ; 天地는 단지 自然으로 봄. 入世 --> 眞我
佛家 ; 出世 --> 眞性(實像)
* 〈齊物論〉
自有我視之,則有人 地 天 之別,
自無我視之,則有人 地 天 也.
* 參 考 文 獻 *
勞思光 著. 《中國哲學史》, 三民書局, 民國79年.
鄭仁在 譯. 《中國哲學史》, 探求堂, 1990.
李康洙.鄭仁在.柳仁熙.李東三 共著.《中國哲學槪論》,방송통신대학,1992
陳鼓應 譯. 《莊子今註今譯》, 商務印書館, 民國73年.
張基槿.李錫浩 譯. 《老子.莊子》, 삼성출판사, 1990.
山 著, 吳進鐸 譯. 《감산의 莊子풀이》, 서광사, 1991.
尹在根 著.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둥지, 1991.
추천자료
 백만장자 마인드
백만장자 마인드 "억만장자의 아들 동굴인"을 읽고...
"억만장자의 아들 동굴인"을 읽고... 중국 주요도시 기행문-북경,장자코우, 석가장, 천진,당산
중국 주요도시 기행문-북경,장자코우, 석가장, 천진,당산 왕건의 사상,가치관,리더쉽
왕건의 사상,가치관,리더쉽 보따리무역으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보따리무역으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공자의 정명사상에 따른 학교장의 리더쉽
공자의 정명사상에 따른 학교장의 리더쉽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비법을 보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비법을 보고 장자의 철학(도, 덕, 성, 안명, 소요유, 심재, 좌망)
장자의 철학(도, 덕, 성, 안명, 소요유, 심재, 좌망) 장자 느낀점, 견해, 생각
장자 느낀점, 견해, 생각 율곡 이이 (栗谷 李珥)의 생애, 업적, 주요사상, 특징, 율곡이이를 통해 살펴 본 경영전략, ...
율곡 이이 (栗谷 李珥)의 생애, 업적, 주요사상, 특징, 율곡이이를 통해 살펴 본 경영전략, ... [독후감] 하브 에커(T. Harv Eker)의 <백만장자 시크릿(Secrets of the Millionaire Mind)>을...
[독후감] 하브 에커(T. Harv Eker)의 <백만장자 시크릿(Secrets of the Millionaire Mind)>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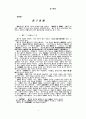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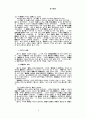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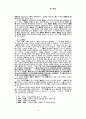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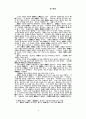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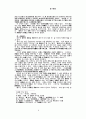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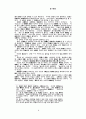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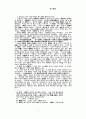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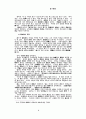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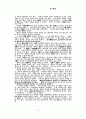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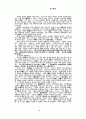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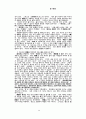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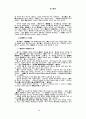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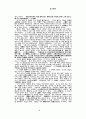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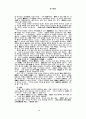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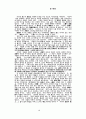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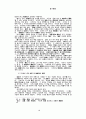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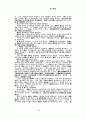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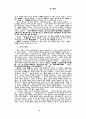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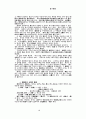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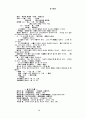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