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 목 :
□ 총 페이지수 :
□ 목 차:
콘스탄틴누스 대제가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거설한 330년부터 시작되어 터키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함락된 1453년까지의 동방기독교사회의 미술이다.
□ 총 페이지수 :
□ 목 차:
콘스탄틴누스 대제가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거설한 330년부터 시작되어 터키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함락된 1453년까지의 동방기독교사회의 미술이다.
본문내용
스팔라토아에 있는 팔각 모슬리엄에서 로마인은 벽돌조 보울트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이는 스퀸치라고 알려진 공법에 의해 3개의 벽돌조 아치는 삼각돌 까지 突出하여 그것을 덮어 감추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折衝的 해결에 불과했다. 마지막 아치의 면은둥근 형태와 여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펜덴티브(pendentives)라 불리는 볼록하게굽은구석사면의 밑동과 돔의 원형 밑동 사이와의 흐름을 이어주는 소피아 대성당이 건축됨으로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십자가의 象徵을 追求하는 비잔틴건축가의 결정과 그들의 예술적 순수성의 연출은 그들의 강렬한 信念을 보여준 것이다.
돔 원통형, 그리스 십자형(Greek Cross)은 비잔틴 교회건축의 주요한 요소들이다. 높고 긴 돔 형탑과 사원하부의 사각형 몸체와의 결합된 효과는 비잔틴 교회를 강렬한 형태로 만들었다. 중요한 점은 성소피아와 같은 거대한 성당이든 카프니카리아 같은 작은 교회이든 패턴은 동일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형태는 축제분위기와도 같이 복잡한 것이었다. 중앙 돔은, 돔의 호를 따라 놓여 있는 로마식 타일로 덮혀있으며 때때로 그 돔의 가장자리는 수평적이었고, 원통형이나 탑에서 눈썹처럼 창문의 아치모양 위로 곡선을 이뤘다. 종종 중앙 돔은 십자형 팔익부와 구석간 위에 다양한 높이로 서 있는 작은 돔의 그룹으로 둘러싸여 있다. 콘스탄티노풍에서 석재는 유용하지 못했다. 가장 유용한 재료로 - 벽돌용 진흙덩이, 콘크리트용 자갈이 가장 많이 쓰였고, 대리석과 기둥용 巨石은 지중해변에 있는 채석장으로부터 輸入을 해야했다. 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매우 풍부하게 장식을 했다. 두께가 1.5인치(4cm)쯤 되는 벽돌 타일과 돌블록 사이에 모르타르가 뚜껍게 바라졌다.
타일과 돌은 줄을 번갈아 놓였는데, 타일은 변칙적으로 배치되었으며 돌은 엄격한 규칙아래 놓였다. 내어 쌓기는 지붕밑에 조각용 프리즈로 사용되었고, 프리즈는 창옆과 아치 위에서 얇고 동근 벽두 리브(rib)로 서 이어져 있다. 에테네의 스몰 메트로폴리스경우처럼 석재작품은 복잡한 형상과 형태로 조각되었다. 이런한 세부적인 것들이 융합되어 건축작품을 거대하고 장엄한 조각품으로 만들었다.
원 모양의 지붕을 씌운 집중식 건축은 성스러운 천계(天界)로 덮인 종교적 공간을 구성하고, 그 원형은 고대 로마에도 있으나 5세기부터 세례당(洗禮堂), 묘당(廟堂), 순교자 기념당 등으로 우선 발달하였고(라벤나의 갈라 플라키디아 묘당 등), 그것이 점차 대형화하여 성당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전례(典禮)를 위해서는 제실과 주랑(主廊)을 직선으로 늘어놓고 다시 거기에 전실(前室:세례 지원자용)과 앞뜰(일반인용)을 추가한 종장식 설계가 편리하므로 집중식의 경우도 대부분 바실리카 구조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장식은 특히 건축 내부에 집중되었다. 이 경우 장식이란 단순한 벽면 미화가 아니라, 조형적 수단에 의하여 공간 내부를 성화(聖化)하여 거기에 초자연적인 세계를 현실에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것 또는 성스러운 공간은 현세 또는 물질계의 것처럼 나타내면 안된다. 이 초자연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보다도 빛이며, 빛의 구성 요소로서의 색채이다. 이리하여 십자가, 여러 종교 용구, 제단 등이 황금·보석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비단 등을 사용한 호화로운 염직품이 귀하게 여겨졌고, 건축장식으로는 색유리를 많이 사용하는 모자이크 미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이탈리아의 라벤나에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모자이크는 비용과 수고가 드는 것이므로 시대 또는 경우에 따라 벽화가 이를 대신하였다. 어쨌든 그 표현양식을 보면 무엇보다도 색채의 효과가 중시되어 3차원적인 표현에서 입체감이나 원근 표현은 되도록 피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성스러운 자나 성스러운 장면의 물질화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성상(聖像) 표현을 우상숭배라 하여 부정하고 아이코노클래즘 운동을 8∼9세기에 걸쳐 흥륭시켰다. 마케도니아 왕조 이래 성상 미술은 또다시 흥하지만 그것도 모자이크·벽화· 아이콘으로부터 사본 등 따위 색채 미술의 각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3차원적 성격의 강한 조각미술이 끝내 발달하지 못한 것은 유대교 이래의 전통인 우상에 대한 강한 경계심 때문일 것이다. 조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기둥머리, 내진 장벽 등) 주제의 대부분은 추상적· 상징적이며, 사람의 상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거의 평면예술에 가깝다.
돔 원통형, 그리스 십자형(Greek Cross)은 비잔틴 교회건축의 주요한 요소들이다. 높고 긴 돔 형탑과 사원하부의 사각형 몸체와의 결합된 효과는 비잔틴 교회를 강렬한 형태로 만들었다. 중요한 점은 성소피아와 같은 거대한 성당이든 카프니카리아 같은 작은 교회이든 패턴은 동일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형태는 축제분위기와도 같이 복잡한 것이었다. 중앙 돔은, 돔의 호를 따라 놓여 있는 로마식 타일로 덮혀있으며 때때로 그 돔의 가장자리는 수평적이었고, 원통형이나 탑에서 눈썹처럼 창문의 아치모양 위로 곡선을 이뤘다. 종종 중앙 돔은 십자형 팔익부와 구석간 위에 다양한 높이로 서 있는 작은 돔의 그룹으로 둘러싸여 있다. 콘스탄티노풍에서 석재는 유용하지 못했다. 가장 유용한 재료로 - 벽돌용 진흙덩이, 콘크리트용 자갈이 가장 많이 쓰였고, 대리석과 기둥용 巨石은 지중해변에 있는 채석장으로부터 輸入을 해야했다. 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매우 풍부하게 장식을 했다. 두께가 1.5인치(4cm)쯤 되는 벽돌 타일과 돌블록 사이에 모르타르가 뚜껍게 바라졌다.
타일과 돌은 줄을 번갈아 놓였는데, 타일은 변칙적으로 배치되었으며 돌은 엄격한 규칙아래 놓였다. 내어 쌓기는 지붕밑에 조각용 프리즈로 사용되었고, 프리즈는 창옆과 아치 위에서 얇고 동근 벽두 리브(rib)로 서 이어져 있다. 에테네의 스몰 메트로폴리스경우처럼 석재작품은 복잡한 형상과 형태로 조각되었다. 이런한 세부적인 것들이 융합되어 건축작품을 거대하고 장엄한 조각품으로 만들었다.
원 모양의 지붕을 씌운 집중식 건축은 성스러운 천계(天界)로 덮인 종교적 공간을 구성하고, 그 원형은 고대 로마에도 있으나 5세기부터 세례당(洗禮堂), 묘당(廟堂), 순교자 기념당 등으로 우선 발달하였고(라벤나의 갈라 플라키디아 묘당 등), 그것이 점차 대형화하여 성당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나 전례(典禮)를 위해서는 제실과 주랑(主廊)을 직선으로 늘어놓고 다시 거기에 전실(前室:세례 지원자용)과 앞뜰(일반인용)을 추가한 종장식 설계가 편리하므로 집중식의 경우도 대부분 바실리카 구조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장식은 특히 건축 내부에 집중되었다. 이 경우 장식이란 단순한 벽면 미화가 아니라, 조형적 수단에 의하여 공간 내부를 성화(聖化)하여 거기에 초자연적인 세계를 현실에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것 또는 성스러운 공간은 현세 또는 물질계의 것처럼 나타내면 안된다. 이 초자연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보다도 빛이며, 빛의 구성 요소로서의 색채이다. 이리하여 십자가, 여러 종교 용구, 제단 등이 황금·보석 등으로 만들어졌으며, 비단 등을 사용한 호화로운 염직품이 귀하게 여겨졌고, 건축장식으로는 색유리를 많이 사용하는 모자이크 미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이탈리아의 라벤나에 풍부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모자이크는 비용과 수고가 드는 것이므로 시대 또는 경우에 따라 벽화가 이를 대신하였다. 어쨌든 그 표현양식을 보면 무엇보다도 색채의 효과가 중시되어 3차원적인 표현에서 입체감이나 원근 표현은 되도록 피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성스러운 자나 성스러운 장면의 물질화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성상(聖像) 표현을 우상숭배라 하여 부정하고 아이코노클래즘 운동을 8∼9세기에 걸쳐 흥륭시켰다. 마케도니아 왕조 이래 성상 미술은 또다시 흥하지만 그것도 모자이크·벽화· 아이콘으로부터 사본 등 따위 색채 미술의 각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3차원적 성격의 강한 조각미술이 끝내 발달하지 못한 것은 유대교 이래의 전통인 우상에 대한 강한 경계심 때문일 것이다. 조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기둥머리, 내진 장벽 등) 주제의 대부분은 추상적· 상징적이며, 사람의 상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거의 평면예술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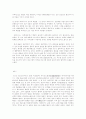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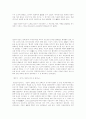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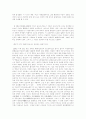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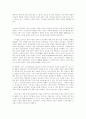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