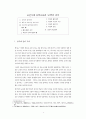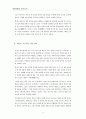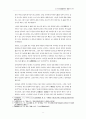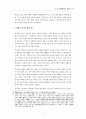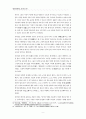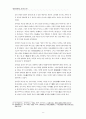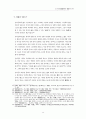목차
Ⅰ. 논의에 들어가며
Ⅱ.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의미
Ⅲ. 조선시대 유학교육에서의 敎와 學
1. 敎와 學의 관계
2. 배움의 단계와 敎와 學
3. 배움과 道와 德
4. 배움과 마음의 쓰임
5. 배움과 知와 行
6. 배움의 방법
Ⅳ. 결론에 대신하여
Ⅱ. 배우고 가르치는 것의 의미
Ⅲ. 조선시대 유학교육에서의 敎와 學
1. 敎와 學의 관계
2. 배움의 단계와 敎와 學
3. 배움과 道와 德
4. 배움과 마음의 쓰임
5. 배움과 知와 行
6. 배움의 방법
Ⅳ. 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말한다. 明辨은 自得한 내용을 밝게 분변하여 행동의 준거가 되는 是非와 善惡과 邪正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배운 것의 내용이 분명해지면 독실하게 실천하는 篤行으로 나아가 배움을 완성하게 된다. 篤行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禮가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禮의 핵심을 요약하여 분명하게 잡는 것이 학문의 마침을 이루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맹자는 "널리 배워서 상세하게 이치를 설명하는 것은 장차 돌이켜 요약하기 위한 것이다"
) 『孟子集註大全』, 離婁章句(下), 『經書』, 612쪽, "孟子曰博學而詳說之,將以反說約也".
라고 말했고, 공자는 학문이 "널리 배우는 博文에서 시작하여 실천의 요령을 파악하는 約禮에서 완결된다"
) 『論語集註大全』, 제9, 子罕, 『經書』, 235쪽, "夫子循循然善誘人,博我以文,約我以禮".
고 말했다.
Ⅳ. 결론에 대신하여
앞의 논의를 통해 조선시대 유학교육은 교육의 핵심이 선비들에게 윤리적 삶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그것의 실현에 필요한 지식체계를 가르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 교육의 목표를 배움의 의미와 가치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두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움의 과정은 앎을 지극히 하는 과정인 동시에 그것을 힘써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윤리적 삶을 실현하는 핵심적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관계로 그들이 윤리적 삶을 실현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들이 삶의 모범을 삼은 聖人도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한편 오늘날 한국에서 행해지는 입시교육은 학생들에게 입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에 필요한 지식체계를 가르치는 것에 중점이 있다.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에게 강조하는 것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훌륭한 간판을 획득함으로써 출세의 기반을 닦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열의는 상관하지 않고, 입시에 필요한 지식만을 학습자에게 주입시키는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윤리적 삶에 대한 열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청소년들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 윤리적 삶에 대한 열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교육을 행하는 목적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시대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것은 첫째,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 교육의 목적, 내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와 오늘날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 내용,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조선시대 유학교육은 윤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윤리적 삶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입시교육은 출세를 강조하기 때문에 출세에 필요한 간판을 획득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둘째,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점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교육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 활동의 중심을 '교육받는 인간'에게 두느냐 아니면 '배우는 인간'에게 두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에는 '배우는 인간'을 대단히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간은 배움에 대한 자발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자발성을 존중할 때 능력의 계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교육받는 인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이 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가 교육받은 인간임을 증명하는 '졸업장'을 획득하는 것에 있다.
오늘날 한국인은 세계화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능력있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을 형성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입시 중심의 제도교육에 눈이 멀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 입시 중심의 제도교육을 통해 인간에 대한 혐오를 강화시키는 교육, 즉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교육을 지속하게 되면 교육에 저항하는 성향을 갖게 되어 배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 배움에 대한 염증으로 제도교육의 틀만 벗어나면 죽어도 자발적으로는 배우지 않으려는 무서운 인간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윤리적 삶에 대한 열망과 태도가 형성되어야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개인적인 이익 증진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전체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인간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 증진의 차원에 머물러 승리감, 편리함, 편안함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들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우고 익히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불리하면 언제든지 배우고 익히는 것을 그만두게 되어 깊이 있는 배움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입시 중심의 제도교육은 철저하게 비판되고 반성되어야 한다. 제도교육이 선을 조장하는 도구로 기능하기 보다는 악을 조장하는 도구로 기능하는 일이 더 많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여,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교육의 이름으로 악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사가 입시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능력을 개발하는데 극히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공부 자체를 멀리하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학모, 교사, 교육재단, 행정가 등의 교육에 대한 사사로운 요구에 굴복하여 교육의 공적 기능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이런 형태의 불합리한 제도교육을 계속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고, 이러한 물음에 기초하여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 『孟子集註大全』, 離婁章句(下), 『經書』, 612쪽, "孟子曰博學而詳說之,將以反說約也".
라고 말했고, 공자는 학문이 "널리 배우는 博文에서 시작하여 실천의 요령을 파악하는 約禮에서 완결된다"
) 『論語集註大全』, 제9, 子罕, 『經書』, 235쪽, "夫子循循然善誘人,博我以文,約我以禮".
고 말했다.
Ⅳ. 결론에 대신하여
앞의 논의를 통해 조선시대 유학교육은 교육의 핵심이 선비들에게 윤리적 삶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그것의 실현에 필요한 지식체계를 가르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 교육의 목표를 배움의 의미와 가치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에 두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움의 과정은 앎을 지극히 하는 과정인 동시에 그것을 힘써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윤리적 삶을 실현하는 핵심적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관계로 그들이 윤리적 삶을 실현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들이 삶의 모범을 삼은 聖人도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한편 오늘날 한국에서 행해지는 입시교육은 학생들에게 입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에 필요한 지식체계를 가르치는 것에 중점이 있다.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에게 강조하는 것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훌륭한 간판을 획득함으로써 출세의 기반을 닦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열의는 상관하지 않고, 입시에 필요한 지식만을 학습자에게 주입시키는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윤리적 삶에 대한 열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청소년들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 윤리적 삶에 대한 열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교육을 행하는 목적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시대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것은 첫째,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 교육의 목적, 내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와 오늘날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 내용,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조선시대 유학교육은 윤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윤리적 삶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입시교육은 출세를 강조하기 때문에 출세에 필요한 간판을 획득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둘째,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관점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교육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 활동의 중심을 '교육받는 인간'에게 두느냐 아니면 '배우는 인간'에게 두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에는 '배우는 인간'을 대단히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간은 배움에 대한 자발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자발성을 존중할 때 능력의 계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교육받는 인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이 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가 교육받은 인간임을 증명하는 '졸업장'을 획득하는 것에 있다.
오늘날 한국인은 세계화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능력있는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을 형성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입시 중심의 제도교육에 눈이 멀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 입시 중심의 제도교육을 통해 인간에 대한 혐오를 강화시키는 교육, 즉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교육을 지속하게 되면 교육에 저항하는 성향을 갖게 되어 배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 배움에 대한 염증으로 제도교육의 틀만 벗어나면 죽어도 자발적으로는 배우지 않으려는 무서운 인간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윤리적 삶에 대한 열망과 태도가 형성되어야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개인적인 이익 증진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전체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인간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 증진의 차원에 머물러 승리감, 편리함, 편안함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들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우고 익히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불리하면 언제든지 배우고 익히는 것을 그만두게 되어 깊이 있는 배움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입시 중심의 제도교육은 철저하게 비판되고 반성되어야 한다. 제도교육이 선을 조장하는 도구로 기능하기 보다는 악을 조장하는 도구로 기능하는 일이 더 많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여,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교육의 이름으로 악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사가 입시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능력을 개발하는데 극히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공부 자체를 멀리하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학모, 교사, 교육재단, 행정가 등의 교육에 대한 사사로운 요구에 굴복하여 교육의 공적 기능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이런 형태의 불합리한 제도교육을 계속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고, 이러한 물음에 기초하여 한국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추천자료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제도]조선시대 인사행정제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분석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제도]조선시대 인사행정제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분석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 [조선시대전기]조선전기(조선시대전기)의 농업, 조선전기(조선시대전기)의 토지세금제도, 조...
[조선시대전기]조선전기(조선시대전기)의 농업, 조선전기(조선시대전기)의 토지세금제도, 조... [조선][조선왕조][조선시대]조선(조선왕조, 조선시대)의 역사와 신분제, 조선(조선왕조, 조선...
[조선][조선왕조][조선시대]조선(조선왕조, 조선시대)의 역사와 신분제, 조선(조선왕조, 조선... 조선 당쟁(붕당정치, 사림정치) 정의와 성격, 조선시대 당쟁(붕당정치)과 공론대두, 조선 당...
조선 당쟁(붕당정치, 사림정치) 정의와 성격, 조선시대 당쟁(붕당정치)과 공론대두, 조선 당... 한국 중세문학 조선전기문학, 한국 중세문학 조선후기문학, 한국 중세문학 조선시대문학 야담...
한국 중세문학 조선전기문학, 한국 중세문학 조선후기문학, 한국 중세문학 조선시대문학 야담... [조선시대 회화]조선시대 회화의 특성, 조선시대 회화의 전개, 조선시대 회화의 조선중기 회...
[조선시대 회화]조선시대 회화의 특성, 조선시대 회화의 전개, 조선시대 회화의 조선중기 회... [도자기][도자기의 개념][도자기의 제작기법][삼국시대의 도자기][고려시대의 도자기][조선시...
[도자기][도자기의 개념][도자기의 제작기법][삼국시대의 도자기][고려시대의 도자기][조선시... [조선시가][조선시대 시가문학][잡가현상][시가문학]조선시가(조선시대 시가문학)의 발생, 조...
[조선시가][조선시대 시가문학][잡가현상][시가문학]조선시가(조선시대 시가문학)의 발생, 조... [조선시대 시조][조선시대][시조][조선시대 시조 변이][사설시조][시조작가]조선시대 시조의 ...
[조선시대 시조][조선시대][시조][조선시대 시조 변이][사설시조][시조작가]조선시대 시조의 ... [불교, 삼국시대 불교, 남북국시대 불교,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불교, 현대시대 불교, 삼...
[불교, 삼국시대 불교, 남북국시대 불교,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불교, 현대시대 불교, 삼... [인사행정][조선왕조시대 인사행정][조선후기 인사행정][이승만정부 인사행정][국민의 정부]...
[인사행정][조선왕조시대 인사행정][조선후기 인사행정][이승만정부 인사행정][국민의 정부]... 조선시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여성의 반항, 그 소극성에서 방관까지 (조희선의 논문 ‘조...
조선시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여성의 반항, 그 소극성에서 방관까지 (조희선의 논문 ‘조... 전통문화의 성 [조선시대 춘화 형성배경]
전통문화의 성 [조선시대 춘화 형성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