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이끄는 말
Ⅱ. 주자의 사·리 개념
1. 도가적 이(理)에 대한 비판
2. 불가적 이(理)에 대한 비판
3. 주자의 사·리 개념
Ⅲ. 원불교의 사·리 개념
1. 사(事)의 성격
2. 이(理)의 성격
3. 사(事)와 이(理)의 관계
Ⅳ. 맺는 말
Ⅱ. 주자의 사·리 개념
1. 도가적 이(理)에 대한 비판
2. 불가적 이(理)에 대한 비판
3. 주자의 사·리 개념
Ⅲ. 원불교의 사·리 개념
1. 사(事)의 성격
2. 이(理)의 성격
3. 사(事)와 이(理)의 관계
Ⅳ. 맺는 말
본문내용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 … 」
) 上揭書, 인도품 1.
즉 소태산은 천도와 인도에 구별없이 도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오직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은 곧 도를 아는 사람이요」라고 하여 도를 「당연」한 길로 해석한다.
) 上揭書, 인도품 1,2.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존재와 당위의 일치를 강조하는 입장인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리체계의 매락에 비추어 볼때 이 견해는 윤리규범의 절대적 근거를 강조하기 위한 언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태도의 근거로는 소태산의 「법」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여기서의 법이란 성자들의 즉 대소유무의 이치를 각득하여 시비이해를 건설할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이(理)에 근거하여 제정해 준 시비이해의 규범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은 성자들의 주체적인 파악에 의존하므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한다.
) 上揭書, 교의품 1.
그러나 그 이유로 인해 법의 절대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하늘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 있다」고 하는 말이 이러한 법의 절대성을 나타낸다.
) 박정훈 편저, 『한 울안 한 이치에』, 원불교출판사, 1982, p.18.
따라서 성자들에 의해 제시된 법은 이(理)에 근거함과 동시에 성자들의 주체적 파악에 의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존재와 당위에 대한 원불교적 견해를 잘 드러내준다. 예컨대 보은이라는 최고 가치규범은 우주의 근원적 존재근거인 생명적 관계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소태산이 이를 파악하고 주체적인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가치규범을 뜻한다.
이상에서는 이(理)와 사(事)의 관계문제에 있어서 주로 사의 의미를 중심하여 살펴 보았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어 보면 이(理)와 사(事)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우 이(理)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 드러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윤리적 가치규범에 존재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소이연과 소당연을 동일시 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이연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소홀히 되기 쉬우며 주자의 경우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구별하고 사(事)의 건설이 이(理)의 파악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때는 이(理)에 대한 몰가치적 탐구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대하게 된다. 실질적인 내용상에는 보면 향상세계의 다양한 원리를 파악하는 제과학이나 가장 근본적인 불생불멸과 인과보은의 원리에 대한 종교적 탐구가 가치세계 건설에 우선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앞에서는 단순히 이(理)의 증득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사에의 탐구가 잘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사(事)에의 탐구에 앞서 이(理)의 증득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참다운 수행의 길은 돈오점수라는 보조국사 지눌의 견해는 이런 의미에서 존중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주법칙과의 조화에서 가치건설의 근원을 찾는 입장을 의미한다.
실은 주자의 격물궁리의 인식체계도 이러한 소이연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는 폭을 지니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소당연에 강점을 두 결과 그러한 폭이 좁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원불교 사상에서 과학의 성과에 대해 개방적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도
) 『대종경』, 교의품 31.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은 근원적인 대(大)와 불변(不變)의 세계에 대한 궁극적 탐구의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적을지 모르지만 자연현상의 다양한 원리에 대한 좋은 탐구방법이기 때문이다.
Ⅳ. 맺는 말
주자가 불·도양가를 비판할 핵심은 인간사의 가치영역에 소홀한 경향을 지녔다는데 있었으며 주자의 비판이 정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자의 비판은 인간사의 윤리적 당연의 영역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주자는 이(理)의 개념에 소당연과 소이연의 두가지 요소를 아울러 인정하였으며 전자를 사(事), 후자를 이(理, 좁은 의미)라고도 말하였다. 그리고 주자는 소이연과 소당연이 분리할 수 없는 근원적 일치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주자의 사리개념은 인간사의 가치영역을 고양시킨 의의는 지니지만 당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존재세계 자체에 대한 탐구의 측면이나 구체적 이용후생의 측면이 소홀하게 취급되기 쉬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원불교의 사·리 개념에 내포된 정신도 우선 인간사의 가치영역을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주자의 입장과 대체로 상통한다. 그리하여 인륜의 당위 실천에 대한 엄숙한 윤리의식은 대단히 강조된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기준에 있어 원불교적 관점은 시비외에 이해를 포함시킴으로써 폭넓은 인간사의 영역을 포괄하려 한다. 물론 이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시(是)와 이(利)라는 성격이 다른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제기하는 데서 따르는 윤리현상의 어려운 문제 즉 시(是)와 이(利)의 명확한 개념규정과 양자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라는 문제가 뒤따른다.
이(理)와 사(事)의 영역을 구별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가 발견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존재와 당위를 직접 일치시키는데서 초래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 인간의 고유한 주체적 가치영역에 대한 존중이라는 의미와, 역으로 존재질서 자체에 대한 탐구를 존중하는 성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理)가 사(事)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우주질서와의 조화를 목적으로하는 기본적 입장을 주자와 다름이 없다. 주자적 이(理)의 구체적 내용이 공의 원리와 유심적 해석을 거부하는데 반해 원불교적 이(理)의 개념에는 이러한 불가적 진리관이 그대로 계승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불교 사상이 불법을 주체로 하고 있다는 대전제는 여기서는 다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회적인 방법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불교의 사·리 개념 자체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끝으로 언급할 사항은 본 논문에서는 사·리 개념의 교리사적 형성과정에 대한 탐구를 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전 : 『원불교사상』6, 원불교사상연구원, 1982>
) 上揭書, 인도품 1.
즉 소태산은 천도와 인도에 구별없이 도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오직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은 곧 도를 아는 사람이요」라고 하여 도를 「당연」한 길로 해석한다.
) 上揭書, 인도품 1,2.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존재와 당위의 일치를 강조하는 입장인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리체계의 매락에 비추어 볼때 이 견해는 윤리규범의 절대적 근거를 강조하기 위한 언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태도의 근거로는 소태산의 「법」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여기서의 법이란 성자들의 즉 대소유무의 이치를 각득하여 시비이해를 건설할 능력을 가진 분들이 이(理)에 근거하여 제정해 준 시비이해의 규범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법은 성자들의 주체적인 파악에 의존하므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한다.
) 上揭書, 교의품 1.
그러나 그 이유로 인해 법의 절대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하늘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 있다」고 하는 말이 이러한 법의 절대성을 나타낸다.
) 박정훈 편저, 『한 울안 한 이치에』, 원불교출판사, 1982, p.18.
따라서 성자들에 의해 제시된 법은 이(理)에 근거함과 동시에 성자들의 주체적 파악에 의존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존재와 당위에 대한 원불교적 견해를 잘 드러내준다. 예컨대 보은이라는 최고 가치규범은 우주의 근원적 존재근거인 생명적 관계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소태산이 이를 파악하고 주체적인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가치규범을 뜻한다.
이상에서는 이(理)와 사(事)의 관계문제에 있어서 주로 사의 의미를 중심하여 살펴 보았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어 보면 이(理)와 사(事)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우 이(理)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 드러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윤리적 가치규범에 존재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소이연과 소당연을 동일시 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이연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소홀히 되기 쉬우며 주자의 경우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구별하고 사(事)의 건설이 이(理)의 파악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때는 이(理)에 대한 몰가치적 탐구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대하게 된다. 실질적인 내용상에는 보면 향상세계의 다양한 원리를 파악하는 제과학이나 가장 근본적인 불생불멸과 인과보은의 원리에 대한 종교적 탐구가 가치세계 건설에 우선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앞에서는 단순히 이(理)의 증득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사에의 탐구가 잘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사(事)에의 탐구에 앞서 이(理)의 증득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참다운 수행의 길은 돈오점수라는 보조국사 지눌의 견해는 이런 의미에서 존중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주법칙과의 조화에서 가치건설의 근원을 찾는 입장을 의미한다.
실은 주자의 격물궁리의 인식체계도 이러한 소이연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강조하는 폭을 지니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소당연에 강점을 두 결과 그러한 폭이 좁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원불교 사상에서 과학의 성과에 대해 개방적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도
) 『대종경』, 교의품 31.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은 근원적인 대(大)와 불변(不變)의 세계에 대한 궁극적 탐구의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적을지 모르지만 자연현상의 다양한 원리에 대한 좋은 탐구방법이기 때문이다.
Ⅳ. 맺는 말
주자가 불·도양가를 비판할 핵심은 인간사의 가치영역에 소홀한 경향을 지녔다는데 있었으며 주자의 비판이 정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자의 비판은 인간사의 윤리적 당연의 영역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주자는 이(理)의 개념에 소당연과 소이연의 두가지 요소를 아울러 인정하였으며 전자를 사(事), 후자를 이(理, 좁은 의미)라고도 말하였다. 그리고 주자는 소이연과 소당연이 분리할 수 없는 근원적 일치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주자의 사리개념은 인간사의 가치영역을 고양시킨 의의는 지니지만 당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존재세계 자체에 대한 탐구의 측면이나 구체적 이용후생의 측면이 소홀하게 취급되기 쉬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원불교의 사·리 개념에 내포된 정신도 우선 인간사의 가치영역을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주자의 입장과 대체로 상통한다. 그리하여 인륜의 당위 실천에 대한 엄숙한 윤리의식은 대단히 강조된다. 그러나 가치판단의 기준에 있어 원불교적 관점은 시비외에 이해를 포함시킴으로써 폭넓은 인간사의 영역을 포괄하려 한다. 물론 이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시(是)와 이(利)라는 성격이 다른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제기하는 데서 따르는 윤리현상의 어려운 문제 즉 시(是)와 이(利)의 명확한 개념규정과 양자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라는 문제가 뒤따른다.
이(理)와 사(事)의 영역을 구별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가 발견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존재와 당위를 직접 일치시키는데서 초래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 인간의 고유한 주체적 가치영역에 대한 존중이라는 의미와, 역으로 존재질서 자체에 대한 탐구를 존중하는 성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理)가 사(事)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우주질서와의 조화를 목적으로하는 기본적 입장을 주자와 다름이 없다. 주자적 이(理)의 구체적 내용이 공의 원리와 유심적 해석을 거부하는데 반해 원불교적 이(理)의 개념에는 이러한 불가적 진리관이 그대로 계승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불교 사상이 불법을 주체로 하고 있다는 대전제는 여기서는 다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회적인 방법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불교의 사·리 개념 자체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끝으로 언급할 사항은 본 논문에서는 사·리 개념의 교리사적 형성과정에 대한 탐구를 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전 : 『원불교사상』6, 원불교사상연구원, 1982>
추천자료
 고대 사회의 불교 건축
고대 사회의 불교 건축 [주식] 주식투자 10계명
[주식] 주식투자 10계명 중세 국어 문장의 종결과 경어법 정리
중세 국어 문장의 종결과 경어법 정리 조선시대 - 형벌과형벌기구
조선시대 - 형벌과형벌기구 1900~1930년대의 특징적 헤어스타일 및 패션
1900~1930년대의 특징적 헤어스타일 및 패션 인제지방에 살아 숨 쉬는 마의태자의 숨결
인제지방에 살아 숨 쉬는 마의태자의 숨결 지반 공학설계
지반 공학설계 61,New Urbanism,뉴어버니즘,도시계획신조류,뉴어바니즘헌장,뉴어바니즘사례,SEASIDE,SOUTH B...
61,New Urbanism,뉴어버니즘,도시계획신조류,뉴어바니즘헌장,뉴어바니즘사례,SEASIDE,SOUTH B... 드레퓌스 사건의 전개와 의의
드레퓌스 사건의 전개와 의의 我是李小龍 - 아직 끝나지 않은 이름, 이소룡(李小龍/Bruce Lee)을 위한 안내서.pptx
我是李小龍 - 아직 끝나지 않은 이름, 이소룡(李小龍/Bruce Lee)을 위한 안내서.pptx 나뚜루 팝 Natuur PoP [촉진전략론] 시장분석, 현황분석, 문제점, 해결방안, 전략(Place Of P...
나뚜루 팝 Natuur PoP [촉진전략론] 시장분석, 현황분석, 문제점, 해결방안, 전략(Place Of P... 「망고식스(MangoSix)」 망고식스 마케팅전략/커피시장 규모,현황/자사분석/경쟁사분석/4p,SW...
「망고식스(MangoSix)」 망고식스 마케팅전략/커피시장 규모,현황/자사분석/경쟁사분석/4p,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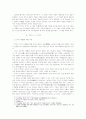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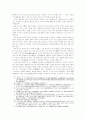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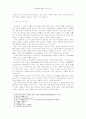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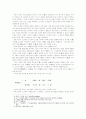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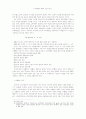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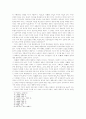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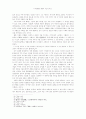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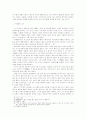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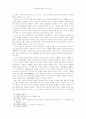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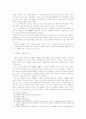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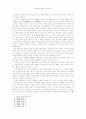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