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릿말
Ⅱ. 중국의 생철학적 경향
Ⅲ. 한국의 생철학적 경향
Ⅳ. 은사상의 생철학적 성격
Ⅴ. 맺은말
Ⅱ. 중국의 생철학적 경향
Ⅲ. 한국의 생철학적 경향
Ⅳ. 은사상의 생철학적 성격
Ⅴ. 맺은말
본문내용
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지의 화육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덕이 「은혜의 발현」으로 규정되는 것에서 보은의 요체가 결국 도덕실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인가. 『정전』 사은편에서 제시하는 강령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천지보은 : 천지 八道를 체받아 실행하는 것
부모보은 : 무자력자 보호의 도를 실현함
동포보은 : 자리이타의 도를 실현함
법률보은 : 인도정의의 법을 실현함
이상의 요목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집약하면 결국 천지의 호생지덕 즉 무한한 생성력을 체받아 실행하자는 것이다. 정전의 보은강령은 「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요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주전체가 하나의 일원화된 생명체임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가는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 즉 우주만유는 천륜적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림으로써 만물을 무한하게 살리는 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어느 것에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살게 하며 무궁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윤리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한없이 살려내서 은혜로 화하는 윤리세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 한종만, 앞의 논문, p.171.
한편으로는 우주만물을 은혜의 덩치로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 『정전』 일상수행의 요법.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한 경외심을 느낀다.
) 『대종경』 교의품 4, 인도품 33.
이 공경과 감사를 바탕으로 하여 무한한 은혜가 발현되도록 하는 삶이 궁극적인 보은의 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보은의 결과는 천인합일로 규정된다. 「우리가 천지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요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천지같은 위력과 천지같은 수명과 일월같은 밝음을 얻어 일체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 「천지보은의 결과」, 이밖에 부모, 동포, 법률 보은의 결과는 천지 보은의 결과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천인합일의 경지는 주역의 천인합일과 상통된다. 주역에서는 성인(大人)에 대해 「대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며 일월과 더불어 그 덕을 합하며 춘하추동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를 합하며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한다」고 말하고, 「하늘에 앞서 일을 하면 하늘이 성인을 어기지 않고 하늘보다 뒤에 일을 하면 천시를 받든다」고 덧붙인다.
) 『주역』 乾卦 文言傳 「大人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不違 後天而奉天時.」
천인합일의 이념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의 위치는 우주의 중심으로 고양된다. 소태사 대종사는 인간을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
) 『대종경』 불지품 13.
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표현은 우주를 주재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근원적 진리의 광명이 인간을 통해 발현되고 실현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간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인간에게 깨달음의 가능성(불성), 자유의식, 가치세계 건설의 능력이 고유하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떠문이다. 「인재양성소연합단원취지서」에서도 인간을 「삼재를 통합한 결정이며 만리를 겸전한 본처」라고 규정하고 인간의 능력이 능히 우주를 움직이고 만사를 흥폐한다고 강조한다.
) 『월말통신』 제3호, 『원불교 교고총간』卷一, 정화사, 1969, p.19.
따라서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면 능히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Ⅴ.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생철학적 흐름과 은사상의 생철학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 검토를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생철학적 흐름은
① 우주를 일대 생명의 흐름으로 보며,
② 그 생성의 흐름을 기론(氣論)으로 설명하고,
③ 그 생명을 체받아 실행하는 호생(好生)의 도를 강조하고,
④ 천지합일의 이상을 설정하며,
⑤ 인간의 위치를 고양시키는 인본 이념을 내포하는 점에서 공통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몇가지 공통점은 그대로 원불교의 은사상에서도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은사상이 생철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불교의 교법이 불법을 주체로 하며 유.도가의 사상을 합일함에 있다고 천명하였다. 그런데 유.도가 사상의 핵심은 생철학적 흐름이므로 원불교사상이 생철학적 흐름을 계승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한편 한국의 고유전통은 유, 불, 선을 종합할 수 있는 폭넓은 조화의 이념 즉 「한」철학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원불교사상의 일원주의가 「한」철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때도 원불교사상에서 생철학의 흐름을 계승하는 것은 필연적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원불교의 은사상이 생철학의 흐름을 계승했다고 하더라도 은사상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삶의 길이 전통적 견해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동일한 생철학의 흐름에 서 있지만 유가, 도가, 묵가의 길이 서로 다른 것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불교의 은사상이 구체적으로 전통사상과 어떻게 구별되는가의 문제 즉 은사상의 독창성 또는 고유성의 문제는 또 다른 연구과제로 남는다.
생철학의 입장에서 은사상을 조명하여 다음의 몇가지 명제를 얻을 수 있다.
가. 일원상의 진리가 우주만물을 무한하게 생성화육하는 원동력 자체가 은이다. 따라서 우주는 일대 생명의 장이며 우주만물의 변화는 생성화육을 위한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세계를 환망으로 보고 고(苦)로 느끼는 입장은 지양된다.
나. 그 은이 인간에 내재하여 인간본성을 이룬다. 따라서 인간본성은 순수지선하다. 은은 나 자신을 생존케하는 타력적 원동력인 동시에 나 자신의 본성을 이룬다. 인간은 이 무한 생성력을 발현하여 천지의 화육에 동참할 책임과 능력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다.
다.우리의 궁극목표는 우주의 대생명력에 합일하는 천인합일이며 수련의 길은 무한 생성력(구체적으로는 和氣)을 알고 (知恩) 그 무한 생성력을 함양하며(養恩) 그 무한 생성력을 베풀어 쓰는데(報恩)있다. 은혜를 베풀어 쓰는 경우 여러 문화적 사회적 삶의 길이 인간으로서 근원적 생명력을 체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출전 : 『원불교사상』9, 원불교사상연구원, 1985>
천지보은 : 천지 八道를 체받아 실행하는 것
부모보은 : 무자력자 보호의 도를 실현함
동포보은 : 자리이타의 도를 실현함
법률보은 : 인도정의의 법을 실현함
이상의 요목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집약하면 결국 천지의 호생지덕 즉 무한한 생성력을 체받아 실행하자는 것이다. 정전의 보은강령은 「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요목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주전체가 하나의 일원화된 생명체임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가는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 즉 우주만유는 천륜적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림으로써 만물을 무한하게 살리는 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어느 것에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살게 하며 무궁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윤리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한없이 살려내서 은혜로 화하는 윤리세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 한종만, 앞의 논문, p.171.
한편으로는 우주만물을 은혜의 덩치로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 『정전』 일상수행의 요법.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한 경외심을 느낀다.
) 『대종경』 교의품 4, 인도품 33.
이 공경과 감사를 바탕으로 하여 무한한 은혜가 발현되도록 하는 삶이 궁극적인 보은의 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보은의 결과는 천인합일로 규정된다. 「우리가 천지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요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직접 복락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 천지같은 위력과 천지같은 수명과 일월같은 밝음을 얻어 일체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할 것이니라.」
) 「천지보은의 결과」, 이밖에 부모, 동포, 법률 보은의 결과는 천지 보은의 결과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천인합일의 경지는 주역의 천인합일과 상통된다. 주역에서는 성인(大人)에 대해 「대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며 일월과 더불어 그 덕을 합하며 춘하추동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를 합하며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한다」고 말하고, 「하늘에 앞서 일을 하면 하늘이 성인을 어기지 않고 하늘보다 뒤에 일을 하면 천시를 받든다」고 덧붙인다.
) 『주역』 乾卦 文言傳 「大人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不違 後天而奉天時.」
천인합일의 이념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의 위치는 우주의 중심으로 고양된다. 소태사 대종사는 인간을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
) 『대종경』 불지품 13.
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표현은 우주를 주재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근원적 진리의 광명이 인간을 통해 발현되고 실현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간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인간에게 깨달음의 가능성(불성), 자유의식, 가치세계 건설의 능력이 고유하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떠문이다. 「인재양성소연합단원취지서」에서도 인간을 「삼재를 통합한 결정이며 만리를 겸전한 본처」라고 규정하고 인간의 능력이 능히 우주를 움직이고 만사를 흥폐한다고 강조한다.
) 『월말통신』 제3호, 『원불교 교고총간』卷一, 정화사, 1969, p.19.
따라서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면 능히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Ⅴ.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생철학적 흐름과 은사상의 생철학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 검토를 통해 중국과 우리나라의 생철학적 흐름은
① 우주를 일대 생명의 흐름으로 보며,
② 그 생성의 흐름을 기론(氣論)으로 설명하고,
③ 그 생명을 체받아 실행하는 호생(好生)의 도를 강조하고,
④ 천지합일의 이상을 설정하며,
⑤ 인간의 위치를 고양시키는 인본 이념을 내포하는 점에서 공통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몇가지 공통점은 그대로 원불교의 은사상에서도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은사상이 생철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불교의 교법이 불법을 주체로 하며 유.도가의 사상을 합일함에 있다고 천명하였다. 그런데 유.도가 사상의 핵심은 생철학적 흐름이므로 원불교사상이 생철학적 흐름을 계승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한편 한국의 고유전통은 유, 불, 선을 종합할 수 있는 폭넓은 조화의 이념 즉 「한」철학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원불교사상의 일원주의가 「한」철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때도 원불교사상에서 생철학의 흐름을 계승하는 것은 필연적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원불교의 은사상이 생철학의 흐름을 계승했다고 하더라도 은사상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삶의 길이 전통적 견해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동일한 생철학의 흐름에 서 있지만 유가, 도가, 묵가의 길이 서로 다른 것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불교의 은사상이 구체적으로 전통사상과 어떻게 구별되는가의 문제 즉 은사상의 독창성 또는 고유성의 문제는 또 다른 연구과제로 남는다.
생철학의 입장에서 은사상을 조명하여 다음의 몇가지 명제를 얻을 수 있다.
가. 일원상의 진리가 우주만물을 무한하게 생성화육하는 원동력 자체가 은이다. 따라서 우주는 일대 생명의 장이며 우주만물의 변화는 생성화육을 위한 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세계를 환망으로 보고 고(苦)로 느끼는 입장은 지양된다.
나. 그 은이 인간에 내재하여 인간본성을 이룬다. 따라서 인간본성은 순수지선하다. 은은 나 자신을 생존케하는 타력적 원동력인 동시에 나 자신의 본성을 이룬다. 인간은 이 무한 생성력을 발현하여 천지의 화육에 동참할 책임과 능력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다.
다.우리의 궁극목표는 우주의 대생명력에 합일하는 천인합일이며 수련의 길은 무한 생성력(구체적으로는 和氣)을 알고 (知恩) 그 무한 생성력을 함양하며(養恩) 그 무한 생성력을 베풀어 쓰는데(報恩)있다. 은혜를 베풀어 쓰는 경우 여러 문화적 사회적 삶의 길이 인간으로서 근원적 생명력을 체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출전 : 『원불교사상』9, 원불교사상연구원,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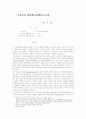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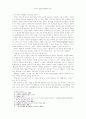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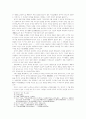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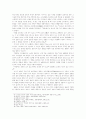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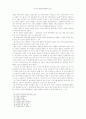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