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목차
=== 1 삼학(三學)의 수행(修行)과 선(禪)
2 원불교 선 수행(禪 修行)의 특징(特徵)
1) 원불교 선 수행의 열가지 특징
2) 원불교 선 수행의 구체적 특징
(1) 도학(道學)공부, (인도실천)
(2) 일원상(一圓相) 수행
(3) 성품(性品) 단련
(4) 마음공부
(5) 일 속의 마음공부
(6) 삼학(三學)
(7) 삼학(三學)훈련
(8) 일 속의 공부
(9) 선(禪)의 실천
(10) 무시선(無時禪)공부
(11) 경계(境界) 속의 선(禪)
3. 원불교 선 수행의 네 가지 공부
1) 자성(自性)을 떠나지 않는 공부로 삼학공부(三學工夫)를 하자.
2) 삼학(三學)을 병진(並進)하는 공부
1. 상시응용 주의사항
2.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3) 일속에서 수행하는 공부
4) 무시선(無時禪)에 이르는 수행
* === 4. 정시선(靜時禪)의 핵심으로서 좌선법(坐禪法)
1) 원불교 좌선법(坐禪法) 의 특징(特徵)
2) 원불교 좌선법의 구체적 방법
(1) 좌선의 기초, 앉는 자세
(2) 단전주로 심신을 대중하는 법
(3)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기본으로 호흡하는 법
(4) 눈을 통해서 식망현진(息妄顯眞)하는 기본 조절법
(5) 입안통해서 수승화강(水昇火降)하는 대중
(6) 정신은 적적성성 성성적적으로 무위자연의 진경에 이르도록함
(7) 선을 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금기사항
(8) 좌선 공부를 오래 오래 계속하면
*==== 5. 동시선(動時禪)의 핵심으로서의 무시선법(無時禪法)
1) 원불교 무시선법(無時禪法)의 특징
2) 무시선에 이르는 전통적 기초(傳統的 基礎)
(1) ⌈진공(眞空)으로 체(體)를 삼고, 묘유(妙有)로 용(用)을 삼는 다⌋
(2) 경계(境界)를 뛰어넘는 공부(工夫)의 기초
(3) 외정정 내정정에 이르는 선
3) 무시선의 실천 방법
(1) 성품(性品)의 단련(鍛鍊)
(2) 진공묘유(眞空妙有). 부동심(不動心)과 청정심(淸淨心)
(3) 공적영지(空寂靈知)의 자성(自性)에 부합하는 공부
(4) 소길드리는 선공부
(5) 경계를 대하면 그것이 곧 공부하는 때
(6) 제호(醍醐)의 일미(一味)
(7) 백천삼매(百千三昧)
(8) 무시선의 실천강령(實踐綱領)
===== 6. 결 론
2 원불교 선 수행(禪 修行)의 특징(特徵)
1) 원불교 선 수행의 열가지 특징
2) 원불교 선 수행의 구체적 특징
(1) 도학(道學)공부, (인도실천)
(2) 일원상(一圓相) 수행
(3) 성품(性品) 단련
(4) 마음공부
(5) 일 속의 마음공부
(6) 삼학(三學)
(7) 삼학(三學)훈련
(8) 일 속의 공부
(9) 선(禪)의 실천
(10) 무시선(無時禪)공부
(11) 경계(境界) 속의 선(禪)
3. 원불교 선 수행의 네 가지 공부
1) 자성(自性)을 떠나지 않는 공부로 삼학공부(三學工夫)를 하자.
2) 삼학(三學)을 병진(並進)하는 공부
1. 상시응용 주의사항
2.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3) 일속에서 수행하는 공부
4) 무시선(無時禪)에 이르는 수행
* === 4. 정시선(靜時禪)의 핵심으로서 좌선법(坐禪法)
1) 원불교 좌선법(坐禪法) 의 특징(特徵)
2) 원불교 좌선법의 구체적 방법
(1) 좌선의 기초, 앉는 자세
(2) 단전주로 심신을 대중하는 법
(3)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기본으로 호흡하는 법
(4) 눈을 통해서 식망현진(息妄顯眞)하는 기본 조절법
(5) 입안통해서 수승화강(水昇火降)하는 대중
(6) 정신은 적적성성 성성적적으로 무위자연의 진경에 이르도록함
(7) 선을 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금기사항
(8) 좌선 공부를 오래 오래 계속하면
*==== 5. 동시선(動時禪)의 핵심으로서의 무시선법(無時禪法)
1) 원불교 무시선법(無時禪法)의 특징
2) 무시선에 이르는 전통적 기초(傳統的 基礎)
(1) ⌈진공(眞空)으로 체(體)를 삼고, 묘유(妙有)로 용(用)을 삼는 다⌋
(2) 경계(境界)를 뛰어넘는 공부(工夫)의 기초
(3) 외정정 내정정에 이르는 선
3) 무시선의 실천 방법
(1) 성품(性品)의 단련(鍛鍊)
(2) 진공묘유(眞空妙有). 부동심(不動心)과 청정심(淸淨心)
(3) 공적영지(空寂靈知)의 자성(自性)에 부합하는 공부
(4) 소길드리는 선공부
(5) 경계를 대하면 그것이 곧 공부하는 때
(6) 제호(醍醐)의 일미(一味)
(7) 백천삼매(百千三昧)
(8) 무시선의 실천강령(實踐綱領)
===== 6. 결 론
본문내용
찾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불교정전』(佛敎正典 원기 28년)과 『불법연구회근행법』(佛法硏究會 勤行法)의 표어로 되어있다. 이것은 일상삼매나 일행삼매는 모두 육조단경의 법문에서 밝혀져 나오고 있다.
만약 내 말을 정심(正心)으로 듣고, 지혜를 얻고자 할진대 모롬직이 일상삼매(一相三昧)와 일행삼매(一行三昧)에 들어야 할지라. 증애(憎愛)가 나타나지 않고 취사심(取捨心)이 없이 성괴(成壞)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한(安閒)하고 념정(恬靜)하며 허융(虛融)하고,담박(澹泊)함에 이것을 이름하여 일상삼매(一相三昧)라 하고, 또한 행주좌와(行住坐臥)의 모든 곳에, 순일직심(純一直心)하면 곧 부동 도량(不動 道場)에 이르러 참정토(眞成淨土)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곧 일행삼매(一行三昧)의 경지로다.라 하였다. 만약 이 두가지 삼매를 가추면 뿌리가 있는 땅에서 그 열매를 장양 성숙하게 되는 것과도 같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일러 일행삼매(一行三昧)라고 한 것이다.
) 『大正藏』 「六祖大師 法寶壇經」 361面 上 - 中
이것이 일상 일행의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원리가 된다.
그런데 이 원리에 의해 마침내 천만 국토의 무량한 경계속에 모두 안정된 삼매를 얻게 되는 것을 일러 백천삼매(百千三昧)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백천삼매는 곧 어느 곳에서나 어느 경계에서나 한가지 삼매를 얻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백천 삼매에 이루는 것은 곧 천만가지 일속에 무시선(無時禪)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을 밝힌 법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시선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원의 진경을 깨닫는 견성을 통하여 일상삼매(一相三昧)에 이르고,또한 그 자리를 실천하여 능히 일행삼매(一行三昧)에 이르며, 아울러 천만 경계에 두루 큰 일과 큰 공부를 행하는 힘으로 능히 백천삼매(百千三昧)를 얻는 것이다.
(8) 무시선의 실천강령(實踐綱領)
무시선의 실천 강령을 한 말로 밝힌 법문은 곧 다음과 같다.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먼저 이 말씀의 근원은 우리 인간이 육근의 동과 정 두 사이에 살아가고 있음을 찾아 동과 정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게 함이니, 이것은 곧 우리의 생활속에 한 가지 정진하고 사는 이른바 간단(間斷)없는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간단 없는 한 생각을 동정간에 하나로 연결하도록하는 길을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과 정, 또는 유사시나 무사시,에 한결같이 살아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을 없앤다는 생각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무시선은 대단히 부담되는 말이 되는 것으로 생각 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쉬는 시간에도 항상 공부심으로 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심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유념과 무념을 아울러 조절해나가는 공부가 중요한 과제는 아닐까 생각 된다.
물론 휴식시간에는 당연히 무념(無念)으로 쉬어야 한다. 그러나 무념 그 자체도 또한 공부심으로 무념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방심을 무념으로 밝힌 것도 있다 여기에서의 무념은 방심이 아니다. ) 공부심 없이 쉬게 되면 바로 도심(道心)이 상(傷)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가 묵어지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유념으로 살아갈 때에는 당연히 챙기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념일때에는 한 생각을 놓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생각 자체가 없이 일념으로 쉬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산종사(鼎山宗師)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鼎山宗師 法語』 「應機編」 42
염염무념(念念無念)은 시정시공부(是靜時工夫)요
사사명사(事事明事)는 시동시공부(是動時工夫)로다.
유념무념(有念無念)이 각수의(各隨意)하니
대도탕탕(大道蕩蕩)에 무소애(無所碍)니라
생각 생각이 생각 없음은 정할 때 공부요, 일일이 일에 밝음은 동할 때 공부라, 유념 무념이 뜻대로 되면 대도 탕탕하여 걸림 없으리라.
이상에서 밝힌 것이 곧 무시선을 실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문임에 틀림없다. 이 강령을 찾아 근원적인 길을 떠나지 않고 동정간에 국한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밝힌 것이다.
정할 때 한 생각 온전한 마음이 동할 때에는 정의로 바꿔지는 공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곧 육근의 동정과 정신의 동정이 서로 일치하게 사는 점, 그리고 무념이 곧 일념이요 일념은 곧 온전한 마음이며, 온전한 마음은 곧 정의(正義)에 이르도록 하는 길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보면 무시선의 공부는 원불교 수행의 근본인 동시에 수행의 완성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심경으로 살아있는 마음을 작용하고 살아 가게 하자는데에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생각 내고 들이는 데 공부심을 떠나지 않고 행할 것이며, 한 몸 작용하고 작용을 놓는때 추호도 법을 떠나지 안도록 하는 것이 마치 일하는 때나 일을 놓는 때나, 모두 살았을 때에는 숨쉬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영원히 쉬고 있는 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추호도 성가시게 생각 하여서는 않된다
6 결 론
원불교 선은 삼학공부를 아울러 행하는 것이요 삼학공부를 병진하는 것은 육근이 쉬는 때만 가지고는 삼학이 병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삼학의 병진을 위해서라도 육근의 동정간에 아울러 삼대력을 얻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하나 일하는 것은 싫어하는 풍토가 생기고 있음은 이상한 일이다. 육근의 동정을 아울러 산다는 것은 곧 일을 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삼학공부는 동정간에 일을 해야 하고, 삼학을 병진하는 동정간의 공부는 곧 일속에서 삼학을 찾는 것이 오히려 바른 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육대강령」이 드러나고 또한 원불교 선 수행의 핵심으로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아울러 행하는 길을 밝힌 것이 바로 삼학병진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과 수행을 아우르는 공부도 이 선 수행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만약 내 말을 정심(正心)으로 듣고, 지혜를 얻고자 할진대 모롬직이 일상삼매(一相三昧)와 일행삼매(一行三昧)에 들어야 할지라. 증애(憎愛)가 나타나지 않고 취사심(取捨心)이 없이 성괴(成壞)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한(安閒)하고 념정(恬靜)하며 허융(虛融)하고,담박(澹泊)함에 이것을 이름하여 일상삼매(一相三昧)라 하고, 또한 행주좌와(行住坐臥)의 모든 곳에, 순일직심(純一直心)하면 곧 부동 도량(不動 道場)에 이르러 참정토(眞成淨土)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곧 일행삼매(一行三昧)의 경지로다.라 하였다. 만약 이 두가지 삼매를 가추면 뿌리가 있는 땅에서 그 열매를 장양 성숙하게 되는 것과도 같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일러 일행삼매(一行三昧)라고 한 것이다.
) 『大正藏』 「六祖大師 法寶壇經」 361面 上 - 中
이것이 일상 일행의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원리가 된다.
그런데 이 원리에 의해 마침내 천만 국토의 무량한 경계속에 모두 안정된 삼매를 얻게 되는 것을 일러 백천삼매(百千三昧)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백천삼매는 곧 어느 곳에서나 어느 경계에서나 한가지 삼매를 얻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백천 삼매에 이루는 것은 곧 천만가지 일속에 무시선(無時禪)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을 밝힌 법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시선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원의 진경을 깨닫는 견성을 통하여 일상삼매(一相三昧)에 이르고,또한 그 자리를 실천하여 능히 일행삼매(一行三昧)에 이르며, 아울러 천만 경계에 두루 큰 일과 큰 공부를 행하는 힘으로 능히 백천삼매(百千三昧)를 얻는 것이다.
(8) 무시선의 실천강령(實踐綱領)
무시선의 실천 강령을 한 말로 밝힌 법문은 곧 다음과 같다.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먼저 이 말씀의 근원은 우리 인간이 육근의 동과 정 두 사이에 살아가고 있음을 찾아 동과 정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게 함이니, 이것은 곧 우리의 생활속에 한 가지 정진하고 사는 이른바 간단(間斷)없는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간단 없는 한 생각을 동정간에 하나로 연결하도록하는 길을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과 정, 또는 유사시나 무사시,에 한결같이 살아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을 없앤다는 생각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무시선은 대단히 부담되는 말이 되는 것으로 생각 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쉬는 시간에도 항상 공부심으로 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심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유념과 무념을 아울러 조절해나가는 공부가 중요한 과제는 아닐까 생각 된다.
물론 휴식시간에는 당연히 무념(無念)으로 쉬어야 한다. 그러나 무념 그 자체도 또한 공부심으로 무념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방심을 무념으로 밝힌 것도 있다 여기에서의 무념은 방심이 아니다. ) 공부심 없이 쉬게 되면 바로 도심(道心)이 상(傷)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가 묵어지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유념으로 살아갈 때에는 당연히 챙기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념일때에는 한 생각을 놓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생각 자체가 없이 일념으로 쉬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산종사(鼎山宗師)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鼎山宗師 法語』 「應機編」 42
염염무념(念念無念)은 시정시공부(是靜時工夫)요
사사명사(事事明事)는 시동시공부(是動時工夫)로다.
유념무념(有念無念)이 각수의(各隨意)하니
대도탕탕(大道蕩蕩)에 무소애(無所碍)니라
생각 생각이 생각 없음은 정할 때 공부요, 일일이 일에 밝음은 동할 때 공부라, 유념 무념이 뜻대로 되면 대도 탕탕하여 걸림 없으리라.
이상에서 밝힌 것이 곧 무시선을 실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문임에 틀림없다. 이 강령을 찾아 근원적인 길을 떠나지 않고 동정간에 국한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밝힌 것이다.
정할 때 한 생각 온전한 마음이 동할 때에는 정의로 바꿔지는 공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곧 육근의 동정과 정신의 동정이 서로 일치하게 사는 점, 그리고 무념이 곧 일념이요 일념은 곧 온전한 마음이며, 온전한 마음은 곧 정의(正義)에 이르도록 하는 길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보면 무시선의 공부는 원불교 수행의 근본인 동시에 수행의 완성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심경으로 살아있는 마음을 작용하고 살아 가게 하자는데에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생각 내고 들이는 데 공부심을 떠나지 않고 행할 것이며, 한 몸 작용하고 작용을 놓는때 추호도 법을 떠나지 안도록 하는 것이 마치 일하는 때나 일을 놓는 때나, 모두 살았을 때에는 숨쉬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영원히 쉬고 있는 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추호도 성가시게 생각 하여서는 않된다
6 결 론
원불교 선은 삼학공부를 아울러 행하는 것이요 삼학공부를 병진하는 것은 육근이 쉬는 때만 가지고는 삼학이 병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삼학의 병진을 위해서라도 육근의 동정간에 아울러 삼대력을 얻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하나 일하는 것은 싫어하는 풍토가 생기고 있음은 이상한 일이다. 육근의 동정을 아울러 산다는 것은 곧 일을 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삼학공부는 동정간에 일을 해야 하고, 삼학을 병진하는 동정간의 공부는 곧 일속에서 삼학을 찾는 것이 오히려 바른 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육대강령」이 드러나고 또한 원불교 선 수행의 핵심으로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아울러 행하는 길을 밝힌 것이 바로 삼학병진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과 수행을 아우르는 공부도 이 선 수행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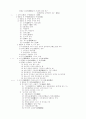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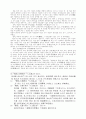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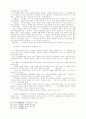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