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러한 사회 구조를 회복시키는 요소는 역시 종법 동형구조와 유교 이념의 공고화이다. 이 종법 동형구조와 유교 이념은 사회의 일체화를 이루는 주요한 하위 시스템으로서 일체화의 부활에도 어김없이 이 등식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5장 〈주기적 동란과 정체성-초안정 시스템〉에서는 초안정 시스템을 제시하여 주기성과 정체성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중국 봉건사회의 지속 원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유럽 봉건사회와는 달리 중국 봉건사회에서는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럽의 봉건사회에서는 하위 시스템 즉, 정치적 구조·경제적 구조·이데올로기적 구조가 잘 조화를 이루어 \' 資本主義의 萌芽\'를 형성·결합 시켜 나가 자본주의 사회로 거듭나게 되었던 반면, 중국에서는 \'資本主義의 萌芽\'에 대해서는 이러한 하위 시스템이 공고해지지 않아서 \'資本主義 萌芽\'현상이 나타나긴 했어도 금방 소멸되어 버린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것이 사회 불안정의 요인이 되어버렸다. 즉 상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비 농업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상품경제가 기형적으로 발전, \'擬似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 의사 자본주의는 사회가 불안정했던 왕조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왕조가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 봉건사회의 사이클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는 \'맹아조짐\'을 보이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 공고화에 부작용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정체현상을 보였던 원인으로 김관도는 \'超安定 시스템의 理論\'을 들고 있다. 초안정 시스템은 왕조의 안정기에 작용된 조절 메카니즘과 농민반란으로 인한 사회붕괴 시기에 작용된 조절 메카니즘, 이 두개의 메카니즘이 번갈아 작용하면서 \'초안정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즉, 어떠한 왕조가 무너질 찌라도 이 두개의 매카니즘이 순환·반복됨으로 인해 다시 이전의 사회구조로 되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 장인 6장 〈간섭·충격·준안정구조〉에서는 이러한 일체화·대일통 사상에 충격을 가하고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회가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현재의 중국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초안정적 시스템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그리고 중국인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김관도는 중국 봉건사회의 존재 주축을 이루는 초안정적 시스템이 붕괴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외래 문명의 전래\'로 보고 있다. 전통적인 중국 적인 사회요소가 사라지고 외래적인 요소가 나타나 하위 시스템을 대신 차지하여(이데올로기 구조에서는 玄學·道家·佛敎가 자리를 차지했고, 경제 구조에서는 莊園經濟가 대신했으며, 정치구조에서는 귀족 문벌 정치가 자리를 대신했다) \'준안정구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에 충격을 주었던 것들이 소실되면서, 일체화 조직력이 다시 회복되어 사회는 종법 일체화 사회로 돌아갔다. 김관도는 이를 전통적인 중국문화로의 회귀의 당연성으로 보았다. 즉, 외래문화가 중국의 봉건사회에 충격과 간섭을 주어도 다시 전통적인 중국문화와 사회구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는 明·淸代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明·淸代의 봉건대국이 그다지 강대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나친 쇄국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즉, 봉건사회가 견고하면 견고할 수록 외래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스스로 움츠러들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김관도는 설명한다. 이는 봉건사회의 굳건함이 \'초안정 시스템\'을 완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김관도는 중국에서의 봉건사회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자신의 존재방식에 대한 탐색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대 중국의 후진성이 明·淸代 선조들의 착오로 고대의 번영을 근대의 낙후로 돌린데 있다고 보고, 언젠가는 이 초안정 시스템이 중국을 이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저자 김관도의 역사적 관찰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역사학과 전공자가 아닌 자연과학계 전공자로서 자연 과학적 입지에서 역사를 보고 이러한 주장을 펼쳤는데, 상당히 조직적이고 예리한 지적임에는 틀림이 없고,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분석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해석을 들여다보면 인문계 출신이 아닌 자연계 출신이니만큼 모든 현상을 도식적으로 보는 맹점도 보인다. 모든 인문학이 그러하지만 특히 역사라는 것은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성이나 돌발성이 항상 있는 법이다. 이러한 점이 역사학도가 아닌 자연과학 학도의 한계성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중공정부 수립 이후 계속 강조되고 연구되던 \'資本主義 萌芽論\'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50∼60년대 毛澤東은 중국에서도 \'자본주의의 자립과 자체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많은 역사학자들을 투입하여 \'자본주의 맹아론\' 도출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김관도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맹아\'는 있었으나 그것은 본격적이고 정상적인 자본주의로 향하게 하기는 커녕 한 왕조의 몰락을 불렀다고 이를 비판하고 축소평가하고 있다. 즉, 그는 이러한 면에서만은 무조건적인 \'中華思想\'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도식적으로 \'자본주의 맹아\'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중화사상\'은 이 책에서 표면적으로 그리고 감정에 젖어 때때로 표출이 되었다. 그는 서양 사상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중국에서 2000년간 지속되었던 \'초안정 시스템\'에 대한 위안과 약간의 옹호론을 보임으로서 \'중화사상\'을 간간이 노출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중화사상\'의 감정에 도취하여 \'위대한 중화민족\'이니 \'중원지대의 유구하고 성숙된 문명\'이니 하는 지나친 수식어를 남발하고 말았다. 이를 우리나라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그럴 듯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학술서에서 감상적인 수식어를 남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어쨌든 이 책은 중국 본토인들의 중국사 연구에 있어서 종전의 유물론적 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학 이론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훌륭한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제 5장 〈주기적 동란과 정체성-초안정 시스템〉에서는 초안정 시스템을 제시하여 주기성과 정체성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중국 봉건사회의 지속 원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유럽 봉건사회와는 달리 중국 봉건사회에서는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럽의 봉건사회에서는 하위 시스템 즉, 정치적 구조·경제적 구조·이데올로기적 구조가 잘 조화를 이루어 \' 資本主義의 萌芽\'를 형성·결합 시켜 나가 자본주의 사회로 거듭나게 되었던 반면, 중국에서는 \'資本主義의 萌芽\'에 대해서는 이러한 하위 시스템이 공고해지지 않아서 \'資本主義 萌芽\'현상이 나타나긴 했어도 금방 소멸되어 버린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이것이 사회 불안정의 요인이 되어버렸다. 즉 상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비 농업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상품경제가 기형적으로 발전, \'擬似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 의사 자본주의는 사회가 불안정했던 왕조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왕조가 붕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 봉건사회의 사이클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는 \'맹아조짐\'을 보이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 공고화에 부작용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정체현상을 보였던 원인으로 김관도는 \'超安定 시스템의 理論\'을 들고 있다. 초안정 시스템은 왕조의 안정기에 작용된 조절 메카니즘과 농민반란으로 인한 사회붕괴 시기에 작용된 조절 메카니즘, 이 두개의 메카니즘이 번갈아 작용하면서 \'초안정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즉, 어떠한 왕조가 무너질 찌라도 이 두개의 매카니즘이 순환·반복됨으로 인해 다시 이전의 사회구조로 되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 장인 6장 〈간섭·충격·준안정구조〉에서는 이러한 일체화·대일통 사상에 충격을 가하고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회가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현재의 중국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초안정적 시스템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그리고 중국인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김관도는 중국 봉건사회의 존재 주축을 이루는 초안정적 시스템이 붕괴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외래 문명의 전래\'로 보고 있다. 전통적인 중국 적인 사회요소가 사라지고 외래적인 요소가 나타나 하위 시스템을 대신 차지하여(이데올로기 구조에서는 玄學·道家·佛敎가 자리를 차지했고, 경제 구조에서는 莊園經濟가 대신했으며, 정치구조에서는 귀족 문벌 정치가 자리를 대신했다) \'준안정구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에 충격을 주었던 것들이 소실되면서, 일체화 조직력이 다시 회복되어 사회는 종법 일체화 사회로 돌아갔다. 김관도는 이를 전통적인 중국문화로의 회귀의 당연성으로 보았다. 즉, 외래문화가 중국의 봉건사회에 충격과 간섭을 주어도 다시 전통적인 중국문화와 사회구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는 明·淸代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明·淸代의 봉건대국이 그다지 강대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나친 쇄국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즉, 봉건사회가 견고하면 견고할 수록 외래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스스로 움츠러들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김관도는 설명한다. 이는 봉건사회의 굳건함이 \'초안정 시스템\'을 완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김관도는 중국에서의 봉건사회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자신의 존재방식에 대한 탐색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대 중국의 후진성이 明·淸代 선조들의 착오로 고대의 번영을 근대의 낙후로 돌린데 있다고 보고, 언젠가는 이 초안정 시스템이 중국을 이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저자 김관도의 역사적 관찰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역사학과 전공자가 아닌 자연과학계 전공자로서 자연 과학적 입지에서 역사를 보고 이러한 주장을 펼쳤는데, 상당히 조직적이고 예리한 지적임에는 틀림이 없고,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분석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해석을 들여다보면 인문계 출신이 아닌 자연계 출신이니만큼 모든 현상을 도식적으로 보는 맹점도 보인다. 모든 인문학이 그러하지만 특히 역사라는 것은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성이나 돌발성이 항상 있는 법이다. 이러한 점이 역사학도가 아닌 자연과학 학도의 한계성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중공정부 수립 이후 계속 강조되고 연구되던 \'資本主義 萌芽論\'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50∼60년대 毛澤東은 중국에서도 \'자본주의의 자립과 자체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많은 역사학자들을 투입하여 \'자본주의 맹아론\' 도출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김관도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맹아\'는 있었으나 그것은 본격적이고 정상적인 자본주의로 향하게 하기는 커녕 한 왕조의 몰락을 불렀다고 이를 비판하고 축소평가하고 있다. 즉, 그는 이러한 면에서만은 무조건적인 \'中華思想\'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도식적으로 \'자본주의 맹아\'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중화사상\'은 이 책에서 표면적으로 그리고 감정에 젖어 때때로 표출이 되었다. 그는 서양 사상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중국에서 2000년간 지속되었던 \'초안정 시스템\'에 대한 위안과 약간의 옹호론을 보임으로서 \'중화사상\'을 간간이 노출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중화사상\'의 감정에 도취하여 \'위대한 중화민족\'이니 \'중원지대의 유구하고 성숙된 문명\'이니 하는 지나친 수식어를 남발하고 말았다. 이를 우리나라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그럴 듯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학술서에서 감상적인 수식어를 남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어쨌든 이 책은 중국 본토인들의 중국사 연구에 있어서 종전의 유물론적 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학 이론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훌륭한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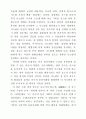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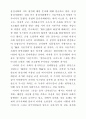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