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신구란?
2. 장신구의 시대적 변화
3. 남자의 장신구
4.여자의 장신구
2. 장신구의 시대적 변화
3. 남자의 장신구
4.여자의 장신구
본문내용
으나 그 밖의 가락지들은 무늬가 없거나 소박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대나 삼국시대보다 일반적으로 고리가 굵은 것이 특징이었으며 2개를 한 쌍으로 한 것이 흔하였다. 2개가 한 쌍으로 된 가락지는 평소에 손가락에 끼지 않고 옷끈에 매어 보관하였다가 명절 때나 예식 때 2개를 같은 손가락에 끼었다. 이런 가락지는 여자들이 시집갈 때 친정집 어머니가 기념으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
가락지 1개만으로 된 것을 반지라고 하는데 반지라는 말은 2개가 1쌍으로 된 가락지에 비해 절반짜리 가락지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겨울에는 금반지, 봄·가을에는 은·칠보반지, 여름에는 옥가락지를 끼는 멋이 있었다.
(3) 허리에 치장하는 것
허리치장에는 주머니·노리개 등이 있다.
1) 주머니
우리 의복에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는 소지품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머니에는 주머니 둘레가 둥근 염낭(두루주머니)과 양옆에 모가 나 있는 귀주머니가 있다. 여기에 수를 놓고 매듭과 오색 술을 달아 모양을 아름답게 꾸몄고, 주머니의 재료나 색깔 등으로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풍년과 평안한 생활을 기원하는 뜻에서 곡식을 태운 재를 넣은 주머니를 임금이 신하들에게 주었으며 이것은 하나의 연례행사
16)\"조선조 행사 때 궁중에서 나이가 젊고 지위가 얕은 환관(宦官)수백명이 횃불을 땅위로 이리저리 내저으면서 \'돼지를 불살라라, 쥐를 불살라라\'하며 돌아다녔다. 또 곡식의 씨를 태워 주머니에 넣어 재신(宰臣)과 근시(近侍)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모두가 풍년을 비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해낭(亥囊), 자낭(子囊)등의 명칭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해낭과 자낭은 둘 다 비단으로 만들었는데 해낭은 둥글고 자낭은 길다. 건릉(健陵:정조의 능)이 등극하시사 이 제도를 복구하여 이런 주머니를 나누어 주었다.\" (《東國歲時記》, 〈上亥上子日〉, 東文選, 李錫浩 譯註, 1991)
가 되었다.
2) 노리개
노리개는 저고리 겉고름이나 안고름 또는 치마허리에 차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시켰다. 화려하고도 섬세하며 또한 다양하여 궁중에서 일반 평민
) 일반평민은 도끼 노리개를 찼는데 도끼는 왕의 예복이나 수렵복·병풍·휘장 등에 도끼무늬를 수놓아 왕을 상징하는 한편, 통치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의장으로도 쓰였다. 민간에서는 부녀자들이 작은 도끼를 여러개 끈으로 꿰거나 주머니에 넣어 허리에 찼다. 혼인 첫날밤에는 이를 요 밑에 깔아 두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도끼날이 여성의 생식기의 막힌 것을 뚫어 잉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韓國文化상징사전》, 〈도끼〉, 동아출판사, 1992)
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자들이 즐겨 찼다.
노리개는 띠돈·끈(다회)·몸체·매듭·술 등으로 이루어졌다.
띠돈은 노리개의 맨 윗부분에 달려 있는 고리로서 노리개 전체를 옷끈에 다는 역할을 하였다. 사각형·원형·꽃형·나비형 등의 형태로 만들고 띠돈의 겉면에는 여러 가지 꽃·불로초·용 등의 동식물문과 길상문을 새겼다.
노리개의 재료는 금·은·동 등의 금속류와 옥·자마노·밀화·산호·진주 등 보석류를 사용하여 박쥐·거북·나비 등의 동물모양이나, 가지·고추·천도 등의 식물모양, 호로병·주머니·방아다리·투호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몸체의 수효에 따라 몸체가 1개인 경우 단작(單作)노리개, 3개인 경우에는 삼작(三作)노리개, 5개인 경우에는 오작노리개라고 불렀다. 노리개 몸체에는 행복과 무병장수를 바라는 소박한 염원이 담겨 있어 예를 들면 박쥐
) 예로부터 박쥐는 오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이라고 믿어 왔다. 부적에도 오복이 수호신으로 상징되며 또한 박쥐는 행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는데, 이는 편복( )의 박쥐 복( )자가 복 복(福)자로 해석한데서 기인한다. 또 박쥐는 하늘나라의 쥐라고 하여 천서(天鼠)라고도 하고, 신선의 쥐라고 하여 선서(仙鼠)라고도 한다. 그래서 박쥐는 일상생활용품이나 회화, 공예품, 가구의 장식, 건축장식 등의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박쥐는 길상(吉祥)문양으로 많이 쓰였다. 베갯모에 쓰인 것은 다산(多産)과 득남(得男)을 상징하였다. 박쥐의 강한 번식력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것이기도 한다. (《韓國文化상징사전》, 〈박쥐〉, 동아출판사, 1992)
는 번식률이 높은 동물로 다남(多男)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고, 복을 상징하기도 했다. 몸체에 새겨진 여러 가지 문양, 덕담의 문자는 장수와 복을 빌거나 액을 피하고 몸을 보호하는 것
) 호랑이 발톱노리개는 호랑이는 병귀(病鬼)나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범 그림이나 \'호(虎)\'자 부적, 단오에 궁중에서 나누어 주었다는 쑥으로 만든 범에서도 이같은 뜻을 볼 수 있다. 또한 범의 일부, 즉 수염·발톱·눈썹은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범을 부린다는 속신도 있다. (《韓國文化상징사전》, 〈호랑이〉, 동아출판사, 1992 )
으로 어떤 염원을 위해 차기도 했고 향갑·향낭·침낭·장도와 같이 실용적인 면에서 찬 것도 있었다.
향갑·향낭은 사향 등을 담은 주머니로 평소에는 향내음을 은근히 풍기고 급할 때에는 구급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침낭은 바늘을 꽂아 두던 바늘집으로 부녀자들이 늘 사용하는 바늘을 손쉽게 찾아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일반 부녀자가 가장 많이 패용한 노리개 중의 하나였다.
남녀가 장도를 차는 풍습은 고려가 원나라에 복속한 뒤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에는 널리 일반화되었다. 여인에 있어 은장도는 장식용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호신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은장도의 칼날에는 \'일편단심\'이라는 글씨를 문양화하여 새기기도 하였다. 또 은젓가락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식사하게 되는 경우 젓가락으로 사용하고, 또 음식 중의 독의 유무를 분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설이 있다.
혼례복에는 크고 화려한 것을 차고, 명절이나 평상시에는 소박한 노리개를 찼는데 상류층 부인들은 보석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서민들은 보석이 귀하므로 아름다운 수를 놓은 수노리개로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가락지 1개만으로 된 것을 반지라고 하는데 반지라는 말은 2개가 1쌍으로 된 가락지에 비해 절반짜리 가락지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겨울에는 금반지, 봄·가을에는 은·칠보반지, 여름에는 옥가락지를 끼는 멋이 있었다.
(3) 허리에 치장하는 것
허리치장에는 주머니·노리개 등이 있다.
1) 주머니
우리 의복에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는 소지품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머니에는 주머니 둘레가 둥근 염낭(두루주머니)과 양옆에 모가 나 있는 귀주머니가 있다. 여기에 수를 놓고 매듭과 오색 술을 달아 모양을 아름답게 꾸몄고, 주머니의 재료나 색깔 등으로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풍년과 평안한 생활을 기원하는 뜻에서 곡식을 태운 재를 넣은 주머니를 임금이 신하들에게 주었으며 이것은 하나의 연례행사
16)\"조선조 행사 때 궁중에서 나이가 젊고 지위가 얕은 환관(宦官)수백명이 횃불을 땅위로 이리저리 내저으면서 \'돼지를 불살라라, 쥐를 불살라라\'하며 돌아다녔다. 또 곡식의 씨를 태워 주머니에 넣어 재신(宰臣)과 근시(近侍)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모두가 풍년을 비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해낭(亥囊), 자낭(子囊)등의 명칭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해낭과 자낭은 둘 다 비단으로 만들었는데 해낭은 둥글고 자낭은 길다. 건릉(健陵:정조의 능)이 등극하시사 이 제도를 복구하여 이런 주머니를 나누어 주었다.\" (《東國歲時記》, 〈上亥上子日〉, 東文選, 李錫浩 譯註, 1991)
가 되었다.
2) 노리개
노리개는 저고리 겉고름이나 안고름 또는 치마허리에 차서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시켰다. 화려하고도 섬세하며 또한 다양하여 궁중에서 일반 평민
) 일반평민은 도끼 노리개를 찼는데 도끼는 왕의 예복이나 수렵복·병풍·휘장 등에 도끼무늬를 수놓아 왕을 상징하는 한편, 통치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의장으로도 쓰였다. 민간에서는 부녀자들이 작은 도끼를 여러개 끈으로 꿰거나 주머니에 넣어 허리에 찼다. 혼인 첫날밤에는 이를 요 밑에 깔아 두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도끼날이 여성의 생식기의 막힌 것을 뚫어 잉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韓國文化상징사전》, 〈도끼〉, 동아출판사, 1992)
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자들이 즐겨 찼다.
노리개는 띠돈·끈(다회)·몸체·매듭·술 등으로 이루어졌다.
띠돈은 노리개의 맨 윗부분에 달려 있는 고리로서 노리개 전체를 옷끈에 다는 역할을 하였다. 사각형·원형·꽃형·나비형 등의 형태로 만들고 띠돈의 겉면에는 여러 가지 꽃·불로초·용 등의 동식물문과 길상문을 새겼다.
노리개의 재료는 금·은·동 등의 금속류와 옥·자마노·밀화·산호·진주 등 보석류를 사용하여 박쥐·거북·나비 등의 동물모양이나, 가지·고추·천도 등의 식물모양, 호로병·주머니·방아다리·투호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몸체의 수효에 따라 몸체가 1개인 경우 단작(單作)노리개, 3개인 경우에는 삼작(三作)노리개, 5개인 경우에는 오작노리개라고 불렀다. 노리개 몸체에는 행복과 무병장수를 바라는 소박한 염원이 담겨 있어 예를 들면 박쥐
) 예로부터 박쥐는 오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이라고 믿어 왔다. 부적에도 오복이 수호신으로 상징되며 또한 박쥐는 행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는데, 이는 편복( )의 박쥐 복( )자가 복 복(福)자로 해석한데서 기인한다. 또 박쥐는 하늘나라의 쥐라고 하여 천서(天鼠)라고도 하고, 신선의 쥐라고 하여 선서(仙鼠)라고도 한다. 그래서 박쥐는 일상생활용품이나 회화, 공예품, 가구의 장식, 건축장식 등의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박쥐는 길상(吉祥)문양으로 많이 쓰였다. 베갯모에 쓰인 것은 다산(多産)과 득남(得男)을 상징하였다. 박쥐의 강한 번식력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것이기도 한다. (《韓國文化상징사전》, 〈박쥐〉, 동아출판사, 1992)
는 번식률이 높은 동물로 다남(多男)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고, 복을 상징하기도 했다. 몸체에 새겨진 여러 가지 문양, 덕담의 문자는 장수와 복을 빌거나 액을 피하고 몸을 보호하는 것
) 호랑이 발톱노리개는 호랑이는 병귀(病鬼)나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범 그림이나 \'호(虎)\'자 부적, 단오에 궁중에서 나누어 주었다는 쑥으로 만든 범에서도 이같은 뜻을 볼 수 있다. 또한 범의 일부, 즉 수염·발톱·눈썹은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이것으로 범을 부린다는 속신도 있다. (《韓國文化상징사전》, 〈호랑이〉, 동아출판사, 1992 )
으로 어떤 염원을 위해 차기도 했고 향갑·향낭·침낭·장도와 같이 실용적인 면에서 찬 것도 있었다.
향갑·향낭은 사향 등을 담은 주머니로 평소에는 향내음을 은근히 풍기고 급할 때에는 구급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침낭은 바늘을 꽂아 두던 바늘집으로 부녀자들이 늘 사용하는 바늘을 손쉽게 찾아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일반 부녀자가 가장 많이 패용한 노리개 중의 하나였다.
남녀가 장도를 차는 풍습은 고려가 원나라에 복속한 뒤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에는 널리 일반화되었다. 여인에 있어 은장도는 장식용으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호신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은장도의 칼날에는 \'일편단심\'이라는 글씨를 문양화하여 새기기도 하였다. 또 은젓가락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식사하게 되는 경우 젓가락으로 사용하고, 또 음식 중의 독의 유무를 분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설이 있다.
혼례복에는 크고 화려한 것을 차고, 명절이나 평상시에는 소박한 노리개를 찼는데 상류층 부인들은 보석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서민들은 보석이 귀하므로 아름다운 수를 놓은 수노리개로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추천자료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의 영향변화 조사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의 영향변화 조사 경쟁력강화를 위한 조직변화 및 개발
경쟁력강화를 위한 조직변화 및 개발 경제 기본법칙의 변화
경제 기본법칙의 변화 중국의 종교인식 변화와 양상에 대한 조사
중국의 종교인식 변화와 양상에 대한 조사 한국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구축방안 가족주의적 전통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현대 가족주의적 가치관
가족주의적 전통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현대 가족주의적 가치관 KT - 변화시대의 신 경영 패러다임
KT - 변화시대의 신 경영 패러다임 농협은 21C 환경변화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농협은 21C 환경변화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고대 조선시대 혼인제도의 변화 (여권의 문제를 중심층으로) & 정조의 화성 건설의 배경 ...
고대 조선시대 혼인제도의 변화 (여권의 문제를 중심층으로) & 정조의 화성 건설의 배경 ... 영국 빈민법의 변화 과정
영국 빈민법의 변화 과정 TV 만화의 변화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과 그 해결 방안
TV 만화의 변화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과 그 해결 방안  근대 문학과 문학의 변화
근대 문학과 문학의 변화 사회복지행정에서 혁신(변화)되어야 할 것들(기획의 특성과 기획과정)에 대해서 서술
사회복지행정에서 혁신(변화)되어야 할 것들(기획의 특성과 기획과정)에 대해서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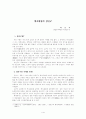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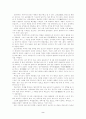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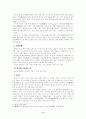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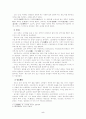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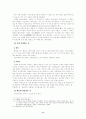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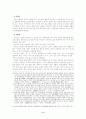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