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줄거리
2.어휘 및 구절 이해
3.작품 해제
4.작품 해설
5.작품 이해
2.어휘 및 구절 이해
3.작품 해제
4.작품 해설
5.작품 이해
본문내용
어다보며 선하품을 하고 섰었다. 그러나 병화의 얼굴에는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모든 오해를 풀고, 인제는 안심하였다는 듯이 화평한 기색이 도는 것 같았다.
차가 떠나려 할 제 큰집 형님은 승강대에 섰는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며,
\"내년 봄에 나오면 어떻게 속현(續絃)할 도리를 차려야 하지 않겠나?\"
하고 난데없는 소리를 하기에 나는,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 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드럭거릴 때가 되거든요!…….\"
하며 웃어 버렸다.
▶ 줄거리
일본에 유학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향한다. 귀국 중 짓궂게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시달려 울분을 터뜨린다. 또한 우리 나라 노무자를 경멸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라 없는 설움과 곤궁 속에 허덕이는 우리 노무자에 대한 연민이 휘몰아친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술타령이나 하면서 아내를 재래식 의술에 맡겨 둔 상태였고, 아내는 얼마 후에 숨을 거둔다. 집안은 과부가 되어 돌아온 누이, 종형(宗兄)과 과객(過客)들이 득실거려 도무지 안정이 안 된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 있던 정자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새 길을 찾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 백 원을 부쳐 준다.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 묘지 같은, 답답한 한국을 떠나 경쾌해진 기분이 되어, 다시 동경으로 향한다.
▶ 어휘 및 구절 이해
몰풍경하다 : 풍경이 삭막하다
암상스러운 : 샘이 많고 심술기가 있는
거간(居間) :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사람
백 씨 : 남의 형을 높여 부르는 말
형공(兄公) :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
궐자(厥者) : 3인칭 \'그\'에 해당하는 말
요보 : 일제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멸시하여 이르던 말
생번(生蕃) : 대만의 토족. 원시적 생활을 함
표독한 : 성질이 사납고 독살스러운
순실한 : 순박하고 참된
호기 만장 : 거드럭거리며 뽐내는 기운이 차서 겉으로 드러남
쿠리 : 중노동에 종사하는 중국, 인도의 하층 노동자
시골서 갓 잡아 올라오는 농군인 듯한 자가 - 앞엣 사람이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 사실주의적 묘사의 특징을 보이는 부분으로 인물의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남을 멸시하고 위압하려는 듯한 어투며 뾰족한 조둥아리가 - 그 따위 종류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 인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 조선의 노동자를 헐값에 팔아 넘기는 거간꾼의 특질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나는 그자의 대추씨 같은 얼굴을 또 한 번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금시라도 말씨가 달라지는 나와 마주 앉은 자의 인물됨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인물 성격을 나타낸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憂國之士)는 아니나 망국(亡國)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 투철한 민족 의식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조선인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멸시와 태도를 볼 때 고통스러워진다. 지식인의 냉정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임. 중립적인 문제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誘發)되는 것인 듯하다. : 적개심이나 반항심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식과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주어지는 감정이다. 즉 일제에 대한 적개심은 투철한 민족 의식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태도 등에서 느껴지는 흥분과 분노로부터 생기는 것인 듯하다.
▶ 작품 해제
갈래 : 장편 소설
배경 : 1918년 겨울(시간). 동경과 서울(공간)
성격 : 사실적. 현실 비판적
구성 : 전체 9장으로 여행의 일정을 따라 전개되는 기행 형식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제재 : 일제 시대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
주제 : 일제 강점 하에서 억압받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상.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 작품 해설
이 소설은 1922년에 발표된 것으로 \'만세 전(萬歲前)\'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3·1 운동 직전의 서울과 동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제 강점 아래 3·1 운동 직전의 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핍박받고 수탈당하는가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주인공 이인화의 의식 구조이다. 주인공은 아내 위독의 전보를 받고도 곧장 귀국하지 않았고, 귀국 중에 민족의 현실에 분노를 느끼고 울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내가 죽자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동경으로 떠나고 만다. 또, 주인공은 무덤 속을 빠져 나간다고 하면서,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공동 묘지로 파악하면서 현실에서 탈출하려고 한다.[이 소설의 원제목이 \"묘지(墓地)\"였다.] 이러한 작가 의식은 다분히 허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허무주의는 일본의 수도인 동경을 탈출구로 삼은 한계는 있으나,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 작품 이해
■ 작품에 나타난 의식
이 작품은 3·1 운동 직전의 서울과 동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중 화자인 \'나\'는 동경에 유학하고 있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별다른 의식 없이 생활을 하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도 무덤덤해 한다.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나는 관부 연락선과 기차 여행 중에, 일제 강점 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공동 묘지로 파악한다. 이 작품의 원제목인 \"묘지\"는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다. 동경과 서울을 오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점에 착안해서 감상한다. 동경 → 서울 → 동경의 여로와 주인공의 의식을 대비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만세 전\"의 구조
이 작품은 주인공이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여로가 중심이 되어 있다. \'동경 → 동경서 신호(神戶) → 하관(下關)에서 배를 탐 → 연락선으로 부산 도착 → 부산에서 술집을 기웃거림 → 부산에서 출발, 김천을 거쳐 서울 도착 → 서울집의 분위기 → 서울에서 배회 → 아내의 죽음, 동경으로 출발\' 이라는 원점회귀(原點回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차가 떠나려 할 제 큰집 형님은 승강대에 섰는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며,
\"내년 봄에 나오면 어떻게 속현(續絃)할 도리를 차려야 하지 않겠나?\"
하고 난데없는 소리를 하기에 나는,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 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드럭거릴 때가 되거든요!…….\"
하며 웃어 버렸다.
▶ 줄거리
일본에 유학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향한다. 귀국 중 짓궂게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시달려 울분을 터뜨린다. 또한 우리 나라 노무자를 경멸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라 없는 설움과 곤궁 속에 허덕이는 우리 노무자에 대한 연민이 휘몰아친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술타령이나 하면서 아내를 재래식 의술에 맡겨 둔 상태였고, 아내는 얼마 후에 숨을 거둔다. 집안은 과부가 되어 돌아온 누이, 종형(宗兄)과 과객(過客)들이 득실거려 도무지 안정이 안 된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 있던 정자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새 길을 찾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돈 백 원을 부쳐 준다. 구더기가 들끓는 공동 묘지 같은, 답답한 한국을 떠나 경쾌해진 기분이 되어, 다시 동경으로 향한다.
▶ 어휘 및 구절 이해
몰풍경하다 : 풍경이 삭막하다
암상스러운 : 샘이 많고 심술기가 있는
거간(居間) :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사람
백 씨 : 남의 형을 높여 부르는 말
형공(兄公) :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
궐자(厥者) : 3인칭 \'그\'에 해당하는 말
요보 : 일제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멸시하여 이르던 말
생번(生蕃) : 대만의 토족. 원시적 생활을 함
표독한 : 성질이 사납고 독살스러운
순실한 : 순박하고 참된
호기 만장 : 거드럭거리며 뽐내는 기운이 차서 겉으로 드러남
쿠리 : 중노동에 종사하는 중국, 인도의 하층 노동자
시골서 갓 잡아 올라오는 농군인 듯한 자가 - 앞엣 사람이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 사실주의적 묘사의 특징을 보이는 부분으로 인물의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남을 멸시하고 위압하려는 듯한 어투며 뾰족한 조둥아리가 - 그 따위 종류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 인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 조선의 노동자를 헐값에 팔아 넘기는 거간꾼의 특질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나는 그자의 대추씨 같은 얼굴을 또 한 번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금시라도 말씨가 달라지는 나와 마주 앉은 자의 인물됨을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인물 성격을 나타낸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憂國之士)는 아니나 망국(亡國)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 투철한 민족 의식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조선인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멸시와 태도를 볼 때 고통스러워진다. 지식인의 냉정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임. 중립적인 문제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誘發)되는 것인 듯하다. : 적개심이나 반항심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식과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주어지는 감정이다. 즉 일제에 대한 적개심은 투철한 민족 의식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태도 등에서 느껴지는 흥분과 분노로부터 생기는 것인 듯하다.
▶ 작품 해제
갈래 : 장편 소설
배경 : 1918년 겨울(시간). 동경과 서울(공간)
성격 : 사실적. 현실 비판적
구성 : 전체 9장으로 여행의 일정을 따라 전개되는 기행 형식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제재 : 일제 시대 암울했던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
주제 : 일제 강점 하에서 억압받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상.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 작품 해설
이 소설은 1922년에 발표된 것으로 \'만세 전(萬歲前)\'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3·1 운동 직전의 서울과 동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제 강점 아래 3·1 운동 직전의 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핍박받고 수탈당하는가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주인공 이인화의 의식 구조이다. 주인공은 아내 위독의 전보를 받고도 곧장 귀국하지 않았고, 귀국 중에 민족의 현실에 분노를 느끼고 울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내가 죽자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동경으로 떠나고 만다. 또, 주인공은 무덤 속을 빠져 나간다고 하면서,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공동 묘지로 파악하면서 현실에서 탈출하려고 한다.[이 소설의 원제목이 \"묘지(墓地)\"였다.] 이러한 작가 의식은 다분히 허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허무주의는 일본의 수도인 동경을 탈출구로 삼은 한계는 있으나,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 작품 이해
■ 작품에 나타난 의식
이 작품은 3·1 운동 직전의 서울과 동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중 화자인 \'나\'는 동경에 유학하고 있는 식민지 지식인으로 별다른 의식 없이 생활을 하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도 무덤덤해 한다.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나는 관부 연락선과 기차 여행 중에, 일제 강점 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당시 조선의 상황을 공동 묘지로 파악한다. 이 작품의 원제목인 \"묘지\"는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다. 동경과 서울을 오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점에 착안해서 감상한다. 동경 → 서울 → 동경의 여로와 주인공의 의식을 대비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만세 전\"의 구조
이 작품은 주인공이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여로가 중심이 되어 있다. \'동경 → 동경서 신호(神戶) → 하관(下關)에서 배를 탐 → 연락선으로 부산 도착 → 부산에서 술집을 기웃거림 → 부산에서 출발, 김천을 거쳐 서울 도착 → 서울집의 분위기 → 서울에서 배회 → 아내의 죽음, 동경으로 출발\' 이라는 원점회귀(原點回歸)의 구조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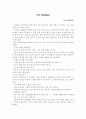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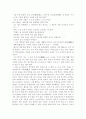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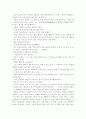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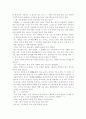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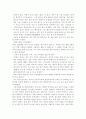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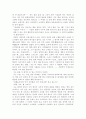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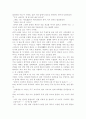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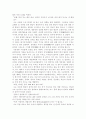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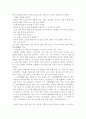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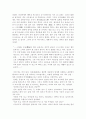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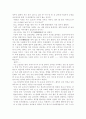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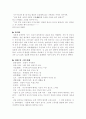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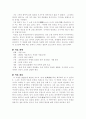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