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고 있다.
방 문턱을 넘으면서도 \'서방님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 읍내를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며 으레 친근감으로 나타내던 장난기 있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착잡하고 괴로운 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거들빼기로 석 잔을 해치우고사 : \'거듭 석 잔을 마시고서야\'의 뜻. 그것도 곱빼기로 석 잔을 마신 것으로 역시 그의 착잡한 심경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곱빼기로 잘 좀 .... 참지름도 치소, 잉 : 겉으로는 냉엄하게 행동하나 속으로는 아들 진수를 극진히 사랑하는 박만도의 부성애(父性愛)가 잘 나타나 있다.
외나무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 아들을 업는 아버지 모습이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외나무다리는 원초적인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해 주고 화합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배경이 된다.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 진수 너의 신세도 참 아무짝에도 쓸데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아버지와 아들 이대(二代)에 걸친 수난의 처절한 비극을 표출한 부분이다.
▶ 작품 해제
갈래 : 단편 소설
배경 : 1950년대 한국의 작은 마을
표현 : ① 기술 방법에 있어, 요약과 장면 제시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구성의 긴밀성을 노리고 있다. ② 토착어를 분위기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묘사가 사실적이다. ③ 비극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처리하여 감동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④ 인물의 심리를 반영한 장면이 제시된다.
제재 : 어느 부자(父子)의 수난
주제 : 수난을 극복하는 삶의 의지. 역사적 시련 극복의 한 모습
▶ 작품 해설
1957년 한국일보에 발표한 가족사의 단편 소설로서,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서 겪은 아버지의 수난과, 한국 전쟁에서 겪는 아들의 수난, 즉 2대(二代)에 걸쳐 이 땅의 현대사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비극과 그 극복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외나무다리가 등장하고 있다. 시간의 역행적 구성, 인물의 뚜렷한 성격 등이 단편 소설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부분은 절정과 결말로서 부자애(父子愛)를 통하여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는 장면이다.
아들의 귀향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리적 명암, 성냥불로 연상되는 과거에의 기억, 주인공의 일정한 버릇, 작품 앞뒤에 나오는 외나무다리 등의 제재의 의미를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성하였다.
▶ 작품 이해
■ 배경에 대하여
이 작품은 6·25 직후의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제 말기의 식민지 시대에서 6·25 사변에 이르는 거대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세부적 배경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작품의 앞뒤에 두 번 나타나는 외나무다리가 있다. 이 외나무다리는 단순한 배경 요소로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핵심적 조건 구실을 한다.
■ 인물에 대하여
이 소설의 등장하는 인물은 \'박만도\'와 그의 아들 \'진수\', 그리고 술집 여편네 등이다. 박만도는 일제 시대에 징용으로 끌려 팔 한 쪽을 잃은 불구자이고, 아들 진수는 6·25 사변에 참전하여 다리 한 쪽을 잃은 상이 용사다. 그들은 한결같이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지만 뜻하지 않은 외부 압력으로 육체적 손상을 입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 부자는 우리의 현대사가 경험한 역사적 수난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만도\'는 일정한 버릇을 지니고 있다. 단골 술집에 들를 때마다, \'서방님 들어가신다.\'고 하여 술집 여편네와 농담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 날만은 그런 농담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여느 때와 다른 심리 상태에 놓여 있으며, 몹시 우울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작가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간접적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아니예\', \'우짜다가\', \'똥이다, 똥\' 등 농민들의 투박한 언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또한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이바지한다.
아버지인 \'박만도\'는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두 차례의 역사적 수난을 거듭 겪고 있지만,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최초의 경험으로 당황하는 아들 \'진수\'와는 이런 점에서 판이하게 구분된다.
■ 주제에 대하여
이 작품은 \"수난 이대\"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가 겪은 가족사적 수난을 다룬 것이다. 즉 아버지는 일제와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팔 한쪽을 잃고, 아들은 6·25때 참전하여 다리 한 쪽을 잃음으로써 모두 불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가 겪은 가족사적 수난의 과정을 통해 이 땅의 현대사가 경험한 역사적 비극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는 그러한 피해와 확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차례차례로 팔과 다리를 잃은 이 두 세대가 서로 도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에서 명백히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극의 상처와 고통을 서로 감싸고 도우면서 극복해 가려는 의지가 감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의 주제는 플롯의 절정을 이루는 이 부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참담한 시대의 인간들이 그래도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데에 이 작품의 근본적 의의가 있다고 했다.
■ 시점에 대하여
이 작품에는 여러 가지 시점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사용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작가 관찰자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한다. 작품에서 주인공 박만도의 성격이 말과 동작으로 제시되어 독자에게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된 경우이다. 그리고 작중 화자가 인물들의 내면 심리 세계에 대해서까지 서술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관찰자 시점으로는 너무 단조롭고 평이한 서술에 그치기 때문에 전지적 시점을 병용하여 주제 표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여러 시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무리 없이 사용하여 오히려 소설의 다양성을 획득하였다.
방 문턱을 넘으면서도 \'서방님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 읍내를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며 으레 친근감으로 나타내던 장난기 있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착잡하고 괴로운 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거들빼기로 석 잔을 해치우고사 : \'거듭 석 잔을 마시고서야\'의 뜻. 그것도 곱빼기로 석 잔을 마신 것으로 역시 그의 착잡한 심경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곱빼기로 잘 좀 .... 참지름도 치소, 잉 : 겉으로는 냉엄하게 행동하나 속으로는 아들 진수를 극진히 사랑하는 박만도의 부성애(父性愛)가 잘 나타나 있다.
외나무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 아들을 업는 아버지 모습이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외나무다리는 원초적인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해 주고 화합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배경이 된다.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 진수 너의 신세도 참 아무짝에도 쓸데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아버지와 아들 이대(二代)에 걸친 수난의 처절한 비극을 표출한 부분이다.
▶ 작품 해제
갈래 : 단편 소설
배경 : 1950년대 한국의 작은 마을
표현 : ① 기술 방법에 있어, 요약과 장면 제시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구성의 긴밀성을 노리고 있다. ② 토착어를 분위기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묘사가 사실적이다. ③ 비극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처리하여 감동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④ 인물의 심리를 반영한 장면이 제시된다.
제재 : 어느 부자(父子)의 수난
주제 : 수난을 극복하는 삶의 의지. 역사적 시련 극복의 한 모습
▶ 작품 해설
1957년 한국일보에 발표한 가족사의 단편 소설로서,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서 겪은 아버지의 수난과, 한국 전쟁에서 겪는 아들의 수난, 즉 2대(二代)에 걸쳐 이 땅의 현대사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비극과 그 극복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외나무다리가 등장하고 있다. 시간의 역행적 구성, 인물의 뚜렷한 성격 등이 단편 소설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부분은 절정과 결말로서 부자애(父子愛)를 통하여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는 장면이다.
아들의 귀향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리적 명암, 성냥불로 연상되는 과거에의 기억, 주인공의 일정한 버릇, 작품 앞뒤에 나오는 외나무다리 등의 제재의 의미를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성하였다.
▶ 작품 이해
■ 배경에 대하여
이 작품은 6·25 직후의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제 말기의 식민지 시대에서 6·25 사변에 이르는 거대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세부적 배경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작품의 앞뒤에 두 번 나타나는 외나무다리가 있다. 이 외나무다리는 단순한 배경 요소로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핵심적 조건 구실을 한다.
■ 인물에 대하여
이 소설의 등장하는 인물은 \'박만도\'와 그의 아들 \'진수\', 그리고 술집 여편네 등이다. 박만도는 일제 시대에 징용으로 끌려 팔 한 쪽을 잃은 불구자이고, 아들 진수는 6·25 사변에 참전하여 다리 한 쪽을 잃은 상이 용사다. 그들은 한결같이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지만 뜻하지 않은 외부 압력으로 육체적 손상을 입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 부자는 우리의 현대사가 경험한 역사적 수난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만도\'는 일정한 버릇을 지니고 있다. 단골 술집에 들를 때마다, \'서방님 들어가신다.\'고 하여 술집 여편네와 농담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 날만은 그런 농담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여느 때와 다른 심리 상태에 놓여 있으며, 몹시 우울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작가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간접적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아니예\', \'우짜다가\', \'똥이다, 똥\' 등 농민들의 투박한 언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또한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이바지한다.
아버지인 \'박만도\'는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두 차례의 역사적 수난을 거듭 겪고 있지만,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최초의 경험으로 당황하는 아들 \'진수\'와는 이런 점에서 판이하게 구분된다.
■ 주제에 대하여
이 작품은 \"수난 이대\"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가 겪은 가족사적 수난을 다룬 것이다. 즉 아버지는 일제와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팔 한쪽을 잃고, 아들은 6·25때 참전하여 다리 한 쪽을 잃음으로써 모두 불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가 겪은 가족사적 수난의 과정을 통해 이 땅의 현대사가 경험한 역사적 비극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는 그러한 피해와 확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차례차례로 팔과 다리를 잃은 이 두 세대가 서로 도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에서 명백히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극의 상처와 고통을 서로 감싸고 도우면서 극복해 가려는 의지가 감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의 주제는 플롯의 절정을 이루는 이 부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참담한 시대의 인간들이 그래도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데에 이 작품의 근본적 의의가 있다고 했다.
■ 시점에 대하여
이 작품에는 여러 가지 시점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어떤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사용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작가 관찰자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한다. 작품에서 주인공 박만도의 성격이 말과 동작으로 제시되어 독자에게 선명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된 경우이다. 그리고 작중 화자가 인물들의 내면 심리 세계에 대해서까지 서술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관찰자 시점으로는 너무 단조롭고 평이한 서술에 그치기 때문에 전지적 시점을 병용하여 주제 표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여러 시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무리 없이 사용하여 오히려 소설의 다양성을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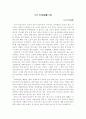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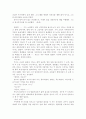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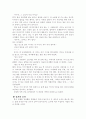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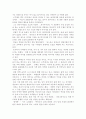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