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이런 이진경의 한계를 적절하게 꼬집은 적이 있지만 사실 그가 제시하는 \'탈주한 자의 꼬뮌\'이란 이상향도 실천력이 없는 선언이나 제안의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진경의 한계는 곧 80년대 학생운동권의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그에 찬성했던 사람이든 그에 반대했던 사람이든, 결국 이진경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한국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실천적 구속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직 담론의 영역에서만 이런 구분이 유효하다는 한국적 좌파의 현실은 이진경에게 행운이자 불행이기도 할 것이다. 이 딜레마를 통해 이진경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했지만 또한 이 모순적 존재기반으로 인해 그는 끊임없이 분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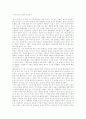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