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제기
2. 경제학/교육에 대한 대학 내외의 사회적 평가
3. 한국 [경제(학)원론] 교육의 문제
4. 결론과 제언
2. 경제학/교육에 대한 대학 내외의 사회적 평가
3. 한국 [경제(학)원론] 교육의 문제
4. 결론과 제언
본문내용
에 달했다. 우리는 \'한국판 르네상스\'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분단국 경제학 교수들은 近代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모두를 지양하여, 새롭게 總體的 生存 危機의 克復과 人間(自己)解放에 나서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었다. 이것이 고통스럽다고 회피한다면, 그 대가는 \'大學校\'라는 거대기업화한 敎育組織과 함께 經濟學이 自然淘汰될 可能性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는 무서운 이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문
)정운찬,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백산서당, 1997. 특히 46-50면, 60-63면, 123-126면 참조.
은 무엇보다 먼저 경제학 교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나라경제가 百尺竿頭에 선 오늘날 韓國(/南韓)은 전세계적으로 이 使命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文化的 條件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한국(/남한)에는 西歐의 모든 근대 學問만이 아니라 宗敎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줄기차게 수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東洋 고유의 學問(/宗敎)적 文化遺産도 東洋社會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나라 경제학이 \'가장 서구(/미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낡은 자기 불신을 과감히 버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슬로건으로 經濟哲學/經濟學을 시작하고, 經濟의 새로운 普遍眞理를 추구해 갈 \'文化的 土臺\'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다(여전히 이것이 믿기지 않는 자기 불신이 있다면, 1996년 한국을 방문한 독일철학자 하버마스(J. Harbermas)가 해인사 등을 둘러보고 난 뒤, 충격과 분개와 안타까움의 심정으로 던진 충고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학문, 문화적 조건이라면, 이 민족이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로 분단되어 전쟁까지 치르며, 전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奇蹟과 沒落의 榮辱을 겪어 왔다는 것은 바로 그 現實的 條件이다.
이런 조건에서 이 나라와 세상을 바꾸어 갈 \'經濟學의 革命\'과 \'經濟敎育의 革命\'을 동시에 달성해 가기 위해서 나의 학문적 스승들, 선배, 동료, 후배들에 대해,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감히 내 놓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기존 경제학 교과서들은 국제/사회적으로 \'불량품\'으로 낙인이 찍히고, 더러는 국내에서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만큼, [經濟原論]은 \'敎育指針書\'로서, \'敎科書\'로서의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參考書\'의 지위로 끌어 내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硏究와 檢證 對象으로 삼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제학 내부 專攻 各論 敎科書도 이 \'經濟原論\'에 기초해 있는 만큼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하여 갖가지 \'네오\', \'신\' \'포스트\' 등등의 \'새로운 경제학\'의 \'최후의 낡은 사대주의적 사슬\'을 끊어야 한다.
둘째, 모든 경제학 교수들이 이 나라의 자기 地域/職域 經濟現場에서 사회경제생활 體驗에 기초하여, \'經濟(學)原論\'을 대체할 \'經濟原理學\'(가칭)이라는 \'작고 강력한 새로운 교과서\'를 대학교수 자신의 힘으로 생산하여, 자기 經濟哲學/理論/思想으로 교육하고, 학문적/ 교육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을 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가장 외제를 좋아하는 만성적 수입/소비자라는 치욕을 극복하여 輸入代替, 나아가 學問의 輸出로 서구경제학자도 가르치는 學問的 自主性과 互惠性을 실현하여 굴욕적 經濟信託統治를 극복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셋째, 교수와 학생간 學問의 主體와 對象, 敎育의 主體와 對象이라는 근대 이후의 오랜 계몽주의 독재적, 비현실적 主客 二分法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이 모두 학문과 교육 과정의 主體로서 자기/상호 자각하여 \'人間과 人間\'으로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兩方向의 열린 학문/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 이에 앞서 교수 자신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객분리를 넘어 자신을 교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 외연으로서 産業界, 勞動界를 비롯한 대학 밖의 사회 각계와도 마찬가지다.
넷째, 선생과 학생이 모두 理論과 生活(/實踐)의 慢性的 分離를 극복하기 위하여, 敎科課程에 다양한 生産的 經濟實習 科程을 도입하여 이론에 대하여 體驗的으로 檢證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내부의 各種 各級 試驗은 물론 경제학 교수가 참여하는 各種 國家 考試와 資格試驗 등에서 檢證되지 않은 이론 중심, 암기한 지식 중심 出題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과학의 관련 타 영역과도 협의해야 한다.
여섯째, 輸入經濟學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學問/敎育現場에서도 \'밥값\'을 못하고서 정계, 행정부의 \'經世濟民\'에 나선 경제학 교수들은 모두 자리를 물러나야 하며, 더 이상은 대학교수들이 남의 나라, 남의 경제학으로 이 나라를 \'立身\'과 \'社會運動\'의 실험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남다른 경험을 토대로 지금이라도 자신의 만든 불량품 경제학 책에 대하여 학문적/교육적으로 책임지는 \'經濟學의 歷史 바로세우기\'를 시작해야 한다.
일곱째, 대학 이전 初中等 科程에서 교사와 학생의 새로운 민주적, 창의적, 인간적 교육을 위하여 經濟/社會 科目의 軍國主義的, (左/右翼) 全體主義的 國定 敎科書 制度를 폐지해야 하며, 이 敎科書의 집필에 대학교수들은 더 이상 무책임하게 참여하여 초중등 교사의 학문/교육의 자생력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남한 내부 경제학, 교육자들이 학생 앞에서 벌이는 시대착오적 理念 敵對와 葛藤을 넘어서는 데서 나아가, 南北韓 經濟敎育者간의 이념적 敵對, 疏外, 그리고 본의 아니라 하더라도 南北韓 學生의 비인간적 理念葛藤과 分裂을 조장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경제학/교육계의 학문적 和解/交流/協力으로 분단민족의 정치, 군사적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인간적 통일의 길을 열어가며, 미래의 통일교육에도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상 지면이 제한된 소논문에 작지 않은 주제를 담아 엉성하고 불비한 것이 많다. 問題意識에 대해서라도 공감되는 바는 같이 뜻을 모아 해결하고 오류나 불충분한 것은 토론을 통해서 바로잡아지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정운찬,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백산서당, 1997. 특히 46-50면, 60-63면, 123-126면 참조.
은 무엇보다 먼저 경제학 교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나라경제가 百尺竿頭에 선 오늘날 韓國(/南韓)은 전세계적으로 이 使命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文化的 條件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한국(/남한)에는 西歐의 모든 근대 學問만이 아니라 宗敎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줄기차게 수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東洋 고유의 學問(/宗敎)적 文化遺産도 東洋社會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나라 경제학이 \'가장 서구(/미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낡은 자기 불신을 과감히 버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슬로건으로 經濟哲學/經濟學을 시작하고, 經濟의 새로운 普遍眞理를 추구해 갈 \'文化的 土臺\'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다(여전히 이것이 믿기지 않는 자기 불신이 있다면, 1996년 한국을 방문한 독일철학자 하버마스(J. Harbermas)가 해인사 등을 둘러보고 난 뒤, 충격과 분개와 안타까움의 심정으로 던진 충고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학문, 문화적 조건이라면, 이 민족이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로 분단되어 전쟁까지 치르며, 전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奇蹟과 沒落의 榮辱을 겪어 왔다는 것은 바로 그 現實的 條件이다.
이런 조건에서 이 나라와 세상을 바꾸어 갈 \'經濟學의 革命\'과 \'經濟敎育의 革命\'을 동시에 달성해 가기 위해서 나의 학문적 스승들, 선배, 동료, 후배들에 대해,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감히 내 놓고자 한다.
첫째, 대학의 기존 경제학 교과서들은 국제/사회적으로 \'불량품\'으로 낙인이 찍히고, 더러는 국내에서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만큼, [經濟原論]은 \'敎育指針書\'로서, \'敎科書\'로서의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參考書\'의 지위로 끌어 내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硏究와 檢證 對象으로 삼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제학 내부 專攻 各論 敎科書도 이 \'經濟原論\'에 기초해 있는 만큼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하여 갖가지 \'네오\', \'신\' \'포스트\' 등등의 \'새로운 경제학\'의 \'최후의 낡은 사대주의적 사슬\'을 끊어야 한다.
둘째, 모든 경제학 교수들이 이 나라의 자기 地域/職域 經濟現場에서 사회경제생활 體驗에 기초하여, \'經濟(學)原論\'을 대체할 \'經濟原理學\'(가칭)이라는 \'작고 강력한 새로운 교과서\'를 대학교수 자신의 힘으로 생산하여, 자기 經濟哲學/理論/思想으로 교육하고, 학문적/ 교육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을 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가장 외제를 좋아하는 만성적 수입/소비자라는 치욕을 극복하여 輸入代替, 나아가 學問의 輸出로 서구경제학자도 가르치는 學問的 自主性과 互惠性을 실현하여 굴욕적 經濟信託統治를 극복하는 데도 기여해야 한다.
셋째, 교수와 학생간 學問의 主體와 對象, 敎育의 主體와 對象이라는 근대 이후의 오랜 계몽주의 독재적, 비현실적 主客 二分法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이 모두 학문과 교육 과정의 主體로서 자기/상호 자각하여 \'人間과 人間\'으로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兩方向의 열린 학문/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 이에 앞서 교수 자신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객분리를 넘어 자신을 교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 외연으로서 産業界, 勞動界를 비롯한 대학 밖의 사회 각계와도 마찬가지다.
넷째, 선생과 학생이 모두 理論과 生活(/實踐)의 慢性的 分離를 극복하기 위하여, 敎科課程에 다양한 生産的 經濟實習 科程을 도입하여 이론에 대하여 體驗的으로 檢證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내부의 各種 各級 試驗은 물론 경제학 교수가 참여하는 各種 國家 考試와 資格試驗 등에서 檢證되지 않은 이론 중심, 암기한 지식 중심 出題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과학의 관련 타 영역과도 협의해야 한다.
여섯째, 輸入經濟學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學問/敎育現場에서도 \'밥값\'을 못하고서 정계, 행정부의 \'經世濟民\'에 나선 경제학 교수들은 모두 자리를 물러나야 하며, 더 이상은 대학교수들이 남의 나라, 남의 경제학으로 이 나라를 \'立身\'과 \'社會運動\'의 실험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남다른 경험을 토대로 지금이라도 자신의 만든 불량품 경제학 책에 대하여 학문적/교육적으로 책임지는 \'經濟學의 歷史 바로세우기\'를 시작해야 한다.
일곱째, 대학 이전 初中等 科程에서 교사와 학생의 새로운 민주적, 창의적, 인간적 교육을 위하여 經濟/社會 科目의 軍國主義的, (左/右翼) 全體主義的 國定 敎科書 制度를 폐지해야 하며, 이 敎科書의 집필에 대학교수들은 더 이상 무책임하게 참여하여 초중등 교사의 학문/교육의 자생력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남한 내부 경제학, 교육자들이 학생 앞에서 벌이는 시대착오적 理念 敵對와 葛藤을 넘어서는 데서 나아가, 南北韓 經濟敎育者간의 이념적 敵對, 疏外, 그리고 본의 아니라 하더라도 南北韓 學生의 비인간적 理念葛藤과 分裂을 조장하는 것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경제학/교육계의 학문적 和解/交流/協力으로 분단민족의 정치, 군사적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인간적 통일의 길을 열어가며, 미래의 통일교육에도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상 지면이 제한된 소논문에 작지 않은 주제를 담아 엉성하고 불비한 것이 많다. 問題意識에 대해서라도 공감되는 바는 같이 뜻을 모아 해결하고 오류나 불충분한 것은 토론을 통해서 바로잡아지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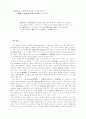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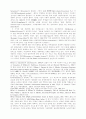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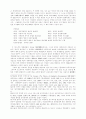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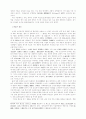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