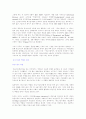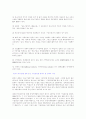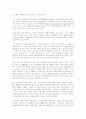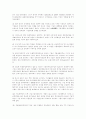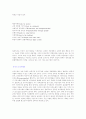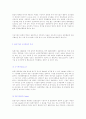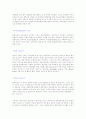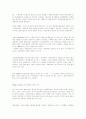목차
1.한국 기업조직의 특질
1) 대,중,소기업의 법률적 양적 및 질적 정의
2.미국, 일본, 한국기업의 조직문화
1) 미국기업의 조직문화적 특성
2) 일본기업의 조직문화적 특성
3) 한국기업의 조직문화적 특성
1) 대,중,소기업의 법률적 양적 및 질적 정의
2.미국, 일본, 한국기업의 조직문화
1) 미국기업의 조직문화적 특성
2) 일본기업의 조직문화적 특성
3) 한국기업의 조직문화적 특성
본문내용
"한국적"이라는 경영풍토의 틀이 변하고 있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가 있다.
아마 1990년대 초반을 분기점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이전부터도 변하고 있었지만 大勢가 기울고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하는 시점이 이즈음일 것이라는 것이다. 대체 어떠한 변화이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William Ouchi의 "Z"이론을 되새겨 보자.
(3) 이에 따르면 日本기업의 특징은 종신고용, 일반경력관리, 집단적...이라고 특징 지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이 조직의 응집력과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一流기업의 기틀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日本은 변화하고 있다. 직장을 자주 이동하고,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개인주의가 증가한다.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연공보다는 능력과 직무가치를 우선하는 성과주의의 연봉제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日本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본기업의 특질을 Z이론 같은 틀로 설명하는 문헌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것일까? 서양문물에 휩쓸려 우리들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상실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계경제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미국과 서구라파에 편입되는 주변부 포디즘으로의 변화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일까? 아니다. 이 변화는 유행도 아니고 종속경제에 의한 편입도 아니고 또 우리 것이 퇴색하는 것도 아니다. 종전의 일본 또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특질들은 한국적인 것도 또 동양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질은 Gemeinschaft(공동사회)의 속성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기반이 들어서기 이전의 사회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기반이 공동사회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 사회 또 중세의 유럽사회에도 있어왔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한 사회가 Gesellschaft(이익사회)로 이행하면 노동력의 이동이 증가하고 전문성이 강화되는 한편 개인주의가 두드러지게 된다. 그런데 왜 농경사회의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한 Gemeinschaft의 사회 문화적 가치가 일본에서는 80년대 후반 그리고 한국은 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는가?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문화 지속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유의할 점은 경제구조가 변하였다고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금방 뒤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1-2세기가 걸리기도 하고 현대 한국과 일본사회의 경우는 약 30-40년의 시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애초에 이 문제는 문화 정치구조(상부구조;super-structure)와 경제 기술구조(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관계에 대한 古典的인 논의의 하나이다. 양자의 관계는 interaction이 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는 꼭 분간하지 않더라도 경제구조의 변화는 사회문화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설이다. 당연히 우리사회도 Gesellschaft의 속성이 인간관계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 갈 것으로 想定된다.
한국적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의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 또는 변해서는 안돼는 속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다분히 저항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사회(Gemeinschaft)의 속성이라고 보게 되면 굳이 붙들고 지켜야 할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따라서 능동적인 변신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한국사회의 문화변동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니 자못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다. 그렇다.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로 이어지는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 인간관계 변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은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서 이익사회(Gesellschaft) 사회로의 이행에 있다.
그래서 K이론이 추구하는 바는 한국 사회의 고유의 변하지 않는 특질을 찾아 한국적 정체성(identity)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사회가 이익사회로 변화하는 데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조직, 인사, 노사, 전략에 대한 보다 통찰력 있는 해석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현장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매우 기민하게 이러한 변화에 대처한다. 실무를 통하여 방법(know-how)을 터득한다. 그러나 요즈음 같이 변화의 폭이 크고 관련된 변수가 많아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근거(know-why)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했더니 효과적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은 이론의 몫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理論은 현실과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실천(action)을 위한 개념이고 틀인 것이다. 유명대학에서의 학위가 곧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방면에서의 오랜 실무와 성공이 정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Know-how와 know-why의 씨줄과 날줄로 엮어 우리 기업에 유용한 개념과 기법들을 찾아 나서자.
한국 기업에 있어 경영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實用的인 代案을 찾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고와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사회의 전형인 美國을 一次的인 Model로 삼아 한국사회의 현재의 변화과정을 가늠하면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기업 경영문제에 관한 한 미국에서 실험과 검증을 통해 개발되는 경영 기법들은 전세계적으로 약 90%정도가 전파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실험을 통해 개발된 풍부한 기법과 개념들을 주저 없이 섭렵하는 일이다. 일본 역시 그들의 응용력은 배워야 할 대상이다. 한국의 현실은 巨視變動의 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Europe 전통의 사상 특히 辨證法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거시적 變化와 그 複合性을 파악하는데는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해준다. 韓國的인 것도 Europ인 것도 日本的인 것도 그 특수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되며, 지역적인 다양성(divergency)이 있을 뿐 Management이론의 보편적 중심은 하나이다. 실용적인 시사점은, 보다 보편적이고 풍부한 것을 指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1990년대 초반을 분기점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이전부터도 변하고 있었지만 大勢가 기울고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하는 시점이 이즈음일 것이라는 것이다. 대체 어떠한 변화이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William Ouchi의 "Z"이론을 되새겨 보자.
(3) 이에 따르면 日本기업의 특징은 종신고용, 일반경력관리, 집단적...이라고 특징 지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이 조직의 응집력과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一流기업의 기틀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日本은 변화하고 있다. 직장을 자주 이동하고,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개인주의가 증가한다.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연공보다는 능력과 직무가치를 우선하는 성과주의의 연봉제가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日本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본기업의 특질을 Z이론 같은 틀로 설명하는 문헌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것일까? 서양문물에 휩쓸려 우리들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상실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계경제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미국과 서구라파에 편입되는 주변부 포디즘으로의 변화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일까? 아니다. 이 변화는 유행도 아니고 종속경제에 의한 편입도 아니고 또 우리 것이 퇴색하는 것도 아니다. 종전의 일본 또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특질들은 한국적인 것도 또 동양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질은 Gemeinschaft(공동사회)의 속성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기반이 들어서기 이전의 사회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인간관계의 기반이 공동사회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 사회 또 중세의 유럽사회에도 있어왔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한 사회가 Gesellschaft(이익사회)로 이행하면 노동력의 이동이 증가하고 전문성이 강화되는 한편 개인주의가 두드러지게 된다. 그런데 왜 농경사회의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한 Gemeinschaft의 사회 문화적 가치가 일본에서는 80년대 후반 그리고 한국은 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는가?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문화 지속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유의할 점은 경제구조가 변하였다고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금방 뒤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1-2세기가 걸리기도 하고 현대 한국과 일본사회의 경우는 약 30-40년의 시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애초에 이 문제는 문화 정치구조(상부구조;super-structure)와 경제 기술구조(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관계에 대한 古典的인 논의의 하나이다. 양자의 관계는 interaction이 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는 꼭 분간하지 않더라도 경제구조의 변화는 사회문화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설이다. 당연히 우리사회도 Gesellschaft의 속성이 인간관계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 갈 것으로 想定된다.
한국적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의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 또는 변해서는 안돼는 속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다분히 저항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사회(Gemeinschaft)의 속성이라고 보게 되면 굳이 붙들고 지켜야 할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따라서 능동적인 변신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한국사회의 문화변동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니 자못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다. 그렇다.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로 이어지는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 인간관계 변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은 공동사회(Gemeinschaft)에서 이익사회(Gesellschaft) 사회로의 이행에 있다.
그래서 K이론이 추구하는 바는 한국 사회의 고유의 변하지 않는 특질을 찾아 한국적 정체성(identity)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사회가 이익사회로 변화하는 데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조직, 인사, 노사, 전략에 대한 보다 통찰력 있는 해석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현장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매우 기민하게 이러한 변화에 대처한다. 실무를 통하여 방법(know-how)을 터득한다. 그러나 요즈음 같이 변화의 폭이 크고 관련된 변수가 많아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근거(know-why)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했더니 효과적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은 이론의 몫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理論은 현실과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실천(action)을 위한 개념이고 틀인 것이다. 유명대학에서의 학위가 곧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방면에서의 오랜 실무와 성공이 정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Know-how와 know-why의 씨줄과 날줄로 엮어 우리 기업에 유용한 개념과 기법들을 찾아 나서자.
한국 기업에 있어 경영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實用的인 代案을 찾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고와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사회의 전형인 美國을 一次的인 Model로 삼아 한국사회의 현재의 변화과정을 가늠하면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기업 경영문제에 관한 한 미국에서 실험과 검증을 통해 개발되는 경영 기법들은 전세계적으로 약 90%정도가 전파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실험을 통해 개발된 풍부한 기법과 개념들을 주저 없이 섭렵하는 일이다. 일본 역시 그들의 응용력은 배워야 할 대상이다. 한국의 현실은 巨視變動의 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Europe 전통의 사상 특히 辨證法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거시적 變化와 그 複合性을 파악하는데는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해준다. 韓國的인 것도 Europ인 것도 日本的인 것도 그 특수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되며, 지역적인 다양성(divergency)이 있을 뿐 Management이론의 보편적 중심은 하나이다. 실용적인 시사점은, 보다 보편적이고 풍부한 것을 指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