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1.국가의 정의
본론
1. 국가의 유래
2. 유가의 유래
3. 국가와 유가
4.유가의 국가개념
결 론
1.유가적 국가관
1.국가의 정의
본론
1. 국가의 유래
2. 유가의 유래
3. 국가와 유가
4.유가의 국가개념
결 론
1.유가적 국가관
본문내용
치의 기조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대상이 처음에는 대부(大夫) 이상의 귀족에 한정되고, 차츰 국인(國人)을 포함하며, 공자에 이르러서는 소인(小人, 民과 구별됨)까지 미치고, 맹자에 이르러서야 이른바 야인(野人) 혹은 민중(民衆) 까지를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유가의 예악지치가 전민정치(全民政治)를 표방하게 된 것은 맹자의 민본론(民本論)이 처음이다. 맹자 민본론의 의의는 군자계층이 비로소 자신들이 백성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양에 의해서 존재하는 집단임을 자각하고 백성들의 존재의의를 인정한 데 있다. [맹자]에서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거나 또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릴 수가 없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부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한 사회 내애서 군주계층과 생산계층인 백성들이 분업을 통한 협조관계에 있음을 인정한 데서 나온 말이다. 그들의 할 일은 비록 통치(=治人)의 일과 생산(=食人)의 일로 귀천의 차이는 있지만, 당당히 분업으로 간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민본론에 있어서 양자의 분업관계는 백성의 과업이 군자계층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라면, 군자계층의 과업은 백성들이 효제(孝弟)할 수 있도록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자는 모든 육체노동을 전담하고, 후자는 정신노동을 책임진다. 그런데 맹자의 인식에는 백성들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안정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생활에 있어서 근본(根本) 이라 하여 이것이 바탕이 되면 왕도정치(王道政治, 곧 예악지치의 이상인 無爲之治)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왕도정치는 수명(受命)의 천자를 중시하던 과거의 천명사상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정치의 공과(功過)를 백성에 둔 민본사상이다. \"백성이 귀하며,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볍다\" 는 말은 그의 민본사상의 귀추를 잘 나타낸 말이다.
결 론
1.유가적 국가관
중국에 있어서 국가는 하(夏)·상(商)·주(周) 등의 나라가 추방사회(酋邦社會)로 부터 국가정제(國家政制)의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이에 비해 유가는 그 보다 훨씬 후대인 춘추시대에 이르러 공자에 의하여 창시되었다. 그러나 공자가 극구 자신의 사상이 전대(前代) 사상을 기술한 것이지 창작이 아니라고 한 데서 우리는 유가의 국가사상은 유가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유가 경전들은 유가 보다 훨씬 앞서 탄생한 국가가 매우 유가적 기원을 가짐을 말하고 있다.
유가에서 말하는 국가는 천명(天命)을 받은 유덕(有德)한 왕이 백성을 통치함으로써 성립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국 역사상 수 많은 국가는 기존의 왕이나 왕실이 덕을 잃거나 새로운 유덕자가 수명함으로써 침부(沈浮)를 거듭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가적 국가관에 있어서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은 형정(刑政)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 예악(禮樂)에 의한 순리(順理)의 방식을 취한다. 사심(私心)이나 강압을 쓰지 않고 순리에 따라 하는 정치가 극에 이르면 무위지치(無爲之治)가 되는데, 공자 이래 유가는 순임금에 의해 꼭 한번 실현되었던 이 무위지치를 이상적인 통치방식으로 찬양해 왔다.
무위지치를 하는 이유는 백성이란 처음엔 먹고 사는 데 급급한 듯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효제(孝弟)하기를 바라는 선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할 일은 그들에게 처음에는 생계를 도와 주고 나중에는 윤리를 도우는 것이다. 맹자의 민본론(民本論)의 요지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유가가 무위지치를 주장하거나 민본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왕이나 국가의 존재를 필요악 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가의 최고 지향(志向)은 순천(順天)·지천(知天)·낙천(樂天)에 있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의식 속에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인민이 함께 누리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하인민이 함께 누리기로는 국가만한 장소가 없고, 국가야 말로 인륜이 실현될 최적의 장소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국가나 왕의 존재가 필요악 쯤으로 그 의의가 삭감되기는 커녕, 권부의 핵을 이루는 임금과 신하는 만인이 우러러 보는 존재로서 천리(天理)의 운행을 그 몸에서 보여주는 사표로서 높여졌던 것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천명과 덕, 예악지치와 민본사상 가운데 어느 하나도 결여된 이상적인 유가국가를 생각할 수도 결코 없지만 군권(君權)이 무시된 유가사회나 군신윤리가 유기된 유가윤리도 종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결 론
1.유가적 국가관
중국에 있어서 국가는 하(夏)·상(商)·주(周) 등의 나라가 추방사회(酋邦社會)로 부터 국가정제(國家政制)의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이에 비해 유가는 그 보다 훨씬 후대인 춘추시대에 이르러 공자에 의하여 창시되었다. 그러나 공자가 극구 자신의 사상이 전대(前代) 사상을 기술한 것이지 창작이 아니라고 한 데서 우리는 유가의 국가사상은 유가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유가 경전들은 유가 보다 훨씬 앞서 탄생한 국가가 매우 유가적 기원을 가짐을 말하고 있다.
유가에서 말하는 국가는 천명(天命)을 받은 유덕(有德)한 왕이 백성을 통치함으로써 성립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국 역사상 수 많은 국가는 기존의 왕이나 왕실이 덕을 잃거나 새로운 유덕자가 수명함으로써 침부(沈浮)를 거듭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가적 국가관에 있어서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은 형정(刑政)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 예악(禮樂)에 의한 순리(順理)의 방식을 취한다. 사심(私心)이나 강압을 쓰지 않고 순리에 따라 하는 정치가 극에 이르면 무위지치(無爲之治)가 되는데, 공자 이래 유가는 순임금에 의해 꼭 한번 실현되었던 이 무위지치를 이상적인 통치방식으로 찬양해 왔다.
무위지치를 하는 이유는 백성이란 처음엔 먹고 사는 데 급급한 듯하지만, 궁극에 가서는 효제(孝弟)하기를 바라는 선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할 일은 그들에게 처음에는 생계를 도와 주고 나중에는 윤리를 도우는 것이다. 맹자의 민본론(民本論)의 요지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유가가 무위지치를 주장하거나 민본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왕이나 국가의 존재를 필요악 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가의 최고 지향(志向)은 순천(順天)·지천(知天)·낙천(樂天)에 있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의식 속에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인민이 함께 누리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하인민이 함께 누리기로는 국가만한 장소가 없고, 국가야 말로 인륜이 실현될 최적의 장소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국가나 왕의 존재가 필요악 쯤으로 그 의의가 삭감되기는 커녕, 권부의 핵을 이루는 임금과 신하는 만인이 우러러 보는 존재로서 천리(天理)의 운행을 그 몸에서 보여주는 사표로서 높여졌던 것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천명과 덕, 예악지치와 민본사상 가운데 어느 하나도 결여된 이상적인 유가국가를 생각할 수도 결코 없지만 군권(君權)이 무시된 유가사회나 군신윤리가 유기된 유가윤리도 종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추천자료
 [사회복지]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시설의 ...
[사회복지]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시설의 ... [민족주의][한국민족주의][민족주의사상]민족주의의 개념, 한국 민족주의, 동학민족주의, 일...
[민족주의][한국민족주의][민족주의사상]민족주의의 개념, 한국 민족주의, 동학민족주의, 일...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의 문제점, 지방재정제도, 지...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의 문제점, 지방재정제도, 지... 라틴아메리카(중남미)의 개념, 라틴아메리카(중남미)의 지역별 분류, 라틴아메리카(중남미)의...
라틴아메리카(중남미)의 개념, 라틴아메리카(중남미)의 지역별 분류, 라틴아메리카(중남미)의...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개념,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실태,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국가별 현황,...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개념,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실태, 파견근로(파견노동)의 국가별 현황,... 동성애자(동성연애자)의 개념, 역사, 동성애자(동성연애자)의 커밍아웃(아웃팅), 억압정책, ...
동성애자(동성연애자)의 개념, 역사, 동성애자(동성연애자)의 커밍아웃(아웃팅), 억압정책, ...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 개념, 종류,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 공공성, NPO...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 개념, 종류,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 공공성, NPO... 사회복지정책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이념을 사회복지정...
사회복지정책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이념을 사회복지정... K-POP(케이팝)의 프랑스 및 일본 진출사례 (문화산업의 개념과 특징, 강남스타일로 보는 K-PO...
K-POP(케이팝)의 프랑스 및 일본 진출사례 (문화산업의 개념과 특징, 강남스타일로 보는 K-PO... 식량안보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식량 안보 과제와 해결방안 (식량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곡...
식량안보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식량 안보 과제와 해결방안 (식량안보의 개념과 중요성, 곡... [노인장기요양제도 총정리 - 복지 국가론 보고서]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연구 ...
[노인장기요양제도 총정리 - 복지 국가론 보고서]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연구 ...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지방재정의 의의(개념정의), 목적, 특징(특성), 기능, 국가재정과 ...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지방재정의 의의(개념정의), 목적, 특징(특성), 기능, 국가재정과 ...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정당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정당참여 기능(순기능과 역기능...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정당참여의 의의(개념정의)와 필요성, 정당참여 기능(순기능과 역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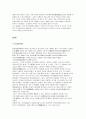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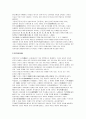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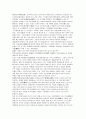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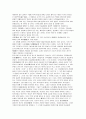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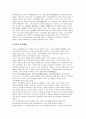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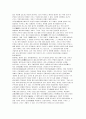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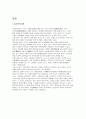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