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택견의 개요.
1. 택견의 정의.
2. 택견의 연원.
3. 택견의 어원.
4. 결련택견.
3. 택견 구성의 요체.
1. 택견경기의 규준.
2. 품밟기의 합목적성.
3. 대접의 규준성.
4. 는질거리기의 호혜성.
4. 결론.
2. 택견의 개요.
1. 택견의 정의.
2. 택견의 연원.
3. 택견의 어원.
4. 결련택견.
3. 택견 구성의 요체.
1. 택견경기의 규준.
2. 품밟기의 합목적성.
3. 대접의 규준성.
4. 는질거리기의 호혜성.
4. 결론.
본문내용
이마재기의 경우 손장심으로 상대방의 이마를 밀어내는데 역시 는지르기로 상대방의 중심을 잃게 하는 기술이다.
송덕기는 택견의 겨루기 기술은 모두 는질러야 하며, 시합에서는 곧은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는질러차기르는 명칭은 편의상 나중에 신한승이 붙인 이름이며, 택견의 모든 발기술이 는질러차기라고 할 수 있다.
\'는질거린다\'는 말은 물크러질 듯이 아주 물러졌다는 뜻이다. 무르다는 것은 연하고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곧 약(弱)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가치로 삼는 무술에 대한 상식으로는 택견의 는질거리는 기법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전(實戰)성을 강조하는 허구적 무술개념으로 택견을 판단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이며, 택견을 무희, 즉 겨루기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는질거리는 기법의 기발(奇拔)성에 감탄하게 된다.
원시적 격투기가 근대적 경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투적인 기술을 경기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다양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점이다. 권투는 솜을 두툼하게 넣은 장갑을 낀 주먹만을 사용하여 허리이상의 신체부위에 대한 때리기만으로 경기를 하고 있으며 씨름, 유도, 레슬링 등은 때리기, 차기를 금하고 잡아 넘기기만으로 승부를 낸다. 일본의 가라데는 인체에 직접 공격을 가하지 못하게 하며, 태권도는 머리, 몸통, 샅을 보호하는 몸가리개를 착용하고 차고 때리기에 의한 점수에 의해 판정을 하고 있다. 우슈는 체조경기와 흡사한 경기규칙을 가지고 있고, 산슈 역시 태권도나 타이복싱과 유사한 시합방식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격투기 경기가 종합적이지 못하고 특정한 기술만의 겨루기로 한정되어 격투기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여,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신종 격투기 경기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잔인성만 가중되었을 뿐 역시 규칙에 의한 제한성은 배제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경기자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서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맨손으로 싸우는 기술이란 원래 전투기술보다는 경기기술이 본질이므로 제한적 기술사용은 맨손 격투기의 원초적 원리인 것이다.
택견은 다른 종목에 비하여 기술의 제한이 덜하며 몸 전체에 대하여 공격이 허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공격기술을 연하고 무르게 전환하고, 급소를 피하고 비교적 신체부위 중에서 안전한 곳을 공격목표로 선택한다. 또한 공격시 사용하는 신체부위는 주먹머리나 손모서리, 발뒤꿈치, 발모서리와 같은 강한 부위대신 손장심, 발등, 발바닥 등의 비교적 부드러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다.(도표 참조)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타격(打擊)을 주는 기술을 금하고 밀쳐내고 걸어 당기는 도괴력(倒壞力)을 발휘하는 기술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택견은 \"차서 쓰러뜨려 승부를 낸다\"는 사전의 해석처럼, 발차기를 주무기로 하고 있지만 넘어뜨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태권도의 타격적 발차기와 운동원리를 달리하는 것이다. 택견의 손기술로는 옛법이라 부르는 주먹쓰기도 있고, 도끼질하듯이 손모서리로 내려찍은 기술도 있지만 경기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주로 손바닥이나 아귀를 이용하여 복장, 어깨, 이마를 밀쳐내는 기술이 발달해 있다. 택견은 발기술, 손기술을 막론하고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는질거린다는 것은 연하고 무르다는 뜻으로 강(强)의 반대개념이기는 하지만, 연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것이요, 무르다는 것은 굳은 물건이 푹 익어서 녹실녹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드러움은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의 절대조건이며, 무른 것은 경직된 심신의 이완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는질거린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기간(氣間)의 변화에 순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신체적.기술적 완숙을 의미하는 것이다. 택견이 춤추는 듯 부드러운 몸짓과 율동적 동작, 우아한 곡선의 동선과 같은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도 는질거리는 기법의 효과 수익인 것이다.
경기자 상호간의 안전을 고려한 는질거리는 택견의 기법은 택견이 상호가해적(相互加害的)이 아니라 호혜적(互惠的)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택견은 방어기술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공격기술로 짜여 있다.
. 택견의 문화재 지정 신청이유(「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 146호, 임 동권, 1982.7)에는 \"相對方의 缺點을 힘 안들이고 勝負를 내는데, 攻擊보다는 守備를 위주로 한 護身術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택견의 수비기술은 발등걸이, 칼재기 등 불과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치고 있으며, 굳이 든다면 품밟기와 활개짓이 수비동작에 포함될 것이다.
이처럼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는 시베리아와 만주대륙을 횡행하던 북방 기마민족적 기질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마족 문화가 부락공동체 의식이 강한 농경문화와 결합되면서 협동과 선린을 존중하는 성격으로 순화(馴化)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견은 경기가 성행하던 동시대의 사회정서가 반영되고 소박한 민중의 시대적 심리현상에 따라 다소의 변모를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무희라는 술어의 의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택견은 힘을 겨루는 경쟁을 즐기고, 그 속에서 가장된 가치를 추구하는 훈련의 축척을 통하여 선린과 우호를 두터이 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여기서는 박투(搏鬪)의 경쟁이 오히려 화합과 단결로 승화하는 것이다.
기 술 명
공 격 부 위
공 격 목 표
전 거
깍 음 대 리
발장심
무릎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 102호
1973.4
조사자 : 예용해
조사대상 : 송덕기
안 짱 걸 이
발둥
발뒤꿈치
안 우 걸 이
발바닥
안복사뼈
낚 시 걸 이
발등
발뒤꿈치
명 치 기
발장심
명치(복장)
곁 치 기
발장심
옆구리
발 따 귀
발바닥
따귀
발 등 걸 이
발바닥
발등
무 릎 팍 치 기
발바닥,무릎
늦은배
내복장 갈기기
발장심
가슴
칼 재 비
웃아귀
목(복장)
- 이 도표는 본래 하나이지만 한글에서 30줄 이상의 표가 지원이 안되므로 전거에 따라서 둘로 나누었음. 옮긴이 주
송덕기는 택견의 겨루기 기술은 모두 는질러야 하며, 시합에서는 곧은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는질러차기르는 명칭은 편의상 나중에 신한승이 붙인 이름이며, 택견의 모든 발기술이 는질러차기라고 할 수 있다.
\'는질거린다\'는 말은 물크러질 듯이 아주 물러졌다는 뜻이다. 무르다는 것은 연하고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곧 약(弱)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가치로 삼는 무술에 대한 상식으로는 택견의 는질거리는 기법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전(實戰)성을 강조하는 허구적 무술개념으로 택견을 판단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이며, 택견을 무희, 즉 겨루기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는질거리는 기법의 기발(奇拔)성에 감탄하게 된다.
원시적 격투기가 근대적 경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투적인 기술을 경기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다양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점이다. 권투는 솜을 두툼하게 넣은 장갑을 낀 주먹만을 사용하여 허리이상의 신체부위에 대한 때리기만으로 경기를 하고 있으며 씨름, 유도, 레슬링 등은 때리기, 차기를 금하고 잡아 넘기기만으로 승부를 낸다. 일본의 가라데는 인체에 직접 공격을 가하지 못하게 하며, 태권도는 머리, 몸통, 샅을 보호하는 몸가리개를 착용하고 차고 때리기에 의한 점수에 의해 판정을 하고 있다. 우슈는 체조경기와 흡사한 경기규칙을 가지고 있고, 산슈 역시 태권도나 타이복싱과 유사한 시합방식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격투기 경기가 종합적이지 못하고 특정한 기술만의 겨루기로 한정되어 격투기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여,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신종 격투기 경기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잔인성만 가중되었을 뿐 역시 규칙에 의한 제한성은 배제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경기자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서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맨손으로 싸우는 기술이란 원래 전투기술보다는 경기기술이 본질이므로 제한적 기술사용은 맨손 격투기의 원초적 원리인 것이다.
택견은 다른 종목에 비하여 기술의 제한이 덜하며 몸 전체에 대하여 공격이 허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공격기술을 연하고 무르게 전환하고, 급소를 피하고 비교적 신체부위 중에서 안전한 곳을 공격목표로 선택한다. 또한 공격시 사용하는 신체부위는 주먹머리나 손모서리, 발뒤꿈치, 발모서리와 같은 강한 부위대신 손장심, 발등, 발바닥 등의 비교적 부드러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다.(도표 참조)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타격(打擊)을 주는 기술을 금하고 밀쳐내고 걸어 당기는 도괴력(倒壞力)을 발휘하는 기술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택견은 \"차서 쓰러뜨려 승부를 낸다\"는 사전의 해석처럼, 발차기를 주무기로 하고 있지만 넘어뜨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태권도의 타격적 발차기와 운동원리를 달리하는 것이다. 택견의 손기술로는 옛법이라 부르는 주먹쓰기도 있고, 도끼질하듯이 손모서리로 내려찍은 기술도 있지만 경기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주로 손바닥이나 아귀를 이용하여 복장, 어깨, 이마를 밀쳐내는 기술이 발달해 있다. 택견은 발기술, 손기술을 막론하고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는질거린다는 것은 연하고 무르다는 뜻으로 강(强)의 반대개념이기는 하지만, 연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것이요, 무르다는 것은 굳은 물건이 푹 익어서 녹실녹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드러움은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의 절대조건이며, 무른 것은 경직된 심신의 이완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는질거린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기간(氣間)의 변화에 순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신체적.기술적 완숙을 의미하는 것이다. 택견이 춤추는 듯 부드러운 몸짓과 율동적 동작, 우아한 곡선의 동선과 같은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도 는질거리는 기법의 효과 수익인 것이다.
경기자 상호간의 안전을 고려한 는질거리는 택견의 기법은 택견이 상호가해적(相互加害的)이 아니라 호혜적(互惠的)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택견은 방어기술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공격기술로 짜여 있다.
. 택견의 문화재 지정 신청이유(「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 146호, 임 동권, 1982.7)에는 \"相對方의 缺點을 힘 안들이고 勝負를 내는데, 攻擊보다는 守備를 위주로 한 護身術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택견의 수비기술은 발등걸이, 칼재기 등 불과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치고 있으며, 굳이 든다면 품밟기와 활개짓이 수비동작에 포함될 것이다.
이처럼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는 시베리아와 만주대륙을 횡행하던 북방 기마민족적 기질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마족 문화가 부락공동체 의식이 강한 농경문화와 결합되면서 협동과 선린을 존중하는 성격으로 순화(馴化)한 것으로 추정된다.
택견은 경기가 성행하던 동시대의 사회정서가 반영되고 소박한 민중의 시대적 심리현상에 따라 다소의 변모를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무희라는 술어의 의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택견은 힘을 겨루는 경쟁을 즐기고, 그 속에서 가장된 가치를 추구하는 훈련의 축척을 통하여 선린과 우호를 두터이 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여기서는 박투(搏鬪)의 경쟁이 오히려 화합과 단결로 승화하는 것이다.
기 술 명
공 격 부 위
공 격 목 표
전 거
깍 음 대 리
발장심
무릎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 102호
1973.4
조사자 : 예용해
조사대상 : 송덕기
안 짱 걸 이
발둥
발뒤꿈치
안 우 걸 이
발바닥
안복사뼈
낚 시 걸 이
발등
발뒤꿈치
명 치 기
발장심
명치(복장)
곁 치 기
발장심
옆구리
발 따 귀
발바닥
따귀
발 등 걸 이
발바닥
발등
무 릎 팍 치 기
발바닥,무릎
늦은배
내복장 갈기기
발장심
가슴
칼 재 비
웃아귀
목(복장)
- 이 도표는 본래 하나이지만 한글에서 30줄 이상의 표가 지원이 안되므로 전거에 따라서 둘로 나누었음. 옮긴이 주
추천자료
 피아제의 인지발달론과 수학과 구성주의적 교수 학습의 원리 및 실제
피아제의 인지발달론과 수학과 구성주의적 교수 학습의 원리 및 실제 스포츠 시설 용구론 택견
스포츠 시설 용구론 택견 [PPT] 한국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호학적 방법론 - 택견의 디지털화
[PPT] 한국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호학적 방법론 - 택견의 디지털화 PLC의 개념및하드웨어구성, 장점과 단점, 작동원리
PLC의 개념및하드웨어구성, 장점과 단점, 작동원리 유아 언어교육 환경구성의 원리, 언어환경 구성요소,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
유아 언어교육 환경구성의 원리, 언어환경 구성요소,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 영아반과 유아반의 영역별 환경 구성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각 영역별 특징, 개념, 교수학습법...
영아반과 유아반의 영역별 환경 구성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각 영역별 특징, 개념, 교수학습법... MRI(Magnetic Resonance Image)에 대한 이해 [MRI, 자기공명, CT, MRI 구성, MRI 원리]
MRI(Magnetic Resonance Image)에 대한 이해 [MRI, 자기공명, CT, MRI 구성, MRI 원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실 실내환경 구성에 대한 사진을 인터넷검색을 통해 스크랩하여 제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실 실내환경 구성에 대한 사진을 인터넷검색을 통해 스크랩하여 제시... 수학활동 영역은 수학학습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의 촉진조건인데 유아 수학교육을 위한 환경구...
수학활동 영역은 수학학습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의 촉진조건인데 유아 수학교육을 위한 환경구... 만5세아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과 방향과 교수 학습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시...
만5세아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과 방향과 교수 학습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시... 보육교사론-만5세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 및 방향과 교수 학습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
보육교사론-만5세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 및 방향과 교수 학습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 [아동환경과 보육]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 실내환경 구성 및 관리의 원리
[아동환경과 보육]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 실내환경 구성 및 관리의 원리 [보육교사론] 만5세 누리과정의 기본구성 및 방향과 교수학습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생...
[보육교사론] 만5세 누리과정의 기본구성 및 방향과 교수학습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생... 표준보육과정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약술하고(개념, 필요성, 기본원리, 성격, 구성 체계 등),...
표준보육과정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약술하고(개념, 필요성, 기본원리, 성격, 구성 체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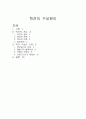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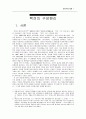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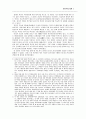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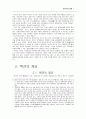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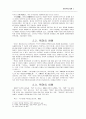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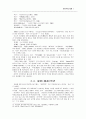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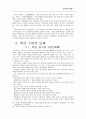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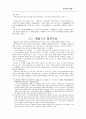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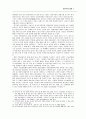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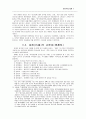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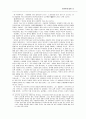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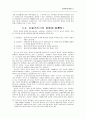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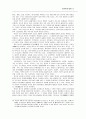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