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윤리를 위한 교정적 비전(Corrected Vision for Medical Ethics)
(종교)윤리학의 역할[The Role of (Religious) Ethics]
신성한 힘으로써의 죽음(Death as Sacral Power)
언약된 직업(A Covenanted Profession)
골치 덩어리: 어려운 문제들(Hard Cases)
(종교)윤리학의 역할[The Role of (Religious) Ethics]
신성한 힘으로써의 죽음(Death as Sacral Power)
언약된 직업(A Covenanted Profession)
골치 덩어리: 어려운 문제들(Hard Cases)
본문내용
(1989: 138).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도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환자의 생김새는 심미적 판단의 추상적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누군가의 얼굴이며 그러므로 자아-현현의 핵심을 잘라버린다. 외래인은 지금 그런 관념을 떠맡고 있다\"(1989: 139-40).
메이가 몸의 심각한 미관손상과 관계하고 있는 경우들을 상당히 초월하여 그 주장을 강조하는 것은 귀찮지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메이가 몸의 의미에 관해서 그 자신의 저술 속에서 종종 표현했던 논지를 훨씬 넘어서지 않았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된다. 그는 이 단행본에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유대 또는 연결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동등하게 형이상학적으로 결정적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 사고, 파괴적인 화재,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좌절, 변경할 수 없으며, 발전적인, 그리고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변형시키는 이동할 수 없는 질병; 그들은 단순히 그것의 가장자리에 생명이라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1989: 141).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자아에 관한 몸의 이런 궁극적 연결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볼 때까지, 우리는 \"일련의 잘못된 가정들\"(series of false assumptions)를 만들어 낸다(1989: 141). 생명 대 생명의 질의 용어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관해 즉시 토론하기 위해 움직인다(자율 대 온정주의). 그러나 만약 이것이 더 이상 똑 같은 생명, 즉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는 개인의 변화된 특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중이라면- 이런 범주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도널드 코우워트가 죽은 지금은 닥스 코우워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책임들을 가지고 있을까 묻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죽음과 새로운 출생의 용어에 관계하여 생각해야만 한다. 메이가 말하듯이, \"만약 그런 사건들 후에 어떤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급격한 재구성에 의존할 것이다\"(1989:142).
그의 시도에 있어서 진부한 주장들로부터 떠나서 자율과 온정주의사이에 싸움을 붙이는 쪽으로 범주들을 옮기는 것은 당황 스럽게 한다. 메이는 본질적으로 자아-창조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로 돌아간다. 그가 저술하는 그런 상황아래 있는 환자들 중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서사를 만든다\"(1989:146). 확실히 우리는 현재의 우리인 그리고 미래의 우리일 사람을 결단하는 결정에 관해 그런 언어의 적절한 자리가 확실히 있다. 아직 그것은 관계와 유대 속의 존재로써의 자아, 신성한 힘에 대한 상호관계에 관해 우리가 메이로부터 기대하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다. 메이는 어버이의 요구 속에서 그리고 온정주의적인 돌봄 속에서, 새로운 탄생처럼 환자를 묘사하는 유비를 거절한다(1989: 148-49). 그러나 그의 분명한 형이상학적 주장은 그럴듯한 유비를 만들어낸다. 왜 여기서 모든 것을 감싸는 온정주의적 돌봄과 결정을 만들어내는 맥락으로부터 분리해서 자기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는 우리가 그런 환자가 죽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물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움이 될까? 우리는 그의 또는 그녀의 특별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환자가 죽도록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지를 질문하는 우리자신을 발견하지 말아야하나? 간단히 말해서, 이런 예에서, 어려운 문제를 더 넓고 더 풍부한 장소 속으로 형성하는 메이의 시도는 만들어져야만 하는 결정들을 설명하는 것이 최종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대제난 다루기\"는 몇몇 완벽한 분별력 있는 충고들을 전해준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회복구를 위한 그리고 장기간의 돌봄 속에서 좀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1989: 145).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결론에 이르도록 메이가 우리에게 제공했던 형이상학적 강한 충격을 거의 요구하지 않았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메이의 노력은 또한 몇몇 덜 강요적인 충고들을 유발시켰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만약 우리가 재구성하기 위하여 그 또는 그녀를 이용하지 않고 외상성 전신마비 희생자의 생명을 단지 보호만 한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생명/죽음/재출생의 언어는 만약 그것이 개인이 단지 살리는 죽음으로써 경험될 수 있는 것의 한 가운데서 개인들의 계속성을 부여했다면, 공동체의 책임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만들어준다\"(1989:145).
한 가지 수준에서, 이런 진술은 명백하게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수준에서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 의무와 다양한 방법들로 도움을 주는 의무와 같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무들 사이의 구별을 무시한다. 비록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거나 요구된 모든 도움을 가져올 수 없을 지라도, 이것은 해를 입히지 안아야할 의무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지 않는다. 아니다, 적어도, 만약 우리가 종교재판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고통을 제거하려고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에 관하여 판단을 이룩해 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생명윤리학에 관해 생각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메이의 저술에 대한 연구에 의해 풍부하게 보상받을 것이다. 그의 지성의 정돈과 보편성, 그리고 그의 저술의 우아함은 이 주제에 대한 동시대의 다른 저술가들과 그를 다르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경우에 대한 12가지 다른 접근의 해석을 위해 그의 작품에 먼저 가지 안을 거라면, 우리는 무엇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을까 에 관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아마도 먼저 그의 작품에 갈 것이고 가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윤리적 비전을 기독교 신학적 통찰들에 의해 개정되고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걸을 잘 배우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외래인인 이야기, 신화, 상징, 의식과 같은 인간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초월과 관계될 때 교정과 변형의 필요에 있지 않은 인간적인 것은 없다.
메이가 몸의 심각한 미관손상과 관계하고 있는 경우들을 상당히 초월하여 그 주장을 강조하는 것은 귀찮지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메이가 몸의 의미에 관해서 그 자신의 저술 속에서 종종 표현했던 논지를 훨씬 넘어서지 않았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된다. 그는 이 단행본에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유대 또는 연결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동등하게 형이상학적으로 결정적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 사고, 파괴적인 화재,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좌절, 변경할 수 없으며, 발전적인, 그리고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변형시키는 이동할 수 없는 질병; 그들은 단순히 그것의 가장자리에 생명이라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1989: 141).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자아에 관한 몸의 이런 궁극적 연결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볼 때까지, 우리는 \"일련의 잘못된 가정들\"(series of false assumptions)를 만들어 낸다(1989: 141). 생명 대 생명의 질의 용어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관해 즉시 토론하기 위해 움직인다(자율 대 온정주의). 그러나 만약 이것이 더 이상 똑 같은 생명, 즉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는 개인의 변화된 특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중이라면- 이런 범주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도널드 코우워트가 죽은 지금은 닥스 코우워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책임들을 가지고 있을까 묻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죽음과 새로운 출생의 용어에 관계하여 생각해야만 한다. 메이가 말하듯이, \"만약 그런 사건들 후에 어떤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급격한 재구성에 의존할 것이다\"(1989:142).
그의 시도에 있어서 진부한 주장들로부터 떠나서 자율과 온정주의사이에 싸움을 붙이는 쪽으로 범주들을 옮기는 것은 당황 스럽게 한다. 메이는 본질적으로 자아-창조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로 돌아간다. 그가 저술하는 그런 상황아래 있는 환자들 중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서사를 만든다\"(1989:146). 확실히 우리는 현재의 우리인 그리고 미래의 우리일 사람을 결단하는 결정에 관해 그런 언어의 적절한 자리가 확실히 있다. 아직 그것은 관계와 유대 속의 존재로써의 자아, 신성한 힘에 대한 상호관계에 관해 우리가 메이로부터 기대하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다. 메이는 어버이의 요구 속에서 그리고 온정주의적인 돌봄 속에서, 새로운 탄생처럼 환자를 묘사하는 유비를 거절한다(1989: 148-49). 그러나 그의 분명한 형이상학적 주장은 그럴듯한 유비를 만들어낸다. 왜 여기서 모든 것을 감싸는 온정주의적 돌봄과 결정을 만들어내는 맥락으로부터 분리해서 자기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는 우리가 그런 환자가 죽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물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결국 그는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움이 될까? 우리는 그의 또는 그녀의 특별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환자가 죽도록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지를 질문하는 우리자신을 발견하지 말아야하나? 간단히 말해서, 이런 예에서, 어려운 문제를 더 넓고 더 풍부한 장소 속으로 형성하는 메이의 시도는 만들어져야만 하는 결정들을 설명하는 것이 최종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대제난 다루기\"는 몇몇 완벽한 분별력 있는 충고들을 전해준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회복구를 위한 그리고 장기간의 돌봄 속에서 좀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1989: 145).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결론에 이르도록 메이가 우리에게 제공했던 형이상학적 강한 충격을 거의 요구하지 않았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메이의 노력은 또한 몇몇 덜 강요적인 충고들을 유발시켰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만약 우리가 재구성하기 위하여 그 또는 그녀를 이용하지 않고 외상성 전신마비 희생자의 생명을 단지 보호만 한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생명/죽음/재출생의 언어는 만약 그것이 개인이 단지 살리는 죽음으로써 경험될 수 있는 것의 한 가운데서 개인들의 계속성을 부여했다면, 공동체의 책임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만들어준다\"(1989:145).
한 가지 수준에서, 이런 진술은 명백하게 사실이다. 그러나 또 다른 수준에서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는 의무와 다양한 방법들로 도움을 주는 의무와 같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무들 사이의 구별을 무시한다. 비록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거나 요구된 모든 도움을 가져올 수 없을 지라도, 이것은 해를 입히지 안아야할 의무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지 않는다. 아니다, 적어도, 만약 우리가 종교재판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고통을 제거하려고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에 관하여 판단을 이룩해 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생명윤리학에 관해 생각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메이의 저술에 대한 연구에 의해 풍부하게 보상받을 것이다. 그의 지성의 정돈과 보편성, 그리고 그의 저술의 우아함은 이 주제에 대한 동시대의 다른 저술가들과 그를 다르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경우에 대한 12가지 다른 접근의 해석을 위해 그의 작품에 먼저 가지 안을 거라면, 우리는 무엇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을까 에 관하여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아마도 먼저 그의 작품에 갈 것이고 가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윤리적 비전을 기독교 신학적 통찰들에 의해 개정되고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걸을 잘 배우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외래인인 이야기, 신화, 상징, 의식과 같은 인간적인 것이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초월과 관계될 때 교정과 변형의 필요에 있지 않은 인간적인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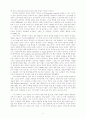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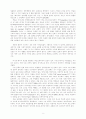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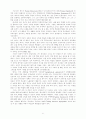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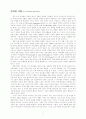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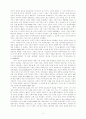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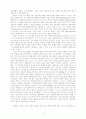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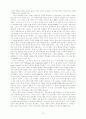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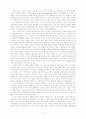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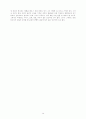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