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도 율법에 충실하려는 쓸데없는 시도 속에서 죄에 지배되고 그것을 번민하는 자로서 바울을 묘사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Krirter Stendahl는 \"바울과 서구의 내성적인(자기 반성적인) 양심\"이라는 그가 쓴 고전 에세이에서, 이러한 하나의 이미지는 어거스틴과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서구신학의 초점이 되어왔던 죄로 둘러싸인 개인적인 양심의 투쟁을 바울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명하게 바울은 자기 반성적인 양심의 유형을 가지고있지 않다.
Stendahl는 유대이즘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숙고하며 율법을 죄의 무거운 짐으로써 암시하는 부분이 없는 빌립보서 3:6의 본문을 지적한다. 바울이 회심 전까지 율법의 열광적인 방어자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바울을 율법에 매이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번민하는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과 모순된다. 바울을 새롭게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분명, 로마서 7:8의 자기 반성적인 내용의 본문이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의 이러한 자서전적인 해석은 의심스럽게 보인다. Sander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서 7장이 행동하는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그의 생애에서 느꼈던 좌절를 보여 준다는 논쟁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7장)이 그러한 방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 7장의 보다 큰 상황은 바울이 율법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율법의 본래적인 선함을 방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롬7:7,13). 죄는 율법이나 그 자신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공허하게 만드는 \"율법\"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이 죄임을 그는 계속해서 보여준다. stendahl가 주목한 것처럼, 바울의 논쟁의 목적은 율법이나 그 자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우주적인 힘을 비판함으로써 그 둘을 면죄시키려는 것이었다.
바울 서신의 보다 폭넓은 상황은 그가 자신의 개인적안 경험의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이전(Pre-christain)사람들의 곤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소급해서 기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 유일한 관점에서부터 왜 율법이 궁극적으로 부적당한지를 신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바울은 그에게 그리스도교의 신앙 안에서 구원을 찾기 위해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버리도록 한 실제적인 개인적 역동성을 기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바울이 인간의 상태에 대한 고민에 찬 분석으로 인한 개종을 추진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유대주의 안에서의 그의 삶은 성공적인 충분히 위임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방인의 상황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후에 우리가 주목할만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우상숭배를하는 이교적인 죄, 그리고 이런 무지로부터 기인된 다른 악덕들(vices)에 대한 그의 전거들은 이방인들에게 끼친 유대주의의 영향에 대한 논거를 축적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운명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교의 방향으로 그를 자극시켰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였고, 우리는 그가 비유대인에 대한 그들의 개방성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바울에게 있어 내지는 그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주의로 개종하는 것은 이방인의 문제에 대한 적당한 해결책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거의 보편주의적 관점에 대한 고통스런 수행 속에서 그의 전통적인 신앙을 버렸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선교신학에 대한 시작점과 기폭제는 그의 그리스도교 이전의 경험이 아니었다.( 율법에 대한 가정된 죄나 비유대인의 운명을 지닌 당혹함도 아니다) 회심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기폭제가 \"밖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본성을 향한 놀라운 통찰을 주었던 종교적인 경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따라서 율법으로부터 분리된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똑같이 \"공평한\"분이시며, 더 나아가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Sanders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해결을 위한 맹세로부터가 아닌 맹세를 위한 해결로터 그의 선교신학을 이해했다. Leander Keck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강요했다. . . . 바울은 그가 비성공적으로 씨름해왔던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그의 신학을 이해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보편적 구원의 조명 아래서, 이것은(신학) 그가 인간문제의 진정한 성격을 분별하는 십자가/부활에 의해 완성되었다.
앞서 우리는 이것이 바울의 시작점이 순수하게 교의적 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한다. 바울신학의 기폭제로서 감소하는 주체적인 죄 또는 인간 환경에 대한 존재론적인 평가는 바울이 보편적인 원리를 열정 없이 바라보는 그리고 추상적인 시작점으로부터 일련의 추론을 계속하는 신학적 수학자를 줄여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보편적 성격에 대한 그의 첫 통찰은 종교적 경험, 즉 그가 숙고한 하나님의 행위(그의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심)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우리가 밑에서 살펴 볼 듯이, 율법의 한계(특히 이방인에 대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하는 구원의 힘에 대한 바울의 더 나아간 결론은 그와 그의 이방인 개종자들의 경험 안에 모든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신학은 보편적인 원리와 결합되지 않는 추상적인 구성이 아니라, 바울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었던 첫 경험에 의해 세워진 실재의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유의 시작점과 바울 신학의 지배적인 주제는 구원론적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대부분의 바울 신학적인 영향은 속죄의 과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함축의 역동성을 다루고 있다.
Stendahl는 유대이즘 속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숙고하며 율법을 죄의 무거운 짐으로써 암시하는 부분이 없는 빌립보서 3:6의 본문을 지적한다. 바울이 회심 전까지 율법의 열광적인 방어자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바울을 율법에 매이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번민하는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과 모순된다. 바울을 새롭게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분명, 로마서 7:8의 자기 반성적인 내용의 본문이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의 이러한 자서전적인 해석은 의심스럽게 보인다. Sander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서 7장이 행동하는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그의 생애에서 느꼈던 좌절를 보여 준다는 논쟁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7장)이 그러한 방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 7장의 보다 큰 상황은 바울이 율법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율법의 본래적인 선함을 방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롬7:7,13). 죄는 율법이나 그 자신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공허하게 만드는 \"율법\"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이 죄임을 그는 계속해서 보여준다. stendahl가 주목한 것처럼, 바울의 논쟁의 목적은 율법이나 그 자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우주적인 힘을 비판함으로써 그 둘을 면죄시키려는 것이었다.
바울 서신의 보다 폭넓은 상황은 그가 자신의 개인적안 경험의 세부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 또는 기독교 이전(Pre-christain)사람들의 곤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소급해서 기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 유일한 관점에서부터 왜 율법이 궁극적으로 부적당한지를 신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바울은 그에게 그리스도교의 신앙 안에서 구원을 찾기 위해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는 존재를 버리도록 한 실제적인 개인적 역동성을 기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바울이 인간의 상태에 대한 고민에 찬 분석으로 인한 개종을 추진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유대주의 안에서의 그의 삶은 성공적인 충분히 위임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방인의 상황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후에 우리가 주목할만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우상숭배를하는 이교적인 죄, 그리고 이런 무지로부터 기인된 다른 악덕들(vices)에 대한 그의 전거들은 이방인들에게 끼친 유대주의의 영향에 대한 논거를 축적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운명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교의 방향으로 그를 자극시켰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였고, 우리는 그가 비유대인에 대한 그들의 개방성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바울에게 있어 내지는 그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주의로 개종하는 것은 이방인의 문제에 대한 적당한 해결책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거의 보편주의적 관점에 대한 고통스런 수행 속에서 그의 전통적인 신앙을 버렸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선교신학에 대한 시작점과 기폭제는 그의 그리스도교 이전의 경험이 아니었다.( 율법에 대한 가정된 죄나 비유대인의 운명을 지닌 당혹함도 아니다) 회심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기폭제가 \"밖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시한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본성을 향한 놀라운 통찰을 주었던 종교적인 경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경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따라서 율법으로부터 분리된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똑같이 \"공평한\"분이시며, 더 나아가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Sanders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해결을 위한 맹세로부터가 아닌 맹세를 위한 해결로터 그의 선교신학을 이해했다. Leander Keck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로 하여금 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강요했다. . . . 바울은 그가 비성공적으로 씨름해왔던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그의 신학을 이해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보편적 구원의 조명 아래서, 이것은(신학) 그가 인간문제의 진정한 성격을 분별하는 십자가/부활에 의해 완성되었다.
앞서 우리는 이것이 바울의 시작점이 순수하게 교의적 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만 한다. 바울신학의 기폭제로서 감소하는 주체적인 죄 또는 인간 환경에 대한 존재론적인 평가는 바울이 보편적인 원리를 열정 없이 바라보는 그리고 추상적인 시작점으로부터 일련의 추론을 계속하는 신학적 수학자를 줄여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보편적 성격에 대한 그의 첫 통찰은 종교적 경험, 즉 그가 숙고한 하나님의 행위(그의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심)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우리가 밑에서 살펴 볼 듯이, 율법의 한계(특히 이방인에 대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하는 구원의 힘에 대한 바울의 더 나아간 결론은 그와 그의 이방인 개종자들의 경험 안에 모든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신학은 보편적인 원리와 결합되지 않는 추상적인 구성이 아니라, 바울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었던 첫 경험에 의해 세워진 실재의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유의 시작점과 바울 신학의 지배적인 주제는 구원론적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대부분의 바울 신학적인 영향은 속죄의 과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함축의 역동성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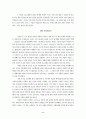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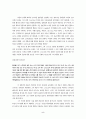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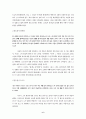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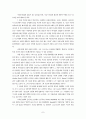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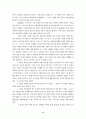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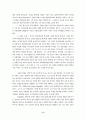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