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팔상도에 나타난 불교의 가르침*
2.도솔래의(두솔래의)와 인도인의 세계관
3.업과 윤회
4.마야의 세계와 성인의 탄생
5.인도인의 시간관
6.하나의 의미
7.싯다르타의 탄생과 출가의 계기
8.사문유관에서 보이는 싯다르타의 삶에 대한 태도
9.고와 쑨야( nya)
10.고의 제거
11.인격의 완성과 출가
2.도솔래의(두솔래의)와 인도인의 세계관
3.업과 윤회
4.마야의 세계와 성인의 탄생
5.인도인의 시간관
6.하나의 의미
7.싯다르타의 탄생과 출가의 계기
8.사문유관에서 보이는 싯다르타의 삶에 대한 태도
9.고와 쑨야( nya)
10.고의 제거
11.인격의 완성과 출가
본문내용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매순간마다 그 어떤 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무도 내 인생 허깨비 같은 거니까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라다의 입장에 따르면 그게 물거품이니 그냥 치지도외(置之度外)해야 할 것이다. A하고 B하고 만났을 적에 뭐 우리 그림자끼리 만났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사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마야바다와 순야바다의 차이이다. 마야가 물거품이라면 순야는 무엇인가? 제로이다. 제로는 모든 수의 출발이면서 모든 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어느 순간에 뭔지 모르지만 어떤 현상을 이런 식으로다가 부풀려 놓은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모두 다 어떤 체험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부풀려 놓고 또 이렇게 부풀려 놓고 증폭해 놓은 것이다.
苦의 제거
보통 불교 철학자들은 고에 대한 부처님의 처방의 비법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고통을 제거해야만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한생각 바꾸어 고통이 고통인 줄을 깨닫게 되면 고통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예 고와 고멸(苦滅)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후대의 철학자들은 부처님의 애초 이야기를 가지고서 몇까지 조작을 통해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 크게 얘기해서 소위 실재론적인 철학, 관념론적인 철학, 그리고 이것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소위 선적인 방법까지 해서 몇 가지 상이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
흔히 무명(無明)은 깨뜨려야 한다고 말한다. 무명이란 말에서 연상되는 것은 \\\'어둡다\\\', \\\'깜깜한 흑암 절벽이다\\\'라는 이미지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시커먼 숫검뎅이 같은 것이라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말끔히 없애 버리면, 혹은 앞을 막고 있는 시커먼 장막 같은 것이라면 찢어발기고 해쳐 나가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겠다. 여기에서 \\\'어둡다\\\', \\\'깜깜하다\\\'라고 표현된 무명 자체를 만약 바깥에 있는 그 어떤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을 없애 버려야 한다라는 식의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소위 실재론자들인데, 무명 자체가 대상으로 실재한다고 믿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철학체계, 수행체계를 끌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흔히 소승불교(小乘佛敎)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다 하는 부류가 바로 그런 쪽에 해당한다. 설일체유부에서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삼세실유 법체항유(三世實有 法 恒有)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법체(法 )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체라고 할 때 법(法)이란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뜻한다. 그 사람들은, 마치 원소주기율표에서처럼, 법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분류를 해서 75가지 혹은 100가지로 나누었다. 만약 그런 법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눌 수 있다면, 수행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실재론적인 철학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효 스님을 떠올려 보자. 그는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깨쳤다고 한다. 갈증이 나서 뭔가를 들이켰는데, 당시에는 내 몸을 축이는 생명수였을 것이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는 구역질이 났다고 한다. 사실 똑같은 물이다. 물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는가? 마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어떤 마음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여지고, 다른 방식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 삼계유심조(三界唯心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좋은 세상도 되고 나쁜 세상도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떠한 처방이 나오겠는가? 마음 자체를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관념론이니 유심론이니 하는 철학이 된다.
나중에 유식철학에 오면 100가지로 법의 체계를 세우게 된다. 그런데 마음이건 객관적인 대상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인 것이다.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가? 똥파리는 더럽고 초파리는 깨끗한가? 짚신벌레는 마치 짚신을 신듯이 밟아 죽여도 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 높여야 되는 것인가? 한생각 돌이켜 보면, 이런 식의 구분은 우리가 어떤 등급을 매기고 값을 매겼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 자신이 설정한 구분을 떠나게 되면, 초파리는 초파리가 되고, 똥파리는 똥파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똥푸는 사람은 똥푸는 사람대로, 밥푸는 사람은 밥푸는 사람대로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임의적인 구분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을 \\\'여여(如如)하게 본다\\\' 느니 \\\'마음을 비우고 본다\\\' 느니 한다. 스님네들이 \\\'무심(無心)하라\\\' 그러는데, 선가(禪家)에서 얘기하는 무심지교(無心之敎)가 바로 이것이다. 과거 2,500년 동안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오늘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 대한 석가모니의 기본적인 통찰로부터 나온 불교의 철학 체계는 요약컨대 이런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다.
인격의 완성과 출가
불교의 4대 성지라고 하면, 아마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깨치고, 처음으로 법을 설하고, 입멸(入滅)한 장소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네 장소는 모두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팔상도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성숙을 해서 소위 완전한 인격자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석가모니의 일생을 소재로 해서 여덟 가지 단계로 도식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팔상도란, 성은 고타마요, 이름은 싯다르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물이 도를 이루고 깨친 사람(붓다), 석가족의 성자(석가모니)가 되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말이다.
위에서 언급한 팔상도의 사문유관(四門遊觀) 부분을 놓고 한 번 얘기를 전개해 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소위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뭔지 모르고 천둥벌거숭이로 온갖
苦의 제거
보통 불교 철학자들은 고에 대한 부처님의 처방의 비법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고통을 제거해야만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한생각 바꾸어 고통이 고통인 줄을 깨닫게 되면 고통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예 고와 고멸(苦滅)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후대의 철학자들은 부처님의 애초 이야기를 가지고서 몇까지 조작을 통해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 크게 얘기해서 소위 실재론적인 철학, 관념론적인 철학, 그리고 이것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소위 선적인 방법까지 해서 몇 가지 상이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
흔히 무명(無明)은 깨뜨려야 한다고 말한다. 무명이란 말에서 연상되는 것은 \\\'어둡다\\\', \\\'깜깜한 흑암 절벽이다\\\'라는 이미지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시커먼 숫검뎅이 같은 것이라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말끔히 없애 버리면, 혹은 앞을 막고 있는 시커먼 장막 같은 것이라면 찢어발기고 해쳐 나가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겠다. 여기에서 \\\'어둡다\\\', \\\'깜깜하다\\\'라고 표현된 무명 자체를 만약 바깥에 있는 그 어떤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을 없애 버려야 한다라는 식의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소위 실재론자들인데, 무명 자체가 대상으로 실재한다고 믿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철학체계, 수행체계를 끌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흔히 소승불교(小乘佛敎)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다 하는 부류가 바로 그런 쪽에 해당한다. 설일체유부에서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삼세실유 법체항유(三世實有 法 恒有)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법체(法 )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체라고 할 때 법(法)이란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뜻한다. 그 사람들은, 마치 원소주기율표에서처럼, 법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분류를 해서 75가지 혹은 100가지로 나누었다. 만약 그런 법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눌 수 있다면, 수행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실재론적인 철학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효 스님을 떠올려 보자. 그는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깨쳤다고 한다. 갈증이 나서 뭔가를 들이켰는데, 당시에는 내 몸을 축이는 생명수였을 것이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는 구역질이 났다고 한다. 사실 똑같은 물이다. 물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는가? 마음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어떤 마음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여지고, 다른 방식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 삼계유심조(三界唯心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말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좋은 세상도 되고 나쁜 세상도 된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떠한 처방이 나오겠는가? 마음 자체를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관념론이니 유심론이니 하는 철학이 된다.
나중에 유식철학에 오면 100가지로 법의 체계를 세우게 된다. 그런데 마음이건 객관적인 대상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인 것이다.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가? 똥파리는 더럽고 초파리는 깨끗한가? 짚신벌레는 마치 짚신을 신듯이 밟아 죽여도 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 높여야 되는 것인가? 한생각 돌이켜 보면, 이런 식의 구분은 우리가 어떤 등급을 매기고 값을 매겼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 자신이 설정한 구분을 떠나게 되면, 초파리는 초파리가 되고, 똥파리는 똥파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똥푸는 사람은 똥푸는 사람대로, 밥푸는 사람은 밥푸는 사람대로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임의적인 구분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을 \\\'여여(如如)하게 본다\\\' 느니 \\\'마음을 비우고 본다\\\' 느니 한다. 스님네들이 \\\'무심(無心)하라\\\' 그러는데, 선가(禪家)에서 얘기하는 무심지교(無心之敎)가 바로 이것이다. 과거 2,500년 동안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오늘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 대한 석가모니의 기본적인 통찰로부터 나온 불교의 철학 체계는 요약컨대 이런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다.
인격의 완성과 출가
불교의 4대 성지라고 하면, 아마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깨치고, 처음으로 법을 설하고, 입멸(入滅)한 장소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네 장소는 모두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팔상도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성숙을 해서 소위 완전한 인격자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석가모니의 일생을 소재로 해서 여덟 가지 단계로 도식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팔상도란, 성은 고타마요, 이름은 싯다르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물이 도를 이루고 깨친 사람(붓다), 석가족의 성자(석가모니)가 되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말이다.
위에서 언급한 팔상도의 사문유관(四門遊觀) 부분을 놓고 한 번 얘기를 전개해 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소위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뭔지 모르고 천둥벌거숭이로 온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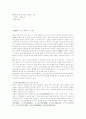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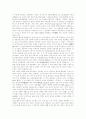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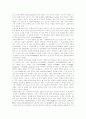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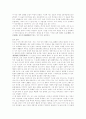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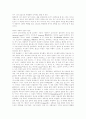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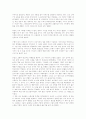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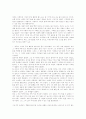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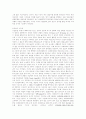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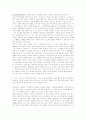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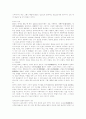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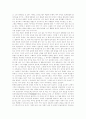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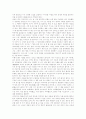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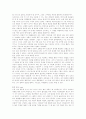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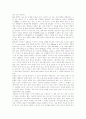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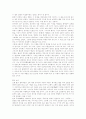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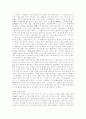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