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중문화 속의 예술과 사상>
Ⅰ. 서두
Ⅱ. 본문
1.「환상은 이성의 힘을 의심하는 시대의 신화」
2. 일상의 문화를 둘러싼 추문
Ⅰ. 서두
Ⅱ. 본문
1.「환상은 이성의 힘을 의심하는 시대의 신화」
2. 일상의 문화를 둘러싼 추문
본문내용
노래하고 지하보도나 백화점 보행 통로에 주저앉는 게 아이들이다. 가난한 젊은이들은 유흥가 대신 작은 공원에서 데이트하고 길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한다. 그건 \'정처 없는\' 홈리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공간에 대해서만은 탁월하게 앞선 인식이기도 하다.
\'길바닥\' 현상은 실업률 높고 돈 없지만 노동 외 시간은 많아지는 후기 산업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보이는 당연한 징후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이다. 이제야 우리 아이들은 환경 탓하지 않고, 국가나 시장에 거는 기대 다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공간 쓰는 방법을 간파한 것이다. 그것은 눈의 훈련이고, 따라서 새로운 문화이다. 도시 미화를 원하는 눈으로는 노점상을 찡그리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빈 공간을, 노점상이 가진 생계 해결의 눈으로는 찾아낼 수 있는 것과 같다.
(4) 거리를 점거하는 것은 어른들 무시하면서 \'알아서 노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알아서 문턱을 넘고 어른들에게 요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미 있는 문화 공간에 싸워서 비집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알아서 따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식들도 추운 거리에 내몰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젊은 문화인들은 <광화문 국립중앙 박물관>이나 <예술의 전당>, <서울시 청소년 센터>로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직도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지난 수십 년간 어른들이 번듯한 공간을 지어주었지만 안에서 기똥찬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관광 지도에는 아이들이 장판을 펴놓고 춤추는 대학로가 <세종문화 홀>보다는 일순위로 올라간다. 이것이 과연 어른들이 바랐던 뜻일까.
이제 원하는 이에게 작은 공간을 나눠주고 스스로 운영하게 만드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지방 자치를 알 법도 하건만. 위에서 만들고 그 공간에 올 사람들 제한하는 법이 여전하다. 이 세대가 다 크고, 가난한 자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주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어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간이 많아질수록 심판은 다가온다
이 글은 요즘 문화 공간 부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꼭 사회에 세워져 있는 토대,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즐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고정관념을 벗어 날수 있다고 하는 막스주의와 구조주의를 지양하는 문화주의가 나타나 있다.
이상 세 가지 글에 대해 이론적 베이스를 살펴보았다. 살아오면서 제대로 한 번 읽어보지도, 설사 읽어 봤다고 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화에 대한 비평, 비판 이번 기회에 미흡하나마 몇 개 읽어보았지만,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이론으로 이야기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느끼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미흡하나마 나의 생각을 적어본다...물론 이런 나의 생각도 어느 이론이 깔려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게 과연 우리 대중문화 속의 예술과 사상 강의 첫시간에 말한 삶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는지도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이제 종강이 될 즈음 마지막으로 한 학기 수업에 대한 나의 의견도 외람되게 붙여보았다.
< 이상 >
★ 참고문헌
1. 신화와 판타지-해방의 출구인가, 억압의 장인가(1)
http://www.hanter21.co.kr/community/expertView.hcl?brdno=226&pageno=0&seq=&ino=35&seq=6&lno=5
2. 일상의 문화를 둘러싼 추문
http://www.hanter21.co.kr/community/expertView.hcl?brdno=292&ino=32&lno=32
3. 눈 씻고 봐라, 문화 공간이 많다
http://www.gaseum.co.kr/1-2/culture/current.htm
\'길바닥\' 현상은 실업률 높고 돈 없지만 노동 외 시간은 많아지는 후기 산업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보이는 당연한 징후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이다. 이제야 우리 아이들은 환경 탓하지 않고, 국가나 시장에 거는 기대 다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공간 쓰는 방법을 간파한 것이다. 그것은 눈의 훈련이고, 따라서 새로운 문화이다. 도시 미화를 원하는 눈으로는 노점상을 찡그리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빈 공간을, 노점상이 가진 생계 해결의 눈으로는 찾아낼 수 있는 것과 같다.
(4) 거리를 점거하는 것은 어른들 무시하면서 \'알아서 노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알아서 문턱을 넘고 어른들에게 요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미 있는 문화 공간에 싸워서 비집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알아서 따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식들도 추운 거리에 내몰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젊은 문화인들은 <광화문 국립중앙 박물관>이나 <예술의 전당>, <서울시 청소년 센터>로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직도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지난 수십 년간 어른들이 번듯한 공간을 지어주었지만 안에서 기똥찬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관광 지도에는 아이들이 장판을 펴놓고 춤추는 대학로가 <세종문화 홀>보다는 일순위로 올라간다. 이것이 과연 어른들이 바랐던 뜻일까.
이제 원하는 이에게 작은 공간을 나눠주고 스스로 운영하게 만드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지방 자치를 알 법도 하건만. 위에서 만들고 그 공간에 올 사람들 제한하는 법이 여전하다. 이 세대가 다 크고, 가난한 자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주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어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간이 많아질수록 심판은 다가온다
이 글은 요즘 문화 공간 부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꼭 사회에 세워져 있는 토대,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즐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고정관념을 벗어 날수 있다고 하는 막스주의와 구조주의를 지양하는 문화주의가 나타나 있다.
이상 세 가지 글에 대해 이론적 베이스를 살펴보았다. 살아오면서 제대로 한 번 읽어보지도, 설사 읽어 봤다고 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화에 대한 비평, 비판 이번 기회에 미흡하나마 몇 개 읽어보았지만, 대중문화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이론으로 이야기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느끼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미흡하나마 나의 생각을 적어본다...물론 이런 나의 생각도 어느 이론이 깔려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는게 과연 우리 대중문화 속의 예술과 사상 강의 첫시간에 말한 삶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는지도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이제 종강이 될 즈음 마지막으로 한 학기 수업에 대한 나의 의견도 외람되게 붙여보았다.
< 이상 >
★ 참고문헌
1. 신화와 판타지-해방의 출구인가, 억압의 장인가(1)
http://www.hanter21.co.kr/community/expertView.hcl?brdno=226&pageno=0&seq=&ino=35&seq=6&lno=5
2. 일상의 문화를 둘러싼 추문
http://www.hanter21.co.kr/community/expertView.hcl?brdno=292&ino=32&lno=32
3. 눈 씻고 봐라, 문화 공간이 많다
http://www.gaseum.co.kr/1-2/culture/current.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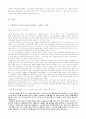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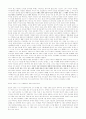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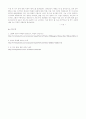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