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읍제국가
2) 은대에 있어서 왕과 여러 씨족과의 관계
3) 은대에 있어서의 왕권의 성격
4) 서주시대에 있어서 왕과 제후와의 관계
2) 은대에 있어서 왕과 여러 씨족과의 관계
3) 은대에 있어서의 왕권의 성격
4) 서주시대에 있어서 왕과 제후와의 관계
본문내용
의 일환이라하여 이것에 연결된 일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자작기에서의 이소실의 의미를 주실 예례에서의 이탈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은대에 있어서의, 왕과 복속제씨족과의 사이에서 불 수 있는 관계와 어떤 형태에서 서로 다른지가 문제되고 있다.
그것에서 상기해야 할 것은 은대의 소위 종법의 문제이다. 종법의 이해에 관하여는 고래 매우 이설이 많고 이곳에서 그것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통상 주대의 봉건제에 성립한 적장자 상속제도에 기초를 두어(同性親族)의 조직이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대대의 주대는 모두 적장자가 부위를 계승하고 시조를 봉하고 대종이 된다. 적장자의 諸庶弟은 소종이라 하고 제후가 된다. 대대의 제후도 또 적장자가 부위을 계승하고 시조를 봉하여 국내에 두고는 대종이 된다. 거듭 저 諸弟을 임명하고 소종이라 하여 경대부에 임명하였다. 그것은 경대부이하 사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것이라 한다. 즉 대종인 주왕을 중심을 하여 말단까지 저 형제부터 가지를 나누었다라는 의미를 두고 주실을 중핵이라 하여 적층적인 국가지배의 질서가 상속법에 기초하여 관철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 관련되는 통속관계가 서주기에 확립되고 있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우도목장씨와 전수할 수 있는 서주제국의 제후의 계보의 분석에서 일견 그 종법적 상속법을 갖고 있었는지와 같지 않아도 춘추전국기에 있었서의 각국의 특색있는 상속법에서 유추한다면 이것이 결코 전체의 형태는 실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춘추전국의 경우보다 성한 종법적 예론에 의거한 작위에 있고, 단 타인보다 비교적 양세한 계도를 잔국인 노·초의 경우에는 분명히 독자의 비종법적 계승법을 볼 수 있다. 이쯤에서는 대강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에서 있었던 일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서주왕실의 계도을 보면 그림3과 같이 있다. 그것에 기초하여 <<사기>> 주본기의 기술을 믿는다고 하면 일일세대 일이왕에 걸친 세계중 유일한 형제상속인 효왕의 경우를 제외한다. 대부분 종법에 기초한 계승법을 볼 수 있다. 한편 효왕의 경우도 ?왕의 후를 숙부효왕이 계승한다. 후를 다시 ?왕의 태자가 계승하고 있는 일에서 본다면 은대세계중기에 다수 볼 수 있는 소위 형제상속이라는 유와는 다르게 종법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하면 적당할 것이다. 이 일에서 보면 서주기에 있어서 종법은 소종집단의 내부에는 미치고 있다. 각국에서 족제에 기초한 상속법이 행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왕실에 서는 대종의 상속법이 이미 확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어째서 주의 왕통에 있어서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은의 왕통과 비교해 보면 제사지냄에 현저한 차이가 보이고 더구나 서주기에 그것이 단에 주왕실의 계승법이 보였던 바로 그것이 주왕실(다시 말하여 종주)의 정치지배이념이었으므로 이런 불가분에서 시작한 것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제사 왕과 제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은 제후가 어느 왕의 부족에 있는지가 명시되고 있는 점이다. 은대를 제외하고는 전술하였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왕과 여러 족장들의 기본적 관계는 그 문에 설정되는 의례적 형제관계이다. 여러 족장은 왕을 선왕의 아들로서 믿는다는 것부터가 왕립의 계승정도도 개작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왕과 친족의 아들로써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은대를 제외하고는 제후가 어떤 왕의 부족에 있었는지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이념되고 있는 왕실과 제후의 문의 혈연관계는 시대의 ?거들에 소원한 것이라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서주왕실의 기본적인 지배이념이 혈연관념을 기초로 하는 이상 가장 중핵이 되는 것은 왕통의 적장자 상속 형태의 준수를 위한 노력인 것은 당연하다. 다시말해 시대들에 속박이 되는 제후나 종법에도 오래 전부터 혈연관념의 존속을 구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진다. 전술한 것처럼 소위 주금문을 제외하고 주와의 상사·책명을 받들기 위함에 제후에 의존하여 제작하는 청동기는 제후자신의 부조를 제사지내기 위한 ?기로써 만드는 사장은 틀림없이 그것에 있다. 이 용기는 주왕측에서 있는 요청을 읽는 일에 의해 처음 그 의의를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명말에 상?구에 『자자손손 영구히 그것을 사용하시오.』 라 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에 의하여가 아닌가 한다. 더구나 서주말기에서 현제에 이르는 주실의 지배체제를, 혼잡하였던 제후들에 의존하였던, 자작기의 자기 부조의 이름이 소멸하고 있던 이유도 아직 그것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은대 이외에 왕실은 기층을 이룬 제족의 연합체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은 같지만 복잡한 것이 있었다. 원래 독립적인 다수의 읍제국가는 연합시켜 왕조를 구성하고 제사는 불가결한 형태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읍락제국가군의 등에서 성장하였던 은에 교체는 서주왕조 이외에도 왕실의 구조와 다른 것이 있다. 그 왕의 계승법에 단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적장자에 기인한 상속은 일선적인 왕통에 의존하는 지배체제을 이념으로 하는 것에서 나왔다. 무엇보다도 현실에는 그 복속제후의 각읍제국가내부 외에는 옛날에 족제가 그 생각대로 특수하고 왕조의 본체의 침투을 저격하고 힘을 작용하는 것에서 있지만 그것도 모두 왕과 제후을 결합시키는 이념이라 하였던 종법개념이 주대에 걸쳐 국가지배체제의 기본적 질서가 성립하였고 주왕측의 요청하며 그 질서의 읍락국가내부에의 침투과 존속이 기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미에은 근년의 연구에 보인 부정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왕국잡민의 은주?왕조의 국가제도의 차이을 강조하고 저 고전적 견해도 아직 고치고 재고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 아직 이 문제은 서주기에 들어와서 와을 천자라고 보는 관념이 급속히 성립하고 있는 것도 무관계에는 없는 것에 있다.
이 기반에 서주시대에는 은대라는 구조적인 차이를 왕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본 것처럼 서주후기이후 특히 필연적이기까지 하였다고 말하는 것에서이다. 그 주실의 예제에서, 난잡히 또 서서히 자립하고 있던 제후에 의존해 춘추시대 이후의 새로워진 전개가 나타나고 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은대에 있어서의, 왕과 복속제씨족과의 사이에서 불 수 있는 관계와 어떤 형태에서 서로 다른지가 문제되고 있다.
그것에서 상기해야 할 것은 은대의 소위 종법의 문제이다. 종법의 이해에 관하여는 고래 매우 이설이 많고 이곳에서 그것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통상 주대의 봉건제에 성립한 적장자 상속제도에 기초를 두어(同性親族)의 조직이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대대의 주대는 모두 적장자가 부위를 계승하고 시조를 봉하고 대종이 된다. 적장자의 諸庶弟은 소종이라 하고 제후가 된다. 대대의 제후도 또 적장자가 부위을 계승하고 시조를 봉하여 국내에 두고는 대종이 된다. 거듭 저 諸弟을 임명하고 소종이라 하여 경대부에 임명하였다. 그것은 경대부이하 사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것이라 한다. 즉 대종인 주왕을 중심을 하여 말단까지 저 형제부터 가지를 나누었다라는 의미를 두고 주실을 중핵이라 하여 적층적인 국가지배의 질서가 상속법에 기초하여 관철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 관련되는 통속관계가 서주기에 확립되고 있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우도목장씨와 전수할 수 있는 서주제국의 제후의 계보의 분석에서 일견 그 종법적 상속법을 갖고 있었는지와 같지 않아도 춘추전국기에 있었서의 각국의 특색있는 상속법에서 유추한다면 이것이 결코 전체의 형태는 실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춘추전국의 경우보다 성한 종법적 예론에 의거한 작위에 있고, 단 타인보다 비교적 양세한 계도를 잔국인 노·초의 경우에는 분명히 독자의 비종법적 계승법을 볼 수 있다. 이쯤에서는 대강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에서 있었던 일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서주왕실의 계도을 보면 그림3과 같이 있다. 그것에 기초하여 <<사기>> 주본기의 기술을 믿는다고 하면 일일세대 일이왕에 걸친 세계중 유일한 형제상속인 효왕의 경우를 제외한다. 대부분 종법에 기초한 계승법을 볼 수 있다. 한편 효왕의 경우도 ?왕의 후를 숙부효왕이 계승한다. 후를 다시 ?왕의 태자가 계승하고 있는 일에서 본다면 은대세계중기에 다수 볼 수 있는 소위 형제상속이라는 유와는 다르게 종법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하면 적당할 것이다. 이 일에서 보면 서주기에 있어서 종법은 소종집단의 내부에는 미치고 있다. 각국에서 족제에 기초한 상속법이 행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왕실에 서는 대종의 상속법이 이미 확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어째서 주의 왕통에 있어서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은의 왕통과 비교해 보면 제사지냄에 현저한 차이가 보이고 더구나 서주기에 그것이 단에 주왕실의 계승법이 보였던 바로 그것이 주왕실(다시 말하여 종주)의 정치지배이념이었으므로 이런 불가분에서 시작한 것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제사 왕과 제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은 제후가 어느 왕의 부족에 있는지가 명시되고 있는 점이다. 은대를 제외하고는 전술하였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왕과 여러 족장들의 기본적 관계는 그 문에 설정되는 의례적 형제관계이다. 여러 족장은 왕을 선왕의 아들로서 믿는다는 것부터가 왕립의 계승정도도 개작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왕과 친족의 아들로써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은대를 제외하고는 제후가 어떤 왕의 부족에 있었는지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이념되고 있는 왕실과 제후의 문의 혈연관계는 시대의 ?거들에 소원한 것이라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서주왕실의 기본적인 지배이념이 혈연관념을 기초로 하는 이상 가장 중핵이 되는 것은 왕통의 적장자 상속 형태의 준수를 위한 노력인 것은 당연하다. 다시말해 시대들에 속박이 되는 제후나 종법에도 오래 전부터 혈연관념의 존속을 구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진다. 전술한 것처럼 소위 주금문을 제외하고 주와의 상사·책명을 받들기 위함에 제후에 의존하여 제작하는 청동기는 제후자신의 부조를 제사지내기 위한 ?기로써 만드는 사장은 틀림없이 그것에 있다. 이 용기는 주왕측에서 있는 요청을 읽는 일에 의해 처음 그 의의를 납득할 수 있다. 그리고 명말에 상?구에 『자자손손 영구히 그것을 사용하시오.』 라 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에 의하여가 아닌가 한다. 더구나 서주말기에서 현제에 이르는 주실의 지배체제를, 혼잡하였던 제후들에 의존하였던, 자작기의 자기 부조의 이름이 소멸하고 있던 이유도 아직 그것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은대 이외에 왕실은 기층을 이룬 제족의 연합체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은 같지만 복잡한 것이 있었다. 원래 독립적인 다수의 읍제국가는 연합시켜 왕조를 구성하고 제사는 불가결한 형태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읍락제국가군의 등에서 성장하였던 은에 교체는 서주왕조 이외에도 왕실의 구조와 다른 것이 있다. 그 왕의 계승법에 단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적장자에 기인한 상속은 일선적인 왕통에 의존하는 지배체제을 이념으로 하는 것에서 나왔다. 무엇보다도 현실에는 그 복속제후의 각읍제국가내부 외에는 옛날에 족제가 그 생각대로 특수하고 왕조의 본체의 침투을 저격하고 힘을 작용하는 것에서 있지만 그것도 모두 왕과 제후을 결합시키는 이념이라 하였던 종법개념이 주대에 걸쳐 국가지배체제의 기본적 질서가 성립하였고 주왕측의 요청하며 그 질서의 읍락국가내부에의 침투과 존속이 기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미에은 근년의 연구에 보인 부정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왕국잡민의 은주?왕조의 국가제도의 차이을 강조하고 저 고전적 견해도 아직 고치고 재고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 아직 이 문제은 서주기에 들어와서 와을 천자라고 보는 관념이 급속히 성립하고 있는 것도 무관계에는 없는 것에 있다.
이 기반에 서주시대에는 은대라는 구조적인 차이를 왕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본 것처럼 서주후기이후 특히 필연적이기까지 하였다고 말하는 것에서이다. 그 주실의 예제에서, 난잡히 또 서서히 자립하고 있던 제후에 의존해 춘추시대 이후의 새로워진 전개가 나타나고 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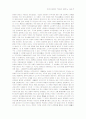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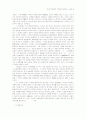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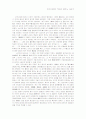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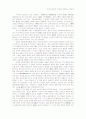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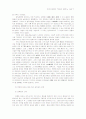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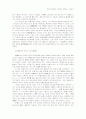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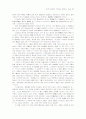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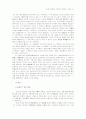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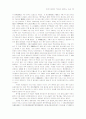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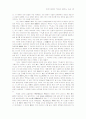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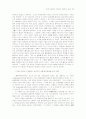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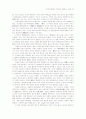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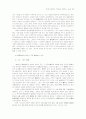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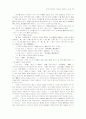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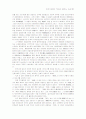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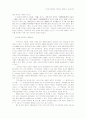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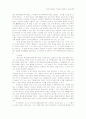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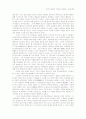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