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문과 교육의 교과서
3. 교과서 심의제도와 한문교과서
3-1. 교과서 심의와 한문교과서
3-2. 교과서 정책의 문제
4. `한문교과서`의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4-1. `1,800자`와 한문교과서 내용
4-2. 성취기준 규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1,800자`
5. 맺는 말
2. 한문과 교육의 교과서
3. 교과서 심의제도와 한문교과서
3-1. 교과서 심의와 한문교과서
3-2. 교과서 정책의 문제
4. `한문교과서`의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4-1. `1,800자`와 한문교과서 내용
4-2. 성취기준 규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1,800자`
5. 맺는 말
본문내용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子㉤/爲㉦ .父子㉤/有㉦ .菊㉤/似
.滄海㉤/化㉦ .桑田㉤/成㉦
.其臺㉤/曰㉦ .吾㉤/必以㉦ .仲子㉤/爲㉦
.軍㉤/至 .靑㉤/出㉦
.堯㉤/讓㉦
.新羅崔伉字㉤/石南㉦
.父母㉤/禁㉦
.伉㉤/暴死㉦
.都人士女㉤/競 ㉦
.孝悌, 而好犯上者㉤/鮮矣㉦
문장 성분으로 보면 주어지만 품사로 보면 명사류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명사류는 두가지가 있는데 서술어 앞에 쓰이는 주어의 명사류와 서술어 뒤에 오는 명사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어(단독 서술어이거나 아니건 간에) 앞에 쓰이는 확실한 주어들을 제외하면, 서술어 뒤에 쓰이는 명사성의 단어들은 기존의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목적어, 보어, 부사어로 번거롭게 분류하느니 보다 아예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이라면 \'명사어\'라고 하고자 한다. \'명사어\'라고 이름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용어는 우리가 늘 쓰는 품사로서의 용어였기 때문에 귀에 익숙하다. 둘째, 한문문장에서 서술어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명사구, 명사절 등이므로 이들을 모두 묶어서 명사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것이 한문 자체의 특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번역 이후에 명사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번역 이후의 문제이지 실은 한문 고유 문장의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문장구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술구조(주어 + 술어)
) 본고에서 \'+\'\'/\'는 짜임의 부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품사와 품사, 성분과 성분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일 뿐이다.
. 山/高 . 惠公元妃/孟子
② 술명구조(술어 + 명사어)
. 無/病 . 登/校 .入/學
. 事/君 . 絶/長 .守/株, 待/兎
③ 수식구조(관형어 + 명사어, 부사어 + 술어)
. 五/更 . 春/風 . 秋/月
④ 명술구조(명사어 + 술어)
④의 경우는 언뜻 이해가 안갈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④는 의문문의 경우나 도치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先生將何之(선생님께서는 장차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서 何는 의문 대명사로 명사어이고, 之는 동사로서 서술어이다. 앞서 언급한 술명구조로 문장을 구성하면 何之가 之何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의문대명사 즉 명사어가 앞으로 간다. (學何所至與:학문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느냐?) 이러한 관습은 영어에서도 의문대명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
번역상 차이에 대해서는 \'∼가(이)\'의 주격조사가 붙는 것, \'∼에, 에게, 보다, 에게서\' 등의 부사격조사가 붙는 것, \'∼을(를)\'등의 목적격조사가 붙는 것 등을 세분화시킨 후, 이를 적용하여 술어 뒤에 오는 명사어를 \'주격 명사어, 목적격 명사어, 부사격 명사어\'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은 간단해야 한다. 간단하게 만들려면 번역 이후에 세부적인 차이점은 있더라도 원문의 공통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명사어라는 말 앞에 수식어(주격, 목적격, 부사격)를 사용한 구분은 번역 이후의 문법 분류로 이전에 겪었던 오류를 다시 저지르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런 세분화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위의 글은 제안에 불과하다.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혼란을 가중할 소지도 많다. 다만 이 전의 것을 개선해보자는 의도에서 제안해 본 것이다. 많은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형용사와 명사의 서술어로서의 기능> <보어의 문제> 말고도 재고해야 할 것들이 많다. \'한자어의 짜임\'을 도식화 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의 문제, 허사로 취급되면서도 실사 구실을 하는 \'以\' \'於\' 등 모두 새로운 정의나 정리를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이들에 대한 빠른 정리가 요구된다.
문법이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규칙적인 법칙이다. 문법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문장을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이 학생과 교사에게 혼동을 주거나 학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 이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혼란을 주는 문법을 가르쳐서도 안되며 만들어내서도 안된다. 지금 한문 교과 말고도 영어나 국어 등의 문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고 교사를 위한 학교문법이 정리되어야 한다. 이 발표는 문법 본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시도된 것일 뿐이다. 보다 깊이 있는 한문 교육 연구자가 나서서 정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이가원(李家源), 『한문신강(漢文新講)』(신구문화사, 1960).
권중구(權重求), 『한문대강(漢文大綱』(통문관, 1971).
박지홍(朴智弘), 『한문입문(漢文入門)』(을유문화사, 1973).
홍인표(洪寅杓), 『한문문법(漢文文法)』(신아사, 1976).
이상은(李相殷), 『한문대강(漢文大綱)』(이우출판사, 1978).
최신호(崔信浩), 『한문강화(漢文講話)』(현암사, 1980).
정우상(鄭愚相).김용걸(金容傑), 『한문문형신강(漢文文型新講)』(성신여대출판부, 1981).
이이화(李離和), 『한문강좌(漢文講座)』(한길사, 1988).
왕 력, 『고대한어(古代漢語)』.
영남중국어문학회편, 『중국어문학통론(中國語文學通論)』(삼진사, 1984).
鮑善淳의 『 樣閱讀古文』.
심경호 옮김, 『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이회문화사, 1992).
관민의(管敏義), 『옛책의 표점을 어떻게 하느냐( 樣標點古書)』.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옮김, 『고급한문해석법』(창작과비평사, 1994).
양백준, 『문언문법(文言文法)』.
주송식, 『고대한어(古代漢語)』.
田壎, 『한문교수첩경(1929)』.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고등학교 문법』, 문교부 저작 고85-3004.
문교부, 『5차 한문과 교육 과정 해설』,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 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 6차 교육 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전시본 1701-1708.
『春秋左氏傳』
『論語』
『史記』
『三國遺事』
『三國史記』
) .子㉤/爲㉦ .父子㉤/有㉦ .菊㉤/似
.滄海㉤/化㉦ .桑田㉤/成㉦
.其臺㉤/曰㉦ .吾㉤/必以㉦ .仲子㉤/爲㉦
.軍㉤/至 .靑㉤/出㉦
.堯㉤/讓㉦
.新羅崔伉字㉤/石南㉦
.父母㉤/禁㉦
.伉㉤/暴死㉦
.都人士女㉤/競 ㉦
.孝悌, 而好犯上者㉤/鮮矣㉦
문장 성분으로 보면 주어지만 품사로 보면 명사류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명사류는 두가지가 있는데 서술어 앞에 쓰이는 주어의 명사류와 서술어 뒤에 오는 명사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어(단독 서술어이거나 아니건 간에) 앞에 쓰이는 확실한 주어들을 제외하면, 서술어 뒤에 쓰이는 명사성의 단어들은 기존의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목적어, 보어, 부사어로 번거롭게 분류하느니 보다 아예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이라면 \'명사어\'라고 하고자 한다. \'명사어\'라고 이름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용어는 우리가 늘 쓰는 품사로서의 용어였기 때문에 귀에 익숙하다. 둘째, 한문문장에서 서술어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명사구, 명사절 등이므로 이들을 모두 묶어서 명사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것이 한문 자체의 특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번역 이후에 명사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번역 이후의 문제이지 실은 한문 고유 문장의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문장구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술구조(주어 + 술어)
) 본고에서 \'+\'\'/\'는 짜임의 부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품사와 품사, 성분과 성분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일 뿐이다.
. 山/高 . 惠公元妃/孟子
② 술명구조(술어 + 명사어)
. 無/病 . 登/校 .入/學
. 事/君 . 絶/長 .守/株, 待/兎
③ 수식구조(관형어 + 명사어, 부사어 + 술어)
. 五/更 . 春/風 . 秋/月
④ 명술구조(명사어 + 술어)
④의 경우는 언뜻 이해가 안갈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④는 의문문의 경우나 도치의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先生將何之(선생님께서는 장차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서 何는 의문 대명사로 명사어이고, 之는 동사로서 서술어이다. 앞서 언급한 술명구조로 문장을 구성하면 何之가 之何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의문대명사 즉 명사어가 앞으로 간다. (學何所至與:학문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느냐?) 이러한 관습은 영어에서도 의문대명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
번역상 차이에 대해서는 \'∼가(이)\'의 주격조사가 붙는 것, \'∼에, 에게, 보다, 에게서\' 등의 부사격조사가 붙는 것, \'∼을(를)\'등의 목적격조사가 붙는 것 등을 세분화시킨 후, 이를 적용하여 술어 뒤에 오는 명사어를 \'주격 명사어, 목적격 명사어, 부사격 명사어\'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은 간단해야 한다. 간단하게 만들려면 번역 이후에 세부적인 차이점은 있더라도 원문의 공통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명사어라는 말 앞에 수식어(주격, 목적격, 부사격)를 사용한 구분은 번역 이후의 문법 분류로 이전에 겪었던 오류를 다시 저지르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런 세분화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위의 글은 제안에 불과하다.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혼란을 가중할 소지도 많다. 다만 이 전의 것을 개선해보자는 의도에서 제안해 본 것이다. 많은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형용사와 명사의 서술어로서의 기능> <보어의 문제> 말고도 재고해야 할 것들이 많다. \'한자어의 짜임\'을 도식화 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의 문제, 허사로 취급되면서도 실사 구실을 하는 \'以\' \'於\' 등 모두 새로운 정의나 정리를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이들에 대한 빠른 정리가 요구된다.
문법이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규칙적인 법칙이다. 문법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문장을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한 목적이 학생과 교사에게 혼동을 주거나 학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면 이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혼란을 주는 문법을 가르쳐서도 안되며 만들어내서도 안된다. 지금 한문 교과 말고도 영어나 국어 등의 문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고 교사를 위한 학교문법이 정리되어야 한다. 이 발표는 문법 본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시도된 것일 뿐이다. 보다 깊이 있는 한문 교육 연구자가 나서서 정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이가원(李家源), 『한문신강(漢文新講)』(신구문화사, 1960).
권중구(權重求), 『한문대강(漢文大綱』(통문관, 1971).
박지홍(朴智弘), 『한문입문(漢文入門)』(을유문화사, 1973).
홍인표(洪寅杓), 『한문문법(漢文文法)』(신아사, 1976).
이상은(李相殷), 『한문대강(漢文大綱)』(이우출판사, 1978).
최신호(崔信浩), 『한문강화(漢文講話)』(현암사, 1980).
정우상(鄭愚相).김용걸(金容傑), 『한문문형신강(漢文文型新講)』(성신여대출판부, 1981).
이이화(李離和), 『한문강좌(漢文講座)』(한길사, 1988).
왕 력, 『고대한어(古代漢語)』.
영남중국어문학회편, 『중국어문학통론(中國語文學通論)』(삼진사, 1984).
鮑善淳의 『 樣閱讀古文』.
심경호 옮김, 『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이회문화사, 1992).
관민의(管敏義), 『옛책의 표점을 어떻게 하느냐( 樣標點古書)』.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옮김, 『고급한문해석법』(창작과비평사, 1994).
양백준, 『문언문법(文言文法)』.
주송식, 『고대한어(古代漢語)』.
田壎, 『한문교수첩경(1929)』.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고등학교 문법』, 문교부 저작 고85-3004.
문교부, 『5차 한문과 교육 과정 해설』,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 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 6차 교육 과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전시본 1701-1708.
『春秋左氏傳』
『論語』
『史記』
『三國遺事』
『三國史記』
추천자료
 생산적 복지를 위한 법적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생산적복지 사회복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법적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생산적복지 사회복지 Moral Hazard에 관하여
Moral Hazard에 관하여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고찰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고찰 낙태에 대한 찬,반의견 및 해결방안
낙태에 대한 찬,반의견 및 해결방안 [위생][식품위생법][식품위생관리][식품위생관리정책]위생의 개념,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과 ...
[위생][식품위생법][식품위생관리][식품위생관리정책]위생의 개념,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과 ... [단일화]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 복수노조...
[단일화]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 복수노조... [산업재해][전기작업 안전기준][건설작업 안전기준][철도산업 안전기준][안전기준]산업재해의...
[산업재해][전기작업 안전기준][건설작업 안전기준][철도산업 안전기준][안전기준]산업재해의... [여성고용할당제][여성고용][고용할당제]여성고용할당제의 의미, 여성고용할당제의 형태와 여...
[여성고용할당제][여성고용][고용할당제]여성고용할당제의 의미, 여성고용할당제의 형태와 여... 프랑스의 문화의 특징과 비즈니스 거래상의 유의점
프랑스의 문화의 특징과 비즈니스 거래상의 유의점 [세금][부가가치세][재산세][지대세][취득세][국세][납세][탈세][지방세][국방세][조세]세금...
[세금][부가가치세][재산세][지대세][취득세][국세][납세][탈세][지방세][국방세][조세]세금... [벤처기업자금지원][벤처기업][자금지원][벤처기업자금지원 단계별 지원]벤처기업자금지원의 ...
[벤처기업자금지원][벤처기업][자금지원][벤처기업자금지원 단계별 지원]벤처기업자금지원의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개념, Repo(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의의, R...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개념, Repo(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의의, R...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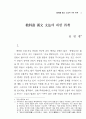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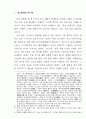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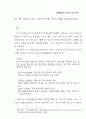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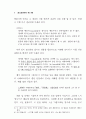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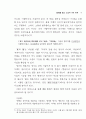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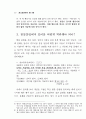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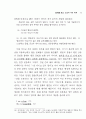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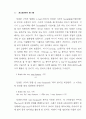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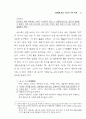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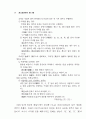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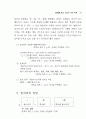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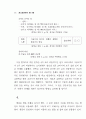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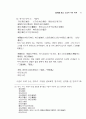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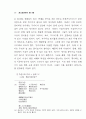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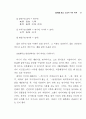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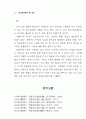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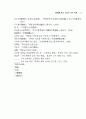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