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명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다. 여기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쯤 있을까? 인간은 지구 유기체의 한 일부에 불과할 지라도 그 안에 속한 생명에 대하여 깊이 고찰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구의 중추신경계라는 식으로 보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인식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다 의식적이고 지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시각에서 본 것이다. 내가 보는 세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경험한 세계이므로 \"나에게만\"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내 방에서 자라고 있는 선인장도 스스로를 가장 유능하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나의 세계\"에서만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생물권 내에서 우리의 위상을 나름대로 파악하여, 다른 생물들과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전 지구 안에서 내공생 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을 통해 생명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조명하면서 생명의 정의에 다가서려고 해 보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구할 수 없는 것 같다. 생명은 자기 초월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의로도 생명의 전부를 포괄 할 수 없다. 생명은 장기간에 걸쳐 상호 작용하고 공진화하면서 원래의 자기 이상이 되는, 창발적이고 신비로운 존재이다. 그래도 내 나름대로 생명에 대한 이미지만이라도 그려보겠다. 먼저, 그것은 버틀러가 말했듯이 \"신\"이다. 그러나 전지 전능한 유일신은 아니다. 한 인도 성자는 \"신은 하나이나 우리는 그것을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정말, 생명은 무한히 많은 얼굴을 한 힌두교의 신과도 같다. 때에 따라 하나에서부터 3만 3천 개 혹은 그 이상도 되는, 존재의 다양한 현현이라고 표현하면 좀 비슷할까? 우리는 보이진 않
지만 소금물에는 소금이 어디에나 고루 퍼져있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란 신도 지구 어디에나 만연하는 존재이다. 생명은 \"쉬바 나타라쟈\"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우주의 리듬에 맞추어 영원한 춤을 추는 신의 모습에는 고요함과 역동성, 자비로움과 냉혹함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리고 \"우로보로스\"가 연상되기도 한다. \"우로보로스\"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다. 그것은 \"내게 끝은 곧 시작이다.\"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우로보로스는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며, 또다시 재창조하는 생명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생명은 결국 불멸하는 영원성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어렸을 적 나는 가끔 \"나는 왜 \'나\'일까?\"라고 내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곤 했었다. 내가 \'나\'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저기 날아가는 새도 아닌 거지? \'나\' 아닌 \'다른 것\'을 \"나다\"라고 느낄 수 없는 것은 왜일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분리시키는 어떤 것, 나를 \'나\'라고 느끼게 해 주는 어떤 것이 내 안 어딘가에 들어있는 걸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은 갑자기 떠올라서는 내 가슴을 마구 방망이질 해댔다. 하지만 이런 흥분은 잠시 나를 사로잡다가 주위로부터 조그마한 자극을 받게 되면 금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물음이 더 이상 내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어도 물어도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에 체념해버린 것인지 몰라도 지금 생각하면 아주 서글픈 일이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한 특징인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체념해버림으로써 진정 \"살아있음\"을 포기해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생명은
\"생물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니까.
이 책을 통해 생명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조명하면서 생명의 정의에 다가서려고 해 보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구할 수 없는 것 같다. 생명은 자기 초월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의로도 생명의 전부를 포괄 할 수 없다. 생명은 장기간에 걸쳐 상호 작용하고 공진화하면서 원래의 자기 이상이 되는, 창발적이고 신비로운 존재이다. 그래도 내 나름대로 생명에 대한 이미지만이라도 그려보겠다. 먼저, 그것은 버틀러가 말했듯이 \"신\"이다. 그러나 전지 전능한 유일신은 아니다. 한 인도 성자는 \"신은 하나이나 우리는 그것을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했다. 정말, 생명은 무한히 많은 얼굴을 한 힌두교의 신과도 같다. 때에 따라 하나에서부터 3만 3천 개 혹은 그 이상도 되는, 존재의 다양한 현현이라고 표현하면 좀 비슷할까? 우리는 보이진 않
지만 소금물에는 소금이 어디에나 고루 퍼져있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란 신도 지구 어디에나 만연하는 존재이다. 생명은 \"쉬바 나타라쟈\"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우주의 리듬에 맞추어 영원한 춤을 추는 신의 모습에는 고요함과 역동성, 자비로움과 냉혹함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리고 \"우로보로스\"가 연상되기도 한다. \"우로보로스\"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다. 그것은 \"내게 끝은 곧 시작이다.\"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우로보로스는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며, 또다시 재창조하는 생명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생명은 결국 불멸하는 영원성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어렸을 적 나는 가끔 \"나는 왜 \'나\'일까?\"라고 내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곤 했었다. 내가 \'나\'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저기 날아가는 새도 아닌 거지? \'나\' 아닌 \'다른 것\'을 \"나다\"라고 느낄 수 없는 것은 왜일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분리시키는 어떤 것, 나를 \'나\'라고 느끼게 해 주는 어떤 것이 내 안 어딘가에 들어있는 걸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은 갑자기 떠올라서는 내 가슴을 마구 방망이질 해댔다. 하지만 이런 흥분은 잠시 나를 사로잡다가 주위로부터 조그마한 자극을 받게 되면 금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물음이 더 이상 내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게 되었다. 물어도 물어도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에 체념해버린 것인지 몰라도 지금 생각하면 아주 서글픈 일이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한 특징인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체념해버림으로써 진정 \"살아있음\"을 포기해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생명은
\"생물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니까.
추천자료
 최종분석 감상문
최종분석 감상문 레미제라블 감상문
레미제라블 감상문 [독후감/서평/요약] 가시고기 감상문
[독후감/서평/요약] 가시고기 감상문 [영화감상문] 식코(sicko)를 보고나서...
[영화감상문] 식코(sicko)를 보고나서... 평양대부흥운동 감상문
평양대부흥운동 감상문 영화<지구> 감상문
영화<지구> 감상문 [감상문] 앙드레지드의 `좁은문`을 읽고
[감상문] 앙드레지드의 `좁은문`을 읽고 우나기 감상문
우나기 감상문 아이로봇 감상문
아이로봇 감상문 [영화감상문] 삶과 죽음의 철학 - 씨 인사이드 (Mar Adentro/The Sea Inside)
[영화감상문] 삶과 죽음의 철학 - 씨 인사이드 (Mar Adentro/The Sea Inside) [영화감상문] 페미니즘의 눈으로 본 ‘판의 미로 - 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 (El Laberinto De...
[영화감상문] 페미니즘의 눈으로 본 ‘판의 미로 - 오필리아와 세 개의 열쇠 (El Laberinto De... [감상문]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天路歷程) _ 지은이 : 존 번연(존 버니언)
[감상문]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天路歷程) _ 지은이 : 존 번연(존 버니언) 캣츠 감상문 및 느낀점 조사분석
캣츠 감상문 및 느낀점 조사분석 BBC영상 감상문(두뇌의 힘, 임신과 출산, 사춘기의 비밀)
BBC영상 감상문(두뇌의 힘, 임신과 출산, 사춘기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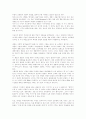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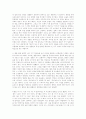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