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緖 論
Ⅱ. 改革·開放과 中國社會의 변화
Ⅲ. 政治制度와 政治體制의 개혁
IV 權力構造의 개편과 ‘新權威主義 政權’의 등장
Ⅱ. 改革·開放과 中國社會의 변화
Ⅲ. 政治制度와 政治體制의 개혁
IV 權力構造의 개편과 ‘新權威主義 政權’의 등장
본문내용
리오는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강택민을 중심으로 하는 신권위주의정권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毛澤東이후의 승계문제와 鄧小平이후의 승계문제의 차별성을 우선 강조한다. 즉, 毛澤東시대의 중국지도부는 문화대혁명을 경험하면서 양극화되었으며,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反左派 연합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비하여, 鄧小平시대의 중국 지도부는 비록 개혁과 개방의 폭과 속도에 관한 이른바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鄧小平의 ‘중국적 사회주의’에 합의를 하였으며, 동시에 권력 엘리트 내부에 조직화된 반대세력, 또는 대체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강택민은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쉽은 없지만, 1989년 천안문사태이후 鄧小平의 후원하에 구축된 세력기반을 중심으로 최소한 상당기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두번째의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택민의 권력기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강택민은 천안문사태로 조자양을 중심으로 구상하던 鄧小平의 후계구도가 차질을 빚으면서 급진개혁파와 보수파를 모두 견제하기 위하여 鄧小平이 전격 기용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기구내부에 독자적인 권력기반이 아직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택민은 보수적인 군부와 당관료를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수 연합세력이 형성된다면, 의외로 쉽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더구나 鄧小平이후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시련에 봉착하게 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군부와 당관료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開發獨裁政權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의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련이나 동구에서 이미 증명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체제변혁을 무한정 연기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천안문사태 당시에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던 밑으로부터의 변혁 요구는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더욱 심화, 확대될 것이지만, 반대로 鄧小平과 같은 혁명 1세대가 사라진 이후 현존 체제를 옹호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이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 체제변혁의 길로 갈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끝으로 鄧小平이후 중국이 天下大亂의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사이, 그리고 연해안지방과 내륙지방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鄧小平이후 권력 엘리트 내부의 권력투쟁과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사회에서 또 다시 지방할거주의가 등장하여 수 많은 ‘獨立王國’간의 천하대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각각의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를 시간적 요인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이를테면, 鄧小平이후 중국의 체제변혁이나 천하대란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지, 鄧小平의 사망과 더불어 가까운 장래에 중국사회나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거나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단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의 체제변혁과 대혼란 가능성보다는 강택민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후계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안 부재론과 대혼란에 대한 권력 엘리트 내부의 공통적인 위기감, 그리고 중국사회의 균열구조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鄧小平정권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사회의 다원화, 자율화, 개방화가 크게 증진되었으며, 당국가의 정통성과 통제력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약화되면서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도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당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조직적 사회세력들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경제발전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신권위주의정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과 개방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사회를 해체시킬 만큼 심각한 지방할거주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의 지방주의는 소련에서와는 달리 민족문제와 중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면서 지방주의가 현재화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통합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주의의 위험을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으로 나타나는 지방주의의 문제점과 성격에 대해서는 \"China Changes Shape: Regionalism and Foreign Policy,\" Adelphi Paper 287 (March 1994) 참조
따라서 鄧小平이후 중국사회에서 지방주의와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는 계속 기존의 당국가체제의 변화를 압박하겠지만, 단기간에 체제변혁이나 천하대란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물론, 권력 엘리트들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이 심화, 확산되어 지방주의와 체제변혁을 요구하는 사회세력을 召命(calling)하는 경우는 다르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현재의 권력엘리트들간에는 그와 같은 위험성에 대하여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鄧小平이후의 권력 엘리트들 내부에서 전개되는 권력투쟁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기존 권력 엘리트들 내부에서의 ‘힘의 재배분’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권위주의정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작업의 성과를 유지해야 하며, 당과 국가기구의 사회주의적 민주화와 법제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참여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치과정의 개방화와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한 체제개혁을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산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와 사회, 당과 정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의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택민의 권력기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강택민은 천안문사태로 조자양을 중심으로 구상하던 鄧小平의 후계구도가 차질을 빚으면서 급진개혁파와 보수파를 모두 견제하기 위하여 鄧小平이 전격 기용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기구내부에 독자적인 권력기반이 아직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택민은 보수적인 군부와 당관료를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수 연합세력이 형성된다면, 의외로 쉽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더구나 鄧小平이후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시련에 봉착하게 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군부와 당관료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開發獨裁政權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의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련이나 동구에서 이미 증명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체제변혁을 무한정 연기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천안문사태 당시에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던 밑으로부터의 변혁 요구는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더욱 심화, 확대될 것이지만, 반대로 鄧小平과 같은 혁명 1세대가 사라진 이후 현존 체제를 옹호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이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 체제변혁의 길로 갈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끝으로 鄧小平이후 중국이 天下大亂의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사이, 그리고 연해안지방과 내륙지방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鄧小平이후 권력 엘리트 내부의 권력투쟁과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사회에서 또 다시 지방할거주의가 등장하여 수 많은 ‘獨立王國’간의 천하대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각각의 시나리오는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를 시간적 요인을 고려함이 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이를테면, 鄧小平이후 중국의 체제변혁이나 천하대란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지, 鄧小平의 사망과 더불어 가까운 장래에 중국사회나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거나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단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의 체제변혁과 대혼란 가능성보다는 강택민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후계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안 부재론과 대혼란에 대한 권력 엘리트 내부의 공통적인 위기감, 그리고 중국사회의 균열구조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鄧小平정권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사회의 다원화, 자율화, 개방화가 크게 증진되었으며, 당국가의 정통성과 통제력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약화되면서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도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당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조직적 사회세력들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경제발전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신권위주의정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과 개방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사회를 해체시킬 만큼 심각한 지방할거주의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중국의 지방주의는 소련에서와는 달리 민족문제와 중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면서 지방주의가 현재화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통합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주의의 위험을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정책으로 나타나는 지방주의의 문제점과 성격에 대해서는 \"China Changes Shape: Regionalism and Foreign Policy,\" Adelphi Paper 287 (March 1994) 참조
따라서 鄧小平이후 중국사회에서 지방주의와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요구는 계속 기존의 당국가체제의 변화를 압박하겠지만, 단기간에 체제변혁이나 천하대란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를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물론, 권력 엘리트들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이 심화, 확산되어 지방주의와 체제변혁을 요구하는 사회세력을 召命(calling)하는 경우는 다르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현재의 권력엘리트들간에는 그와 같은 위험성에 대하여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鄧小平이후의 권력 엘리트들 내부에서 전개되는 권력투쟁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기존 권력 엘리트들 내부에서의 ‘힘의 재배분’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권위주의정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작업의 성과를 유지해야 하며, 당과 국가기구의 사회주의적 민주화와 법제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참여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치과정의 개방화와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한 체제개혁을 계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산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와 사회, 당과 정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편해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탈 냉전시기 중국과 러시아간의 정치관계연구
탈 냉전시기 중국과 러시아간의 정치관계연구 등소평 시기의 중국의 대외정책: 중.미 관계를 중심으로
등소평 시기의 중국의 대외정책: 중.미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정치 [인문과학]
중국의 정치 [인문과학]  [중국 이동통신 시장]중국 이동통신 시장과 서비스 분석 및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중국 이동...
[중국 이동통신 시장]중국 이동통신 시장과 서비스 분석 및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중국 이동... [모택동][마오쩌둥][모택동 사상][마오쩌둥 사상][중국][철학]모택동(마오쩌둥)의 철학과 사...
[모택동][마오쩌둥][모택동 사상][마오쩌둥 사상][중국][철학]모택동(마오쩌둥)의 철학과 사...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비교(인물, 정치, 경제, 사상측면에서 접근)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비교(인물, 정치, 경제, 사상측면에서 접근) [현대정치] 중국의 통치체제와 구조 그리고 중국의 미래
[현대정치] 중국의 통치체제와 구조 그리고 중국의 미래 중국의 정치조직
중국의 정치조직 [정치외교] 중국의 동북아정책
[정치외교] 중국의 동북아정책 국제정치에너지,중국시장,글로벌경제
국제정치에너지,중국시장,글로벌경제 <중국고대의 사상적 배경과 에토스 - 신과 인간의 교감> 고대 중국의 종교적 특징, 고대 유가...
<중국고대의 사상적 배경과 에토스 - 신과 인간의 교감> 고대 중국의 종교적 특징, 고대 유가... 중국의 정치 - 춘추전국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 의의에 관해
중국의 정치 - 춘추전국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 의의에 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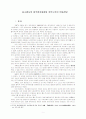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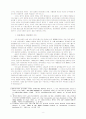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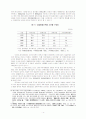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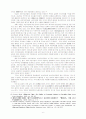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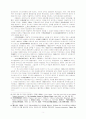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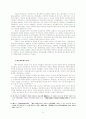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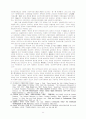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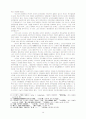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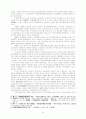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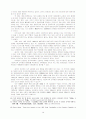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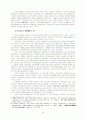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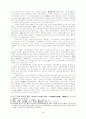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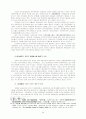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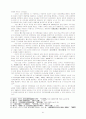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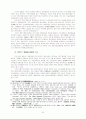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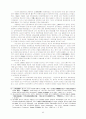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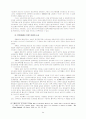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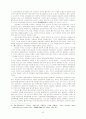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