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재산, 재산권, 그리고 소유
3. 밴담(Jeremy Bentham)의 재산권 사상
4. 마르크스(Karl Marx)의 재산권 사상
5. `사회 전체의 행복의 증진`과 `그 사람의 노동`
5. 결 론
2. 재산, 재산권, 그리고 소유
3. 밴담(Jeremy Bentham)의 재산권 사상
4. 마르크스(Karl Marx)의 재산권 사상
5. `사회 전체의 행복의 증진`과 `그 사람의 노동`
5. 결 론
본문내용
기본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는 기초적 생각일 것이다.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전제조건이 실현된 다음에나 진리(?)로 인정될 미완성의 그것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전제조건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에 마르크스의 사상이 그렇게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회의 평등\"과 \"불로 소득의 근절\"일 것이다. 우리 나라를 보라! 광복 이후, 올바른 자본주의가 아닌 이른바 천민 자본주의의 도래로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심각한 사회적 몸살을 앓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 위에는 언제나 수천만원짜리 소파에 앉아서 자신이 소유한 땅의 시세를 계산하며 주판질이나 하는 소위 졸부라는 족속들이 있어 왔고, 그네들의 후예(?)들은 세칭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면서까지 온갖 자본주의의 사생아로서의 방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밴담이 보아서도 결코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자본주의의 비뚤어진 단면들일 것이다. 즉, 밴담이 의도하고자 한 그것이 아닌, 엉뚱하게 생긴 자본주의 부산물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르크스의 생각도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 사람의 노동\"을 주장한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노동의 결과가 바로 그 노동을 한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밴담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새삼스럽게 이렇게 내세울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보면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때문에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그들에게 재산을 만들어 주질 못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만들어 내는 것은 자본, 즉 임금 노동을 착취하는 재산이며, 이것은 임금 노동을 새로이 착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임금 노동을 재생산하는 조건하에서만 증식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주창했었다. 따라서 그는 임금 노동자가 자기 활동의 결과로 얻는 것은 고작 자신의 생명을 재생산할 만한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고 천명하게 되었던 것이고,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사적 소유를 폐지하면 그와 함께 일체의 활동이 정지되고 전반적으로 게으름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반박에 관해, 만약 그러하다면 부르주아 사회는 - 여기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반면에 무엇인가를 얻는 자들은 일하지 않으므로 - 이미 오래 전에 게으름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하면 안되었을 거라며 응수한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자본주의 병폐가 생기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앞서 언급했었던 그러한 자본주의 부산물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 철저한 마르크스 신봉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 이데올로기의 폭풍을 겪어야만 했고, - 비록 실패임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지만 -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실험하느라고 인류의 거의 반이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아야 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런 그의 사상의 오류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그가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만을 바라본 나머지, 그런데로 가지고 있던 자본주의의 순기능 - 앞서 밴담이 제시했었던 그것 - 을 무시했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는 아니었기에 이 순수한 철학자의 기대를 져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5. 결 론
우리는 지금껏 재산권 사상에 관해서 밴담과 마르크스의 사상을 알아보았다.
그 둘은 \"노동\"이 소유의 기준이 되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그러한 이유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서로간에 결코 합쳐질 수 없는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즉, 하나의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차가 뒤에 엄청난 두 사상사이의 갭(gap)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시각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밴담과 마르크스의 재산권 사상을 비교하면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재산권 사상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고담준론이나 일삼는 정체된 학문이 아닌 이상, 학문이란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왜곡 없는 반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의 사상이 얼마나 인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도 - 부차적이긴 하지만 -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그 사람의 노동\"을 주장한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노동의 결과가 바로 그 노동을 한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밴담의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에 새삼스럽게 이렇게 내세울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보면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때문에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그들에게 재산을 만들어 주질 못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만들어 내는 것은 자본, 즉 임금 노동을 착취하는 재산이며, 이것은 임금 노동을 새로이 착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임금 노동을 재생산하는 조건하에서만 증식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주창했었다. 따라서 그는 임금 노동자가 자기 활동의 결과로 얻는 것은 고작 자신의 생명을 재생산할 만한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고 천명하게 되었던 것이고,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사적 소유를 폐지하면 그와 함께 일체의 활동이 정지되고 전반적으로 게으름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반박에 관해, 만약 그러하다면 부르주아 사회는 - 여기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반면에 무엇인가를 얻는 자들은 일하지 않으므로 - 이미 오래 전에 게으름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하면 안되었을 거라며 응수한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자본주의 병폐가 생기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앞서 언급했었던 그러한 자본주의 부산물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 철저한 마르크스 신봉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 이데올로기의 폭풍을 겪어야만 했고, - 비록 실패임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지만 - 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실험하느라고 인류의 거의 반이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아야 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런 그의 사상의 오류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그가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만을 바라본 나머지, 그런데로 가지고 있던 자본주의의 순기능 - 앞서 밴담이 제시했었던 그것 - 을 무시했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는 아니었기에 이 순수한 철학자의 기대를 져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5. 결 론
우리는 지금껏 재산권 사상에 관해서 밴담과 마르크스의 사상을 알아보았다.
그 둘은 \"노동\"이 소유의 기준이 되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그러한 이유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서로간에 결코 합쳐질 수 없는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즉, 하나의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차가 뒤에 엄청난 두 사상사이의 갭(gap)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시각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밴담과 마르크스의 재산권 사상을 비교하면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재산권 사상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고담준론이나 일삼는 정체된 학문이 아닌 이상, 학문이란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왜곡 없는 반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의 사상이 얼마나 인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도 - 부차적이긴 하지만 -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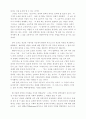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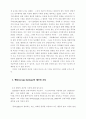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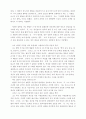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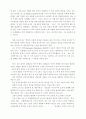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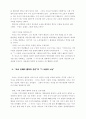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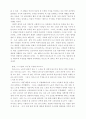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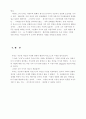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