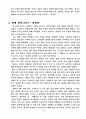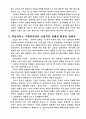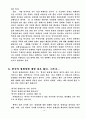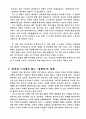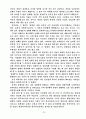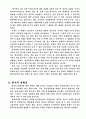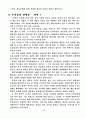목차
1. 소개글
2. 저자소개
3. 작가의 말
4. 함께 찾아나가는 `정체성`
5. 역동적이고 구체적이면서 보편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6.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답은 없다. 그러나...
7.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정체성`의 정체
8. 한국의 정체성
9. 우리들의 정체성 - 과연 ?
2. 저자소개
3. 작가의 말
4. 함께 찾아나가는 `정체성`
5. 역동적이고 구체적이면서 보편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6.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답은 없다. 그러나...
7.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정체성`의 정체
8. 한국의 정체성
9. 우리들의 정체성 - 과연 ?
본문내용
문고판이라서 부담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 책인데 쉽게 쓴 철학책이다.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는 철학자의 고민을 볼 수 있고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뒤짚는 것들이 많다. 판소리, 영화같은 우리주위의 문화를 통해서 어느것이 한국적인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저자의 주장에 다 찬성하는것인 아니지만 시원함을
- 7 -
느낀다. 참고문헌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비평이 색다른 재미이다.
9. 우리들의 정체성 - 과연 ?
<한국의 정체성>이란 책은 휴가 기간중 비디오 빌리러 갔다가 만난 책이었다. 우선 이 책은 작고 가볍다. 이 책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는 전혀 아랑곳 없이 책은 작고 가볍기만하다. 우리 주변에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책들사이에서 유독 이 책만큼은 작다.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좋은 모양이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반감을 느꼈던 부분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책에 대한 옳을 것 같다. 그 이야기는 판소리에 관한 이야기였다. 판소리가 한국 문화에서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정체성 탐구의 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더 이상 한국의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계속 대중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판소리는 한국의 소리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사실 저자는 이 부문 이전에서 판소리와 같은 전통문화의 발굴은 우리 문화를 풍성 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투라는 이야기를 했다. 글 속에서도 나오지만 현재성, 오늘날과의 관련성이 없다면 한국의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발굴의 의미를 지닌다.
나는 한국 문화의 발굴의 양식에서 판소리와 같은 문화가 정부의 지원이나 사회에서의 온실 보호를 이야기하고 보존을 통한 존재라면 결국 현재성을 상실한 박물관의 유물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대중성의 상실 역시.
하지만 대중성의 상실문제에서 더 이상 대중성을 상실한다는 문제점이 판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것은 판소리와 같은 문화의 전승양식의 문제점이 우선 지적되어야만 한다. 박물관의 유물은 희소성의 의미 외에 별다른 가치가 있는가. 발굴 및 계승은 양식은 현재성의 문제와 같이 생각해서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학가요제에서의 흥부가라는 노래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이 노래는 퓨전의 형태로 랩이라는 형식과 흥부가라는 형식의 형식상의 변화와 과거의 슬프고 애닳는 흐름에서 밝고 경쾌한 형태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양식이었다.
이후에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찾아볼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은 대중성의 무반응에 항의하거나 더욱 큰 지원을 이야기에 앞서 현실성과 맞닿는 부문에 대한 탐구가 요구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이 수반된 다음에 대중성의 논의를 거치고 경쟁을 해내야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결국 이와 같은 계승 발전의 책임의 문제를 단순한 대중성의 문제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은 철학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게하는 장치가 여러군데에 설치 되어 있다. 그런 부문으로 보편성에 대한 논리가 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과연 보편성이라는 가치가 있을까라는 대목에서 아마도 그런 가치는 추상적이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된다. 하지만 보편성을 상실 하였다면서 어떻게 개별자라는 개인의 묶음 국가의 정체성, 보편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이다.
- 8 -
물론 저자는 합성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국인 정체성과 한국의 정체성은 상호간에 관계가 있지만 서로 같은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의 탐구과정을 한글과 그 외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푸는 데 그 보편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까하는 생각이 든다. 개별자로서의 한국인과 개별자로서의 한국의 각 문화의 보편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외에도 더욱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적욕심보다는 이 책에서 던지는 고민들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주체성에 대한 생각들, 한국전쟁, 제2차 세계대전 - 미국과 유럽 중심의 사고들 - 의 발견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체에 관한 고민들에 대한 해답추구의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번정도는 다시 읽고 그 뒤에 있는 추천하는 책들을 대학에 다녔던,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 9 -
- 7 -
느낀다. 참고문헌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비평이 색다른 재미이다.
9. 우리들의 정체성 - 과연 ?
<한국의 정체성>이란 책은 휴가 기간중 비디오 빌리러 갔다가 만난 책이었다. 우선 이 책은 작고 가볍다. 이 책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는 전혀 아랑곳 없이 책은 작고 가볍기만하다. 우리 주변에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책들사이에서 유독 이 책만큼은 작다.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좋은 모양이다.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반감을 느꼈던 부분으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책에 대한 옳을 것 같다. 그 이야기는 판소리에 관한 이야기였다. 판소리가 한국 문화에서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정체성 탐구의 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더 이상 한국의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계속 대중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판소리는 한국의 소리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사실 저자는 이 부문 이전에서 판소리와 같은 전통문화의 발굴은 우리 문화를 풍성 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투라는 이야기를 했다. 글 속에서도 나오지만 현재성, 오늘날과의 관련성이 없다면 한국의 정체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발굴의 의미를 지닌다.
나는 한국 문화의 발굴의 양식에서 판소리와 같은 문화가 정부의 지원이나 사회에서의 온실 보호를 이야기하고 보존을 통한 존재라면 결국 현재성을 상실한 박물관의 유물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대중성의 상실 역시.
하지만 대중성의 상실문제에서 더 이상 대중성을 상실한다는 문제점이 판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것은 판소리와 같은 문화의 전승양식의 문제점이 우선 지적되어야만 한다. 박물관의 유물은 희소성의 의미 외에 별다른 가치가 있는가. 발굴 및 계승은 양식은 현재성의 문제와 같이 생각해서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학가요제에서의 흥부가라는 노래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이 노래는 퓨전의 형태로 랩이라는 형식과 흥부가라는 형식의 형식상의 변화와 과거의 슬프고 애닳는 흐름에서 밝고 경쾌한 형태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양식이었다.
이후에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찾아볼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은 대중성의 무반응에 항의하거나 더욱 큰 지원을 이야기에 앞서 현실성과 맞닿는 부문에 대한 탐구가 요구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이 수반된 다음에 대중성의 논의를 거치고 경쟁을 해내야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결국 이와 같은 계승 발전의 책임의 문제를 단순한 대중성의 문제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은 철학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게하는 장치가 여러군데에 설치 되어 있다. 그런 부문으로 보편성에 대한 논리가 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과연 보편성이라는 가치가 있을까라는 대목에서 아마도 그런 가치는 추상적이고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된다. 하지만 보편성을 상실 하였다면서 어떻게 개별자라는 개인의 묶음 국가의 정체성, 보편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이다.
- 8 -
물론 저자는 합성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국인 정체성과 한국의 정체성은 상호간에 관계가 있지만 서로 같은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정체성의 탐구과정을 한글과 그 외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푸는 데 그 보편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까하는 생각이 든다. 개별자로서의 한국인과 개별자로서의 한국의 각 문화의 보편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외에도 더욱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적욕심보다는 이 책에서 던지는 고민들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주체성에 대한 생각들, 한국전쟁, 제2차 세계대전 - 미국과 유럽 중심의 사고들 - 의 발견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체에 관한 고민들에 대한 해답추구의 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번정도는 다시 읽고 그 뒤에 있는 추천하는 책들을 대학에 다녔던,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