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고소설연구의 이념과 실현 과정
1) 연구의 출발과 정체성의 확인
2) 고소설연구의 역사와 그 성과
3. 고소설연구의 과제와 방향
2. 고소설연구의 이념과 실현 과정
1) 연구의 출발과 정체성의 확인
2) 고소설연구의 역사와 그 성과
3. 고소설연구의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을 文·史·哲의 통합으로 보았던 초창기 연구자들의 文學觀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고전문학연구자들의 의식 밑에 깔려있는 이러한 文學觀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고, 나아가서는 국문학과 인접 학문과의 거리를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전문학연구는 초창기 연구자들이 불가피하게 지고 있던 國學硏究로서의 과중한 부담을 스스로 벗고 문학을 文藝學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개화기 이전까지 고소설은 賤視와 非難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초창기 연구자들은 그것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의미를 부여한 경향이 있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고소설연구가 지난날의 활기찬 모습을 잃고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연구의 의의와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에 가졌단 當爲論的 視角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소설처럼 效用論的 視角을 내세울 수도 없다는 점에서 고소설연구자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연구의 이념과 목표를 재정립하는 문제는 고소설을 포함한 고전문학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고소설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개방된 자세를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소설은 문학으로서가 아니라 학교 교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연구된 감이 없지 않다. 고소설 작품들 가운데 일부가 初中等學校의 敎科書에 수록된 것은 고소설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소설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가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된 점도 있다. <홍길동전>, <춘향전> 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초창기 연구자들이 내렸던 교훈적 해석이나 평가가 깨뜨릴 수 없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길동전>의 주제로 제시한 \'抵抗性\'과 \'平等主義的 思考\'는 고소설연구자들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작품을 통해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주장이 작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들이 소망하는 것으로 머물 때, 고소설 연구의 의의와 성과는 부정되거나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고소설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 비판적 견해들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작품의 해석과 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 교육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사고는 개방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고소설은 文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연구의 성과가 보장되는 \'文學\'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다. 고소설 연구자들과 교사들은 이제 지난날의 무리한 주장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학교 교육에 반영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고소설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功利的 文學觀의 강박 관념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고소설은 弱者이거나 障碍者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소설에 대해서 요구하는 엄정한 문학비평의 논리가 고소설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고소설의 연구의 영역을 세분화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를 심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학문 연구의 역사는 세분화의 과정으로 이어지며, 고전문학연구사도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國學硏究의 한 분야에서 국문학으로 독립되었고, 그것은 다시 국문학과 국어학으로 분화되었으며,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분화과정을 거쳐 고소설 분야가 전문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고소설의 영역도 이제 너무나 광범위하고 축적된 연구 성과가 너무 많아 한 사람의 연구자가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연구 영역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고소설 연구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고소설연구의 방법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각 측면은 각각 상당 수준의 실력을 요한다. 서지와 이본에 대한 검토, 근원과 비교문학적 검토, 작품 분석과 해석의 방법 등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각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인접 학문과의 상호 연관성을 강화하거나 인접 영역의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이른바 학제적 연구를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넷째, 고소설의 현대적 수용과 계승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소설은 고전문학 가운데 가장 후대에 생성된 문학이며 현대문학과 깊은 관련을 가진 문학이다. 많은 고소설 작품은 현재도 읽히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작되고 있다. 고소설은 未完의 문학으로서 完成을 지향하고 있는 문학이다. 고소설 작품 가운데 상당수는 어느 한 시기에 완성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작되기를 계속하고 있다. 고소설 발전의 흐름이 개화기에 와서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대소설과 단절된 것도 아니다. 변모의 양상과 정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전혀 다른 문학으로 취급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편의주의적 사고나 역량의 부족, 또는 연구자들의 현실적 이해 관계에서 나온 결과이다.
고소설연구자들은 스스로 고소설은 과거의 골동품으로 다루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고소설은 이야기문화의 전통 속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산물이면서, 다음 시대의 문학과 맥을 잇는 살아있는 문학이다. 이야기문화는 계층이나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어 설화가 되기도 하고, 글로 표현되어 소설이 되기도 하며, 그림이나 행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만화, 연극, 영화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모두가 이야기문화의 전통을 잇는 것이라 할 때, 고소설연구의 관심 영역은 소설이나 설화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잇는 후대의 모든 예술 양식에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화기 소설을 고소설연구에 포함시켜 연구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는 것은 물론이고, 고소설의 현대소설적 수용에 대한 연구도 현대소설 전공자들에게 내맡겨 둘 것이 아니라, 고전소설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하는 능동적 연구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고소설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개방된 자세를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소설은 문학으로서가 아니라 학교 교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연구된 감이 없지 않다. 고소설 작품들 가운데 일부가 初中等學校의 敎科書에 수록된 것은 고소설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소설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가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된 점도 있다. <홍길동전>, <춘향전> 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초창기 연구자들이 내렸던 교훈적 해석이나 평가가 깨뜨릴 수 없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길동전>의 주제로 제시한 \'抵抗性\'과 \'平等主義的 思考\'는 고소설연구자들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작품을 통해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주장이 작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들이 소망하는 것으로 머물 때, 고소설 연구의 의의와 성과는 부정되거나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 고소설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 비판적 견해들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작품의 해석과 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 교육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사고는 개방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고소설은 文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연구의 성과가 보장되는 \'文學\'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다. 고소설 연구자들과 교사들은 이제 지난날의 무리한 주장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학교 교육에 반영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고소설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功利的 文學觀의 강박 관념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고소설은 弱者이거나 障碍者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소설에 대해서 요구하는 엄정한 문학비평의 논리가 고소설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고소설의 연구의 영역을 세분화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를 심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학문 연구의 역사는 세분화의 과정으로 이어지며, 고전문학연구사도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國學硏究의 한 분야에서 국문학으로 독립되었고, 그것은 다시 국문학과 국어학으로 분화되었으며,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분화과정을 거쳐 고소설 분야가 전문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고소설의 영역도 이제 너무나 광범위하고 축적된 연구 성과가 너무 많아 한 사람의 연구자가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연구 영역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고소설 연구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고소설연구의 방법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각 측면은 각각 상당 수준의 실력을 요한다. 서지와 이본에 대한 검토, 근원과 비교문학적 검토, 작품 분석과 해석의 방법 등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각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인접 학문과의 상호 연관성을 강화하거나 인접 영역의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이른바 학제적 연구를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넷째, 고소설의 현대적 수용과 계승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소설은 고전문학 가운데 가장 후대에 생성된 문학이며 현대문학과 깊은 관련을 가진 문학이다. 많은 고소설 작품은 현재도 읽히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작되고 있다. 고소설은 未完의 문학으로서 完成을 지향하고 있는 문학이다. 고소설 작품 가운데 상당수는 어느 한 시기에 완성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작되기를 계속하고 있다. 고소설 발전의 흐름이 개화기에 와서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대소설과 단절된 것도 아니다. 변모의 양상과 정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전혀 다른 문학으로 취급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편의주의적 사고나 역량의 부족, 또는 연구자들의 현실적 이해 관계에서 나온 결과이다.
고소설연구자들은 스스로 고소설은 과거의 골동품으로 다루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고소설은 이야기문화의 전통 속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산물이면서, 다음 시대의 문학과 맥을 잇는 살아있는 문학이다. 이야기문화는 계층이나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어 설화가 되기도 하고, 글로 표현되어 소설이 되기도 하며, 그림이나 행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만화, 연극, 영화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모두가 이야기문화의 전통을 잇는 것이라 할 때, 고소설연구의 관심 영역은 소설이나 설화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잇는 후대의 모든 예술 양식에까지 미쳐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화기 소설을 고소설연구에 포함시켜 연구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는 것은 물론이고, 고소설의 현대소설적 수용에 대한 연구도 현대소설 전공자들에게 내맡겨 둘 것이 아니라, 고전소설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하는 능동적 연구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추천자료
 춘향전의 기녀 자의식
춘향전의 기녀 자의식 텍스트 속에 반영된 죽음에 대한 의식과 양상
텍스트 속에 반영된 죽음에 대한 의식과 양상 《운영전》의 갈등양상
《운영전》의 갈등양상 고전소설의 유통
고전소설의 유통 A+레포트 고전소설
A+레포트 고전소설 [국문학]금오신화의 용궁부연록 작품론
[국문학]금오신화의 용궁부연록 작품론 금오신화(작가, 작품 분석, 의의, 성격, 특징)
금오신화(작가, 작품 분석, 의의, 성격, 특징)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한계와 여성영웅소설의 문학사적 위치
홍계월전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한계와 여성영웅소설의 문학사적 위치 우리나라 고소설의 전개과정
우리나라 고소설의 전개과정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  운영전의 내용과 운영전에 대한 북한문학사에서의 시대별 가치평가(국어국문학과 고전소설강독)
운영전의 내용과 운영전에 대한 북한문학사에서의 시대별 가치평가(국어국문학과 고전소설강독) [고전소설 운영전][고전소설][운영전][고전문학][문학][소설][운영전평가]고전소설 운영전의 ...
[고전소설 운영전][고전소설][운영전][고전문학][문학][소설][운영전평가]고전소설 운영전의 ... 교산(蛟山) 허균(許筠) - 자는 단보이고 호는 교산, 학산, 성소, 백월거사 등 여러 가지를 썼다.
교산(蛟山) 허균(許筠) - 자는 단보이고 호는 교산, 학산, 성소, 백월거사 등 여러 가지를 썼다. [홍길동전]홍길동전(허균 소설)의 내용요약, 홍길동전(허균 소설)의 작가, 홍길동전(허균 소...
[홍길동전]홍길동전(허균 소설)의 내용요약, 홍길동전(허균 소설)의 작가, 홍길동전(허균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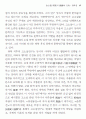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