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序) - 시작하며******************1
2. 본(本) - 들어가며******************2
1) 술의 역사
2) 명절에 따른 술
3) 사회에서의 술
3. 결(結) - 끝맺으며*****************10
*참고문헌
2. 본(本) - 들어가며******************2
1) 술의 역사
2) 명절에 따른 술
3) 사회에서의 술
3. 결(結) - 끝맺으며*****************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력 5월 5일 단오는 설, 추석과 함께 우리 나라의 3대 명절 중 하나이다. 창포주는 단오에 마시는 술로 이 술을 마시면 창포의 향기로 모든 악병을 쫓는 것으로 믿어 왔으며 고려 시대부터 만들어졌다고 한다.
) 조정형, op. cit. p.70
6월 보름을 유두일(流頭日)이라 하는데 이 날 동쪽으로 흐르는 시원한 개천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유두음(流頭飮)이라 한다. 신라 때부터 이러한 풍습이 전래되었으며 피서 겸 물가에서 하루를 즐기며 술을 마시고 피로를 풀었던 것이다. 이 풍속은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어 토속적인 명절이 되었으며 경주와 상주에는 아직도 이런 풍속이 남아있다.
) Ibid. pp.70∼71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 또는 가위, 가윗날이라고 한다. 이 날은 햇곡식으로 만든 술과 햅쌀밥을 지어 조상에게 제사지내며 산소에 성묘한다. 성묘가 끝나면 햇곡식으로 빚은 신곡주(新穀酒)와 음식으로 추석놀이를 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빚어진 술이 동동주였다.
) Ibid. p.72
동동주는 맑은 술과 찹쌀 누룩만으로 빚어지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맑은 술로 부의주(浮蟻酒)라고도 하는데, 술 표면에 삭은 밥알이 동동 떠 있는 것이 마치 개미가 떠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그 맛이 달고 독하다. 이 술은 고려시대 이후 가장 널리, 그리고 많이 보급되어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빚어지고 있다.
) 李秀洪,「우리 나라 향토 민속주(1)」,『우리문화』, 전국문화원 연합회, 1998.6, p.76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重陽節)이라고 부르는데 이 때는 국화가 만발하는 날이기에 국화에 관계되는 풍속이 많았었다. 특히, 멋을 즐기는 선비들은 경치 좋은 산에 올라가 단풍과 들국화를 감상하며 시를 읊조리고 들놀이를 즐겼는데 이 때의 국화주(菊花酒)는 빼놓을 수 없는 술로서 계절주(季節酒)의 대표격이다. 중양절(重陽節)은 선비들의 가을 야유회의 날로서 국화주(菊花酒)와 함께 국화향(菊花香) 속에 취하여 멋과 기량을 발산하는 날로 여겨졌던 것이다.
3. 사회 속에서의 술
우리 나라의 술문화로는 대포문화(大匏文化)와 통과의례(通過儀禮)에서의 술문화 등을 들 수 있다.
대포문화의 의도는 단체 구성원의 결속과 일체를 꾀하는데 있다. 큰 바가지를 뜻하는 대포(大匏)의 뿌리는, 여러 사람이 한 잔 술을 마시려면 잔이 커야했고 서로 마시는 술잔의 가장 원시적인 술잔이 바가지
) 이규태,「대포」, 이경찬 엮,『한국인의 주도』, 자유문고, 1992, pp.43∼44
라는 것에 있다. 이러한 대포문화에서 나온 것이 수작문화(酬酌文化)이다. 수작문화(酬酌文化)는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시는 술문화이다. 이것은 서양, 일본, 중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신라의 화랑들은 큰 잔에 차를 나누어 마시며 결의를 다졌다
) Loc. cit.
고 하며, 조선조에는 각 관청마다 커다란 대포잔을 마련하고 여기에 술을 가득 부은 다음 상하,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가 나누어 마심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 Loc. cit.
아울러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통혼례의 합환주 풍습도 수작문화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Ibid. p.61
이처럼 수작문화는 단순히 술 마시는 방법에 머물지 않고 서로의 우의와 결의를 다지는 의식적인 성격이 강했다.
우리 나라의 혼례(婚禮), 장례(葬禮), 제례(祭禮), 관례(冠禮)와 같은 통과의례의 격식을 갖추는데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술이었다. 혼례 때 조롱박을 둘로 쪼개어 만든 합근(合 )박에다 술을 담아 신랑, 신부가 서로 입을 댐으로서 일심동체를 맹약하는 합근례는 극히 근간(近間)에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서 혼례(婚禮)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 이규태,「대포」,『우리의 음식이야기』, 기린원, 1991, p.188
오늘날의 신참신고식과 같은 문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참신고식은 조선시대 초기에 생겨난 \'신래침학(新來侵虐)\'이라는 것이 현대식으로 변질된 것이라 여겨진다. `신래(新來)\'란 관청에 첫 발을 내딛은 오늘의 \'신참\'을 뜻하는데, 고참들이 후배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생각에서 신참에게 술을 내도록 하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구 퍼먹이는 풍습이다. 이러한 풍습은 조선조 초기에 생겨났는데, 이것을 \'신래침학(新來侵虐)\'이라고 하였다.
) 권두언, 「신참신고식」,『우리문화』, 전국문화원 연합회, 1998.10, p. 4
60년대에서 80년대로 이어지는 군사독재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하게 했다. 지식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들 조국의 암울한 현시대를 부정하며, 술로서 그 시름을 잊어보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대의 술 소비량은 폭증하였다. 이 때의 사람들에겐 술은 단순히 유흥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의 탈출구이자 새 희망의 공급원이었던 것이다.
3.결(結) - 끝맺으며
지금까지 서(序)에서 언급했던 바를 본(本)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리를 해보면, 먼저 본(本)의 처음에는 삼한(三韓)시대부터 삼국시대의 세 나라 고려, 조선, 그리고 구한말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술 변천사를 밝혔다. 그 다음으론 설날, 정월대보름, 삼짇날의 크고 작은 명절을 중심으로 발달한 세시풍속(歲時風俗) 속의 술을 알아보았다. 우리의 술문화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우리만의 것을 연구했는데, 그 중의 첫 번째가 바로 대포문화(大砲文化)와 수작문화(酬酌文化)였다. 우리의 술문화를 연구한 부분에서는 대포문화, 수작문화와 더불어 의식속의 술과 현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반정치적인 의미의 술도 알아보았다. 특히, 역사를 조사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술문화가 예전에는 퇴폐적이거나 타락적이지 않았으며 현대로 올수록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특히 역사와 관계가 깊은 연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또,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전통 술문화를 직시하고, 현대의 잘못된 술문화를 고치는데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 조정형, op. cit. p.70
6월 보름을 유두일(流頭日)이라 하는데 이 날 동쪽으로 흐르는 시원한 개천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유두음(流頭飮)이라 한다. 신라 때부터 이러한 풍습이 전래되었으며 피서 겸 물가에서 하루를 즐기며 술을 마시고 피로를 풀었던 것이다. 이 풍속은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어 토속적인 명절이 되었으며 경주와 상주에는 아직도 이런 풍속이 남아있다.
) Ibid. pp.70∼71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 또는 가위, 가윗날이라고 한다. 이 날은 햇곡식으로 만든 술과 햅쌀밥을 지어 조상에게 제사지내며 산소에 성묘한다. 성묘가 끝나면 햇곡식으로 빚은 신곡주(新穀酒)와 음식으로 추석놀이를 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빚어진 술이 동동주였다.
) Ibid. p.72
동동주는 맑은 술과 찹쌀 누룩만으로 빚어지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맑은 술로 부의주(浮蟻酒)라고도 하는데, 술 표면에 삭은 밥알이 동동 떠 있는 것이 마치 개미가 떠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그 맛이 달고 독하다. 이 술은 고려시대 이후 가장 널리, 그리고 많이 보급되어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빚어지고 있다.
) 李秀洪,「우리 나라 향토 민속주(1)」,『우리문화』, 전국문화원 연합회, 1998.6, p.76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重陽節)이라고 부르는데 이 때는 국화가 만발하는 날이기에 국화에 관계되는 풍속이 많았었다. 특히, 멋을 즐기는 선비들은 경치 좋은 산에 올라가 단풍과 들국화를 감상하며 시를 읊조리고 들놀이를 즐겼는데 이 때의 국화주(菊花酒)는 빼놓을 수 없는 술로서 계절주(季節酒)의 대표격이다. 중양절(重陽節)은 선비들의 가을 야유회의 날로서 국화주(菊花酒)와 함께 국화향(菊花香) 속에 취하여 멋과 기량을 발산하는 날로 여겨졌던 것이다.
3. 사회 속에서의 술
우리 나라의 술문화로는 대포문화(大匏文化)와 통과의례(通過儀禮)에서의 술문화 등을 들 수 있다.
대포문화의 의도는 단체 구성원의 결속과 일체를 꾀하는데 있다. 큰 바가지를 뜻하는 대포(大匏)의 뿌리는, 여러 사람이 한 잔 술을 마시려면 잔이 커야했고 서로 마시는 술잔의 가장 원시적인 술잔이 바가지
) 이규태,「대포」, 이경찬 엮,『한국인의 주도』, 자유문고, 1992, pp.43∼44
라는 것에 있다. 이러한 대포문화에서 나온 것이 수작문화(酬酌文化)이다. 수작문화(酬酌文化)는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마시는 술문화이다. 이것은 서양, 일본, 중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신라의 화랑들은 큰 잔에 차를 나누어 마시며 결의를 다졌다
) Loc. cit.
고 하며, 조선조에는 각 관청마다 커다란 대포잔을 마련하고 여기에 술을 가득 부은 다음 상하,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가 나누어 마심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 Loc. cit.
아울러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통혼례의 합환주 풍습도 수작문화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Ibid. p.61
이처럼 수작문화는 단순히 술 마시는 방법에 머물지 않고 서로의 우의와 결의를 다지는 의식적인 성격이 강했다.
우리 나라의 혼례(婚禮), 장례(葬禮), 제례(祭禮), 관례(冠禮)와 같은 통과의례의 격식을 갖추는데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술이었다. 혼례 때 조롱박을 둘로 쪼개어 만든 합근(合 )박에다 술을 담아 신랑, 신부가 서로 입을 댐으로서 일심동체를 맹약하는 합근례는 극히 근간(近間)에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서 혼례(婚禮)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 이규태,「대포」,『우리의 음식이야기』, 기린원, 1991, p.188
오늘날의 신참신고식과 같은 문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참신고식은 조선시대 초기에 생겨난 \'신래침학(新來侵虐)\'이라는 것이 현대식으로 변질된 것이라 여겨진다. `신래(新來)\'란 관청에 첫 발을 내딛은 오늘의 \'신참\'을 뜻하는데, 고참들이 후배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생각에서 신참에게 술을 내도록 하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구 퍼먹이는 풍습이다. 이러한 풍습은 조선조 초기에 생겨났는데, 이것을 \'신래침학(新來侵虐)\'이라고 하였다.
) 권두언, 「신참신고식」,『우리문화』, 전국문화원 연합회, 1998.10, p. 4
60년대에서 80년대로 이어지는 군사독재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하게 했다. 지식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들 조국의 암울한 현시대를 부정하며, 술로서 그 시름을 잊어보고자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대의 술 소비량은 폭증하였다. 이 때의 사람들에겐 술은 단순히 유흥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의 탈출구이자 새 희망의 공급원이었던 것이다.
3.결(結) - 끝맺으며
지금까지 서(序)에서 언급했던 바를 본(本)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리를 해보면, 먼저 본(本)의 처음에는 삼한(三韓)시대부터 삼국시대의 세 나라 고려, 조선, 그리고 구한말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술 변천사를 밝혔다. 그 다음으론 설날, 정월대보름, 삼짇날의 크고 작은 명절을 중심으로 발달한 세시풍속(歲時風俗) 속의 술을 알아보았다. 우리의 술문화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우리만의 것을 연구했는데, 그 중의 첫 번째가 바로 대포문화(大砲文化)와 수작문화(酬酌文化)였다. 우리의 술문화를 연구한 부분에서는 대포문화, 수작문화와 더불어 의식속의 술과 현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반정치적인 의미의 술도 알아보았다. 특히, 역사를 조사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술문화가 예전에는 퇴폐적이거나 타락적이지 않았으며 현대로 올수록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특히 역사와 관계가 깊은 연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 또,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며,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전통 술문화를 직시하고, 현대의 잘못된 술문화를 고치는데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추천자료
 술과 호스테스를 통해서 본 한일 양국의 문화비교
술과 호스테스를 통해서 본 한일 양국의 문화비교 술에관한 모든 것(역사.종류.주도.숙취.문화.알콜중독)
술에관한 모든 것(역사.종류.주도.숙취.문화.알콜중독) 서울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의 술자리 게임문화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의 술자리 게임문화에 대한 고찰 한국의 전통문화(음식, 차, 술, 간식)
한국의 전통문화(음식, 차, 술, 간식) 술을 통해 본 유럽의 문화
술을 통해 본 유럽의 문화 [영국문화][영국의 문화][영국 축제문화][영국 정치문화][영국 음주문화][영국 차문화][축제]...
[영국문화][영국의 문화][영국 축제문화][영국 정치문화][영국 음주문화][영국 차문화][축제]... 칼럼 - 대학생의 술 문화
칼럼 - 대학생의 술 문화  우리나라 술 문화에 대한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우리나라 술 문화에 대한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식생활 비교 고려시대 생활상 외래문화영향 고기음식 김치 술 양주업 ...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식생활 비교 고려시대 생활상 외래문화영향 고기음식 김치 술 양주업 ... [A+] 독일의 맥주 음주문화 - 대표맥주, 맥주순수령, 뮌헨, OKTOBERFEST, 술소비량, 와인생...
[A+] 독일의 맥주 음주문화 - 대표맥주, 맥주순수령, 뮌헨, OKTOBERFEST, 술소비량, 와인생... 한국문화의 이해_술의 일화와 속담
한국문화의 이해_술의 일화와 속담 국가별 음주매너 {술에 대한 이해, 한국의 음주 매, 음주문화, 각 나라의 음주매너}.ppt
국가별 음주매너 {술에 대한 이해, 한국의 음주 매, 음주문화, 각 나라의 음주매너}.ppt
 일본 음식문화(지역별 음식,음료,술,디저트)
일본 음식문화(지역별 음식,음료,술,디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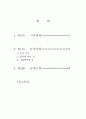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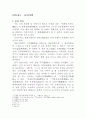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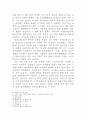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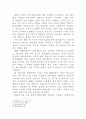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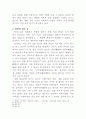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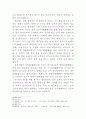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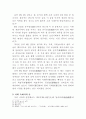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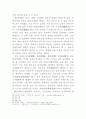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