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고슬라비아의 역사
1) 약사
2) 역 사
2. 발칸문제의 근원 : 인종적 충돌의 역사
3. 보스니아 내전 이후 발칸전쟁의 공포
4. 유고슬라비아의 태도
5. 경제제재 조치 이후
1) 약사
2) 역 사
2. 발칸문제의 근원 : 인종적 충돌의 역사
3. 보스니아 내전 이후 발칸전쟁의 공포
4. 유고슬라비아의 태도
5. 경제제재 조치 이후
본문내용
. 아제르바이잔은 92년 10월 연합을 탈퇴하였다가 93년 9월 복귀하였다.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110112&docid=261263 에서 인용
1985년 고르바쵸프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은 일대 변화를 겪게 된다.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의 추진은 소련 내 누진되어 왔던 경제적, 사회적, 민족적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사이에서도 경제적 문제들과 민족 갈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에 들어 와서는 각 공화국들이 주권선언 및 독립선언을 하였고, 1991년 3월 17일 실시했던 소비에트연방 존속을 묻는 투표에서는 연방의 존속을 그래도 인정하였으나, 1991년 8월 소련 보수파 쿠데타의 실패 이후 소비에트 연방체제는 빠른 속도로 해체되어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1991년 12월 8일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Minsk)에 모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는 「독립국가연합체」 창설을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튀르크계 이슬람공화국 중에서 먼저 카작키스탄이 자신들을 배제한 슬라브계 국가들만의 블럭 형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카작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처리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 부터 압력을 받은 러시아는 카작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국가연합 가담에 동의함으로써 독립국가연합이 애당초 하고자 했던 슬라브계 국가들만의 연합체 구성은 포기되었다. 뒤이어 1991년 12월 13일 소비에트 연방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며, 며칠 뒤인 12월 21일 알마아타 회담에서 11개 공화국이 독립국가연합 창설 멤바로서 협정에 조인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1922년 소비에트연방 형성 이후 70년간의 사회주의 연방국가의 한 구성원의 위치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는 동시에 동등한 독립국의 자격으로 새로운 형태의 연합체에 가담하게 되었다.
독립국가연합은 91년 12월 21일 알마아타에서 출범식을 갖고, 92년 2월 14일 민스크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8개국이 통합군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10월 9일 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는 루블화공동은행 창설과 공동 텔레비전 ·라디오 설립 등에 합의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7개 가맹국은 93년 1월 22일 민스크 정상회담에서 경제유대를 강화하는 대신 군사적 ·정치적 관계는 보다 느슨한 형태를 띠도록 하는 독립국가연합 헌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연합의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연합내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계속 대립관계에 있었다. 12월 아슈하바트 정상회담에서는 독립국가연합 창설 2주년을 맞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본떠 가맹국간의 ‘협력 및 신뢰구축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95년 2월 10일 알마아타 정상회담에서는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평화 ·안정증진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상호협력협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과 공동국경방위체제를 수립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의 조직은 최고협의기구인 국가원수평의회(정상회담)와 그 산하에 총리협의체 그리고 가맹국의 해당 장관들로 구성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각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회담은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협력체제의 효율적 확립을 위하여 6개월 임기의 순회의장제를 도입하였다. 총리협의체는 연 2회, 각료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5개의 공화국과 20개의 자치공화국으로 이루어졌던 소비에트 연방의 가장 큰 문제는 「민족간 갈등」이었는데, 이것은 소연방의 와해를 급속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었다. 그런데, 독립국가연합이 형성된 지금, 민족적 갈등이 또다시 그 연합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민족 갈등 및 분쟁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정부가 러시아인 중심의 정책을 펴 나가면서 자의적으로 공화국을 설정하고 소수 민족을 분산, 이주시킴으로 불씨를 키워온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구소련의 연방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첫째, 중앙집권적 행정집행체제로 각 민족의 불만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었고, 종종 소수 민족들의 요구는 사회주의 연방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분리주의적 반혁명세력의 행위로 간주하여 배척당해 왔었다.
둘째, 민족의 자주성을 형식상 인정했으나, 각 민족의 문화, 언어, 종교는 사실상 경시되어 왔으며, 민족 행사들은 부르조아적인 것으로 몰려 폐지되었고 고등교육기관에서 러시아교육이 의무화되고 러시아어가 법적으로 공용화되었다.
셋째, 연방 전체의 이익을 내세운 강제적인 이주와 러시아 중심적인 경제정책은 많은 소수민족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비러시아계 공화국들과 러시아계 공화국간의 경제적 격차는 계속 증가하였다.
넷째, 1936년 스탈린 헌법으로 연방의 권한은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공화국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과거 구소련 통치하의 불공평한 통제정치로 인해 타민족들의 러시아에 대한 불만은소련의 변화와 함께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한 불만과 분쟁의 불씨는 1985년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의 강력한 추진에 편승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집단적 시위 및 탈소(脫蘇) 움직임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 참 고 문 헌
http://www.goodnews.co.kr/cksik/mtext/m6/4.htm
http://san.hufs.ac.kr/%7Eyugo/y218-1.htm
http://web.korea.ac.kr/~yoonin/worldrace/yugohistory.htm
http://www.cncho.pe.kr/kric/kric/yugo-serbia.htm
http://san.hufs.ac.kr/%7Eyugo/y218-1.htm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110112&docid=261263 에서 인용
1985년 고르바쵸프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은 일대 변화를 겪게 된다.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의 추진은 소련 내 누진되어 왔던 경제적, 사회적, 민족적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사이에서도 경제적 문제들과 민족 갈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에 들어 와서는 각 공화국들이 주권선언 및 독립선언을 하였고, 1991년 3월 17일 실시했던 소비에트연방 존속을 묻는 투표에서는 연방의 존속을 그래도 인정하였으나, 1991년 8월 소련 보수파 쿠데타의 실패 이후 소비에트 연방체제는 빠른 속도로 해체되어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1991년 12월 8일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Minsk)에 모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는 「독립국가연합체」 창설을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튀르크계 이슬람공화국 중에서 먼저 카작키스탄이 자신들을 배제한 슬라브계 국가들만의 블럭 형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카작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처리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 부터 압력을 받은 러시아는 카작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국가연합 가담에 동의함으로써 독립국가연합이 애당초 하고자 했던 슬라브계 국가들만의 연합체 구성은 포기되었다. 뒤이어 1991년 12월 13일 소비에트 연방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며, 며칠 뒤인 12월 21일 알마아타 회담에서 11개 공화국이 독립국가연합 창설 멤바로서 협정에 조인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1922년 소비에트연방 형성 이후 70년간의 사회주의 연방국가의 한 구성원의 위치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는 동시에 동등한 독립국의 자격으로 새로운 형태의 연합체에 가담하게 되었다.
독립국가연합은 91년 12월 21일 알마아타에서 출범식을 갖고, 92년 2월 14일 민스크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8개국이 통합군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10월 9일 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는 루블화공동은행 창설과 공동 텔레비전 ·라디오 설립 등에 합의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7개 가맹국은 93년 1월 22일 민스크 정상회담에서 경제유대를 강화하는 대신 군사적 ·정치적 관계는 보다 느슨한 형태를 띠도록 하는 독립국가연합 헌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연합의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연합내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계속 대립관계에 있었다. 12월 아슈하바트 정상회담에서는 독립국가연합 창설 2주년을 맞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본떠 가맹국간의 ‘협력 및 신뢰구축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95년 2월 10일 알마아타 정상회담에서는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에 합의하는 한편, 평화 ·안정증진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상호협력협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과 공동국경방위체제를 수립하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의 조직은 최고협의기구인 국가원수평의회(정상회담)와 그 산하에 총리협의체 그리고 가맹국의 해당 장관들로 구성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각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회담은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협력체제의 효율적 확립을 위하여 6개월 임기의 순회의장제를 도입하였다. 총리협의체는 연 2회, 각료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5개의 공화국과 20개의 자치공화국으로 이루어졌던 소비에트 연방의 가장 큰 문제는 「민족간 갈등」이었는데, 이것은 소연방의 와해를 급속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었다. 그런데, 독립국가연합이 형성된 지금, 민족적 갈등이 또다시 그 연합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민족 갈등 및 분쟁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정부가 러시아인 중심의 정책을 펴 나가면서 자의적으로 공화국을 설정하고 소수 민족을 분산, 이주시킴으로 불씨를 키워온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구소련의 연방정부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첫째, 중앙집권적 행정집행체제로 각 민족의 불만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었고, 종종 소수 민족들의 요구는 사회주의 연방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분리주의적 반혁명세력의 행위로 간주하여 배척당해 왔었다.
둘째, 민족의 자주성을 형식상 인정했으나, 각 민족의 문화, 언어, 종교는 사실상 경시되어 왔으며, 민족 행사들은 부르조아적인 것으로 몰려 폐지되었고 고등교육기관에서 러시아교육이 의무화되고 러시아어가 법적으로 공용화되었다.
셋째, 연방 전체의 이익을 내세운 강제적인 이주와 러시아 중심적인 경제정책은 많은 소수민족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 결과 비러시아계 공화국들과 러시아계 공화국간의 경제적 격차는 계속 증가하였다.
넷째, 1936년 스탈린 헌법으로 연방의 권한은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공화국의 권한은 축소되었다.
과거 구소련 통치하의 불공평한 통제정치로 인해 타민족들의 러시아에 대한 불만은소련의 변화와 함께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한 불만과 분쟁의 불씨는 1985년 고르바쵸프 등장 이후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의 강력한 추진에 편승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집단적 시위 및 탈소(脫蘇) 움직임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 참 고 문 헌
http://www.goodnews.co.kr/cksik/mtext/m6/4.htm
http://san.hufs.ac.kr/%7Eyugo/y218-1.htm
http://web.korea.ac.kr/~yoonin/worldrace/yugohistory.htm
http://www.cncho.pe.kr/kric/kric/yugo-serbia.htm
http://san.hufs.ac.kr/%7Eyugo/y218-1.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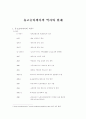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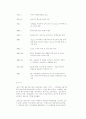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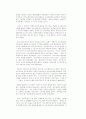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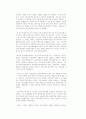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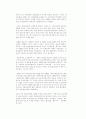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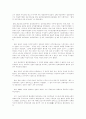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