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언
2. 시대 구분론
(1) 조선시대 전반에 관한 입장
(2) 붕당정치의 시기별 분류
3. 붕당정치의 변천
(1) 붕당론
(2) 사림의 대두와 정치체제 변화
(3) 붕당정치의 발달
(4) 붕당정치의 변질
(5) 탕평책의 대두와 특징
(6) 붕당정치의 파탄
4. 결 어
2. 시대 구분론
(1) 조선시대 전반에 관한 입장
(2) 붕당정치의 시기별 분류
3. 붕당정치의 변천
(1) 붕당론
(2) 사림의 대두와 정치체제 변화
(3) 붕당정치의 발달
(4) 붕당정치의 변질
(5) 탕평책의 대두와 특징
(6) 붕당정치의 파탄
4. 결 어
본문내용
譯), <後期李朝黨爭史에 관한 一考察>(p. 64)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91.
(6) 朋黨政治의 破綻
) 이 時期는 모든 原則이 무너져서 三政의 紊亂, 民亂의 發生 등 社會가 엄청나게 어지러워 졌다.
* 崔完基, <朝鮮 政治史의 새로운 照明>《朝鮮時代史의 理解》, 느티나무, 1993.
朋黨政治의 破綻이라고 함은 19世紀에 있었던 勢道政治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린 王들이 계속 卽位하면서 王權이 形便없이 弱해져서 나타난 現象이다. 政權의 屬性이 여기에서도 遺憾없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勢道政治는 朋黨政治와는 달리 利로운 點이 하나도 없다. 때문에 이 部分에서는 勢道政治의 歷史上의 位置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政權의 屬性 中의 하나가 바로 權力이 集中이 되면 될수록 그 힘이 더 커진다는 데에 있다. 卽 朋黨政治의 變質이라고 일컫던 時期의 特徵이 一黨專制化인데 이 時期는 一黨 中에서도 一家門 獨裁인 것이다. 이로 因하여 英.正祖代에 艱辛히 그 힘을 回復한 王權은 다시 무너지게 되었고 下層民의 生活은 이루 말할 수 없이 疲弊해져갔다. 또한 우리 歷史에서 重大한 課題 中의 하나였던 近代化를 이루어야 할 時期에 가장 封建的이고 近代化에 逆行하는 跛行政治가 이루어져서 英.正祖代에 싹트던 近代意識의 萌芽마저 잘라버렸다. 이로 因하여 우리 歷史는 逆行을 하였고 이는 近代의 時期에 國權强奪까지 이르게 되었다.
) 近代 萌芽論이 最近 크게 浮刻이 되고 있다. 政治面에서는 民主政治, 經濟面에서는 資本主義, 社會面에서는 平等社會의 志向, 文化面에서는 合理的 思考를 바탕으로 한 文化 등을 追求하면 近代의 萌芽라고 하는데 이러한 現象이 우리 歷史에서도 17世紀 後半∼18世紀 末까지 確然히 나타났다.
4. 結 語
歷史에 無知한 많은 사람들이 흔히 錯覺하는 것이 朝鮮이 黨爭으로 因하여 亡했다는 것이다. 植民史觀의 影響이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朋黨政治는 몇가지 側面을 除外하고는 바람직한 機能이 더 많았다고 보인다. 最近의 民族主義 史學은 黨爭이란 用語 自體를 否認하고 있다. 中國 宋代의 朋黨論을 들면서 朝鮮時代 當代에 쓰이던 朋黨이란 말을 導入해 朋黨政治라고 말한다. 이는 바람직한 現象이라고 생각하기 前에 當然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16世紀 後半 以來의 朋黨政治는 社會.經濟的 變動 속에서 兩班社會가 動搖함에 이르러 이를 나름대로 克服하고자 政治秩序를 再編함으로써, 政局運營에서의 當爲性을 찾고 基層社會를 더욱 效果的으로 支配하기 위하여 提示된 便法的 政治原理라 하겠다. 朋黨政治가 다소 進展된 政治形態로 理解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中世的 政治原理 以上의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朋黨政治는 兩班社會 矛盾의 副産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民衆史觀的 立場에서 본 意義이다. 崔完基 敎授가 <朋黨政治의 展開와 政局의 變化>〔《韓國史》9 (中世社會의 解體-1), 한길사, 1994.〕에서 主張한 바이다.
내 立場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當時의 價値觀, 政治 發達 段階, 經濟 水準, 意識化 程度를 살펴보면 이는 宏壯히 發達된 政治 形態라고 느끼며 이런 發達된 政治 形態를 갖추고 運營했던 것이 놀라울 程度이다. 中國에서도 결코 適用하지 못했던 進步한 政治 形態를 갖춘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진다.
난 朝鮮 後期의 政治史의 性格을 序言에서 「士林의 言論을 通한 均衡의 政治」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不足한 點도 많았지만 어느 程度 糾明이 되었다고 믿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1. 李泰鎭, <黨爭을 어떻게 볼 것인가>《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91.
2. 李泰鎭, <朝鮮後期의 政治的 葛藤과 그 解決>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91.
3. 石井壽夫(洪淳民 譯), <後期李朝黨爭史에 관한 一考察>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91.
4. 鄭萬祚, <英祖代 初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推進>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91.
5. 崔完基, <世紀史로서의 理解>《朝鮮時代史의 理解》, 느티나무, 1993.
6. 崔完基, <政局運營>《朝鮮時代史의 理解》, 느티나무, 1993.
7. 崔完基, <朝鮮 政治史의 새로운 照明>《朝鮮時代史의 理解》, 느티나무, 1993.
8. 李銀順, <老少黨論과 政論의 源流>《朝鮮後期 黨爭史 硏究》, 一潮閣, 1993.
9. 李銀順, <老少黨爭의 論點과 名分論>《朝鮮後期 黨爭史 硏究》, 一潮閣, 1993.
10. 李銀順, <朝鮮後期 黨爭史의 性格과 意義>《朝鮮後期 黨爭史 硏究》, 一潮閣, 1993.
11. 黃元九, <閥閱政治>《韓國史》13, 國史編纂委員會, 1984.
12. 최이돈, <士林의 擡頭와 中央政治體制의 變化>
《韓國史》7 (中世社會의 發展-1), 한길사, 1994.
13. 崔完基, <朋黨政治의 展開와 政局의 變化>
《韓國史》9 (中世社會의 解體-1), 한길사, 1994.
14. 朴光用,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韓國史論》10,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84.
15. 吳洙彰,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韓國史論》13,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85.
16. 金恒洙, <16世紀 士林의 性理學 理解>《韓國史論》7,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85.
17. 鄭萬祚,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韓國史學》10,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9.
18. 李綺南, <光海朝 政治勢力의 構造와 變動>
《北岳史論》(第2輯), 國民大學校 國史學科, 1990.
19. 徐仁漢, <仁祖初 服制 論議에 대한 小考>
《北岳史論》(創刊號), 國民大學校 國史學科, 1989.
20. 邊太燮,《韓國史通論》(三訂版), 三英社, 1993.
21. 李基白,《韓國史新論》(新修版), 一潮閣, 1993.
22. 韓國史硏究會 編,《第2版 韓國史硏究入門》, 知識産業社, 1993.
<時代 區分論>
* 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서술분과,《한국근대운동사》, 돌베개, 1989.
* 역사문제연구소,《한국근현대 연구입문》, 역사비평사, 1989.
* 趙東杰,《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硏究》, 知識産業社, 1989.
* 車河淳 編著,《史觀이란 무엇인가》<청람논단 1>, 청람, 1993.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91.
(6) 朋黨政治의 破綻
) 이 時期는 모든 原則이 무너져서 三政의 紊亂, 民亂의 發生 등 社會가 엄청나게 어지러워 졌다.
* 崔完基, <朝鮮 政治史의 새로운 照明>《朝鮮時代史의 理解》, 느티나무, 1993.
朋黨政治의 破綻이라고 함은 19世紀에 있었던 勢道政治를 가리키는 말이다. 어린 王들이 계속 卽位하면서 王權이 形便없이 弱해져서 나타난 現象이다. 政權의 屬性이 여기에서도 遺憾없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勢道政治는 朋黨政治와는 달리 利로운 點이 하나도 없다. 때문에 이 部分에서는 勢道政治의 歷史上의 位置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政權의 屬性 中의 하나가 바로 權力이 集中이 되면 될수록 그 힘이 더 커진다는 데에 있다. 卽 朋黨政治의 變質이라고 일컫던 時期의 特徵이 一黨專制化인데 이 時期는 一黨 中에서도 一家門 獨裁인 것이다. 이로 因하여 英.正祖代에 艱辛히 그 힘을 回復한 王權은 다시 무너지게 되었고 下層民의 生活은 이루 말할 수 없이 疲弊해져갔다. 또한 우리 歷史에서 重大한 課題 中의 하나였던 近代化를 이루어야 할 時期에 가장 封建的이고 近代化에 逆行하는 跛行政治가 이루어져서 英.正祖代에 싹트던 近代意識의 萌芽마저 잘라버렸다. 이로 因하여 우리 歷史는 逆行을 하였고 이는 近代의 時期에 國權强奪까지 이르게 되었다.
) 近代 萌芽論이 最近 크게 浮刻이 되고 있다. 政治面에서는 民主政治, 經濟面에서는 資本主義, 社會面에서는 平等社會의 志向, 文化面에서는 合理的 思考를 바탕으로 한 文化 등을 追求하면 近代의 萌芽라고 하는데 이러한 現象이 우리 歷史에서도 17世紀 後半∼18世紀 末까지 確然히 나타났다.
4. 結 語
歷史에 無知한 많은 사람들이 흔히 錯覺하는 것이 朝鮮이 黨爭으로 因하여 亡했다는 것이다. 植民史觀의 影響이라고 여겨진다. 오히려 朋黨政治는 몇가지 側面을 除外하고는 바람직한 機能이 더 많았다고 보인다. 最近의 民族主義 史學은 黨爭이란 用語 自體를 否認하고 있다. 中國 宋代의 朋黨論을 들면서 朝鮮時代 當代에 쓰이던 朋黨이란 말을 導入해 朋黨政治라고 말한다. 이는 바람직한 現象이라고 생각하기 前에 當然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16世紀 後半 以來의 朋黨政治는 社會.經濟的 變動 속에서 兩班社會가 動搖함에 이르러 이를 나름대로 克服하고자 政治秩序를 再編함으로써, 政局運營에서의 當爲性을 찾고 基層社會를 더욱 效果的으로 支配하기 위하여 提示된 便法的 政治原理라 하겠다. 朋黨政治가 다소 進展된 政治形態로 理解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中世的 政治原理 以上의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朋黨政治는 兩班社會 矛盾의 副産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民衆史觀的 立場에서 본 意義이다. 崔完基 敎授가 <朋黨政治의 展開와 政局의 變化>〔《韓國史》9 (中世社會의 解體-1), 한길사, 1994.〕에서 主張한 바이다.
내 立場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當時의 價値觀, 政治 發達 段階, 經濟 水準, 意識化 程度를 살펴보면 이는 宏壯히 發達된 政治 形態라고 느끼며 이런 發達된 政治 形態를 갖추고 運營했던 것이 놀라울 程度이다. 中國에서도 결코 適用하지 못했던 進步한 政治 形態를 갖춘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진다.
난 朝鮮 後期의 政治史의 性格을 序言에서 「士林의 言論을 通한 均衡의 政治」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不足한 點도 많았지만 어느 程度 糾明이 되었다고 믿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1. 李泰鎭, <黨爭을 어떻게 볼 것인가>《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91.
2. 李泰鎭, <朝鮮後期의 政治的 葛藤과 그 解決>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91.
3. 石井壽夫(洪淳民 譯), <後期李朝黨爭史에 관한 一考察>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91.
4. 鄭萬祚, <英祖代 初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推進>
《朝鮮時代 政治史의 再照明》, 汎潮社, 1991.
5. 崔完基, <世紀史로서의 理解>《朝鮮時代史의 理解》, 느티나무, 1993.
6. 崔完基, <政局運營>《朝鮮時代史의 理解》, 느티나무, 1993.
7. 崔完基, <朝鮮 政治史의 새로운 照明>《朝鮮時代史의 理解》, 느티나무, 1993.
8. 李銀順, <老少黨論과 政論의 源流>《朝鮮後期 黨爭史 硏究》, 一潮閣, 1993.
9. 李銀順, <老少黨爭의 論點과 名分論>《朝鮮後期 黨爭史 硏究》, 一潮閣, 1993.
10. 李銀順, <朝鮮後期 黨爭史의 性格과 意義>《朝鮮後期 黨爭史 硏究》, 一潮閣, 1993.
11. 黃元九, <閥閱政治>《韓國史》13, 國史編纂委員會, 1984.
12. 최이돈, <士林의 擡頭와 中央政治體制의 變化>
《韓國史》7 (中世社會의 發展-1), 한길사, 1994.
13. 崔完基, <朋黨政治의 展開와 政局의 變化>
《韓國史》9 (中世社會의 解體-1), 한길사, 1994.
14. 朴光用, <蕩平論과 政局의 變化>《韓國史論》10,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84.
15. 吳洙彰,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韓國史論》13,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85.
16. 金恒洙, <16世紀 士林의 性理學 理解>《韓國史論》7,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85.
17. 鄭萬祚,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韓國史學》10,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9.
18. 李綺南, <光海朝 政治勢力의 構造와 變動>
《北岳史論》(第2輯), 國民大學校 國史學科, 1990.
19. 徐仁漢, <仁祖初 服制 論議에 대한 小考>
《北岳史論》(創刊號), 國民大學校 國史學科, 1989.
20. 邊太燮,《韓國史通論》(三訂版), 三英社, 1993.
21. 李基白,《韓國史新論》(新修版), 一潮閣, 1993.
22. 韓國史硏究會 編,《第2版 韓國史硏究入門》, 知識産業社, 1993.
<時代 區分論>
* 망원한국사연구실 한국근대민중운동사서술분과,《한국근대운동사》, 돌베개, 1989.
* 역사문제연구소,《한국근현대 연구입문》, 역사비평사, 1989.
* 趙東杰,《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硏究》, 知識産業社, 1989.
* 車河淳 編著,《史觀이란 무엇인가》<청람논단 1>, 청람,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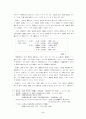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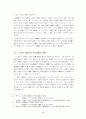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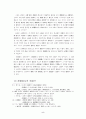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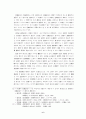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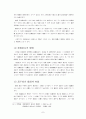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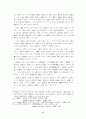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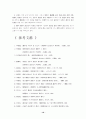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