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체주의란?
2. 해체주의대표건축가
3. (버나드 미츄)-작품 해설
4. 결론
2. 해체주의대표건축가
3. (버나드 미츄)-작품 해설
4. 결론
본문내용
조형적 시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점은 자연의 모방으로 이어져온 옴스테드식 전통에 대한 반성과 도시공원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라빌레뜨와 이에 대한 비평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데에 있다.
일부에서는 공원이 지나치게 건축위주의 구성으로 자연경관적 요소를 건축에 종속시켰고 자연을 건축물 사이에 채우는 것으로 전락시켰다는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도 있고, 건축적 관념의 과잉으로 공원이 가져야 할 감각적인 자연의 체험을 축소한 측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공원의 모습에 식상한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도시와 대화하고 도시 문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변화 가능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원의 모델을 탐색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제 공원은 자연을 재현하는 장으로서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러 양태의 활동들, 놀이나 집회, 행사 모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과 문화를 담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베르나르 츄미의 라빌레뜨는 이러한 변화된 공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garden of mists garden of bamboos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1980년대 중반 이후 건축계에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해체주의 계열의 건축은 신세대 건축가 들의 적극적 호응을 받고있는 건축으로 촬스젠크스는 Neo-Modernism계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1988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해체주의 건축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전시회를 통하여 이 용어가 확산되기 시작 하였다.
이 전시회의 게스트 큐레이터인 건축가 필립 존슨이 7명의 건축가(Frank O, Gehry, Daniel Libeskind, Rem Koolhaas, Peter Eisenman, Zaha M, Hadid, Coop Himmelbl, Bernard Tschumi )를 초빙 1980년 이후의 작품을 모아 전시를 한 것으로 그것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 유사한 경향을 연결시킨 전시회였다. 필립 존슨은 전 시회 행사를 위한 출판물에서 해체주의 건축은 새로운 양식은 아니며 근대건축의 구세주적인 열 정이나 천주교나 캘빈교와 같은 일종의 배타주의로서 그것의 발전을 횡탈하지 않으며 해체주의 건축은 어떠한 운동도 대표하지 않고 강령도 아니다. 그것은 추종해야될 어떠한 규칙도 없으며 7명의 건축가는 더욱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부 큐레이터인 마크 위글리는 이 전시회에 초대 된 프로젝트들은 순수한 형태에 대한 꿈이 좌절된 색다른 감각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은 해체주의(Deconstruction)라는 철학이론으로 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건축적 전통속에서 부터 나온 것으로 몇몇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존슨은 그것은 1920-30년대의 러시아 구성주의를 출발점으로 보고 말레비치(Malevich)에서 리씨츠키(Lissitzky)까지의 모든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작품과 이들과의 유사함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들 작품은 \"침해된 완전성\"으로 해체주의는 파괴나 위선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조화, 통일, 안전성에 대한 가치에 도전함으로서 그것의 모든 힘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은신되어 있는 전통의 순수한 형태를 꺼내어서 억압된 불순성의 징후를 부드럽게 달래거나 가칠게 다루어 표면으로 끌어내는데, 불순하고, 삐뚤어지고, 균열되고, 변곡되며, 부유하고 충돌하는 불규칙성의 집합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란은 깨지고 쪼개 지며 분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의 분열, 전위, 편향, 일탈 및 비틀림으로 구조속에 형상들을 교란시키면서 내적 구조와 구축물 속에 포함시키는 치환의 방법이다. 이러한 교란은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화적 변천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또한 그것으로 귀착되는 것도 아니다.
그 동요는 한세 대의 새로운 정신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며, 불안정한 세계가 불안정된 건축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건축가는 무의식적인 순수한 형태속에 존재하면서 급진적인 다른 방식으로 형태를 전복 시키기 위해 전통적으로 억제된 것을 제거한다. 따라서 마침내는 형태가 새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를 찌그러트리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 셀 푸코(Michel Foucault)의 \"광기의 역사나\" 자크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주의(차연의 이론)에서 그 근거를 관련시켜 합리화 하고 있으며 츄미나 피터 아이젠만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부에서는 공원이 지나치게 건축위주의 구성으로 자연경관적 요소를 건축에 종속시켰고 자연을 건축물 사이에 채우는 것으로 전락시켰다는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도 있고, 건축적 관념의 과잉으로 공원이 가져야 할 감각적인 자연의 체험을 축소한 측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공원의 모습에 식상한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 도시와 대화하고 도시 문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변화 가능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원의 모델을 탐색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제 공원은 자연을 재현하는 장으로서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러 양태의 활동들, 놀이나 집회, 행사 모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과 문화를 담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베르나르 츄미의 라빌레뜨는 이러한 변화된 공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garden of mists garden of bamboos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1980년대 중반 이후 건축계에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해체주의 계열의 건축은 신세대 건축가 들의 적극적 호응을 받고있는 건축으로 촬스젠크스는 Neo-Modernism계열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1988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해체주의 건축 (Deconstructivist Architecture)
전시회를 통하여 이 용어가 확산되기 시작 하였다.
이 전시회의 게스트 큐레이터인 건축가 필립 존슨이 7명의 건축가(Frank O, Gehry, Daniel Libeskind, Rem Koolhaas, Peter Eisenman, Zaha M, Hadid, Coop Himmelbl, Bernard Tschumi )를 초빙 1980년 이후의 작품을 모아 전시를 한 것으로 그것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 유사한 경향을 연결시킨 전시회였다. 필립 존슨은 전 시회 행사를 위한 출판물에서 해체주의 건축은 새로운 양식은 아니며 근대건축의 구세주적인 열 정이나 천주교나 캘빈교와 같은 일종의 배타주의로서 그것의 발전을 횡탈하지 않으며 해체주의 건축은 어떠한 운동도 대표하지 않고 강령도 아니다. 그것은 추종해야될 어떠한 규칙도 없으며 7명의 건축가는 더욱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부 큐레이터인 마크 위글리는 이 전시회에 초대 된 프로젝트들은 순수한 형태에 대한 꿈이 좌절된 색다른 감각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은 해체주의(Deconstruction)라는 철학이론으로 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건축적 전통속에서 부터 나온 것으로 몇몇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존슨은 그것은 1920-30년대의 러시아 구성주의를 출발점으로 보고 말레비치(Malevich)에서 리씨츠키(Lissitzky)까지의 모든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작품과 이들과의 유사함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들 작품은 \"침해된 완전성\"으로 해체주의는 파괴나 위선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조화, 통일, 안전성에 대한 가치에 도전함으로서 그것의 모든 힘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은신되어 있는 전통의 순수한 형태를 꺼내어서 억압된 불순성의 징후를 부드럽게 달래거나 가칠게 다루어 표면으로 끌어내는데, 불순하고, 삐뚤어지고, 균열되고, 변곡되며, 부유하고 충돌하는 불규칙성의 집합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란은 깨지고 쪼개 지며 분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의 분열, 전위, 편향, 일탈 및 비틀림으로 구조속에 형상들을 교란시키면서 내적 구조와 구축물 속에 포함시키는 치환의 방법이다. 이러한 교란은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화적 변천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또한 그것으로 귀착되는 것도 아니다.
그 동요는 한세 대의 새로운 정신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며, 불안정한 세계가 불안정된 건축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건축가는 무의식적인 순수한 형태속에 존재하면서 급진적인 다른 방식으로 형태를 전복 시키기 위해 전통적으로 억제된 것을 제거한다. 따라서 마침내는 형태가 새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를 찌그러트리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 셀 푸코(Michel Foucault)의 \"광기의 역사나\" 자크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주의(차연의 이론)에서 그 근거를 관련시켜 합리화 하고 있으며 츄미나 피터 아이젠만이 대표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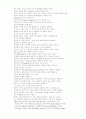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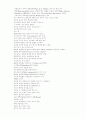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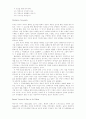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