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2.코페르니쿠스의 변혁
3.코페르니쿠스 변혁이 야기한 천문학 외적인 문제
4.신플라톤주의와 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
5.코페르니쿠스 변혁의 한계성
6.과도기적 천문학자였던 티코 브라헤
7.케플러와 타원궤도
8.갈릴레오의 망원경 관찰
2.코페르니쿠스의 변혁
3.코페르니쿠스 변혁이 야기한 천문학 외적인 문제
4.신플라톤주의와 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
5.코페르니쿠스 변혁의 한계성
6.과도기적 천문학자였던 티코 브라헤
7.케플러와 타원궤도
8.갈릴레오의 망원경 관찰
본문내용
받아들여졌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운동에 대한 원인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성이 부등속 타원운동을 하게 되면 문제는 달랐다. 왜 행성이 그러한 운동을 하는가, 무엇이 그러한 운동의 원인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케플러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해서, 한때 그는 당시 발표된 길버트(William Gilbert, 1540∼1603)의 『자석에 대해서』(De Magnete, 1600)에 영향받아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기적 힘에 의해 행성이 움직인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뉴튼(Isaac Newton, 1642∼1727)의 만유인력의 개념과 새로운 역학체계의 출현을 기다려야만 했다.
갈릴레오의 망원경 관찰
케플러의 법칙들과 그에 의한 정학한 계산들에 의해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구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에게는 천문학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설득이 필요했고 갈릴레오가 이를 제공했다. 갈릴레오는 1609년에 새로 고안한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관측하고 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를 위한 증거로 사용될 만한 여러 사실들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음을 관측했고, 특히 별들의 크기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별빛이 퍼져서 크게 보이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만큼 별들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앞에서 본 것처럼 시차가 관측 안 될 정도로 별들의 거리가 먼, 거의 무한한 우주의 관념에 관한 뒷받침이 되었다. 또 망원경으로 본 달의 표면이 아주 울퉁불퉁하고 거의 지구의 표면과 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 것은 완전한 천상계와 불완전한 지상계의 엄격한 구별에 타격을 가했다. 더구나 천체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되어온 태양마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흑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불규칙하다는 관측은 천상계가 완전하고 불변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관념을 깨뜨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목성에도 달이 있다는 갈릴레오의 관측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구조에 있어서 달이 지니는 문제---즉 행성인 지구가 그 자체의 위성을 지니는 문제---를 제거해 주었다. 목성에도 달이 있다면 행성이 그 자체의 달을 지니는 것은 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구조에도 나타날 문제이기 때문이다.
갈릴레오의 망원경을 통한 관측결과들 중 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에 대해 지금까지 본 것들에 비해 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금성이 달처럼 차고 기우는 것을 관측한 것이 그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구조에 의하면 지구에서는 항상 금성의 태양 반대쪽 면만 보기 때문에 초생달 모양만 보여야 할 것인 데 반해, 코페르니쿠스 구조에서는 초생달 모양, 반달모양, 보름달 모양이 모두 가능하고, 특히 보름달 모양의 경우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크기가 작고 반대의 경우는 커야 한다. 망원경의 관측결과는 바로 코페르니쿠스 구조에서 예측된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코페르니쿠스 구조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서 생각되었다.
이와 같은 망원경을 통한 증거들은---금성의 차고 기울음의 관측도---물론 코페르니쿠스의 구조에 대한 완전한 증명은 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티코의 구조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증거들은 이미 케플러의 업적에 의해 천문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구조를 받아들인 후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 증거들의 기여는 천문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비수학적인 차원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데 있었다.
갈릴레오의 망원경 관찰
케플러의 법칙들과 그에 의한 정학한 계산들에 의해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구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에게는 천문학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설득이 필요했고 갈릴레오가 이를 제공했다. 갈릴레오는 1609년에 새로 고안한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관측하고 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를 위한 증거로 사용될 만한 여러 사실들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음을 관측했고, 특히 별들의 크기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별빛이 퍼져서 크게 보이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만큼 별들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고 앞에서 본 것처럼 시차가 관측 안 될 정도로 별들의 거리가 먼, 거의 무한한 우주의 관념에 관한 뒷받침이 되었다. 또 망원경으로 본 달의 표면이 아주 울퉁불퉁하고 거의 지구의 표면과 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 것은 완전한 천상계와 불완전한 지상계의 엄격한 구별에 타격을 가했다. 더구나 천체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되어온 태양마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흑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불규칙하다는 관측은 천상계가 완전하고 불변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관념을 깨뜨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목성에도 달이 있다는 갈릴레오의 관측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구조에 있어서 달이 지니는 문제---즉 행성인 지구가 그 자체의 위성을 지니는 문제---를 제거해 주었다. 목성에도 달이 있다면 행성이 그 자체의 달을 지니는 것은 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톨레마이오스 구조에도 나타날 문제이기 때문이다.
갈릴레오의 망원경을 통한 관측결과들 중 코페르니쿠스 우주구조에 대해 지금까지 본 것들에 비해 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금성이 달처럼 차고 기우는 것을 관측한 것이 그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구조에 의하면 지구에서는 항상 금성의 태양 반대쪽 면만 보기 때문에 초생달 모양만 보여야 할 것인 데 반해, 코페르니쿠스 구조에서는 초생달 모양, 반달모양, 보름달 모양이 모두 가능하고, 특히 보름달 모양의 경우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크기가 작고 반대의 경우는 커야 한다. 망원경의 관측결과는 바로 코페르니쿠스 구조에서 예측된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코페르니쿠스 구조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서 생각되었다.
이와 같은 망원경을 통한 증거들은---금성의 차고 기울음의 관측도---물론 코페르니쿠스의 구조에 대한 완전한 증명은 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티코의 구조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증거들은 이미 케플러의 업적에 의해 천문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구조를 받아들인 후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 증거들의 기여는 천문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비수학적인 차원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데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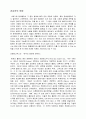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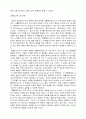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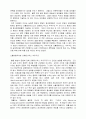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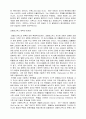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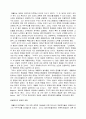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