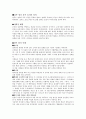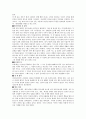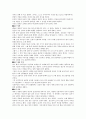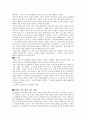목차
절부 열녀 효부 효녀 의미
시대적 배경
절부 열녀 사례
효부 효녀 사례
절개와 효에 관한 나의 견해
시대적 배경
절부 열녀 사례
효부 효녀 사례
절개와 효에 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없어지고 저녁 햇살이 숲속을 훤하게 비추고 있었다. 선심은 꿈에 들은 노인의 말이 생각나 발밑을 살펴보니 지금껏 보지 못한 풀 한포기가 돌틈에 삐죽 나와 있었다. 기이한 생각이든 선심은 조심조심 뿌리가 상하지 않게 캐냈다. 몇백년 묵은 산삼을 캔 것이다. 집에 돌아온 선심은 정성껏 다려 드렸더니 어머니의 병환은 씻은 듯이 나았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산으로 몰려갔지만 산삼은 캐지 못하였다. 효심이 지극한 선심만이 산삼을 볼 수 있도록 산신령이 도와준 것임을 알았다. 그 후부터 선심이 살던 골짜기를 선심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효녀 지은
주인공 지은이 연권(連權)의 딸리기 때문에 '연권녀' 설화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한다. <삼국유사> 권5에는 '빈녀양모(貧女養母)'라 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효녀 지은(知恩)은 연권의 딸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32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다. 그는 품팔이 뿐만 아니라 걸인 노릇도 하면서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섬겼다, 그러나 어는 해 큰 흉년이 들어 동냥도 할 수 없게 되자 지은이 양곡 30석에 남의 집 종이 되었다. 종일 일하고는 밥을 얻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게 된 후로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밥맛을 잃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따지자 지은은 종이 된 사실을 고백하고 모녀는 붙들고 울었다. 마침 화랑 효종랑(孝宗郞)이 집 앞을 지나다가 듣고는 들어가 사정을 묻고 조[粟] 100석과 의복을 보냈다. 후에 진성왕(眞聖王)이 알고 다시 조 500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군사를 보내어 그 집을 호위하도록 했다. 그 동리를 표창하여 효양리(孝養里)라고 하게 하였다.
이 설화는 [심청전]의 근원설화가 된다.
■절개와 효에 대한 나의 견해
조선시대의 유교이념에 의해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지배하는 크게는 나라 작게는 가문을 위해 여성의 희생은 당연시 되었다.현대사회에 성이 상품화되어 남용되고 순결의 의미가 퇴색되어가지만 조선시대와 같은 지나친 여성의 희생은 불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삶은 철저히 무시된채 자의적 타의적으로 여성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홀로살아가거나 목숨을 끊어야 했다. 나라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상을 주거나 가문에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 이야기책까지 만들어 여성의 절개를 강요하였다. 여성의 인권보장이 된 상황에서 조선시대의 여성의 절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과 달리 동양사상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 효 사상이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이며 의무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나라에서 효부 효녀 상을 제정하여 매년 상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남아있는 유교의 잔재로 인해 남성이 처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아직도 당연시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남성들에게 주는 효의 상은 없다. 효는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기본덕목인 것이다. 인간윤리의 기분에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가지는 것이 아쉽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산으로 몰려갔지만 산삼은 캐지 못하였다. 효심이 지극한 선심만이 산삼을 볼 수 있도록 산신령이 도와준 것임을 알았다. 그 후부터 선심이 살던 골짜기를 선심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효녀 지은
주인공 지은이 연권(連權)의 딸리기 때문에 '연권녀' 설화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한다. <삼국유사> 권5에는 '빈녀양모(貧女養母)'라 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효녀 지은(知恩)은 연권의 딸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느라고 32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다. 그는 품팔이 뿐만 아니라 걸인 노릇도 하면서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섬겼다, 그러나 어는 해 큰 흉년이 들어 동냥도 할 수 없게 되자 지은이 양곡 30석에 남의 집 종이 되었다. 종일 일하고는 밥을 얻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게 된 후로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밥맛을 잃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따지자 지은은 종이 된 사실을 고백하고 모녀는 붙들고 울었다. 마침 화랑 효종랑(孝宗郞)이 집 앞을 지나다가 듣고는 들어가 사정을 묻고 조[粟] 100석과 의복을 보냈다. 후에 진성왕(眞聖王)이 알고 다시 조 500석과 집 한 채를 하사하고, 군사를 보내어 그 집을 호위하도록 했다. 그 동리를 표창하여 효양리(孝養里)라고 하게 하였다.
이 설화는 [심청전]의 근원설화가 된다.
■절개와 효에 대한 나의 견해
조선시대의 유교이념에 의해 여성은 남성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지배하는 크게는 나라 작게는 가문을 위해 여성의 희생은 당연시 되었다.현대사회에 성이 상품화되어 남용되고 순결의 의미가 퇴색되어가지만 조선시대와 같은 지나친 여성의 희생은 불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삶은 철저히 무시된채 자의적 타의적으로 여성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홀로살아가거나 목숨을 끊어야 했다. 나라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상을 주거나 가문에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 이야기책까지 만들어 여성의 절개를 강요하였다. 여성의 인권보장이 된 상황에서 조선시대의 여성의 절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과 달리 동양사상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 효 사상이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이며 의무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나라에서 효부 효녀 상을 제정하여 매년 상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남아있는 유교의 잔재로 인해 남성이 처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아직도 당연시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남성들에게 주는 효의 상은 없다. 효는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기본덕목인 것이다. 인간윤리의 기분에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가지는 것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