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초기의 부대 편제
3. 개편 후의 부대 편제
4. 광복군의 활동
5. 맺음말
2. 초기의 부대 편제
3. 개편 후의 부대 편제
4. 광복군의 활동
5. 맺음말
본문내용
52)『독립운동사』6, 462쪽.
한편 부양에 잔류한 인원은 대부분 적 점령지역으로 나가 지하공작원으로 징모제6분처의 활동을 계속하고 초모공작을 수행하여 후일 제3지대를 창설하는 주역이 되었다.
3) 선전활동
광복군의 선전활동은 광복군의 창설 사실과 그 존재를 알리고 광복군의 활동상을 국내외에 알려서, 국내외 동포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광복군에서는 선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훈처에 선전과를 설치하여 선전활동의 방침이나 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광복군 선전활동의 대상은 주로 적 점령지역내에 있는 동포들이었다. 중일전쟁이후 중국 화북지역에는 많은 한인동포가 거주하였고 일본군의 군속으로 복무하는 한인의 수도 증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광복군의 참여와 지원을 위한 선전공작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본군내에 있는 한적사병들에게도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1938년 지원병제, 1944년 학병과 징병으로 인하여 일본군내에 한인사병의 수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53) 韓詩俊,『韓國光復軍硏究』, 252 - 253쪽.
또 하나는 대적선전인데 이는 적군의 사기저하를 목적으로 중국전선에 나와있는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이들에게 反戰·厭戰思想을 유포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며 일본군의 패전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중국어·일어·영어 등으로 된 잡지의 발간과 전단·벽보 등을 작성하여 유포하는 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와 함께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선전활동으로 중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대상으로 \'對國際宣傳\' 을 중요시 하였다.
광복군은 창설 후인 1941년 2월 기관지인《光復》을 창간하여 광복군에 대한 선전과 홍보를 시작하였다.
54)《光復》誌에 대한 내용은 愼鏞廈,「《光復》誌 解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한국독립
운동사자료총서』1) 참조.
《光復》지의 간행은 총사령부의 정훈처가 담당하여 정훈처장의 책임하에 선전과 요원들이 실무자로 활동하였다. 중국어본 창간사에서는 발행목적을 \'중국의 민중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중국의 필승과 일본의 패망을 선전하여, 韓中의 연합항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고 하였다.《光復》은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의 두 종류를 발행하여 중국내의 교포와 중국의 행정·교육·군사·언론기관에 배포하여 큰 선전효과를 거두었다.
55) 愼鏞廈,「《光復》誌 解題」.
광복군의 선전활동은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선전활동을 통하여 나타난다. 즉 방송·전단살포·연극공연·음악활동 등이 그것이다. 방송을 통한 선전활동은 중경의 국제방송국을 통하여 3·1절이나 광복군 창설 기념일 기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기념 선언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방송을 통하여 전선하였다. 1945년초 총사령부에서는 心理硏究室을 설치하고 주로 여군들을 요원으로하여 방송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56)『독립운동사』6, 368쪽.
선전전단의 살포나 표어부착같은 것을 통한 선전활동도 이루어 졌다. 즉 총사령부에서 발표한 기념선언문이나 성명서 등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각 지대와 중국군 전방 유격대를 통해 배포되었으며, 각 지대 자체에서도 간행물과 전단을 작성하여 살포하였다. 이외에 연극공연이나 음악활동으로도 선전공작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지공작대는 서안에서 여러 차례 연극공연을 실시하였다.
57) 전지공작대에서는 1940년 5월, 6월에 서안에서 3부작 \'아리랑\' 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공연하여 중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韓詩俊,『韓國光復軍硏究』, 259쪽).
이 공연들은 중국인들의 항일의식을 크게 고취시켰으며, 한중합작을 위한 선전효과도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광복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의 自力에 의해 1940년 9월 17일 총사령부 성립식을 거행하고, 임정의 국군으로 창설되었다. 또한 광복군은 독립군의 人的 脈絡을 계승하였다. 즉 총사령 이청천·참모장 이범석·제1지대장 이준식·제2지대장 공진원·제3지대장 김학규 등 광복군의 핵심간부들이 1930년대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만주 독립군 출신으로 이루어 진 것이 그것이다.
1941년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 을 계기로 광복군은 중국군사위원회의 통제와 간섭을 받게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중국군이 광복군을 장악하였다. 그후 임정의 끈질긴 교섭에 의해 1944년 \'9개준승\' 취소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체하여 \'원조한국광복군판법\' 이 체결되어 1945년 5월 1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광복군의 독립성과 자주권이 회복되게 된 것이다.
한국광복군은 총사령부와 3개 지대로 편제되었다. 처음 총사령부를 설립하고 이후 단위부대를 편성하는 下向式 編制方法에 의해 부대편제를 갖추어 갔다. 제1·제2·제3지대는 총사령부 요인과 군사특파단 인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제5지대는 전지공작대가 편입하여 성립되었다. 이러한 편제는 1942년 개편되었다. 조선의용대가 편입해오면서 제1지대가 되었고 종전의 제1·제2·제5지대를 통합하여 제2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징모제6분처가 발전하여 제3지대로 성립되었다. 제1지대는 지대장 김원봉을 중심으로 중경에 지대본부를 두고, 호북성 노하구와 절강성 금화에 각각 구대를 설치하였다. 제2지대는 이범석을 지대장으로 하고, 섬서성 서안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제5지대 인원들이 부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제3지대는 김학규가 지대장이 되어 안휘성 부양을 거점으로 징모제6분처에서 초모한 인원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이러한 한국광복군의 병력규모는 1945년 8월 현재 대개 7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복군에서는 초모한 인원을 중국군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시키는 한편 기관지《광복》등을 통해 대내외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일무장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영국군과의 공동작전 및 미군과의 OSS훈련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광복군은 독립군을 계승하여 임정의 국군으로, 자주적으로 성립되었다. 초기의 30여명으로 창설된 이래 700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한 무장세력으로 발전해 간 광복군을 볼 때 그들의 자주적 항일독립 의지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양에 잔류한 인원은 대부분 적 점령지역으로 나가 지하공작원으로 징모제6분처의 활동을 계속하고 초모공작을 수행하여 후일 제3지대를 창설하는 주역이 되었다.
3) 선전활동
광복군의 선전활동은 광복군의 창설 사실과 그 존재를 알리고 광복군의 활동상을 국내외에 알려서, 국내외 동포들의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광복군에서는 선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훈처에 선전과를 설치하여 선전활동의 방침이나 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광복군 선전활동의 대상은 주로 적 점령지역내에 있는 동포들이었다. 중일전쟁이후 중국 화북지역에는 많은 한인동포가 거주하였고 일본군의 군속으로 복무하는 한인의 수도 증가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광복군의 참여와 지원을 위한 선전공작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본군내에 있는 한적사병들에게도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1938년 지원병제, 1944년 학병과 징병으로 인하여 일본군내에 한인사병의 수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53) 韓詩俊,『韓國光復軍硏究』, 252 - 253쪽.
또 하나는 대적선전인데 이는 적군의 사기저하를 목적으로 중국전선에 나와있는 일본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이들에게 反戰·厭戰思想을 유포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며 일본군의 패전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중국어·일어·영어 등으로 된 잡지의 발간과 전단·벽보 등을 작성하여 유포하는 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와 함께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선전활동으로 중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대상으로 \'對國際宣傳\' 을 중요시 하였다.
광복군은 창설 후인 1941년 2월 기관지인《光復》을 창간하여 광복군에 대한 선전과 홍보를 시작하였다.
54)《光復》誌에 대한 내용은 愼鏞廈,「《光復》誌 解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한국독립
운동사자료총서』1) 참조.
《光復》지의 간행은 총사령부의 정훈처가 담당하여 정훈처장의 책임하에 선전과 요원들이 실무자로 활동하였다. 중국어본 창간사에서는 발행목적을 \'중국의 민중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중국의 필승과 일본의 패망을 선전하여, 韓中의 연합항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고 하였다.《光復》은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의 두 종류를 발행하여 중국내의 교포와 중국의 행정·교육·군사·언론기관에 배포하여 큰 선전효과를 거두었다.
55) 愼鏞廈,「《光復》誌 解題」.
광복군의 선전활동은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선전활동을 통하여 나타난다. 즉 방송·전단살포·연극공연·음악활동 등이 그것이다. 방송을 통한 선전활동은 중경의 국제방송국을 통하여 3·1절이나 광복군 창설 기념일 기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기념 선언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방송을 통하여 전선하였다. 1945년초 총사령부에서는 心理硏究室을 설치하고 주로 여군들을 요원으로하여 방송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56)『독립운동사』6, 368쪽.
선전전단의 살포나 표어부착같은 것을 통한 선전활동도 이루어 졌다. 즉 총사령부에서 발표한 기념선언문이나 성명서 등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각 지대와 중국군 전방 유격대를 통해 배포되었으며, 각 지대 자체에서도 간행물과 전단을 작성하여 살포하였다. 이외에 연극공연이나 음악활동으로도 선전공작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지공작대는 서안에서 여러 차례 연극공연을 실시하였다.
57) 전지공작대에서는 1940년 5월, 6월에 서안에서 3부작 \'아리랑\' 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공연하여 중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韓詩俊,『韓國光復軍硏究』, 259쪽).
이 공연들은 중국인들의 항일의식을 크게 고취시켰으며, 한중합작을 위한 선전효과도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광복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의 自力에 의해 1940년 9월 17일 총사령부 성립식을 거행하고, 임정의 국군으로 창설되었다. 또한 광복군은 독립군의 人的 脈絡을 계승하였다. 즉 총사령 이청천·참모장 이범석·제1지대장 이준식·제2지대장 공진원·제3지대장 김학규 등 광복군의 핵심간부들이 1930년대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만주 독립군 출신으로 이루어 진 것이 그것이다.
1941년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 을 계기로 광복군은 중국군사위원회의 통제와 간섭을 받게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중국군이 광복군을 장악하였다. 그후 임정의 끈질긴 교섭에 의해 1944년 \'9개준승\' 취소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체하여 \'원조한국광복군판법\' 이 체결되어 1945년 5월 1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광복군의 독립성과 자주권이 회복되게 된 것이다.
한국광복군은 총사령부와 3개 지대로 편제되었다. 처음 총사령부를 설립하고 이후 단위부대를 편성하는 下向式 編制方法에 의해 부대편제를 갖추어 갔다. 제1·제2·제3지대는 총사령부 요인과 군사특파단 인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제5지대는 전지공작대가 편입하여 성립되었다. 이러한 편제는 1942년 개편되었다. 조선의용대가 편입해오면서 제1지대가 되었고 종전의 제1·제2·제5지대를 통합하여 제2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징모제6분처가 발전하여 제3지대로 성립되었다. 제1지대는 지대장 김원봉을 중심으로 중경에 지대본부를 두고, 호북성 노하구와 절강성 금화에 각각 구대를 설치하였다. 제2지대는 이범석을 지대장으로 하고, 섬서성 서안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제5지대 인원들이 부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제3지대는 김학규가 지대장이 되어 안휘성 부양을 거점으로 징모제6분처에서 초모한 인원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이러한 한국광복군의 병력규모는 1945년 8월 현재 대개 7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복군에서는 초모한 인원을 중국군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시키는 한편 기관지《광복》등을 통해 대내외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일무장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영국군과의 공동작전 및 미군과의 OSS훈련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광복군은 독립군을 계승하여 임정의 국군으로, 자주적으로 성립되었다. 초기의 30여명으로 창설된 이래 700명 이상의 인원을 확보한 무장세력으로 발전해 간 광복군을 볼 때 그들의 자주적 항일독립 의지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경남 지역의 독립 운동가
경남 지역의 독립 운동가 의병,독립군,광복군
의병,독립군,광복군 한국 독립 운동사
한국 독립 운동사 독립 운동의 전개
독립 운동의 전개 민족의 독립 운동
민족의 독립 운동 [의병][의병전쟁][독립군][의병활동][의병정신][의병운동]의병의 의의, 의병전쟁의 정치경제...
[의병][의병전쟁][독립군][의병활동][의병정신][의병운동]의병의 의의, 의병전쟁의 정치경제... [육당 최남선][기미독립선언서][계몽운동][선구자적 관점][친일론적 관점]육당 최남선의 생애...
[육당 최남선][기미독립선언서][계몽운동][선구자적 관점][친일론적 관점]육당 최남선의 생애... [프랑스어권연구]퀘벡 독립 운동의 역사 및 배경에 대하여 - 퀘벡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된 ...
[프랑스어권연구]퀘벡 독립 운동의 역사 및 배경에 대하여 - 퀘벡 독립 운동이 일어나게 된 ... 산미증식계획수업지도안(모의수업 세안 & 약안 & 학습활용자료) - Ⅲ. 민족 독립 운동...
산미증식계획수업지도안(모의수업 세안 & 약안 & 학습활용자료) - Ⅲ. 민족 독립 운동...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서재필, 독립협회 구성, 독립협회 활동 변화, 자주 국권 운동, 자유 민...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서재필, 독립협회 구성, 독립협회 활동 변화, 자주 국권 운동, 자유 민... [기념일, 환경의날, 4.19혁명]환경의날기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대한...
[기념일, 환경의날, 4.19혁명]환경의날기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대한... [한국근현대사]한국근현대사와 조선후기, 한국근현대사와 서원철폐, 한국근현대사와 갑신정변...
[한국근현대사]한국근현대사와 조선후기, 한국근현대사와 서원철폐, 한국근현대사와 갑신정변... 호찌민 (베트남 독립 운동)
호찌민 (베트남 독립 운동) [한국민족운동사] 1930년대 이후의 항일무장투쟁 단체 - 한국독립군,한국독립군의 창설과 투...
[한국민족운동사] 1930년대 이후의 항일무장투쟁 단체 - 한국독립군,한국독립군의 창설과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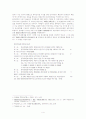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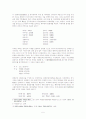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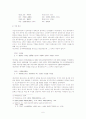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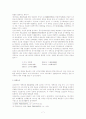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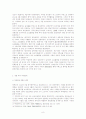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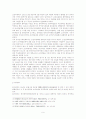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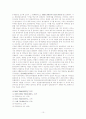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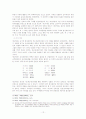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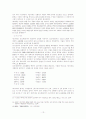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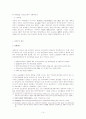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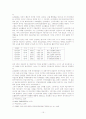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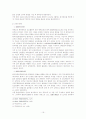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