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춘향전이란?
2.춘향전이 나타난 사회적 배경은?
3.춘향전의 구조
4.등장인물의 성격
5.춘향전의 심리학적 분석
6.주제의식
8.결론적으로
2.춘향전이 나타난 사회적 배경은?
3.춘향전의 구조
4.등장인물의 성격
5.춘향전의 심리학적 분석
6.주제의식
8.결론적으로
본문내용
규정되고, 이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개별 이본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배제할 수 없다. 개별 <춘향전>은 작품의 표제명에 있어서도 <춘향전>,<별춘향전>,<열녀춘향수절가>,<옥중화>등으로 그 변이를 보여주고 있다.
<춘향전군>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한 접근방법으로 다수의 <춘향전> 이본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 이본 계통을 크게 나누고, 이를 중심으로 한 <춘향전>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도 <춘향전>의 역사적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통시적 변이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태도는 개별 이본이 어떤 시기의 작품인지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설정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춘향의 신분을 중심으로 내려올수록 모계는 기생이나 부계는 양반으로 설정되어 비록 從母法이란 당시대의 신분제에 다른 피상적 논리 이상의 사회적 인식 변모에 의한 신분의 상승적 변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후기에 형성된 작품에서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춘향을 기생으로 확정시켜 작품을 전개한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이러한 점들을 주목하여 춘향전을 기생계 작품과 비기생계 작품으로 계통의 갈래를 짓기도 한다.
작품의 부분 소재가 아닌 총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계통을 구분한다면, 20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40종 이상의 필사본 및 목판본<춘향전>은 별춘향전계의 작품들과 남원고사계 작품들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들 두 작품군들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선후를 실증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별춘향전 계통의 작품이 절대 다수의 이본을 남겨놓고 있고, 같은 계통본 속에서도 지속적인 변이를 보여온 것을 고려한다면 별춘향전 계통의 남원고사 계통보다 선행한 계통본으로 추정된다.
1) 별춘향전계의 대표 이본이 지닌 개별성
별춘향전 계통에 속하는 이본들로는 <孫本별춘향전>을 비롯한 20세기 이전에 정착된 대부분의 필사본과 <完板 30장본 별춘향전>,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의 목판본들이 있다. 이들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작품의 짜임새도 뛰어난 것은 이들 중 가장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이다.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완판 30장본 별춘향전>이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로 확대 변이가 된 다음에 다시 84장으로 재확대되면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앞서 필사본이나 목판본에 비하여 월매와 춘향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춘향가의 인물들인 월매, 춘향, 향단의 세 여인상이 개성있게 부각되고 있다.
이 작품은 순조, 헌종, 고종의 삼대에 걸친 판소기극 전성시대의 여러 명창들에 의하여 다듬어진 판소리극 사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新판소리극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의 재담을 비롯한 풍부한 치레와 가요가 흥겨운 정감과 한스러운 정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갑오경장을 전후한 창작시기의 시대적 분위기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열녀로서의 춘향의 의식 못지 않게 불의에 저항하는 춘향의 매서움을 확산시킬 수 있는 풍자성을 은밀히 형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참신하고 세련된 언어표현 형식이 주는 미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현대 독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본으로서의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되었다.
2)남원고사계의 대표 이본이 지닌 개별성
남원고사 계통에 속하는 이본들로는 파리 동양어학교본 <南原古詞>를 비롯한 일본의 동양문고본 <춘향전>, 동경대학본 <춘향전> 등의 필사본과 최남선의 <古本春香傳>이 있고, 경판 35장본, 30장본, 23장본, 17장본, 16장본, 안성판 20장본의 목판본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작품의 짜임새가 뛰어난 것은 이들 중 가장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양어학교본 <南原古詞>다.
<남원고사>는 5책으로 필사되어 있고, 필사시기는 1권의 셰갑ㅈ(歲甲子) 하뉵월\' 4권의 셰긔 ㅅ(歲己巳) 구월 념오\'등으로 보아 1846년에서 1869년 사이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작품의 창작시기의 표시라기 보다는 선행본에서의 전사(轉寫)시기를 뜻하므로 원본은 이 시기 이전에 형성된 작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남원고사>의 특징은 20세기 이전에 창작된 <춘향전>으로서는 가장 장편으로 전체 분량이 약 10만자 정도가 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춘향전>의 기본 줄거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부분 장면을 확장시키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 변이를 보였음을 뜻한다.
전반적인 서술태도를 본다면 <남원고사>는 창작의식이 뚜렷한 작가에 의하여 판소리극 사설의 구성원리를 근거로 하여 장편소설화가 이루어진 이본이다. 이 작가는 고급문예인 한문학과 대중문예인 국문문학, 구비문학의 다양한 소재를 상당수 삽입시켜 엮었다. 또 한 작가의 일관된 서술방식에 의하여, 광대들의 판소리극 <춘향가> 사설보다 더 많은 재담과 가요를 수용하면서도 사건의 전체적 흐름에는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작품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 이는 전반부에서는 기생 춘향의 행동을 강조하고, 후반부에서는 열녀 춘향의 행동을 강조함과, 이도령을 만날때는 춘향의 신분이 기생이고 변부사를 만날 때는 代婢定屬한 것으로 설정한 사실에도 확인된다. 춘향의 애초의 신분은 기생인 월매의 딸이었기 때문에, 춘향은 스스로 기생임을 인정하고 뒷날을 위하여 不忘記를 받고 몸을 허락한다. 이러한 점은 <남원고사>가 <춘향전>의 역사적 전개로 볼 때 초기의 계통인 不忘記系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기생으로서의 춘향의 행동은 육체적 사랑을 표현함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별 후의 규수로서의 춘향의 행동은 강인한 정신적 사랑을 표현함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짜임새로 보면 두 가지 속성의 사랑을 구비한 온전한 사랑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춘향을 김춘향으로 설정하여 안씨, 성씨, 서씨로 설정한 이본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작품의 표제로 이 계통에 속하는 작품속에서도 이 이본만 유달리 <남원고사>란 특징있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춘향전군>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한 접근방법으로 다수의 <춘향전> 이본을 대표할 수 있는 몇몇 이본 계통을 크게 나누고, 이를 중심으로 한 <춘향전>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도 <춘향전>의 역사적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통시적 변이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태도는 개별 이본이 어떤 시기의 작품인지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틀을 설정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춘향의 신분을 중심으로 내려올수록 모계는 기생이나 부계는 양반으로 설정되어 비록 從母法이란 당시대의 신분제에 다른 피상적 논리 이상의 사회적 인식 변모에 의한 신분의 상승적 변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후기에 형성된 작품에서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춘향을 기생으로 확정시켜 작품을 전개한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이러한 점들을 주목하여 춘향전을 기생계 작품과 비기생계 작품으로 계통의 갈래를 짓기도 한다.
작품의 부분 소재가 아닌 총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계통을 구분한다면, 20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40종 이상의 필사본 및 목판본<춘향전>은 별춘향전계의 작품들과 남원고사계 작품들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들 두 작품군들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선후를 실증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별춘향전 계통의 작품이 절대 다수의 이본을 남겨놓고 있고, 같은 계통본 속에서도 지속적인 변이를 보여온 것을 고려한다면 별춘향전 계통의 남원고사 계통보다 선행한 계통본으로 추정된다.
1) 별춘향전계의 대표 이본이 지닌 개별성
별춘향전 계통에 속하는 이본들로는 <孫本별춘향전>을 비롯한 20세기 이전에 정착된 대부분의 필사본과 <完板 30장본 별춘향전>,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의 목판본들이 있다. 이들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작품의 짜임새도 뛰어난 것은 이들 중 가장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이다.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완판 30장본 별춘향전>이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로 확대 변이가 된 다음에 다시 84장으로 재확대되면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앞서 필사본이나 목판본에 비하여 월매와 춘향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춘향가의 인물들인 월매, 춘향, 향단의 세 여인상이 개성있게 부각되고 있다.
이 작품은 순조, 헌종, 고종의 삼대에 걸친 판소기극 전성시대의 여러 명창들에 의하여 다듬어진 판소리극 사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新판소리극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의 재담을 비롯한 풍부한 치레와 가요가 흥겨운 정감과 한스러운 정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갑오경장을 전후한 창작시기의 시대적 분위기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열녀로서의 춘향의 의식 못지 않게 불의에 저항하는 춘향의 매서움을 확산시킬 수 있는 풍자성을 은밀히 형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참신하고 세련된 언어표현 형식이 주는 미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현대 독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이본으로서의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되었다.
2)남원고사계의 대표 이본이 지닌 개별성
남원고사 계통에 속하는 이본들로는 파리 동양어학교본 <南原古詞>를 비롯한 일본의 동양문고본 <춘향전>, 동경대학본 <춘향전> 등의 필사본과 최남선의 <古本春香傳>이 있고, 경판 35장본, 30장본, 23장본, 17장본, 16장본, 안성판 20장본의 목판본이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작품의 짜임새가 뛰어난 것은 이들 중 가장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양어학교본 <南原古詞>다.
<남원고사>는 5책으로 필사되어 있고, 필사시기는 1권의 셰갑ㅈ(歲甲子) 하뉵월\' 4권의 셰긔 ㅅ(歲己巳) 구월 념오\'등으로 보아 1846년에서 1869년 사이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작품의 창작시기의 표시라기 보다는 선행본에서의 전사(轉寫)시기를 뜻하므로 원본은 이 시기 이전에 형성된 작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남원고사>의 특징은 20세기 이전에 창작된 <춘향전>으로서는 가장 장편으로 전체 분량이 약 10만자 정도가 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춘향전>의 기본 줄거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부분 장면을 확장시키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 변이를 보였음을 뜻한다.
전반적인 서술태도를 본다면 <남원고사>는 창작의식이 뚜렷한 작가에 의하여 판소리극 사설의 구성원리를 근거로 하여 장편소설화가 이루어진 이본이다. 이 작가는 고급문예인 한문학과 대중문예인 국문문학, 구비문학의 다양한 소재를 상당수 삽입시켜 엮었다. 또 한 작가의 일관된 서술방식에 의하여, 광대들의 판소리극 <춘향가> 사설보다 더 많은 재담과 가요를 수용하면서도 사건의 전체적 흐름에는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작품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 이는 전반부에서는 기생 춘향의 행동을 강조하고, 후반부에서는 열녀 춘향의 행동을 강조함과, 이도령을 만날때는 춘향의 신분이 기생이고 변부사를 만날 때는 代婢定屬한 것으로 설정한 사실에도 확인된다. 춘향의 애초의 신분은 기생인 월매의 딸이었기 때문에, 춘향은 스스로 기생임을 인정하고 뒷날을 위하여 不忘記를 받고 몸을 허락한다. 이러한 점은 <남원고사>가 <춘향전>의 역사적 전개로 볼 때 초기의 계통인 不忘記系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기생으로서의 춘향의 행동은 육체적 사랑을 표현함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별 후의 규수로서의 춘향의 행동은 강인한 정신적 사랑을 표현함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짜임새로 보면 두 가지 속성의 사랑을 구비한 온전한 사랑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춘향을 김춘향으로 설정하여 안씨, 성씨, 서씨로 설정한 이본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작품의 표제로 이 계통에 속하는 작품속에서도 이 이본만 유달리 <남원고사>란 특징있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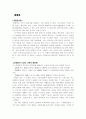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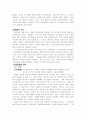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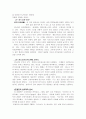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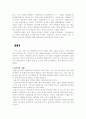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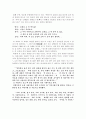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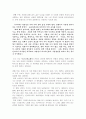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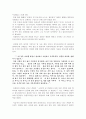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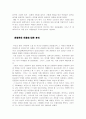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