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EU의 산업경쟁력 현황
1. EU국가들의 제조업부문 세계시장점유율
2.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투자규모
Ⅲ. EU의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1. EU경제의 당면문제
2. 4大 최우선과제
1) 무형투자의 확대
2) 산업협력의 증진
3) 공정경쟁여건의 조성
4) 공공부문의 역할 선진화
3. 4大 실천방안
1) 지식과 인적자원의 함양
2) 범유럽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생산조직의 개선
3) 과학.기술의 진보
4) 고성장시장에의 진출강화
IV. 결론
II. EU의 산업경쟁력 현황
1. EU국가들의 제조업부문 세계시장점유율
2.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투자규모
Ⅲ. EU의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1. EU경제의 당면문제
2. 4大 최우선과제
1) 무형투자의 확대
2) 산업협력의 증진
3) 공정경쟁여건의 조성
4) 공공부문의 역할 선진화
3. 4大 실천방안
1) 지식과 인적자원의 함양
2) 범유럽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생산조직의 개선
3) 과학.기술의 진보
4) 고성장시장에의 진출강화
IV. 결론
본문내용
들은 앞으로도 계속 제조업이 유럽경제의 근간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무형투자가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들어, 이에 시급히 적응하는 방향으로 생산방식 및 패턴 등 제품생산과 결부되어 있는 전반적인 조직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즉, R&D투자의 확대, 직업교육의 재정비 및 생산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강조 등을 통해 실로 커다란 생산조직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유럽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과학.기술의 진보
EU국가들은 산업경쟁력의 향상과 시장수요의 충족이라는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가지 고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기초과학연구, 경쟁이전의 실용연구 및 실용과학연구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학적 연구의 구분방식에 계속 따를 경우 연구결과를 유럽의 산업이 활용하는 정도가 과거처럼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이를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확산 및 이전, 그리고 이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기업부문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이를 위해 「경쟁력백서」는 과학연구의 최종책임자인 각 회원국 정부와 개별기업들이 주요 경쟁상대국의 동분야 전략을 면밀하게 연구.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WTO에서 제정된 보조금규정 등 EU가 준수해야 할 책임.의무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유럽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미래지향적으로 발굴하는 데 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특수한 용도에 투입되는 과학기술의 개발에 최우선적인 노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4) 고성장시장에의 진출강화
끝으로 유럽국가들은 EU전체의 산업생산능력에 비해 특정 성장산업에 있어서 유럽기업들의 상대적 위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EU기업들이 인접한 구동구권 국가에서의 영업활동은 대단히 활발한 반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는 매우 불만족한 진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EU집행위원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94년 7월 「EU의 對아시아 新전략」보고서를 발표하고, 금년 3월 아시아.유럽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아시아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음.
또한 산업분야의 측면에 있어서도 EU기업들의 활동이 성장속도가 빠르지 못한 전통적 산업분야에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래산업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고성장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여타 경쟁국에 뒤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유럽의 기업들은 EU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역외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등 시장진출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식.문화산업, 위생.생명공학산업 및 환경보호산업 등 미래의 기간산업이 될 분야에로의 진출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분야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최고급제품에의 특화전략으로 그들의 산업활동의 중점을 방향전환할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지금까지 EU가 공동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의 대강을 살펴 보았다. 이에 의하면 EU국가들은 EU의 산업경쟁력이 특히 8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일본, 그리고 한국.대만 등의 신흥공업국에 뒤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U집행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산업경쟁력 회복전략은 대체로 보아 정부의 역할은 공공부문의 서비스 선진화 등 경제의 효율성제고 측면에 제한하면서 최소화하면서, 다자간경쟁규범의 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등 시장기구 및 경제논리의 창달에 보다 커다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범유럽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한 생산조직 및 체계의 변화,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EU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경쟁력강화 전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생산활동의 범세계화에 동승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의 정부, 기업 및 소비자들로서도 세계 최대규모의 단일 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충격파를 보다 냉정한 눈으로 분석하고 이에 면밀하게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리라고 본다.
< 參考文獻 >
박성훈 (1996) :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의 배경과 경제적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96-03」 참조.
유진수(1993) :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15」 참조.
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1995) : \"Enhancing European Competi- tiveness\". Second Report to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Prime Ministers and Heads of State. December 1995.
European Commission , Growth, Competitiveness, Employment, White Paper, 1994.
European Commission, \"Industrial Policy in an Open and Competitive Environment. Guidelines for a Community Approach\", Communications of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o the European Parliament, COM(90) 556 final, Brussels, 16 November, 1990.
3) 과학.기술의 진보
EU국가들은 산업경쟁력의 향상과 시장수요의 충족이라는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가지 고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기초과학연구, 경쟁이전의 실용연구 및 실용과학연구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학적 연구의 구분방식에 계속 따를 경우 연구결과를 유럽의 산업이 활용하는 정도가 과거처럼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이를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확산 및 이전, 그리고 이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기업부문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이를 위해 「경쟁력백서」는 과학연구의 최종책임자인 각 회원국 정부와 개별기업들이 주요 경쟁상대국의 동분야 전략을 면밀하게 연구.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WTO에서 제정된 보조금규정 등 EU가 준수해야 할 책임.의무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유럽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미래지향적으로 발굴하는 데 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특수한 용도에 투입되는 과학기술의 개발에 최우선적인 노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4) 고성장시장에의 진출강화
끝으로 유럽국가들은 EU전체의 산업생산능력에 비해 특정 성장산업에 있어서 유럽기업들의 상대적 위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EU기업들이 인접한 구동구권 국가에서의 영업활동은 대단히 활발한 반면,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는 매우 불만족한 진출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EU집행위원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94년 7월 「EU의 對아시아 新전략」보고서를 발표하고, 금년 3월 아시아.유럽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아시아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음.
또한 산업분야의 측면에 있어서도 EU기업들의 활동이 성장속도가 빠르지 못한 전통적 산업분야에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래산업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고성장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여타 경쟁국에 뒤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유럽의 기업들은 EU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역외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등 시장진출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지식.문화산업, 위생.생명공학산업 및 환경보호산업 등 미래의 기간산업이 될 분야에로의 진출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분야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최고급제품에의 특화전략으로 그들의 산업활동의 중점을 방향전환할 가능성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지금까지 EU가 공동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의 대강을 살펴 보았다. 이에 의하면 EU국가들은 EU의 산업경쟁력이 특히 8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일본, 그리고 한국.대만 등의 신흥공업국에 뒤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U집행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산업경쟁력 회복전략은 대체로 보아 정부의 역할은 공공부문의 서비스 선진화 등 경제의 효율성제고 측면에 제한하면서 최소화하면서, 다자간경쟁규범의 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등 시장기구 및 경제논리의 창달에 보다 커다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범유럽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한 생산조직 및 체계의 변화,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EU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경쟁력강화 전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생산활동의 범세계화에 동승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의 정부, 기업 및 소비자들로서도 세계 최대규모의 단일 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충격파를 보다 냉정한 눈으로 분석하고 이에 면밀하게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리라고 본다.
< 參考文獻 >
박성훈 (1996) :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의 배경과 경제적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96-03」 참조.
유진수(1993) :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15」 참조.
Competitiveness Advisory Group (1995) : \"Enhancing European Competi- tiveness\". Second Report to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e Prime Ministers and Heads of State. December 1995.
European Commission , Growth, Competitiveness, Employment, White Paper, 1994.
European Commission, \"Industrial Policy in an Open and Competitive Environment. Guidelines for a Community Approach\", Communications of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o the European Parliament, COM(90) 556 final, Brussels, 16 November,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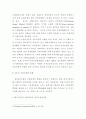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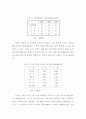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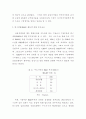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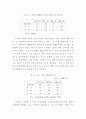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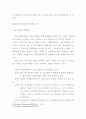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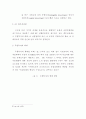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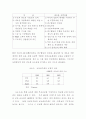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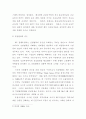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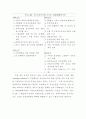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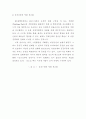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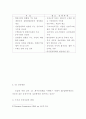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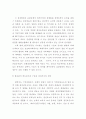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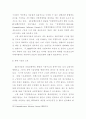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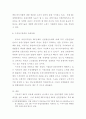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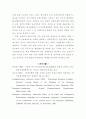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