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시읽기의기초 2025년 1학기 중간과제물
(1) ‘죽음’이란 주제를 위 세 편의 작품이 각각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세 작품을 서로 비교 대조하세요. 이 때 각 작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반드시 포함해서 서술하세요.
1. 「Death Be Not Proud」 – 존 던이 죽음에게 던지는 도전장
2.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 – 회한과 성찰의 공간, 그레이의 묘지에서
3. 「Crossing the Bar」– 테니슨의 조용한 항해
4. 죽음을 향한 세 갈래의 시선 – 공통성과 차이점, 그리고 문체적 특성
(2) 세 편의 시 분석을 토대로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이 때 자신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세 개를 정해서 글 속에 포함하세요. 과제 마지막 줄에 키워드 3개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1. 죽음은 경계일 뿐이다
2.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3. 기억이라는 ‘두 번째 삶’
(3) 참고문헌
(1) ‘죽음’이란 주제를 위 세 편의 작품이 각각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세 작품을 서로 비교 대조하세요. 이 때 각 작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을 반드시 포함해서 서술하세요.
1. 「Death Be Not Proud」 – 존 던이 죽음에게 던지는 도전장
2.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 – 회한과 성찰의 공간, 그레이의 묘지에서
3. 「Crossing the Bar」– 테니슨의 조용한 항해
4. 죽음을 향한 세 갈래의 시선 – 공통성과 차이점, 그리고 문체적 특성
(2) 세 편의 시 분석을 토대로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이 때 자신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세 개를 정해서 글 속에 포함하세요. 과제 마지막 줄에 키워드 3개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1. 죽음은 경계일 뿐이다
2.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3. 기억이라는 ‘두 번째 삶’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 마음을 떼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살아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 과연 단지 육체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한 ‘존재의 연속성’이란 단순히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서, 누군가의 경험 속에서, 누군가의 삶과 접촉했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Gray가 말한 무명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없지만, 시인의 사색과 우리 독자의 공감을 통해 그들의 존재는 시간 너머로 호흡하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언젠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이지만, 내가 타인과 맺은 관계와 남긴 흔적들, 나의 말과 행동, 감정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죽음이 존재의 종료가 아니라, 형태만 바뀐 채 지속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은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매 순간을 단절된 찰나가 아니라, 연결된 시간의 흐름 속 일부로 인식하게 되었고, 내 존재의 무게가 단지 오늘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현재를 더 귀중하게 만든다. 죽음을 넘어서도 이어지는 존재의 연속성은, 삶의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꾸게 하는 힘이 있다.
3. 기억이라는 ‘두 번째 삶’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 존경했던 인물, 혹은 한순간이라도 우리 삶에 영향을 준 이들을 기억 속에서 되살리며 살아간다. 이처럼 기억은 죽은 이를 다시 삶 속으로 초대하는 또 하나의 생명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이 개념은 Tennyson의 시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죽음을 ‘항해’로 묘사하고,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라고 말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경계 너머에 있는 존재신 또는 궁극의 자아와의 재회를 희망한다. 이는 단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삶이 끝난 이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을 계승하며, 그로부터 받은 감정을 현재에 살아 있게 하는 행위이다. Gray가 무명인의 삶을 기억하려고 애쓴 이유도, 그런 ‘기억의 윤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완전히 잊히지 않는다면,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공백이 될 수 없다. 나 역시 언젠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영향이라도 남겼다면,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기억은 인간 관계의 마지막 선물이자, 죽음이 우리 삶을 침묵시키지 못하게 하는 저항의 방식이다. 누군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인이 된다. 나의 죽음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쓰여진다면, 나는 충분히 살아낸 셈이 아닐까.
키워드: 경계 / 존재의 연속성 / 기억
(3) 참고문헌
김정환. (2019). 죽음의 시학: 영미시에서의 죽음과 존재의 인식. 서울: 문학과비평사.
박혜숙. (2016). 『테니슨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Crossing the Bar〉를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24(3), 125144.
이현우. (2014). 『존 던의 성스러운 반역: 〈Death Be Not Proud〉에 나타난 메타시적 전략』. 영문학연구논집, 56(1), 89112.
조은경. (2018). 『토마스 그레이의 엘레지에 나타난 인간 존재의 허무와 회한』. 18세기 영문학, 17(1), 5780.
백승균. (2021). 삶과 죽음의 인문학: 문학 속 죽음의 얼굴들. 서울: 사계절출판사.
내가 이해한 ‘존재의 연속성’이란 단순히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서, 누군가의 경험 속에서, 누군가의 삶과 접촉했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Gray가 말한 무명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없지만, 시인의 사색과 우리 독자의 공감을 통해 그들의 존재는 시간 너머로 호흡하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언젠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이지만, 내가 타인과 맺은 관계와 남긴 흔적들, 나의 말과 행동, 감정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죽음이 존재의 종료가 아니라, 형태만 바뀐 채 지속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은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매 순간을 단절된 찰나가 아니라, 연결된 시간의 흐름 속 일부로 인식하게 되었고, 내 존재의 무게가 단지 오늘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현재를 더 귀중하게 만든다. 죽음을 넘어서도 이어지는 존재의 연속성은, 삶의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꾸게 하는 힘이 있다.
3. 기억이라는 ‘두 번째 삶’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 존경했던 인물, 혹은 한순간이라도 우리 삶에 영향을 준 이들을 기억 속에서 되살리며 살아간다. 이처럼 기억은 죽은 이를 다시 삶 속으로 초대하는 또 하나의 생명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이 개념은 Tennyson의 시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죽음을 ‘항해’로 묘사하고,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라고 말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경계 너머에 있는 존재신 또는 궁극의 자아와의 재회를 희망한다. 이는 단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삶이 끝난 이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을 계승하며, 그로부터 받은 감정을 현재에 살아 있게 하는 행위이다. Gray가 무명인의 삶을 기억하려고 애쓴 이유도, 그런 ‘기억의 윤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완전히 잊히지 않는다면,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인 공백이 될 수 없다. 나 역시 언젠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영향이라도 남겼다면,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기억은 인간 관계의 마지막 선물이자, 죽음이 우리 삶을 침묵시키지 못하게 하는 저항의 방식이다. 누군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인이 된다. 나의 죽음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쓰여진다면, 나는 충분히 살아낸 셈이 아닐까.
키워드: 경계 / 존재의 연속성 / 기억
(3) 참고문헌
김정환. (2019). 죽음의 시학: 영미시에서의 죽음과 존재의 인식. 서울: 문학과비평사.
박혜숙. (2016). 『테니슨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Crossing the Bar〉를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24(3), 125144.
이현우. (2014). 『존 던의 성스러운 반역: 〈Death Be Not Proud〉에 나타난 메타시적 전략』. 영문학연구논집, 56(1), 89112.
조은경. (2018). 『토마스 그레이의 엘레지에 나타난 인간 존재의 허무와 회한』. 18세기 영문학, 17(1), 5780.
백승균. (2021). 삶과 죽음의 인문학: 문학 속 죽음의 얼굴들. 서울: 사계절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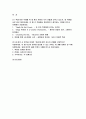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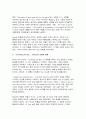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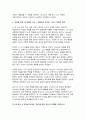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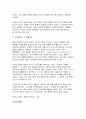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