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黃昏)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信念)이 깊은 으젓한 양(羊)처럼
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1942.4.14)
일본에 간 후 첫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시는 시인 자신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바로 그의 심리적 내면의 풍경이다.
연전 졸업 후의 진로를 두고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임무, 한 인간으로서의 이상, 또 지조....이런 여러 갈래로 처절하게 서로 부딪히고있던 갈등이, 이젠 대학 졸업 후의 문제로 일단 유예되었다. 그간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정신의 긴장이 스르르 이완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고장으로 돌려 보내면>서, <거리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를 감지한다. 그는 갈등과 긴장이 고조에 달했을 때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 지조 높은 개> ([또 다른 고향])에게 쫓기는 듯한 처절한 강박감에 시달렸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젠 긴장이 풀어져서 <하루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는 신념이 깊은 으젓한 양>과 같은 느긋한 심리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이완된 심리상태는 위험하다. 틈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다. 실제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있었다. 바로<향수>였다. [흐르는 거리],[사랑스런 전당]등 모두 5월에 쓴 시인데 두편 모두 심한 향수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불과 석달전에 통절한 시 [참회록]을 썼던 사람의 시인가/ 불과 다섯 달 반쯤전에 저 비장하고 절박한 심정이 선지 피 엉기듯이 엉기어 있던 시 [간]을 쓴 사람의 시안가? 과연 그러한가?
이들 시의 행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한 젊은이의 모습, 이국땅에서 향수병에 시달리며 마음붙일 곡 없어 그저 서성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그런 의문은 참으로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젊은이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다가가서 지켜보노라면, 서성거리는 겉모습보다는 그의 상한 마음 쪽이 차츰 더욱 크게 부각되어옴을 느낀다. 그가 그처럼 향수에 시달렸다는 것은 상실한것에 대한 통증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오래 서성거리지 않았다. 그후 얼마안되 [쉽게 쓰여진 시]를 통해 그는 그의 심령을 물어뜯던 향수를 극복하고 났다.
쉽게 쓰여진 詩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6疊房(6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어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講義)를 들으로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마,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데 씌어지는 것은
부그러운 일이다.
6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握手)
(1942.6.3)
한 식민지 청년이 적국이자 종주국인나라의 수도에 서서, 자신은 결코 그들의 신민이 아님을 선언하는 데는 이 한마디로 족했던 것이다. <육첩방은 남의나라>라고.....
이 선언은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6첩방> 적인 크기밖에 지니지 못한 나라, 라는 이중적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 볼 것이다.
[쉽게 씌어진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서 펼칠 본격적인 시생활의 출발점이란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시에서 그는<생각해 보면 어린때 동무를/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나는 무얼 바라/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자문함으로써, 일본에 도착해서부터 그때까지의 <서성거린>생활을 두고 <침전>이라고 냉철하게 규정짓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스스로를 성찰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는 드디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로 자신을 새롭게 정립했다. 그리하여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자기자신과 <눈물과 위안으로> 된 <최초의 악수>를 교환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윤동주가 다다른 이러한 시적 깊이와 각오를 고찰해 볼수록, 다시금 일경에 체포될 때 같이 압수되어 증발하고 만 그의 나머지 시들의 행방이 안타까울뿐이다.
그 후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윤동주 시인의 고결하고 짤은 생은 그렇게 감옥에서 마감하게 된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黃昏)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信念)이 깊은 으젓한 양(羊)처럼
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1942.4.14)
일본에 간 후 첫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시는 시인 자신에 대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바로 그의 심리적 내면의 풍경이다.
연전 졸업 후의 진로를 두고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임무, 한 인간으로서의 이상, 또 지조....이런 여러 갈래로 처절하게 서로 부딪히고있던 갈등이, 이젠 대학 졸업 후의 문제로 일단 유예되었다. 그간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정신의 긴장이 스르르 이완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고장으로 돌려 보내면>서, <거리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를 감지한다. 그는 갈등과 긴장이 고조에 달했을 때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 지조 높은 개> ([또 다른 고향])에게 쫓기는 듯한 처절한 강박감에 시달렸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젠 긴장이 풀어져서 <하루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는 신념이 깊은 으젓한 양>과 같은 느긋한 심리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이완된 심리상태는 위험하다. 틈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다. 실제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있었다. 바로<향수>였다. [흐르는 거리],[사랑스런 전당]등 모두 5월에 쓴 시인데 두편 모두 심한 향수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불과 석달전에 통절한 시 [참회록]을 썼던 사람의 시인가/ 불과 다섯 달 반쯤전에 저 비장하고 절박한 심정이 선지 피 엉기듯이 엉기어 있던 시 [간]을 쓴 사람의 시안가? 과연 그러한가?
이들 시의 행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한 젊은이의 모습, 이국땅에서 향수병에 시달리며 마음붙일 곡 없어 그저 서성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그런 의문은 참으로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젊은이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다가가서 지켜보노라면, 서성거리는 겉모습보다는 그의 상한 마음 쪽이 차츰 더욱 크게 부각되어옴을 느낀다. 그가 그처럼 향수에 시달렸다는 것은 상실한것에 대한 통증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오래 서성거리지 않았다. 그후 얼마안되 [쉽게 쓰여진 시]를 통해 그는 그의 심령을 물어뜯던 향수를 극복하고 났다.
쉽게 쓰여진 詩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6疊房(6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詩人)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어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講義)를 들으로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마,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데 씌어지는 것은
부그러운 일이다.
6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最後)의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握手)
(1942.6.3)
한 식민지 청년이 적국이자 종주국인나라의 수도에 서서, 자신은 결코 그들의 신민이 아님을 선언하는 데는 이 한마디로 족했던 것이다. <육첩방은 남의나라>라고.....
이 선언은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6첩방> 적인 크기밖에 지니지 못한 나라, 라는 이중적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 볼 것이다.
[쉽게 씌어진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서 펼칠 본격적인 시생활의 출발점이란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시에서 그는<생각해 보면 어린때 동무를/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나는 무얼 바라/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자문함으로써, 일본에 도착해서부터 그때까지의 <서성거린>생활을 두고 <침전>이라고 냉철하게 규정짓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스스로를 성찰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는 드디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로 자신을 새롭게 정립했다. 그리하여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자기자신과 <눈물과 위안으로> 된 <최초의 악수>를 교환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윤동주가 다다른 이러한 시적 깊이와 각오를 고찰해 볼수록, 다시금 일경에 체포될 때 같이 압수되어 증발하고 만 그의 나머지 시들의 행방이 안타까울뿐이다.
그 후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윤동주 시인의 고결하고 짤은 생은 그렇게 감옥에서 마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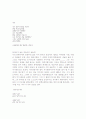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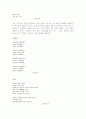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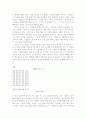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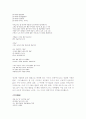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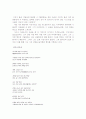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