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서 론
Ⅰ. 특수상대성 이론(Special Theory of Relativity)
Ⅲ. 역사적 조망
제 2장 특수상대성 관련 이론
Ⅰ. 개관
Ⅱ. 갈릴레이 변환
Ⅲ. 빛의 속력과 에테르
...
Ⅰ. 특수상대성 이론(Special Theory of Relativity)
Ⅲ. 역사적 조망
제 2장 특수상대성 관련 이론
Ⅰ. 개관
Ⅱ. 갈릴레이 변환
Ⅲ. 빛의 속력과 에테르
...
본문내용
른 부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 물리학에서의 시간과공간은 서로 독립적이며 물질의 존재로부터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서 이를\"절대공간\", \"절대시간\"이라 부른다. 구체적으로, 공간은 유클리드 기하로 기술되는 연속적이고 균질적, 등방적인 무한대 3차원 공간이고 시간은 모든 관측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무한히 연속되는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개념은 가장 간명한 것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적인 감각과도 잘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관측을 통해서도 확인될수 있는 개념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혹시 근사적으로만 성립되고 엄밀하게는 틀린 개념인지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상대성이론에서는 고전 물리학에서와는 다른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을 인식한다.
이처럼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역학이론이 가지고 있던 고정 관념을 깨고 현대 물리학의 지평을 연 태두이다.
제 7장 결 론
아인슈타인은 그의 생전에 광전효과에 관한 연구,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이론, 통일장 이론 등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지만 그에 대해 특히 신비스럽게 비추어지는 것은 그의 특수상대성이론이다. 상대성이론에 관해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렇듯이 자신도 모르게 한 두번은 공상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간의 거리를 재기 위해 자를 쓰고, 시간의 흐름을 알기 위해 시계를 사용한다. 그런데 만약 자의 길이가 수시로 변하고 시간의 초점이 불규칙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군가가 \'자의 길이와 시간의 흐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정하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물리학에 관해 문외한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길이의 자와 정확한 시계라 할 지라도 그 이동속도에 따라 길이는 짧아지고, 시간은 늦어진다는 것을 발표한 이래 이러한 물리관은 뉴턴 이후의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큰 발견, 발명이나 학설은 처음부터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 노력이 경주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우연한 동기나 작은 생각의 발단이 자라고 자라서 큰 결실을 맺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내게 된 데에는 처음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기 보다는 그에 관한 일화대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생긴 처음의 작은 의문이 싹이 되어서 큰 우주법칙을 찾아내게 된 것이라든지, 프랭클린이 벼락치는 것을 보고 종국에는 피뢰침을 고안해 내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지 하는 예는 과학사에 얼마든지 있다.
뉴턴이나 프랭클린 이후에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다거나 벼락치는 것을 본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모두가 평범하게 겪는 일상사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피뢰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초 사유의 발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화려한 결과에 가려서 고귀한 사유의 동기가 묻혀지기 쉬우며 이는 애석한일이라 사료된다. 인류문명의 보다 내실하고 장구한 발전을 위해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좋은 결과를 낳게 한 최초 사유의 동기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의미의 발단이 어떠한 현상의 결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가리는 일은 일회적인 좋은 성과에 만족하는 것보다 사유의 전개과정과 총체성을 파악하게 됨으로서 다음의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날 천체운행에 관한 인류의 오랜 의문은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냄으로서 그 신비스런 경외로부터 조화로운 감탄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자연에 대한 인류의 정서를 순화시키는데도 큰 몫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을 내놓음으로서 대자연을 다시 신비주의로 몰아가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의 양자론과 더불어 대자연의 마지막은 불확정적인 신비로 마무리져 있다는 인상을 확산시킴으로서 오늘날 현대과학은 다시금 인류를\'조화로운 자연관\'으로부터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조화로운 것이며, 막연한 신비주의가 대자연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을 우리는 저버리기 어려우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은 이처럼 자연의 면모를 일부 밝혀 놓은 것에 불과하다. 과학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대자연의 신비를 일부 밝힌 탐험가적인 역량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잘못 악용되어 원지폭탄의 제조에 이용되었다는 것은 그 이론 오용의 돌이킬 수 없는 적용의 한 예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론도 대자연의 위력에 한 걸음 다가서는 근본 이치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생명의 터전이면서 우리에게 끝없는 의문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다시 그 답을 간직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인류를 항상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에 과학은 인류가 자연을 좀더 잘 이용하면서 자연에 대한 질문방식을 결정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연에서 찾아가는 일련의 탐구과정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과학이 묻는 방식대로 답할 것이며, 어떤 과학도 그 답은 자연에 있고, 훌륭한 과학일수록 대자연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Charles Kittle, Walter D. Knight, Malvin A. Ruderman, 1973. Mechanics.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in Publication Data.
Arthur Beiser, Concept of Modern Physics, 1991. 현대물리학, 장준성, 이재성, 1994. 형설출판사.
Grant R. Fowles, Analytical Mechanics 4th editon, 1986. 임우영 외 3인, 역학, 1993. 반도출판사.
A. Einstein, Theory of Relativity, 김종오 역, 1992, 미래사
N. Colder, Cosmos of Einstein, 김기대 역, 1994, 미래사
뉴튼 1999년 3월호, 계몽사
과학동아 1998년 12월호, 동아출판사
이처럼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역학이론이 가지고 있던 고정 관념을 깨고 현대 물리학의 지평을 연 태두이다.
제 7장 결 론
아인슈타인은 그의 생전에 광전효과에 관한 연구,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이론, 통일장 이론 등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지만 그에 대해 특히 신비스럽게 비추어지는 것은 그의 특수상대성이론이다. 상대성이론에 관해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렇듯이 자신도 모르게 한 두번은 공상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떨어져 있는 두 물체간의 거리를 재기 위해 자를 쓰고, 시간의 흐름을 알기 위해 시계를 사용한다. 그런데 만약 자의 길이가 수시로 변하고 시간의 초점이 불규칙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군가가 \'자의 길이와 시간의 흐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정하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물리학에 관해 문외한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길이의 자와 정확한 시계라 할 지라도 그 이동속도에 따라 길이는 짧아지고, 시간은 늦어진다는 것을 발표한 이래 이러한 물리관은 뉴턴 이후의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큰 발견, 발명이나 학설은 처음부터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 노력이 경주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우연한 동기나 작은 생각의 발단이 자라고 자라서 큰 결실을 맺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내게 된 데에는 처음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기 보다는 그에 관한 일화대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생긴 처음의 작은 의문이 싹이 되어서 큰 우주법칙을 찾아내게 된 것이라든지, 프랭클린이 벼락치는 것을 보고 종국에는 피뢰침을 고안해 내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지 하는 예는 과학사에 얼마든지 있다.
뉴턴이나 프랭클린 이후에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다거나 벼락치는 것을 본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모두가 평범하게 겪는 일상사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피뢰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초 사유의 발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화려한 결과에 가려서 고귀한 사유의 동기가 묻혀지기 쉬우며 이는 애석한일이라 사료된다. 인류문명의 보다 내실하고 장구한 발전을 위해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좋은 결과를 낳게 한 최초 사유의 동기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의미의 발단이 어떠한 현상의 결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가리는 일은 일회적인 좋은 성과에 만족하는 것보다 사유의 전개과정과 총체성을 파악하게 됨으로서 다음의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날 천체운행에 관한 인류의 오랜 의문은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냄으로서 그 신비스런 경외로부터 조화로운 감탄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자연에 대한 인류의 정서를 순화시키는데도 큰 몫을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을 내놓음으로서 대자연을 다시 신비주의로 몰아가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의 양자론과 더불어 대자연의 마지막은 불확정적인 신비로 마무리져 있다는 인상을 확산시킴으로서 오늘날 현대과학은 다시금 인류를\'조화로운 자연관\'으로부터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조화로운 것이며, 막연한 신비주의가 대자연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을 우리는 저버리기 어려우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은 이처럼 자연의 면모를 일부 밝혀 놓은 것에 불과하다. 과학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대자연의 신비를 일부 밝힌 탐험가적인 역량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잘못 악용되어 원지폭탄의 제조에 이용되었다는 것은 그 이론 오용의 돌이킬 수 없는 적용의 한 예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론도 대자연의 위력에 한 걸음 다가서는 근본 이치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생명의 터전이면서 우리에게 끝없는 의문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다시 그 답을 간직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인류를 항상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에 과학은 인류가 자연을 좀더 잘 이용하면서 자연에 대한 질문방식을 결정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연에서 찾아가는 일련의 탐구과정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과학이 묻는 방식대로 답할 것이며, 어떤 과학도 그 답은 자연에 있고, 훌륭한 과학일수록 대자연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Charles Kittle, Walter D. Knight, Malvin A. Ruderman, 1973. Mechanics.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in Publication Data.
Arthur Beiser, Concept of Modern Physics, 1991. 현대물리학, 장준성, 이재성, 1994. 형설출판사.
Grant R. Fowles, Analytical Mechanics 4th editon, 1986. 임우영 외 3인, 역학, 1993. 반도출판사.
A. Einstein, Theory of Relativity, 김종오 역, 1992, 미래사
N. Colder, Cosmos of Einstein, 김기대 역, 1994, 미래사
뉴튼 1999년 3월호, 계몽사
과학동아 1998년 12월호, 동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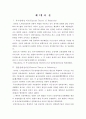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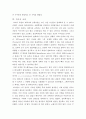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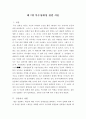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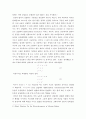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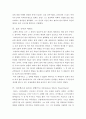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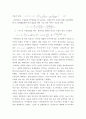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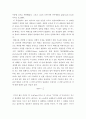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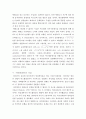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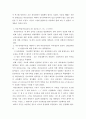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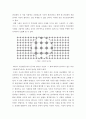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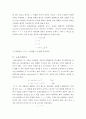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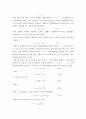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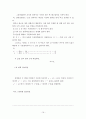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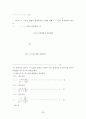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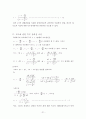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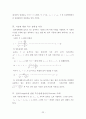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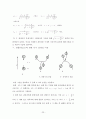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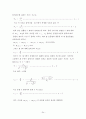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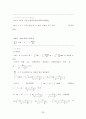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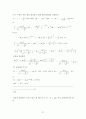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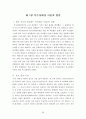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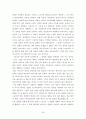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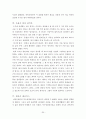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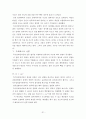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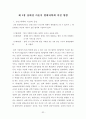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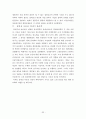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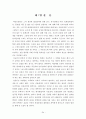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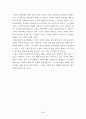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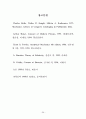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