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조리극의 플롯구조
2. 마당극의 병렬플롯구조
2. 마당극의 병렬플롯구조
본문내용
의 모든 플롯구조가 이런 것은 아니며, 초기에 창작된 작품들이 이런 경향이 강하다) 마당극운동의 초창기에 나온 작품인 김지하의 <진오귀 굿>([한국의 민중극], 창작과비평사에 실려 있음)을 보면, <해설자마당> <도깨비마당> <협업마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세 마당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의 플롯구조에 비해 월등히 느슨하게 묶여져 있다. 특히 해설자 마당이 판소리의 공연자질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도깨비마당은 서구적 무대극의 공연자질을 활용하여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협업마당은 가면극적인 공연기술로 농민들의 현실을 극복해나갈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세 마당은 독립성이 강하지만, 당대 농촌과 농민들의 현실을 드러내어 알려주고, 극복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향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병렬의 플롯구조는 연극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전체 모습 중에서 그 현상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부분만 선택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얻고 있다. 즉 일관된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기보다는, 선택한 부분을 강조하여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상황이 지니는 의미를 관객들이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렬의 플롯구조는 연극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전체 모습 중에서 그 현상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부분만 선택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얻고 있다. 즉 일관된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기보다는, 선택한 부분을 강조하여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상황이 지니는 의미를 관객들이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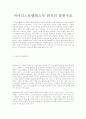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