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러한 측면이 지속적으로 흡수되어감을 인식할 수가 있을 것이다.
. 불확실성하에서 합리적인 행위에 대한 경우, 기대가치이론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관적 효용이론은 경제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기는 해야지만, 합리성으로 수용된다. 프리드만의 영구소득가설에 대한 예가 바로 그렇다. (즉, 합리적인 것보다 할인율이 높지만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
- 다른 쪽의 예들도 있다.
. 제12장에 나오는 화폐의 정의가 그렇다. 사람들은 화폐를 교환의 수단으로서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용도의 목저을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이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도리어 기존의 이론에 여러 류의 변수를 더 포함하는 것이 된다.
. 제12장에 나오는 저축이론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저축을 미래소비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고 대부분의이론이 그렇다.(영구소득가설을 포함하여서) 그러나, 이런이론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있다.(Johnson 1971) 따라서 Clower & Johnson(1968)은 부를 미래소비를 위한 비축이 아닌 것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효용은 자산과 소비의 함수로서 다루어도 최적화 이론으로 역시 기능은 발휘한다.
- Rachlin은 결국 경제심리학자들이 극대화를 꼬집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차라리 주어진 상화에서 극대화의 대상(maximand)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근사극대화 : approximate maximization}
- 수학적인 극대화를 보면 극대화의 근방에서 미분값은 매우 조금씩 변한다. 따라서 유사극대화의 근방은 상당한 범주를 가질 수가 있다.
[합리성의 비중요성 : the unimportant of rationality ]
- 분명, 합리성 가정은 무너버릴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우리가 내릴 수있는 결론은 이 가정이 경제에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있는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다음에 기술되는 장에서는 경제행위를 설명하는데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동시에 이용된다.
- Rachlin(1980)의 합리성에 대한 관점으로 되돌아 가자. 어떠한 일관적인 행위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있다. 이것은 합리성의 가정을 거의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그의 주장은 우리의 관점을 이동시켰다. 극대화되느냐에서 무엇을 극대화하는냐로, 그에 의하면,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극대화대상, 상품, 강화물, 적합성 : Maximands, goods, reinforcers, and fitness}
- Rachlin의 주장은 다른 생물학과 사회과학의 몇가지 다른 것과 병치된다.
. 예를들어서, 경제학에서 재화를 정의하는 문제를 고려해보자. 이것은 욕감의 공준과 순환론법에 빠진다. 재화는 욕망이 포화되지 않아야한다. 그런데 욕망이 포화되는 것은 비재화가 된다. 따라서 재화에서는 욕망의 법칙이 언제나 성립한다. 따라서 이공준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체로서는 비판이 불가능하고, 다만 포화가 존재하는 것을 중심적인 주제로 삼아야한다. (premack principle의 도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 극대화문제에대한 두번째 양립은 심리학에서 온다.
. 강화물을 자극재로 본다. 강화물은 반응을 낳는다. 그렇다면, 강화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 다른 병치는 진화생물학(evolutionary biology)에서도 유도된다.
. 생물의 적합성은 한 생물의 번식된 자손의 수로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다윈이론의 기초적인 주장에 대하여 논의를 할 수가 없다. 적자는 생존하고, 생존자는 적자이다. 우리는 적합성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 여기서는 모두 문제의 논의를 다른 방향을 돌리므로써 진전을 보았다. 여기서도 경제심리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기로 한다.
{인간의 경제행위는 합리적인가? : is human economic behavior rational ?}
- 경제행위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를 묻는 것은 유익한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일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또한 비합리성을 포함하는 공준을 만들거나, 합리성을 재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전망있는 접근법이 아니다.
- 합리성의 공준이 왜 심리경제학을 비생산적으로 만드는가 ? 앞에서 살펴본 바를 재고하면 이유가 몇가지 있다.
1. 이것은 경제하과 심리학의 이분법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통합을 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퇴보적이다.
2. 합리성에대한 논쟁의 집중은 이론우선(theory-first)의 경제심리학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료중심적인 접근법(data-driven approach)을 경제학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경제심리학에서 밝혀야 할 것은 경제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이다.(Rachlin이 주장) 이것은 한편 인간욕구(human needs)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는 인간행동의 내용을 깊이 보고 합리성의 가정은 가볍게 다룰 필요가 있다.
- 합리성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것을 중심으로 학문을 하여야 할 까 ? 이것은 제 20장에서 거론될 것이다. 이것은 Paradigm의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
1. 개인의 경제행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경제현상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 우리는 경제구조(economic structure)와 개인의 욕구(individual needs)가 어떻게 상호제약을 하면서 작용하는가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나머지에서는 이러한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로 하겠다.
요약작성 1996년 1월 29~31
제5장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인가 ?
The Individual In The Economy - a taxt book of economic psychology-
written by
Stephen E.G. Lea
Roger M. Tarpy
Paul Webley
in 1987
at Combridge university press.
. 불확실성하에서 합리적인 행위에 대한 경우, 기대가치이론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관적 효용이론은 경제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기는 해야지만, 합리성으로 수용된다. 프리드만의 영구소득가설에 대한 예가 바로 그렇다. (즉, 합리적인 것보다 할인율이 높지만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
- 다른 쪽의 예들도 있다.
. 제12장에 나오는 화폐의 정의가 그렇다. 사람들은 화폐를 교환의 수단으로서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용도의 목저을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이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도리어 기존의 이론에 여러 류의 변수를 더 포함하는 것이 된다.
. 제12장에 나오는 저축이론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저축을 미래소비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고 대부분의이론이 그렇다.(영구소득가설을 포함하여서) 그러나, 이런이론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있다.(Johnson 1971) 따라서 Clower & Johnson(1968)은 부를 미래소비를 위한 비축이 아닌 것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효용은 자산과 소비의 함수로서 다루어도 최적화 이론으로 역시 기능은 발휘한다.
- Rachlin은 결국 경제심리학자들이 극대화를 꼬집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차라리 주어진 상화에서 극대화의 대상(maximand)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근사극대화 : approximate maximization}
- 수학적인 극대화를 보면 극대화의 근방에서 미분값은 매우 조금씩 변한다. 따라서 유사극대화의 근방은 상당한 범주를 가질 수가 있다.
[합리성의 비중요성 : the unimportant of rationality ]
- 분명, 합리성 가정은 무너버릴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우리가 내릴 수있는 결론은 이 가정이 경제에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있는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다음에 기술되는 장에서는 경제행위를 설명하는데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동시에 이용된다.
- Rachlin(1980)의 합리성에 대한 관점으로 되돌아 가자. 어떠한 일관적인 행위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있다. 이것은 합리성의 가정을 거의 무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그의 주장은 우리의 관점을 이동시켰다. 극대화되느냐에서 무엇을 극대화하는냐로, 그에 의하면,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극대화대상, 상품, 강화물, 적합성 : Maximands, goods, reinforcers, and fitness}
- Rachlin의 주장은 다른 생물학과 사회과학의 몇가지 다른 것과 병치된다.
. 예를들어서, 경제학에서 재화를 정의하는 문제를 고려해보자. 이것은 욕감의 공준과 순환론법에 빠진다. 재화는 욕망이 포화되지 않아야한다. 그런데 욕망이 포화되는 것은 비재화가 된다. 따라서 재화에서는 욕망의 법칙이 언제나 성립한다. 따라서 이공준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체로서는 비판이 불가능하고, 다만 포화가 존재하는 것을 중심적인 주제로 삼아야한다. (premack principle의 도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 극대화문제에대한 두번째 양립은 심리학에서 온다.
. 강화물을 자극재로 본다. 강화물은 반응을 낳는다. 그렇다면, 강화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 다른 병치는 진화생물학(evolutionary biology)에서도 유도된다.
. 생물의 적합성은 한 생물의 번식된 자손의 수로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다윈이론의 기초적인 주장에 대하여 논의를 할 수가 없다. 적자는 생존하고, 생존자는 적자이다. 우리는 적합성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 여기서는 모두 문제의 논의를 다른 방향을 돌리므로써 진전을 보았다. 여기서도 경제심리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기로 한다.
{인간의 경제행위는 합리적인가? : is human economic behavior rational ?}
- 경제행위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를 묻는 것은 유익한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일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또한 비합리성을 포함하는 공준을 만들거나, 합리성을 재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전망있는 접근법이 아니다.
- 합리성의 공준이 왜 심리경제학을 비생산적으로 만드는가 ? 앞에서 살펴본 바를 재고하면 이유가 몇가지 있다.
1. 이것은 경제하과 심리학의 이분법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통합을 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퇴보적이다.
2. 합리성에대한 논쟁의 집중은 이론우선(theory-first)의 경제심리학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료중심적인 접근법(data-driven approach)을 경제학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경제심리학에서 밝혀야 할 것은 경제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이다.(Rachlin이 주장) 이것은 한편 인간욕구(human needs)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는 인간행동의 내용을 깊이 보고 합리성의 가정은 가볍게 다룰 필요가 있다.
- 합리성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것을 중심으로 학문을 하여야 할 까 ? 이것은 제 20장에서 거론될 것이다. 이것은 Paradigm의 구축과 관련된 것이다.
1. 개인의 경제행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경제현상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 우리는 경제구조(economic structure)와 개인의 욕구(individual needs)가 어떻게 상호제약을 하면서 작용하는가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나머지에서는 이러한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로 하겠다.
요약작성 1996년 1월 29~31
제5장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인가 ?
The Individual In The Economy - a taxt book of economic psychology-
written by
Stephen E.G. Lea
Roger M. Tarpy
Paul Webley
in 1987
at Combridge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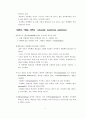





























소개글